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배경설화
2.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3. 시대적 배경과 녹림군자(綠林君子)
4. 사상적 배경과 석영재(釋永才)
5. 문학적 분석
Ⅲ. 맺음말
Ⅱ. 본문
1. 배경설화
2.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3. 시대적 배경과 녹림군자(綠林君子)
4. 사상적 배경과 석영재(釋永才)
5. 문학적 분석
Ⅲ. 맺음말
본문내용
우적가(遇賊歌)
차 례
Ⅰ. 머리말
Ⅱ. 본문
1. 배경설화
2.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3. 시대적 배경과 녹림군자(綠林君子)
4. 사상적 배경과 석영재(釋永才)
5. 문학적 분석
Ⅲ. 맺음말
Ⅰ. 머리말
우적가는 三國遺事 卷五 避隱 第八永才遇賊條에 전하는 노래로 원문의 해독이 그리 쉬운 편이 아니며 더욱이 결자가 많아서 그 결자 선택에 따라 커다란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노래의 명칭도 우적가(양주동, 조윤제), 도적가(홍기문, 김사엽), 永才述懷(정열모), 永才遇賊(지헌영), 永才遇賊歌(류창선), 도둑 만남 노래(김선기) 등으로 지칭된다.
우적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향가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독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학적 해독의 결과에 따라서 문학적 작품해석, 배경설화의 이해에도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본고에서는 우적가를 중심으로 배경설화의 연구,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시대적 배경과 녹림군자(綠林君子), 사상적 배경과 석영재(釋永才), 문학적 분석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본문
1. 배경설화
釋永才 性滑稽 不累於物 善鄕歌 暮歲將隱于南岳 至大峴嶺 遇賊大十餘人 將加害 才臨刃無懼色 怡然當之 賊怪而問其名 曰永才 賊素聞其名 乃命作歌 其辭曰(歌略)賊感其意 贈之綾二端 才笑而前謝曰 知財賄之爲地獄根本 將避於窮山 以餞一生 何敢受焉 乃投之地 賊又感其言 皆釋 投戈 落髮爲徒 同隱智異 不復蹈世 才年僅九十矣 在元聖大王之世 讚曰 策杖歸山意轉深 綺紈珠玉豈治心 綠林君子休相贈 地獄無根只寸金
영재 스님은 천성이 활달하여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 지었다. 만년에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현령에 이르렀을때, 60여명의 도적을 만났다. 도적들이 그를 해치려 했지만 영재는 그들의 칼날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없이 태연히 맞섰다. 도적들은 이상하게 여겨 그 이름을 물었는데, 그는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적들은 본래 그 이름을 들어오던 터라 그에게 명하여 노래를 짓게 하였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가략) 도적들은 그 뜻에 감동되어 비단 두 필을 주었으나 영재는 웃으면서 사양하고 말하기를 “재물이 지옥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여 깊은 산에 숨어 일생을 보내려 하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것을 받겠느냐?” 하고 비단을 땅에 던져 버렸다. 도적들은 다시 그 말에 감동되어 지니고 있던 창과 칼을 모두 던져버리고 머리를 깍고 영재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영재와 함께 지리산에 들어가 숨은 뒤로는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때 영재의 나이 90이었고, 원성대왕(서기 785~798) 때 일이었다. 이렇게 찬을 한다.
지팡이 짚고 산을 찾는 그 뜻 더욱 깊은데
비단이나 주옥이 어찌 그 마음 다스리랴.
숲속의 군자들아 주려고 생각 말라.
지옥이 따로 없다 촌금(寸金)일 뿐이다.
2.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원문〉 〈의역〉
自矣心米 제 마음의
史毛達只將來呑隱日- 참 모습을 모르던 날을
遠鳥逸過出知遣 멀리 지나 보내고
今呑藪未去遣省如 이제는 숨어서 가고자 한다
但非乎隱焉破主 오직 그릇된 파계주를 만나
次弗史內於都還於尸朗也 두려움에 다시 또 돌아가겠는가
此兵物叱沙過乎 이 칼에 찔리고
好尸曰沙也內乎呑尼 좋은 날이 고대 새리라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陵隱 아아 오직 요만한 선업은
安支尙宅都乎隱以多 새집이 안됩니다
- 양주동 -
〈직역〉
제 매 제의 제 미
모려 날 즈 모 보려든, 모기려 날
머리 디나치고 日遠鳥逸 라 난 알고 멀오 디나치고
차 례
Ⅰ. 머리말
Ⅱ. 본문
1. 배경설화
2.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3. 시대적 배경과 녹림군자(綠林君子)
4. 사상적 배경과 석영재(釋永才)
5. 문학적 분석
Ⅲ. 맺음말
Ⅰ. 머리말
우적가는 三國遺事 卷五 避隱 第八永才遇賊條에 전하는 노래로 원문의 해독이 그리 쉬운 편이 아니며 더욱이 결자가 많아서 그 결자 선택에 따라 커다란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노래의 명칭도 우적가(양주동, 조윤제), 도적가(홍기문, 김사엽), 永才述懷(정열모), 永才遇賊(지헌영), 永才遇賊歌(류창선), 도둑 만남 노래(김선기) 등으로 지칭된다.
우적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향가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독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학적 해독의 결과에 따라서 문학적 작품해석, 배경설화의 이해에도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본고에서는 우적가를 중심으로 배경설화의 연구,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시대적 배경과 녹림군자(綠林君子), 사상적 배경과 석영재(釋永才), 문학적 분석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본문
1. 배경설화
釋永才 性滑稽 不累於物 善鄕歌 暮歲將隱于南岳 至大峴嶺 遇賊大十餘人 將加害 才臨刃無懼色 怡然當之 賊怪而問其名 曰永才 賊素聞其名 乃命作歌 其辭曰(歌略)賊感其意 贈之綾二端 才笑而前謝曰 知財賄之爲地獄根本 將避於窮山 以餞一生 何敢受焉 乃投之地 賊又感其言 皆釋 投戈 落髮爲徒 同隱智異 不復蹈世 才年僅九十矣 在元聖大王之世 讚曰 策杖歸山意轉深 綺紈珠玉豈治心 綠林君子休相贈 地獄無根只寸金
영재 스님은 천성이 활달하여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 지었다. 만년에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현령에 이르렀을때, 60여명의 도적을 만났다. 도적들이 그를 해치려 했지만 영재는 그들의 칼날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없이 태연히 맞섰다. 도적들은 이상하게 여겨 그 이름을 물었는데, 그는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적들은 본래 그 이름을 들어오던 터라 그에게 명하여 노래를 짓게 하였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가략) 도적들은 그 뜻에 감동되어 비단 두 필을 주었으나 영재는 웃으면서 사양하고 말하기를 “재물이 지옥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여 깊은 산에 숨어 일생을 보내려 하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것을 받겠느냐?” 하고 비단을 땅에 던져 버렸다. 도적들은 다시 그 말에 감동되어 지니고 있던 창과 칼을 모두 던져버리고 머리를 깍고 영재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영재와 함께 지리산에 들어가 숨은 뒤로는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때 영재의 나이 90이었고, 원성대왕(서기 785~798) 때 일이었다. 이렇게 찬을 한다.
지팡이 짚고 산을 찾는 그 뜻 더욱 깊은데
비단이나 주옥이 어찌 그 마음 다스리랴.
숲속의 군자들아 주려고 생각 말라.
지옥이 따로 없다 촌금(寸金)일 뿐이다.
2. 원문 해석과 어휘 풀이
〈원문〉 〈의역〉
自矣心米 제 마음의
史毛達只將來呑隱日- 참 모습을 모르던 날을
遠鳥逸過出知遣 멀리 지나 보내고
今呑藪未去遣省如 이제는 숨어서 가고자 한다
但非乎隱焉破主 오직 그릇된 파계주를 만나
次弗史內於都還於尸朗也 두려움에 다시 또 돌아가겠는가
此兵物叱沙過乎 이 칼에 찔리고
好尸曰沙也內乎呑尼 좋은 날이 고대 새리라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陵隱 아아 오직 요만한 선업은
安支尙宅都乎隱以多 새집이 안됩니다
- 양주동 -
〈직역〉
제 매 제의 제 미
모려 날 즈 모 보려든, 모기려 날
머리 디나치고 日遠鳥逸 라 난 알고 멀오 디나치고
추천자료
 한국문학사의 시대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사의 시대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 향가, 고려가요 등등
한국문학- 향가, 고려가요 등등 『한국문학의 이해』(김흥규, 민음사, 1998) 내용 요약·정리
『한국문학의 이해』(김흥규, 민음사, 1998) 내용 요약·정리 <국문학사>와 <한국문학통사> 비교
<국문학사>와 <한국문학통사> 비교 [한국현대문학] 신경숙 외딴방 등장인물과 작품분석
[한국현대문학] 신경숙 외딴방 등장인물과 작품분석 [한국문학A+] 백석과 정지용 작품 중심으로 1930년대 시세계과 모더니즘 분석
[한국문학A+] 백석과 정지용 작품 중심으로 1930년대 시세계과 모더니즘 분석  [한국현대문학A+] 정미경 작가소개와 주요작품분석 및 등장인물분석
[한국현대문학A+] 정미경 작가소개와 주요작품분석 및 등장인물분석 한국문학입문 (강의)
한국문학입문 (강의) 한국문학사 (김시습과 <금오신화> , 허균(許筠)과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8231...
한국문학사 (김시습과 <금오신화> , 허균(許筠)과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8231... 한국문학 작품 중 외국인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작품을 선택하셔서 그 작품에 대한 교수법과 ...
한국문학 작품 중 외국인에게 교육시키고 싶은 작품을 선택하셔서 그 작품에 대한 교수법과 ... 한국현대문학사 (권영민) 1-2권 정리
한국현대문학사 (권영민) 1-2권 정리 1910년대의 한국문학 레포트
1910년대의 한국문학 레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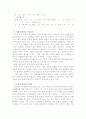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