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분에 대한 다양한 고전작품을
조사하여
본문과 설명
(총 19작품)
조사하여
본문과 설명
(총 19작품)
본문내용
갈라지는 긴 가뭄 끝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내려 거북등 같은 논바닥을 적실 때, 모든 것이 어리둥절한 낯선 타관 땅에서 옛 친구와 약속도 없이 만났을 때, 그 기쁨이야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 수줍기만 한 신부와의 첫날밤, 과거 급제의 방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였을 때의 설레임은 어떨까. 인간 세상의 유쾌한 득의사를 노래한 것이다. 그러자 어떤 장난스런 사람이 여기에 잇대어 「失意詩(실의시)」한 수를 지었다.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우는 모습
장군이 적에게 사로잡혔을 때.
은혜 잃은 궁녀의 표정
과거에 낙방한 선비의 심정.
복풍한설 몰아치는 겨울 골목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과부의 모습, 위풍당당하던 기상은 간데없이 초라하게 적 앞에 무릎을 꿇은 늙은 장군의 처참한 심정, 임금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긴 궁녀의 허탈한 표정,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나 금년에도 합격자의 명단에 끼지 못한 만년 낙방 선비의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을 그 누가 알랴. 장난시이면서도 인생의 단면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과거 급제가 예전 선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니 이를 제재로 한 시가 옛 시화 중에 심심찮게 보인다. 청나라 원매는 「수원시화」에서 당청신唐靑臣이란 이의 「落第詩(낙제시)」를 소개하고 있다.
급제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오니
처자의 낯빛이 반기는 기색 없네.
누렁이만 흡사 반갑다는 듯
문 앞에 드러누워 꼬리 흔드네.
남편의 과거 급제만 바라보고 그간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또 낙방을 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남편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아내의 구박이 서운은 하지만 또 어찌하랴. 다만 충직한 황구만이 제 주인을 알아보고 문 앞까지 나와 꼬리를 흔들며 반갑다 한다. 찬밥 신세이기로는 저나 나나 같으니, 동병상련의 연민은 아니었을까. 뒤로 벌렁 누워 오랜만에 보는 주인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누렁이의 모습이, 이를 바라보는 주인의 씁쓸한 표정과 함께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다.
낙제하고 보니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내의 냉대이다. 당나라 때 두고杜羔가 과거에 낙방하고 집에 돌아가려 하자, 그 아내가 시를 지어 보냈다.
낭군께선 우뚝한 재주를 지니시곤
무슨 일로 해마다 낙제하고 오십니까?
이제는 님의 낯을 뵙기 부끄러우니
오시려든 밤중에나 돌아오시소.
이건 숫제 협박이나 진배없다. 누구는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느냔 말이다. 한낮에 말고 밤중에 들어오라니, 사실 자기가 남편 얼굴 보기 민망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 볼 면목이 없다는 타령이다. 대장부가 아무리 그렇기로 제 집을 도둑 고양이 들듯 할 수야 있으랴. 이에 발분하여 용맹정진을 거듭한 두고는 마침내 이듬해 과거에서 급제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엔 두고가 집에 들어오질 않고 밖으로만 돌았다. 이에 그 아내가 다시 시를 지었는데,
낭군께선 뜻을 얻고 나이 한창 젊으신데
오늘 밤 어느 곳 술집에서 취해 주무시나요.
라 하였다. 일껏 공부 열심히 하라고 구박했더니 보답치고는 참으로 고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니 평소에 잘해주라는 말씀이다. 「지봉유설」에 나온다.
궁상스럽기로 호가 난 맹교도 진사시에 응거하였으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는 다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이듬해에도 역시 낙방하고 말았다. 그 답답한 심정을,
하룻밤에 아홉 번을 일어나 탄식하니
꿈길도 토막토막 집에 닿지 못하네.
라고 노래하였다. 거푸 낙제를 하고 보니, 가슴에 불덩이가 든 듯하여 잠이 오질 않는다. 억지로 잠을 청해 누워보아도 울컥울컥 치미는 탄식은 또 어찌해볼 수가 없다. 나약해진 마음에 고향 생각이 굴뚝 같지만 무슨 낯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꿈에라도 가볼까 하여 잠을 청해보아도 그나마 자주 깨는 통에 꿈길이 토막 나 집에 이르지도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그가 세 번째 응시에서 마침내 급제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때의 득의를 또 한 편의 시로 남겼는데,
지난날 고생을 뽐낼 것 없네
오늘 아침 툭 터진 듯 후련한 생각.
봄바람에 뜻을 얻어 말 발굽도 내달리니
오늘 하루 장안 꽃을 죄다 보리라.
라 하였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더니 막상 급제하고 보니, 종전의 고향 생각은 간데 없고, 장안의 미회를 끼고 놀 생각부터 급하다. 지난해의 시와 비교해볼 때 시의 기상이 판연하여 마치 다른 사람의 시처럼 보인다.
18. 자자회문시(字字廻文詩)중 하나
마음을 맑게 할 수가 있고
맑은 마음으로 마셔도 좋다.
맑은 마음으로도 괜찮으니
마음도 맑아질 수가 있고
또한 마음을 맑게 해준다.
둥근 찻 주전자에 돌려가며 쓴 글이니 사실 어느 글자로부터 읽어야 할 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 글자부터 읽더라도 뜻이 통하도 록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자자회문시(字字廻文詩)라 한다.
중국에선 예로부터 차와 그에 따른 예법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차를 늘 가까이 여기고 즐겨 하였다. 이 시는 차로 하여금 기분이 상쾌해짐을 특이한 형식으로서 보여준다. 차를 마실 때마다 차에 쓰여진 시를 보면서 마음 역시 더불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다.
19. 맑은 밤에 물을 긷다 <淸夜汲水>
-김삼의당 (金三宜堂, 1769-?) 의 <三宜)堂集 삼의당 집>이라는 문집에 수록
淸夜汲淸水(청야급청수) : 맑은 달밤에 맑은 물을 긷노라니
明月湧金井(명월용금정) : 밝은 달이 우물에서 솟아오른다.
無語立欄干(무어립난간) : 말없이 난간에 서있노라니
風動梧葉影(풍동오엽영) : 바람은 오동나무 그림자를 흔든다.
밤이 맑고 물도 맑다는 서두에서부터 아주 신선한 느낌을 나타냈다. 우물에서 솟는 밝은 달. 오동나무 가지를 흔드는 바람을 말하면서, 어둠과 밝음, 낮은 곳과 높은 곳, 고요함과 움직임의 오묘한 조화를 느끼는 황홀감을 전하고 있다. 맑은 밤, 밝은 달, 오동나무 그림자를 흔드는 바람을 시를 읽음 과 동시에 느낄수 있으며 더불어 시원한 느낌이 전해지는 듯하다.
참고도서
고전작가의 풍모와 문학 <김진영>
조선고전문학선집46 정약용 작품집 <리철화>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한시미학산책 <정민>
한서이불과 논어병풍 <정민>
생활의 발견 <임어당>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정민>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우는 모습
장군이 적에게 사로잡혔을 때.
은혜 잃은 궁녀의 표정
과거에 낙방한 선비의 심정.
복풍한설 몰아치는 겨울 골목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과부의 모습, 위풍당당하던 기상은 간데없이 초라하게 적 앞에 무릎을 꿇은 늙은 장군의 처참한 심정, 임금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긴 궁녀의 허탈한 표정,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나 금년에도 합격자의 명단에 끼지 못한 만년 낙방 선비의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을 그 누가 알랴. 장난시이면서도 인생의 단면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과거 급제가 예전 선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보니 이를 제재로 한 시가 옛 시화 중에 심심찮게 보인다. 청나라 원매는 「수원시화」에서 당청신唐靑臣이란 이의 「落第詩(낙제시)」를 소개하고 있다.
급제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오니
처자의 낯빛이 반기는 기색 없네.
누렁이만 흡사 반갑다는 듯
문 앞에 드러누워 꼬리 흔드네.
남편의 과거 급제만 바라보고 그간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또 낙방을 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남편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아내의 구박이 서운은 하지만 또 어찌하랴. 다만 충직한 황구만이 제 주인을 알아보고 문 앞까지 나와 꼬리를 흔들며 반갑다 한다. 찬밥 신세이기로는 저나 나나 같으니, 동병상련의 연민은 아니었을까. 뒤로 벌렁 누워 오랜만에 보는 주인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누렁이의 모습이, 이를 바라보는 주인의 씁쓸한 표정과 함께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다.
낙제하고 보니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내의 냉대이다. 당나라 때 두고杜羔가 과거에 낙방하고 집에 돌아가려 하자, 그 아내가 시를 지어 보냈다.
낭군께선 우뚝한 재주를 지니시곤
무슨 일로 해마다 낙제하고 오십니까?
이제는 님의 낯을 뵙기 부끄러우니
오시려든 밤중에나 돌아오시소.
이건 숫제 협박이나 진배없다. 누구는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느냔 말이다. 한낮에 말고 밤중에 들어오라니, 사실 자기가 남편 얼굴 보기 민망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 볼 면목이 없다는 타령이다. 대장부가 아무리 그렇기로 제 집을 도둑 고양이 들듯 할 수야 있으랴. 이에 발분하여 용맹정진을 거듭한 두고는 마침내 이듬해 과거에서 급제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엔 두고가 집에 들어오질 않고 밖으로만 돌았다. 이에 그 아내가 다시 시를 지었는데,
낭군께선 뜻을 얻고 나이 한창 젊으신데
오늘 밤 어느 곳 술집에서 취해 주무시나요.
라 하였다. 일껏 공부 열심히 하라고 구박했더니 보답치고는 참으로 고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니 평소에 잘해주라는 말씀이다. 「지봉유설」에 나온다.
궁상스럽기로 호가 난 맹교도 진사시에 응거하였으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는 다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이듬해에도 역시 낙방하고 말았다. 그 답답한 심정을,
하룻밤에 아홉 번을 일어나 탄식하니
꿈길도 토막토막 집에 닿지 못하네.
라고 노래하였다. 거푸 낙제를 하고 보니, 가슴에 불덩이가 든 듯하여 잠이 오질 않는다. 억지로 잠을 청해 누워보아도 울컥울컥 치미는 탄식은 또 어찌해볼 수가 없다. 나약해진 마음에 고향 생각이 굴뚝 같지만 무슨 낯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꿈에라도 가볼까 하여 잠을 청해보아도 그나마 자주 깨는 통에 꿈길이 토막 나 집에 이르지도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그가 세 번째 응시에서 마침내 급제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때의 득의를 또 한 편의 시로 남겼는데,
지난날 고생을 뽐낼 것 없네
오늘 아침 툭 터진 듯 후련한 생각.
봄바람에 뜻을 얻어 말 발굽도 내달리니
오늘 하루 장안 꽃을 죄다 보리라.
라 하였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더니 막상 급제하고 보니, 종전의 고향 생각은 간데 없고, 장안의 미회를 끼고 놀 생각부터 급하다. 지난해의 시와 비교해볼 때 시의 기상이 판연하여 마치 다른 사람의 시처럼 보인다.
18. 자자회문시(字字廻文詩)중 하나
마음을 맑게 할 수가 있고
맑은 마음으로 마셔도 좋다.
맑은 마음으로도 괜찮으니
마음도 맑아질 수가 있고
또한 마음을 맑게 해준다.
둥근 찻 주전자에 돌려가며 쓴 글이니 사실 어느 글자로부터 읽어야 할 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 글자부터 읽더라도 뜻이 통하도 록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자자회문시(字字廻文詩)라 한다.
중국에선 예로부터 차와 그에 따른 예법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차를 늘 가까이 여기고 즐겨 하였다. 이 시는 차로 하여금 기분이 상쾌해짐을 특이한 형식으로서 보여준다. 차를 마실 때마다 차에 쓰여진 시를 보면서 마음 역시 더불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다.
19. 맑은 밤에 물을 긷다 <淸夜汲水>
-김삼의당 (金三宜堂, 1769-?) 의 <三宜)堂集 삼의당 집>이라는 문집에 수록
淸夜汲淸水(청야급청수) : 맑은 달밤에 맑은 물을 긷노라니
明月湧金井(명월용금정) : 밝은 달이 우물에서 솟아오른다.
無語立欄干(무어립난간) : 말없이 난간에 서있노라니
風動梧葉影(풍동오엽영) : 바람은 오동나무 그림자를 흔든다.
밤이 맑고 물도 맑다는 서두에서부터 아주 신선한 느낌을 나타냈다. 우물에서 솟는 밝은 달. 오동나무 가지를 흔드는 바람을 말하면서, 어둠과 밝음, 낮은 곳과 높은 곳, 고요함과 움직임의 오묘한 조화를 느끼는 황홀감을 전하고 있다. 맑은 밤, 밝은 달, 오동나무 그림자를 흔드는 바람을 시를 읽음 과 동시에 느낄수 있으며 더불어 시원한 느낌이 전해지는 듯하다.
참고도서
고전작가의 풍모와 문학 <김진영>
조선고전문학선집46 정약용 작품집 <리철화>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한시미학산책 <정민>
한서이불과 논어병풍 <정민>
생활의 발견 <임어당>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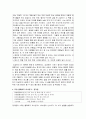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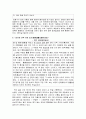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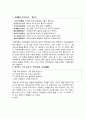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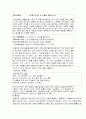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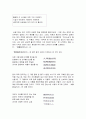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