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민가사
1)서민가사의 개념
2) 서민가사의 내용
3) 서민가사에 나타난 비판 정신
4) 서민가사의 표현상 특성
5) 서민가사의 미의식
6) 문학사적 의의
2.『초당문답가(草堂問答歌)』
1) 작품 해제(解題)
2)『초당문답가』의 문제적 상황과 해결 방식
3. <용부가>
1) 작품 해제(解題)
2) <용부가>의 내용분석
3) 문학사적 의의
Ⅲ. 결론
Ⅱ. 본론
1. 서민가사
1)서민가사의 개념
2) 서민가사의 내용
3) 서민가사에 나타난 비판 정신
4) 서민가사의 표현상 특성
5) 서민가사의 미의식
6) 문학사적 의의
2.『초당문답가(草堂問答歌)』
1) 작품 해제(解題)
2)『초당문답가』의 문제적 상황과 해결 방식
3. <용부가>
1) 작품 해제(解題)
2) <용부가>의 내용분석
3) 문학사적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초당주인의 이러한 말에 백발노인은 <지기편>에서 공명은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치국안민(治國安民)할 생각은 하지말고 가정을 조정같이 여기고 수신제가에 힘쓰라고 당부한다. 이렇게 공명의 부질없음을 말한 뒤에, <오륜편><사군편><부부편><부인잠><장유편><총론장>을 통해 수신제가의 방편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륜의 내용이 치국보다는 수신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인의 말에 한 소년(초당주인)이 등장하여 진담누설(陳談陋說) 케케묵은 진부한 소리.
을 듣기 싫다고 하면서 시속대로 살면 그만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개몽편>은 이러한 소년의 항변과 이를 설득하려는 노인의 말로 이루어져 있다. 소년은 삼강오륜을 모른다고 먹고 사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고 항변한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착한 놈이나 못된 놈이나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늙기 전에 마음껏 놀아보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인은 소년에게 부지런히 수신제가에 힘쓰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수신제가를 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우부편>,<용부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부편>에서는 ‘개똥이’, ‘꾕생원’, ‘꼼생원’을 등장시켜 이들의 행태와 말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용부편>에서는 게으르고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저 부인’과 ‘뺑덕어미’를 등장시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인물들의 행태와 말로를 징험한다. <용부편>의 마지막에서 노인은 이러한 인물들의 거동을 자세히 보고 그른 줄을 알았으면 고치기에 힘을 쓰고, 옳은 말을 들었으면 행하기를 위주로 하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경신편>과 <치산편>을 제시한다. <경신편>에서 백발노인은 수신에서 삼가야 할 내용을, <치산편>에서는 제가의 바탕으로서 건전한 부의 축적을 역설한다. <치산편>에 제시되는 부의 축적 방법은 농사와 근검절약이다.
초당주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백발노인은 마지막으로 <낙지편>에서 자신의 뜻을 퉁소에 실어 노래한다. 지금까지 노인과 논란을 벌였던 소년이 노인의 퉁소노래를 듣고 수긍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상과 같이 『초당문답가』의 구조는 백발노인과 초당주인(소년)이 서로간에 대화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합일에 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당문답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과 의식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치로부터 어긋나 있다. <개몽편>에서 노인과 논란을 벌이는 ‘소년’, <우부가>에 나오는 ‘개똥이’, ‘꾕생원’, ‘꼼생원’, 그리고 <용부편>에 나오는 ‘저 부인’과 ‘뺑덕어미’ 등이 모두 그렇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모두 잘못되었으니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윤리의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보면 치국보다는 수신제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仁義禮智 생긴대로 修身齊家하려니와 治國平天下는 몰라도 관계없다.”
그리고 수신제가의 방편으로서 치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有口則 必食하고 有食則 必顯이라 禮節도 衣食이요 行勢도 의식이요 親舊도 의식이요 功名도 의식이요 事業도 의식이요”
요컨대, 근대적인 윤리로 옮겨가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초당문답가』의 문제적 상황과 해결 방식 정재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p436~461, 박연호, 『초당문답가』의 지향과 창작기반
교훈가사에 나타난 문제적 상황은 작가가 기반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작가의 의식을 반영한다. 『초당문답가』에서 문제삼고 있는 상황은 개인의 가치관으로부터 정치권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에 대한 해결방식이나 대응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정과 개인, 공동체(향촌이나 도시), 국가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① 가부장권의 절대화를 통한 가정의 안정
가정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오륜편><부부편><부인잠><장유편><총론편> 등 ‘오륜항목’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부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에 대부분의 논의가 할애되고 있다. 각 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오륜편>은 부자관계를 다루고 있다. 서두에서 지나친 물욕 때문에 인성이 파괴되었다고 하여 오륜항목을 제시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이어서 효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할 것, 부모 사후의 극진한 제사, 자식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할 것, 서모(庶母)와 서제(庶弟)를 차별대우하지 말 것 등.
이러한 방법들은 전기부터 강조되어 오던 것으로, 『소학』에서 이미 제시된 것들이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를 의식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부자관계의 이완이 경제적 관심의 증대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축첩으로 인한 적서차별의 문제를 지적하여, 친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養子), 서자(庶子), 이복자(異腹子)야 남의 부모라 간격마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효의 강조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부부편>은 서두에서 “오륜에 시작이요 만복지원(萬福之源)이로다”라고 하여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가정의 평안을 위한 남편의 도리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인을 친압(親狎)하지 말 것, 부인을 박대하지 말 것, 부인이 부덕해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잘 타이를 것, 아무리 악한 부인이라도 버리지 말 것, 축첩하지 말 것 등.
여기에서 문제시하는 상황은 여성문제로 인한 가정의 파괴이며,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남편의 아량에 호소하고 있다.
<부인잠>은 부인에 대한 것으로, 부인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남편과 시부모에게 복종할 것, 침선방적봉제사접빈객 등 집안일에만 전념할 것, 나서지 말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버리지 말 것, 친정일로 시부모를 속이지 말 것 등.
이 작품에서 여성은 수동적이며 종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의 행위가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며 “여인은
이러한 노인의 말에 한 소년(초당주인)이 등장하여 진담누설(陳談陋說) 케케묵은 진부한 소리.
을 듣기 싫다고 하면서 시속대로 살면 그만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개몽편>은 이러한 소년의 항변과 이를 설득하려는 노인의 말로 이루어져 있다. 소년은 삼강오륜을 모른다고 먹고 사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고 항변한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착한 놈이나 못된 놈이나 죽고 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늙기 전에 마음껏 놀아보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인은 소년에게 부지런히 수신제가에 힘쓰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수신제가를 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우부편>,<용부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부편>에서는 ‘개똥이’, ‘꾕생원’, ‘꼼생원’을 등장시켜 이들의 행태와 말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용부편>에서는 게으르고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저 부인’과 ‘뺑덕어미’를 등장시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인물들의 행태와 말로를 징험한다. <용부편>의 마지막에서 노인은 이러한 인물들의 거동을 자세히 보고 그른 줄을 알았으면 고치기에 힘을 쓰고, 옳은 말을 들었으면 행하기를 위주로 하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경신편>과 <치산편>을 제시한다. <경신편>에서 백발노인은 수신에서 삼가야 할 내용을, <치산편>에서는 제가의 바탕으로서 건전한 부의 축적을 역설한다. <치산편>에 제시되는 부의 축적 방법은 농사와 근검절약이다.
초당주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백발노인은 마지막으로 <낙지편>에서 자신의 뜻을 퉁소에 실어 노래한다. 지금까지 노인과 논란을 벌였던 소년이 노인의 퉁소노래를 듣고 수긍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상과 같이 『초당문답가』의 구조는 백발노인과 초당주인(소년)이 서로간에 대화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합일에 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당문답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과 의식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치로부터 어긋나 있다. <개몽편>에서 노인과 논란을 벌이는 ‘소년’, <우부가>에 나오는 ‘개똥이’, ‘꾕생원’, ‘꼼생원’, 그리고 <용부편>에 나오는 ‘저 부인’과 ‘뺑덕어미’ 등이 모두 그렇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모두 잘못되었으니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윤리의 내용을 세밀하게 따져보면 치국보다는 수신제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仁義禮智 생긴대로 修身齊家하려니와 治國平天下는 몰라도 관계없다.”
그리고 수신제가의 방편으로서 치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有口則 必食하고 有食則 必顯이라 禮節도 衣食이요 行勢도 의식이요 親舊도 의식이요 功名도 의식이요 事業도 의식이요”
요컨대, 근대적인 윤리로 옮겨가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초당문답가』의 문제적 상황과 해결 방식 정재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p436~461, 박연호, 『초당문답가』의 지향과 창작기반
교훈가사에 나타난 문제적 상황은 작가가 기반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작가의 의식을 반영한다. 『초당문답가』에서 문제삼고 있는 상황은 개인의 가치관으로부터 정치권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에 대한 해결방식이나 대응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정과 개인, 공동체(향촌이나 도시), 국가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① 가부장권의 절대화를 통한 가정의 안정
가정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오륜편><부부편><부인잠><장유편><총론편> 등 ‘오륜항목’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부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에 대부분의 논의가 할애되고 있다. 각 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오륜편>은 부자관계를 다루고 있다. 서두에서 지나친 물욕 때문에 인성이 파괴되었다고 하여 오륜항목을 제시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제시하고, 이어서 효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할 것, 부모 사후의 극진한 제사, 자식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할 것, 서모(庶母)와 서제(庶弟)를 차별대우하지 말 것 등.
이러한 방법들은 전기부터 강조되어 오던 것으로, 『소학』에서 이미 제시된 것들이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를 의식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부자관계의 이완이 경제적 관심의 증대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축첩으로 인한 적서차별의 문제를 지적하여, 친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養子), 서자(庶子), 이복자(異腹子)야 남의 부모라 간격마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효의 강조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부부편>은 서두에서 “오륜에 시작이요 만복지원(萬福之源)이로다”라고 하여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가정의 평안을 위한 남편의 도리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인을 친압(親狎)하지 말 것, 부인을 박대하지 말 것, 부인이 부덕해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잘 타이를 것, 아무리 악한 부인이라도 버리지 말 것, 축첩하지 말 것 등.
여기에서 문제시하는 상황은 여성문제로 인한 가정의 파괴이며,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남편의 아량에 호소하고 있다.
<부인잠>은 부인에 대한 것으로, 부인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남편과 시부모에게 복종할 것, 침선방적봉제사접빈객 등 집안일에만 전념할 것, 나서지 말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버리지 말 것, 친정일로 시부모를 속이지 말 것 등.
이 작품에서 여성은 수동적이며 종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의 행위가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며 “여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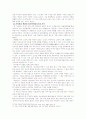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