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자 전래의 역사
2. 한자 차용 표기법의 원리
3. 이두, 구결, 향찰의 개념적 고찰
1) 이두
① 이두의 개념과 역사
② 이두 표기의 원리
③ 이두의 한계와 향찰과의 관계
2) 향찰
① 향찰의 개념과 역사
② 향찰 표기의 원리
③ 향찰의 명칭
3) 구결
① 구결의 개념과 역사
② 구결 표기의 원리
③ 구결과 훈민정음과의 관계
4. 이두, 구결, 향찰의 비교 분석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Ⅱ. 본 론
1. 한자 전래의 역사
2. 한자 차용 표기법의 원리
3. 이두, 구결, 향찰의 개념적 고찰
1) 이두
① 이두의 개념과 역사
② 이두 표기의 원리
③ 이두의 한계와 향찰과의 관계
2) 향찰
① 향찰의 개념과 역사
② 향찰 표기의 원리
③ 향찰의 명칭
3) 구결
① 구결의 개념과 역사
② 구결 표기의 원리
③ 구결과 훈민정음과의 관계
4. 이두, 구결, 향찰의 비교 분석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두 서사 체계발전의 원줄기인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두라고 하면 이찰을 뜻한다. 그런 용법을 사용한다면 향찰의 이두의 일종이 아니라 이두와 나란히 존재했던 우리말 표기 방식인 것이다. 향찰은 이두의 발전과정에서 향가라는 노래를 표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곁가지로서 개발된 서사체계였다. 그것은 물론 이찰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명료하게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서사 체계였다. 만약에 이찰이 아니라 향찰이 이두 발전 과정의 본령을 차지했다면 우리 문자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글이라는 음소 문자가 만들어지는 대신에 가나류의 보조적인 음절 문자가 만들어져 지금의 일본에서처럼 한자 위주의 국한 혼용이지배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이찰의 우리말 표기 능력이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음소 문자 창제라는 혁명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찰의 소멸은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었는지도 모른다.
② 향찰 표기의 원리
이찰과 마찬가지로 향찰도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다. 엄격한 원칙은 없지만 실질적 의미적 요소는 훈독법이 주가되고 형태적 요소, 문법적 요소인 조사나 어미 등은 음독법이 주가 된다.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遺去如 서동요(삼국유사)
그 예로 현전하는 향가 중 최고의 작품인 <서동요>를 살펴보자. 처음 행인 \'善化公主主隱\'을 현대국어로 풀어 보면 \'선화공주님은\'이 된다. \'主\'는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쓰였다. 첫 번 째 \'主\'는 음을 딴 것이면 두 번 째 \'主\'는 뜻을 따서 적은 글자이다. \'隱\'의 기능을 살펴보면
향찰표기에서 조사, 접미사 등의 문법적 요소는 음을 따서 적었으므로 주제의 보조사 \'은\'을 나타내기 위해 \'隱\'의 음을 따온 것이다.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인명 명사나 지명 명사를 표기했던 고유명사 표기법과 달리 향찰은 문법적 요소(조사, 어미등)까지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고유명사 표기법보다 훨씬 발달된 단계의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隱\'과 같은 주제의 보조사, 즉, 문장 내의 문법적 요소는 한자의 음을 따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에 반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는 한자의 뜻을 따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東京明期月良(동경명기월량) 셔블 발긔 다래
夜入伊遊行如可(야입이유행여가) 밤 드리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입양사침의견곤) 드러와 자리 보곤
脚烏伊四是良羅(각오이사시양나) 가라리 네히어라
二隱吾下於叱古(이혜은오하어질고) 둘흔 내해엇고
二隱誰支不焉古(이혜은수지불언고) 둘흔 뉘해언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본의오하시여마어은) 본데 내해다마는
奪叱良乙何如爲理古(탈질양을하여위리고) 아사날 엇디하릿고 <처용가>의 해독에서는 김완진(1980)의 내용을 따랐다.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차자표기를 보면 향찰의 표기 단위는 어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절을 구성하는 실사는 훈차표기를 하고 허사는 음차표기를 하여 ‘실사+허사’로 구성되는 각 어절은 ‘훈차+음차’의 표기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명사와 조사의 결합인 明月, 寢矣, 脚烏伊 등이나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 期月, 入伊, 遊行如可, 入良沙, 見昆 등에서 실사인 月, 寢, 脚烏, 明, 入, 遊行, 入, 見 등은 훈차표기하고 허사인 明, 矣, 伊, 期, 伊, 如可, 良沙, 昆 등은 음차표기를 한 ‘如可’를 ‘다가’로 해독할 때, ‘如’는 훈자표기한 예로서 실사는 훈차표기하고 허사는 음차표기하는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이다. ‘如’는 문법 형태소임에도 특이하게 훈차표기한 것이다. 근래에 발굴된 중세국어의 문헌에 ‘같다’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如’의 ‘다’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이현희 1996)
예들로서 ‘실사+허사’의 구성이 ‘훈차+음차’ 표기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③ 향찰의 명칭
향찰이라는 명칭은 〈균여전〉(1075)에 실린 최행귀의 역시(譯詩) 서문에 처음 나타난다. 이 서문은 균여대사(均如大師)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최행귀가 균여대사가 지은 〈보현십원가〉를 한시로 번역하면서 쓴 것으로, 여기에서의 향찰이라는 말은 신라어로 적은 문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악(唐樂)에 대한 향악(鄕樂), 당언(唐言)에 대한 향언(鄕言), 당인(唐人)에 대한 향인(鄕人)의 경우와 같이 우리 고유의 것을 \'향\'(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문(唐文)에 대해 상대적인 뜻으로 향찰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용어도 본래는 이두와 같이 차자표기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향가와 같이 우리말을 전반적으로 표기한 차자표기를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다. 우리말을 전반적으로 표기한 차자표기자료는 향가밖에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현재 향찰의 표기법이 곧 향가 표기법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향찰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고려대에 오면서 그것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향찰이 고려 일대를 내려왔고 급기야 조선 초 국자가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향찰을 신라의 표기법으로 인식하여 접근하고 있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향찰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고대 한국어는 아직도 우리에게 미지로 남아 있어서 향찰의 정확한 해석은 지금도 연구자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구결
① 구결의 개념과 역사
한문을 읽을 때에 문맥을 밝히기 위하여 한문의 구두 사이에 들어가는 우리말. 토(吐)라고도 한다. 한문을 이해하려면 구결을 정확히 달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 한문의 학습에는 구결을 중시하였다.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초학자를 위한 학습서에는 행간에 표기하여 인쇄하거나 붓으로 써 넣었다. 한문에 구결을 넣는 일을 ‘구결을 달다, 토를 달다, 현토(懸吐)하다, 현결(懸訣)하다’ 라고 한다. 구결과 토의 어원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다. 구결은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입으로 전달하는 비결을 뜻하는 한자어 ‘구수전결(口授傳訣)’의 준말이라는 견해와, 조사를 뜻하는 고유어 ‘입
② 향찰 표기의 원리
이찰과 마찬가지로 향찰도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다. 엄격한 원칙은 없지만 실질적 의미적 요소는 훈독법이 주가되고 형태적 요소, 문법적 요소인 조사나 어미 등은 음독법이 주가 된다.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遺去如 서동요(삼국유사)
그 예로 현전하는 향가 중 최고의 작품인 <서동요>를 살펴보자. 처음 행인 \'善化公主主隱\'을 현대국어로 풀어 보면 \'선화공주님은\'이 된다. \'主\'는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쓰였다. 첫 번 째 \'主\'는 음을 딴 것이면 두 번 째 \'主\'는 뜻을 따서 적은 글자이다. \'隱\'의 기능을 살펴보면
향찰표기에서 조사, 접미사 등의 문법적 요소는 음을 따서 적었으므로 주제의 보조사 \'은\'을 나타내기 위해 \'隱\'의 음을 따온 것이다.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인명 명사나 지명 명사를 표기했던 고유명사 표기법과 달리 향찰은 문법적 요소(조사, 어미등)까지 표기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고유명사 표기법보다 훨씬 발달된 단계의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隱\'과 같은 주제의 보조사, 즉, 문장 내의 문법적 요소는 한자의 음을 따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에 반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는 한자의 뜻을 따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東京明期月良(동경명기월량) 셔블 발긔 다래
夜入伊遊行如可(야입이유행여가) 밤 드리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입양사침의견곤) 드러와 자리 보곤
脚烏伊四是良羅(각오이사시양나) 가라리 네히어라
二隱吾下於叱古(이혜은오하어질고) 둘흔 내해엇고
二隱誰支不焉古(이혜은수지불언고) 둘흔 뉘해언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본의오하시여마어은) 본데 내해다마는
奪叱良乙何如爲理古(탈질양을하여위리고) 아사날 엇디하릿고 <처용가>의 해독에서는 김완진(1980)의 내용을 따랐다.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차자표기를 보면 향찰의 표기 단위는 어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절을 구성하는 실사는 훈차표기를 하고 허사는 음차표기를 하여 ‘실사+허사’로 구성되는 각 어절은 ‘훈차+음차’의 표기 원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명사와 조사의 결합인 明月, 寢矣, 脚烏伊 등이나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 期月, 入伊, 遊行如可, 入良沙, 見昆 등에서 실사인 月, 寢, 脚烏, 明, 入, 遊行, 入, 見 등은 훈차표기하고 허사인 明, 矣, 伊, 期, 伊, 如可, 良沙, 昆 등은 음차표기를 한 ‘如可’를 ‘다가’로 해독할 때, ‘如’는 훈자표기한 예로서 실사는 훈차표기하고 허사는 음차표기하는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이다. ‘如’는 문법 형태소임에도 특이하게 훈차표기한 것이다. 근래에 발굴된 중세국어의 문헌에 ‘같다’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如’의 ‘다’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이현희 1996)
예들로서 ‘실사+허사’의 구성이 ‘훈차+음차’ 표기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③ 향찰의 명칭
향찰이라는 명칭은 〈균여전〉(1075)에 실린 최행귀의 역시(譯詩) 서문에 처음 나타난다. 이 서문은 균여대사(均如大師)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최행귀가 균여대사가 지은 〈보현십원가〉를 한시로 번역하면서 쓴 것으로, 여기에서의 향찰이라는 말은 신라어로 적은 문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악(唐樂)에 대한 향악(鄕樂), 당언(唐言)에 대한 향언(鄕言), 당인(唐人)에 대한 향인(鄕人)의 경우와 같이 우리 고유의 것을 \'향\'(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문(唐文)에 대해 상대적인 뜻으로 향찰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용어도 본래는 이두와 같이 차자표기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는 향가와 같이 우리말을 전반적으로 표기한 차자표기를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다. 우리말을 전반적으로 표기한 차자표기자료는 향가밖에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현재 향찰의 표기법이 곧 향가 표기법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향찰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고려대에 오면서 그것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향찰이 고려 일대를 내려왔고 급기야 조선 초 국자가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향찰을 신라의 표기법으로 인식하여 접근하고 있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향찰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고대 한국어는 아직도 우리에게 미지로 남아 있어서 향찰의 정확한 해석은 지금도 연구자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구결
① 구결의 개념과 역사
한문을 읽을 때에 문맥을 밝히기 위하여 한문의 구두 사이에 들어가는 우리말. 토(吐)라고도 한다. 한문을 이해하려면 구결을 정확히 달아야 하기 때문에 옛날 한문의 학습에는 구결을 중시하였다.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초학자를 위한 학습서에는 행간에 표기하여 인쇄하거나 붓으로 써 넣었다. 한문에 구결을 넣는 일을 ‘구결을 달다, 토를 달다, 현토(懸吐)하다, 현결(懸訣)하다’ 라고 한다. 구결과 토의 어원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이 없다. 구결은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입으로 전달하는 비결을 뜻하는 한자어 ‘구수전결(口授傳訣)’의 준말이라는 견해와, 조사를 뜻하는 고유어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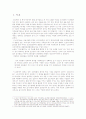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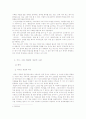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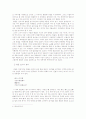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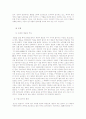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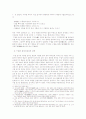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