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이두
ㄱ. 개념과 구성요소
ㄴ. 서기체 표기와 이두와의 관계
ㄷ. 성립시기와 발달과정
ㄹ. 이두의 형태
(2) 구결
ㄱ. 개념
ㄴ. 성립시기
ㄷ. 특징과 목적
ㄹ. 구결의 표기
ㅁ. 구결의 영향
ㅂ. 구결표
(3) 향찰
ㄱ. 개념
ㄴ. 향찰의 표기법과 특징
ㄷ. 향찰의 한계
ㄹ. 향찰과 이두
Ⅲ.결 론
Ⅱ.본 론
(1) 이두
ㄱ. 개념과 구성요소
ㄴ. 서기체 표기와 이두와의 관계
ㄷ. 성립시기와 발달과정
ㄹ. 이두의 형태
(2) 구결
ㄱ. 개념
ㄴ. 성립시기
ㄷ. 특징과 목적
ㄹ. 구결의 표기
ㅁ. 구결의 영향
ㅂ. 구결표
(3) 향찰
ㄱ. 개념
ㄴ. 향찰의 표기법과 특징
ㄷ. 향찰의 한계
ㄹ. 향찰과 이두
Ⅲ.결 론
본문내용
재고해볼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대의 문자생활을 담당하였던 이두ㆍ구결ㆍ향찰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두(吏讀)
ㄱ. 개념과 구성요소
이두는 넓은 의미로는 이두나 구결을 포함한 한자차용표기법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한자를 한국어의 문장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에 한정하는 한자차용표기법을 뜻한다. 배열이 국어의 문장구조를 따르는데, 의미부는 한자의 훈을 취하고 형태부는 음을 취하여 특히 곡용이나 활용에 나타나는 격이나 어미를 표현한다. 이는 한자에 의하여 자국어를 표기하려는 노력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두는 吏道, 吏頭, 吏札, 吏套, 吏吐 등의 이칭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동일명의 이표기에 지나지 않는다.
ㄴ. 서기체 표기와 이두와의 관계
서기식 표기란 1940년 경주 石丈寺址에서 출토된 소위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것의 표기적 특징은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일견 한문과도 같아 보이지만 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글자 뜻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구나 국어 문장의 성분 배열순에 준하여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서기식 표현은 문장 단위의 국어를 표기해 보려는 언중의 강렬한 욕구와 함께 한자어와 국어가 문장의 성분배열순, 즉 어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기식 표기는 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국어의 특성인 서술성을 나타내는 형태와 단어들의 형태 표기도 전혀 표기되지 않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한 서기체 표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기식 표기에 국어식 문법적 형태가 첨가되어 나타난 것이 이두이다. 이두는 국어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법적 형태까지 표현되어 국어의 어음과 문법구조 및 문법적 형태를 모두 갖춘 표기법이었다.
ㄷ. 성립시기와 발달과정
이두는 삼국시대에 고구려에서 시작된 한자를 통한 자국어 표기의 노력이 신라로 이어지면서 본격화 되어 7세기에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통일적인 표기법 체계를 지향하면서 발달을 거듭하다가 이태조 4년에 편찬된 『대명률직해』에 이르러 거의 집대성되었다.
『제왕운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설총이 이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설총보다 백여 년이나 앞서 진평왕 13년(591)에 건립된 경주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에서 이두식 표기의 완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며 설총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두를 만든 이치와 그 서사체계를 깨닫고 그것의 실제 사용에서 노력하여 이두를 집대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두는 19세기 초까지도 관민의 공용문자로 널리 이용되었다. 토지문서나 노비문서 등의 작성에는 거의 이두를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두가 우리 고유의 문자체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실용상으로 이찰(吏胥)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그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문자 생황의 핵심적인 표기 수단인 한문의 후광을 입을 수 있었던 것과 갑오경장까지 한글로 된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ㄹ. 이두의 형태
①초기 이두
초기 이두란 시기적으로 맨처음에 나온 이두를 말하며 또 그 구조에서 어순이 본래의 한문과는 구별되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문에서 이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본래의 한문에 이두적인 요소가 끼어드는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두를 쓴 가장 오래된 유물은 5세기 중엽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세운 성돌의 글이다. <평양성돌>은 지금까지 네차례 발굴되었는데 그 중 첫 번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己丑年 五月 卄一日 自此 以下 向 東 十一里 物省小兄 俳□
(기축년 5월 21일 여기서부터 아래로 향하여 동쪽 11리는 물성소형 배□
百頭 □節矣
백두□가 맡은 것이다.)
이처럼 평양성돌에 새겨진 글들은 우리 말의 어순대로 된 것으로 보나 일부 조선식 한자를 만들어 쓴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초기이두라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발생한 초기 이두는 신라에도 영향일 미쳤고, 이것은 1940년 경상북도 경주군에 있는 석장사에서 발굴된 <임신서기석>에 나타난다.
壬申年 六月 十六日 二人幷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若此事失
天大罪得誓 ……(이하 생략)
(임신년 유월 십육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맹서한다. 지금으로부터 삼년 이후에 충도를 집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일 이 일을 잃으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서한다. ……(이하 생략))
이 글은 한자를 우리 말의 어순대로 적은 문장이다. 하지만 이두나 향찰체와 같이 한자의 음과 뜻을 따서 우리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한자를 우리 말의 어순대로 배열한데 지나지 않은것만큼 한문 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서투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이두는 어순이 우리말 식으로 되었다고는 하나의 문자로서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두는 다시 관청용 문자인 이찰을 낳았으며 또 향가와 같은 시가를 적는 향찰의 발달을 가져왔다.
② 본격적인 이두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두탑은 천보 17년 무술에 세웠다)
妹三人業以成在之 (오라버니 손누이 손아래누이 세 사람의 업으로 이루었다)
者零妙寺言寂師在 (오라버니는 영묘사 언적법사로 있으며)
者昭文皇太后君在 (손누이는 조문황태후님내에 있으며)
妹者敬信太王在在也 (손아래누이는 경신대왕내에 있다)
길항사 돌탑에서 발견된 이 글은 <戊戌中> 의 中은 위격 에, <業以>의 以는 조격 으로, <立在之>의 在는 있다의 존칭 계시다로 쓰는 것과 같은 토의 사용이 나타남으로써 이두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③ 고려와 조선의 이두
한문 - 蠶陽物 大惡水 故食而不飾
이두 - 蠶段(딴) 陽物是乎等用良(이온쓰아) 水氣乙(을) 厭却 桑葉*分(뿐) 喫破爲遣(고) 飮水不冬(안).
(2) 구결(口訣)
ㄱ. 개념
이두의 범주에 들어가는 서사형태의 하나인 구결은 ‘입
Ⅱ. 본 론
(1) 이두(吏讀)
ㄱ. 개념과 구성요소
이두는 넓은 의미로는 이두나 구결을 포함한 한자차용표기법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한자를 한국어의 문장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에 한정하는 한자차용표기법을 뜻한다. 배열이 국어의 문장구조를 따르는데, 의미부는 한자의 훈을 취하고 형태부는 음을 취하여 특히 곡용이나 활용에 나타나는 격이나 어미를 표현한다. 이는 한자에 의하여 자국어를 표기하려는 노력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두는 吏道, 吏頭, 吏札, 吏套, 吏吐 등의 이칭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동일명의 이표기에 지나지 않는다.
ㄴ. 서기체 표기와 이두와의 관계
서기식 표기란 1940년 경주 石丈寺址에서 출토된 소위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것의 표기적 특징은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일견 한문과도 같아 보이지만 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한자의 글자 뜻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구나 국어 문장의 성분 배열순에 준하여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서기식 표현은 문장 단위의 국어를 표기해 보려는 언중의 강렬한 욕구와 함께 한자어와 국어가 문장의 성분배열순, 즉 어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기식 표기는 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국어의 특성인 서술성을 나타내는 형태와 단어들의 형태 표기도 전혀 표기되지 않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한 서기체 표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기식 표기에 국어식 문법적 형태가 첨가되어 나타난 것이 이두이다. 이두는 국어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법적 형태까지 표현되어 국어의 어음과 문법구조 및 문법적 형태를 모두 갖춘 표기법이었다.
ㄷ. 성립시기와 발달과정
이두는 삼국시대에 고구려에서 시작된 한자를 통한 자국어 표기의 노력이 신라로 이어지면서 본격화 되어 7세기에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통일적인 표기법 체계를 지향하면서 발달을 거듭하다가 이태조 4년에 편찬된 『대명률직해』에 이르러 거의 집대성되었다.
『제왕운기』를 비롯한 여러 역사서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설총이 이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설총보다 백여 년이나 앞서 진평왕 13년(591)에 건립된 경주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에서 이두식 표기의 완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며 설총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두를 만든 이치와 그 서사체계를 깨닫고 그것의 실제 사용에서 노력하여 이두를 집대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두는 19세기 초까지도 관민의 공용문자로 널리 이용되었다. 토지문서나 노비문서 등의 작성에는 거의 이두를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두가 우리 고유의 문자체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실용상으로 이찰(吏胥)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그 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문자 생황의 핵심적인 표기 수단인 한문의 후광을 입을 수 있었던 것과 갑오경장까지 한글로 된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ㄹ. 이두의 형태
①초기 이두
초기 이두란 시기적으로 맨처음에 나온 이두를 말하며 또 그 구조에서 어순이 본래의 한문과는 구별되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문에서 이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본래의 한문에 이두적인 요소가 끼어드는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두를 쓴 가장 오래된 유물은 5세기 중엽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세운 성돌의 글이다. <평양성돌>은 지금까지 네차례 발굴되었는데 그 중 첫 번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己丑年 五月 卄一日 自此 以下 向 東 十一里 物省小兄 俳□
(기축년 5월 21일 여기서부터 아래로 향하여 동쪽 11리는 물성소형 배□
百頭 □節矣
백두□가 맡은 것이다.)
이처럼 평양성돌에 새겨진 글들은 우리 말의 어순대로 된 것으로 보나 일부 조선식 한자를 만들어 쓴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초기이두라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발생한 초기 이두는 신라에도 영향일 미쳤고, 이것은 1940년 경상북도 경주군에 있는 석장사에서 발굴된 <임신서기석>에 나타난다.
壬申年 六月 十六日 二人幷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若此事失
天大罪得誓 ……(이하 생략)
(임신년 유월 십육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맹서한다. 지금으로부터 삼년 이후에 충도를 집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일 이 일을 잃으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서한다. ……(이하 생략))
이 글은 한자를 우리 말의 어순대로 적은 문장이다. 하지만 이두나 향찰체와 같이 한자의 음과 뜻을 따서 우리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한자를 우리 말의 어순대로 배열한데 지나지 않은것만큼 한문 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서투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이두는 어순이 우리말 식으로 되었다고는 하나의 문자로서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두는 다시 관청용 문자인 이찰을 낳았으며 또 향가와 같은 시가를 적는 향찰의 발달을 가져왔다.
② 본격적인 이두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두탑은 천보 17년 무술에 세웠다)
妹三人業以成在之 (오라버니 손누이 손아래누이 세 사람의 업으로 이루었다)
者零妙寺言寂師在 (오라버니는 영묘사 언적법사로 있으며)
者昭文皇太后君在 (손누이는 조문황태후님내에 있으며)
妹者敬信太王在在也 (손아래누이는 경신대왕내에 있다)
길항사 돌탑에서 발견된 이 글은 <戊戌中> 의 中은 위격 에, <業以>의 以는 조격 으로, <立在之>의 在는 있다의 존칭 계시다로 쓰는 것과 같은 토의 사용이 나타남으로써 이두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③ 고려와 조선의 이두
한문 - 蠶陽物 大惡水 故食而不飾
이두 - 蠶段(딴) 陽物是乎等用良(이온쓰아) 水氣乙(을) 厭却 桑葉*分(뿐) 喫破爲遣(고) 飮水不冬(안).
(2) 구결(口訣)
ㄱ. 개념
이두의 범주에 들어가는 서사형태의 하나인 구결은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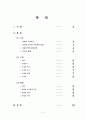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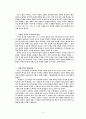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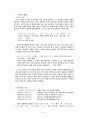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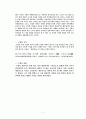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