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것도 농업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농촌의 관광체육복지시설 등 설치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것도 농업생산기반자체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Ⅲ. 결 론
세계화로부터 농촌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안정적인 식량확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 또한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농산물을 해외시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계농산물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문제이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농식품 체제는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영농체계를 무너뜨리고, 유전적 자원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다량투입을 전제로 한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분리시킴으로써 환경파괴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의 확보는 녹색혁명형 농업, 즉 공장식 농업의 극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산물 수출대국 미국에서조차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기업전략의 전개에 직면하여 광범한 비판세력이 형성되어 초국적기업반대, 가족농업경영옹호 등의 정책을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진출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전공학부문과 관련하여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대체농업운동단체나 환경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들도 이미 유전자조작식품에 반대하는 대열에 합류해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운동과 함께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저항도 일어나고 있다.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한 안전한 식량의 공급은 지역차원의 자원순환형 기능에 기초한 지역순환형 사회(지속가능한 사회)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지역순환형 사회의 건설은 지역단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유기농업이나 환경농업과 같은 대체농업과의 관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이 지원하는 농업)는 식량주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먹거리로 이용하게 되면, 농산물이 농민의 손을 떠나 밥상에 오르기까지 운송되는 거리가 축소되어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이후의 물질순환도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물적 순환의 구체적 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더군다나 지역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농업여건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업여건이 가장 열악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등이 농업을 가장 잘 개발한 데 반해서 여건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를 자각하지 못하면 세계화 시대에서의 우리 농촌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한국은 가장 좋은 농업여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을 개발하면 세계화 된 세상에서의 부활한 농촌이 가능해질 것이다.
Ⅲ. 결 론
세계화로부터 농촌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안정적인 식량확보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 또한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농산물을 해외시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세계농산물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문제이지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농식품 체제는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영농체계를 무너뜨리고, 유전적 자원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다량투입을 전제로 한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분리시킴으로써 환경파괴문제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의 확보는 녹색혁명형 농업, 즉 공장식 농업의 극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산물 수출대국 미국에서조차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기업전략의 전개에 직면하여 광범한 비판세력이 형성되어 초국적기업반대, 가족농업경영옹호 등의 정책을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진출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전공학부문과 관련하여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대체농업운동단체나 환경운동단체, 소비자운동단체들도 이미 유전자조작식품에 반대하는 대열에 합류해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운동과 함께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저항도 일어나고 있다.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한 안전한 식량의 공급은 지역차원의 자원순환형 기능에 기초한 지역순환형 사회(지속가능한 사회)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지역순환형 사회의 건설은 지역단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이는 유기농업이나 환경농업과 같은 대체농업과의 관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이 지원하는 농업)는 식량주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먹거리로 이용하게 되면, 농산물이 농민의 손을 떠나 밥상에 오르기까지 운송되는 거리가 축소되어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이후의 물질순환도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물적 순환의 구체적 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더군다나 지역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한국의 농업여건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업여건이 가장 열악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등이 농업을 가장 잘 개발한 데 반해서 여건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를 자각하지 못하면 세계화 시대에서의 우리 농촌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한국은 가장 좋은 농업여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을 개발하면 세계화 된 세상에서의 부활한 농촌이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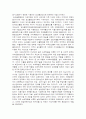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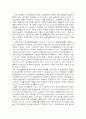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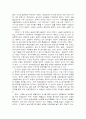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