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강원도의 개관 및 국어 방언권의 구획
1. 강원도의 개관
2. 국어 방언권의 구획
Ⅲ. 강원도 방언권과 강원도 방언권의 구획
1. 강원도 방언권
2. 강원도 방언의 구획
Ⅳ. 강원도 방언의 특징
1. 음운론
2. 문법론
1) 형태론
2) 통사론
3. 의미론
Ⅴ. 결론
참고문헌
Ⅱ. 강원도의 개관 및 국어 방언권의 구획
1. 강원도의 개관
2. 국어 방언권의 구획
Ⅲ. 강원도 방언권과 강원도 방언권의 구획
1. 강원도 방언권
2. 강원도 방언의 구획
Ⅳ. 강원도 방언의 특징
1. 음운론
2. 문법론
1) 형태론
2) 통사론
3. 의미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 :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홍천, 횡성, 원주
영동방언권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동해, 태백, 평창, 정선, 영월
위의 구분에서 영서방언권에 속한 군들의 언어는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방언권에 속한 군들은 방언적 차이를 보여 북단영동방언권, 강릉방언권, 삼척방언권, 서남영동방언권으로 구분된다.
북단영동방언권은 고성, 속초, 양양이 속하며, 휴전선 이북까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방언권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강릉방언권은 강릉, 명주를 묶은 지역으로, 이 지역은 때로는 양양과 가까운 관계를 보이기도 하나 여러 방언 특징에 의해 이웃지역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방언권을 형성한다.
삼척방언권은 삼척, 동해, 태백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언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영동의 한 방언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서남영동방언권은 평창, 정선, 영월의 세 군을 묶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동방언과 영서방언권의 요소가 뒤섞여 나타나는 지역으로 영동방언권에서 영서방언권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방언권이다.
Ⅳ. 강원도 방언의 특징
1. 음운론
1) 음운체계 (운소쳬계)
① 자음
전국적으로 자음체계는 그리 큰 방언적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원도 방언의 자음체계 역시 표준어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후두파열음 음소목록에 추가시킬지의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묻-(問)의 경우에도 물:는다, 물:째, 물:뜨라, 물:네야등과 같이 활용된다. 표준어의 ㄷ변칙 용언에 해당하는 어형이 영동방언에 없음을 알려주고, 의 음소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경음 음소들을 각 계열의 평음과 의 합음을 처리함으로써 음소목록을 간단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 음소 설정에 대한 문제점은 기저음운을 굳이 음소목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 될 것이다.
강원도 영동 지역의 방언에서는 모음 앞에서의 받침 은 매우 특이하게 발음된다. 영동방언에는생우(새우), 영우(여우), 맹이(모이), 호맹이(호미), 마뎅이(타작)등에서 이런 발음이 번번이 나타난다. 중우(주의), 뭉우(무), 방아등도 얼추 들으면 주, 무, 바와 같은 단음절로 들리지만 실은 약화된 음을(또는 비모음을 동반한) 2음절 단어들이다.
② 모음
강원도방언의 단모음은 10개로서 4계열 3단계의 모음체계를 지닌다. 한글자모로는 구별되어 있으나 많은 방언에서 그 변별력이 상실된 것이 강원도방언에서는 고스란히 그것이 지켜지고 있기 대문이다. 일례로 경상도나 전라도와 같은 남부의 방언들은 일찍부터 ㅐ와 ㅔ가 변별되지 않았다. 그런데 강원도방언에서는 우선 ㅐ와 ㅔ가 뚜렷이 변별된다. 때와 떼, 개(짐승의)와 게(곗돈을 붓는), 재(타고 남은)와, 제(겨), 새다(물이)와 세다(개수를 한 개 두 개)와 같은 최소 대립어도 물론 존재한다. 또한 ㅚ와 ㅟ는 서울에서조차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못하고 대개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강원도 영동방언에서는 정확한 단모음φ와y로 실현된다.꾀, 되, 쇠꼽, 동회, 괴다(제삿상에 과일을)나귀, 뉘, 뒤, 쥐, 곰취, 취하다등의 ㅚ와 ㅟ가 모두 정확히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외국과 왜국을 혼동하는 따위의 일은 영동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강원도방언은 우선 단모음의 수에서 전국 어느 방언보다 앞선다. 다음과 같은 10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ㅣ ㅟ ㅡ ㅜ
ㅔ ㅚ ㅓ ㅗ
ㅐ ㅏ
③ 이중모음
영동지방의 이중모음은 다른 방언에 있는 것이 다 있으면서 두 개가 더 있다.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그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지만=과ㅛㅣ가 있다. 그 중에서도=는ㅑ,ㅛ등이 각각 반모음j가ㅏ와ㅗ앞에 결합된 소리이다.ㅛㅣ가 현재 오직 한 어휘요ㅣ에 이 음이 쓰이고 있다. 요ㅣ란 외출 중이어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따로 남겨 놓는, 또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몫으로 떼어놓은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나간 사람의 요ㅣ는 있어도 자는 사람의 요ㅣ는 없다드라”와 같이 쓰인다. 반면 =는 영동방언에서 상당 수 발견되고 있다. 이 이중모음은 한글로 표기할 수조차 없는데 영감, 연하다, 여부(與否), 열(생선의 쓸개), 여드름, 열때(열쇠), 여젱이(모자라는 사람)등의 ㅕ가 이 음에 속한다. 이 이중모음을 흔히 편법으로 ㅡ를 위아래로 포개어 =로, 표기한다.=는 분포상의 제약을 크게 받아 자음을 선행시키지 못하고 또 반드시 장음을 동반한다. 늘 장모음만으로 실현되는 특징은 이 모음이ㅕ의 변이음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일으키나 같은 장모음의 여:럿, 연:꽃의 여는 결코=로 발음되는 일이 없고 또 현지 토박이들이 두 가지 음을 잘 구별하고 있어 두 모음이 별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영동지역의 이중모음의 예는 다음과 같다.
ㅑ , ㅕ, ㅛ, ㅛㅣ, ㅠ, ㅐ, ㅖ, = , ㅘ, ㅝ, ㅙ, ㅞ, ㅢ
④ 성조와 음장
영동방언은 음운으로서 상기한 자음, 모음 이외에 운소를 더 가지고 있다. 성조와 음장이 그것이다. 즉 성조와 음장이 모두 어의를 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동방언은 고조와 저조의 대립을 가지며 동시에 장음과 단음의 대립을 가지는데 여기서 고조와 장음을 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영동방언에서의 성조의 음운론적 대립은 제일음절에 국한하는 듯하며 또 장음, 단음 역시 제일음절의 모음의 길이를 뜻한다.
고조
저조
성
조
허물(과실)
허물(껍질)
우리(돼지의)
우리(we)
새끼(짐승)
새끼(짚으로 꼬은)
고름(옷고름)
고름(상처에서)
장음
단음
음
장
눈:(하늘에서내림)
눈(사람의)
매:(하늘을 나는)
매(때리는)
짐:(수증기의)
짐(등에 지는)
간:다(맷돌로간다)
간다(걸어간다)
2) 음운현상
① 경음화
어두의 경음화 현상은 임진왜란 이후 국어에서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음운현상 중의 하나인데, 강원도 방언에서도 어두의 경음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구리→깨구리, 가위→까새, 갓난아이→깐난애기
도랑→또랑, 두레박→뜨레박
박쥐→빡쮜, 벗기다→뺏기다, (콩을)불리다→뿔구다
사례→싸레, 삶다→
영동방언권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동해, 태백, 평창, 정선, 영월
위의 구분에서 영서방언권에 속한 군들의 언어는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방언권에 속한 군들은 방언적 차이를 보여 북단영동방언권, 강릉방언권, 삼척방언권, 서남영동방언권으로 구분된다.
북단영동방언권은 고성, 속초, 양양이 속하며, 휴전선 이북까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방언권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강릉방언권은 강릉, 명주를 묶은 지역으로, 이 지역은 때로는 양양과 가까운 관계를 보이기도 하나 여러 방언 특징에 의해 이웃지역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방언권을 형성한다.
삼척방언권은 삼척, 동해, 태백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언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영동의 한 방언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서남영동방언권은 평창, 정선, 영월의 세 군을 묶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동방언과 영서방언권의 요소가 뒤섞여 나타나는 지역으로 영동방언권에서 영서방언권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방언권이다.
Ⅳ. 강원도 방언의 특징
1. 음운론
1) 음운체계 (운소쳬계)
① 자음
전국적으로 자음체계는 그리 큰 방언적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강원도 방언의 자음체계 역시 표준어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후두파열음 음소목록에 추가시킬지의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묻-(問)의 경우에도 물:는다, 물:째, 물:뜨라, 물:네야등과 같이 활용된다. 표준어의 ㄷ변칙 용언에 해당하는 어형이 영동방언에 없음을 알려주고, 의 음소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경음 음소들을 각 계열의 평음과 의 합음을 처리함으로써 음소목록을 간단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 음소 설정에 대한 문제점은 기저음운을 굳이 음소목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 될 것이다.
강원도 영동 지역의 방언에서는 모음 앞에서의 받침 은 매우 특이하게 발음된다. 영동방언에는생우(새우), 영우(여우), 맹이(모이), 호맹이(호미), 마뎅이(타작)등에서 이런 발음이 번번이 나타난다. 중우(주의), 뭉우(무), 방아등도 얼추 들으면 주, 무, 바와 같은 단음절로 들리지만 실은 약화된 음을(또는 비모음을 동반한) 2음절 단어들이다.
② 모음
강원도방언의 단모음은 10개로서 4계열 3단계의 모음체계를 지닌다. 한글자모로는 구별되어 있으나 많은 방언에서 그 변별력이 상실된 것이 강원도방언에서는 고스란히 그것이 지켜지고 있기 대문이다. 일례로 경상도나 전라도와 같은 남부의 방언들은 일찍부터 ㅐ와 ㅔ가 변별되지 않았다. 그런데 강원도방언에서는 우선 ㅐ와 ㅔ가 뚜렷이 변별된다. 때와 떼, 개(짐승의)와 게(곗돈을 붓는), 재(타고 남은)와, 제(겨), 새다(물이)와 세다(개수를 한 개 두 개)와 같은 최소 대립어도 물론 존재한다. 또한 ㅚ와 ㅟ는 서울에서조차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못하고 대개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강원도 영동방언에서는 정확한 단모음φ와y로 실현된다.꾀, 되, 쇠꼽, 동회, 괴다(제삿상에 과일을)나귀, 뉘, 뒤, 쥐, 곰취, 취하다등의 ㅚ와 ㅟ가 모두 정확히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외국과 왜국을 혼동하는 따위의 일은 영동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강원도방언은 우선 단모음의 수에서 전국 어느 방언보다 앞선다. 다음과 같은 10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ㅣ ㅟ ㅡ ㅜ
ㅔ ㅚ ㅓ ㅗ
ㅐ ㅏ
③ 이중모음
영동지방의 이중모음은 다른 방언에 있는 것이 다 있으면서 두 개가 더 있다.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그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지만=과ㅛㅣ가 있다. 그 중에서도=는ㅑ,ㅛ등이 각각 반모음j가ㅏ와ㅗ앞에 결합된 소리이다.ㅛㅣ가 현재 오직 한 어휘요ㅣ에 이 음이 쓰이고 있다. 요ㅣ란 외출 중이어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따로 남겨 놓는, 또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의 몫으로 떼어놓은 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나간 사람의 요ㅣ는 있어도 자는 사람의 요ㅣ는 없다드라”와 같이 쓰인다. 반면 =는 영동방언에서 상당 수 발견되고 있다. 이 이중모음은 한글로 표기할 수조차 없는데 영감, 연하다, 여부(與否), 열(생선의 쓸개), 여드름, 열때(열쇠), 여젱이(모자라는 사람)등의 ㅕ가 이 음에 속한다. 이 이중모음을 흔히 편법으로 ㅡ를 위아래로 포개어 =로, 표기한다.=는 분포상의 제약을 크게 받아 자음을 선행시키지 못하고 또 반드시 장음을 동반한다. 늘 장모음만으로 실현되는 특징은 이 모음이ㅕ의 변이음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일으키나 같은 장모음의 여:럿, 연:꽃의 여는 결코=로 발음되는 일이 없고 또 현지 토박이들이 두 가지 음을 잘 구별하고 있어 두 모음이 별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영동지역의 이중모음의 예는 다음과 같다.
ㅑ , ㅕ, ㅛ, ㅛㅣ, ㅠ, ㅐ, ㅖ, = , ㅘ, ㅝ, ㅙ, ㅞ, ㅢ
④ 성조와 음장
영동방언은 음운으로서 상기한 자음, 모음 이외에 운소를 더 가지고 있다. 성조와 음장이 그것이다. 즉 성조와 음장이 모두 어의를 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동방언은 고조와 저조의 대립을 가지며 동시에 장음과 단음의 대립을 가지는데 여기서 고조와 장음을 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영동방언에서의 성조의 음운론적 대립은 제일음절에 국한하는 듯하며 또 장음, 단음 역시 제일음절의 모음의 길이를 뜻한다.
고조
저조
성
조
허물(과실)
허물(껍질)
우리(돼지의)
우리(we)
새끼(짐승)
새끼(짚으로 꼬은)
고름(옷고름)
고름(상처에서)
장음
단음
음
장
눈:(하늘에서내림)
눈(사람의)
매:(하늘을 나는)
매(때리는)
짐:(수증기의)
짐(등에 지는)
간:다(맷돌로간다)
간다(걸어간다)
2) 음운현상
① 경음화
어두의 경음화 현상은 임진왜란 이후 국어에서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 음운현상 중의 하나인데, 강원도 방언에서도 어두의 경음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구리→깨구리, 가위→까새, 갓난아이→깐난애기
도랑→또랑, 두레박→뜨레박
박쥐→빡쮜, 벗기다→뺏기다, (콩을)불리다→뿔구다
사례→싸레, 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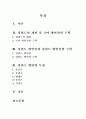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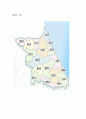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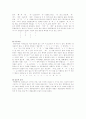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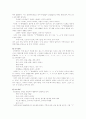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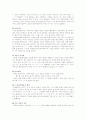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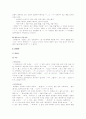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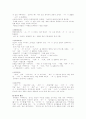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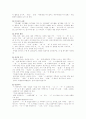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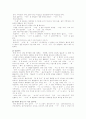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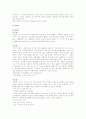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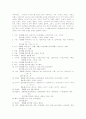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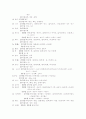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