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김동리의 삶
Ⅱ. 김동리 문학의 모습
Ⅲ. 인간주의적 생명성
Ⅳ. 샤머니즘과 비극미의 결합
Ⅴ. 예술가로서의 운명
Ⅵ. 남은 과제들
<참고문헌>
Ⅱ. 김동리 문학의 모습
Ⅲ. 인간주의적 생명성
Ⅳ. 샤머니즘과 비극미의 결합
Ⅴ. 예술가로서의 운명
Ⅵ. 남은 과제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원형질’의 탐구이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기층민의 삶을 탐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Ⅲ. 인간주의적 생명성
김동리의 문학은 인간과 우주의 근원에 대한 의문과 여기서 파생되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예정된 길이거나 그곳에서 시작되는 만남과 이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운명에 작가는 주목한다. 아울러 보편적 운명을 삶의 원형적 정서인 허무와 슬픔 등 인간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보편적 정서로 풀어낸다.
① 초월적 세계에 운명을 맡긴「바위」
「바위」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집착과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갈망이 복바위의 전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복바위를 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민간에서 떠도는 전설만을 믿고 어머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복바위로 간다.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세계를 그리면서, 구원은 결국 과학주의가 아닌 샤머니즘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소박한 조선인의 맹목적인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초월적인 세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것은 현실세계의 불투명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바위는 술이 어머니에게는 ‘그립고 아쉽고 또 원망스럽고 밉살스러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행복과 불행이 전부 매인’ 절재적인 존재이다. 곧 일상적인 세계임과 동시에 주술적인 세계인 것이다. 한 연구자는 식민자적 상황과 접목시켜서 ‘복바위’를 안고 죽은 문둥이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적 상황의 보편적 고뇌와 해방에의 기원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짓기도 한다. 현실의 비극성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데서 공허한 일제말기의 한 단면을 엿보게 된다.
② 숙명이라 인식하여 자신의 운명에 순응한 「역마」
전라도 구례, 경상도의 하동 그리고 쌍계사로 들어가는 세 갈래 길목에 자리잡은 화개장터에서 옥화는 주막을 한다. 어느 날 늙은 체장수는 계연이라는 딸을 옥화에게 맡기고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아들 성기와 이어지기를 바라나 계연의 머리를 빗어주다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동생임을 안다. 이와 같은 자매의 운명적 만남과 성기와 계연의 가슴 저린 헤어짐을 예견하고 상처를 받는다. 계연이 떠난 후 몸져누운 성기에게 옥화는 먹구름처럼 내려앉은 운명의 장난을 이야기한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 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신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 그에게 보여 주었다.
-「역마」 중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인 성기는 엿판을 둘러메고 떠나게 되고 옥화가 구름 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사연이 모두 예정된 일임을 새삼 깨닫
Ⅲ. 인간주의적 생명성
김동리의 문학은 인간과 우주의 근원에 대한 의문과 여기서 파생되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예정된 길이거나 그곳에서 시작되는 만남과 이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운명에 작가는 주목한다. 아울러 보편적 운명을 삶의 원형적 정서인 허무와 슬픔 등 인간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보편적 정서로 풀어낸다.
① 초월적 세계에 운명을 맡긴「바위」
「바위」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집착과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갈망이 복바위의 전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복바위를 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민간에서 떠도는 전설만을 믿고 어머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복바위로 간다.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세계를 그리면서, 구원은 결국 과학주의가 아닌 샤머니즘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소박한 조선인의 맹목적인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초월적인 세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것은 현실세계의 불투명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바위는 술이 어머니에게는 ‘그립고 아쉽고 또 원망스럽고 밉살스러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행복과 불행이 전부 매인’ 절재적인 존재이다. 곧 일상적인 세계임과 동시에 주술적인 세계인 것이다. 한 연구자는 식민자적 상황과 접목시켜서 ‘복바위’를 안고 죽은 문둥이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적 상황의 보편적 고뇌와 해방에의 기원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짓기도 한다. 현실의 비극성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데서 공허한 일제말기의 한 단면을 엿보게 된다.
② 숙명이라 인식하여 자신의 운명에 순응한 「역마」
전라도 구례, 경상도의 하동 그리고 쌍계사로 들어가는 세 갈래 길목에 자리잡은 화개장터에서 옥화는 주막을 한다. 어느 날 늙은 체장수는 계연이라는 딸을 옥화에게 맡기고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아들 성기와 이어지기를 바라나 계연의 머리를 빗어주다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동생임을 안다. 이와 같은 자매의 운명적 만남과 성기와 계연의 가슴 저린 헤어짐을 예견하고 상처를 받는다. 계연이 떠난 후 몸져누운 성기에게 옥화는 먹구름처럼 내려앉은 운명의 장난을 이야기한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 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신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 그에게 보여 주었다.
-「역마」 중에서
숙명으로 받아들인 성기는 엿판을 둘러메고 떠나게 되고 옥화가 구름 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사연이 모두 예정된 일임을 새삼 깨닫
추천자료
 관촌수필의 분석과 나의 견해
관촌수필의 분석과 나의 견해 농민소설론에 대해서
농민소설론에 대해서 1930년대 소설을 통한 근대정신의 심층 탐구
1930년대 소설을 통한 근대정신의 심층 탐구 해방기 소설
해방기 소설 [오발탄 분석, 오발탄] 오발탄 작품분석 - 작가 이범선, 작품들의 특징, 내용분석
[오발탄 분석, 오발탄] 오발탄 작품분석 - 작가 이범선, 작품들의 특징, 내용분석 1970년대 비평사
1970년대 비평사 이태준의 (꽃나무는 심어 놓고) (촌띄기) (봄) (농군)의 작품 줄거리와 주인공 성격 비교 분...
이태준의 (꽃나무는 심어 놓고) (촌띄기) (봄) (농군)의 작품 줄거리와 주인공 성격 비교 분... (방송통신대) 이태준의 <꽃나무는 심어 놓고>, <촌띄기>, <봄>, <농군> 줄거리 및 주인공의 ...
(방송통신대) 이태준의 <꽃나무는 심어 놓고>, <촌띄기>, <봄>, <농군> 줄거리 및 주인공의 ... [인문과학] 액자소설연구
[인문과학] 액자소설연구 박목월 시 연구
박목월 시 연구  【국어교과서 수록】근대소설 교육의 실제 이범선의 오발탄
【국어교과서 수록】근대소설 교육의 실제 이범선의 오발탄  [소설][1920년대][1930년대][1940년대][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1920년대 소...
[소설][1920년대][1930년대][1940년대][1950년대][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1920년대 소... [현대 시인론] 이형기 & 정호승
[현대 시인론] 이형기 & 정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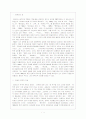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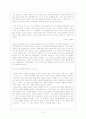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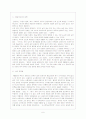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