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사문학에 대하여
1. 가사문학이란?
2. 가사문학의 발생에 대한 견해
3. 가사문학의 변모 양상
Ⅱ. 송강 정철에 대하여
1. 송강 정철에 대한 개괄적 설명
2. 송강 정철의 연보
Ⅲ. 송강 정철의 가사 작품
1. 관동별곡
2. 사미인곡
3. 속미인곡
Ⅳ. 정철 작품의 문체적 특징과 문학사적 의미
<참고문헌>
1. 가사문학이란?
2. 가사문학의 발생에 대한 견해
3. 가사문학의 변모 양상
Ⅱ. 송강 정철에 대하여
1. 송강 정철에 대한 개괄적 설명
2. 송강 정철의 연보
Ⅲ. 송강 정철의 가사 작품
1. 관동별곡
2. 사미인곡
3. 속미인곡
Ⅳ. 정철 작품의 문체적 특징과 문학사적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깐 동안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북두 칠성과 같은 국자를 기울여 동해물 같은 술을 부어 저도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를 추켜 올리니, 아득한 하늘도 웬만하면 날 것같구나.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 가니, 공중의 옥퉁소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렴푹하네.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하물며 가인들 어찌 알리. 명월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곳이 없다.
-관동별곡 작품 해설
1580년(선조 13) 정철이 지은 가사. ≪송강가사≫와 ≪협률대성≫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가 45세 되는 해 정월에 강원도관찰사의 직함을 받고 원주에 부임하여, 3월에 내금강·외금강·해금강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는 가운데 뛰어난 경치와 그에 따른 감흥을 표현한 작품이다.
내용을 시상의 전개에 따라 나누면 4단으로 나뉜다. 1단에서는 향리에 은거하고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찰사에 제수되어 강원도 원주로 부임하는 과정을 노래하였다.
2단에서는 만폭동, 금강대, 진헐대, 개심대, 화룡연, 십이폭포 등 내금강의 절경을 읊고 있다.
3단에서는 총석정·삼일포·의상대의 일출, 경포대·죽서루 및 망양정에서 보는 동해의 경치 등 외금강·해금강과 동해안에서의 유람을 노래했다. 4단에서는 꿈속에서 신선과 더불어 노니는 것에 비유하여 작자의 풍류를 읊었다.
율격은 가사의 전형적인 4음 4보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음절수의 양상을 보면, 3·4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4·4조이다. 그 밖에 2·4조, 4·3조, 3·3조, 2·3조, 3·2조, 3·5조, 5·2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진술양식에서 작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인 신선과의 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감탄사와 생략법과 대구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우리말을 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자의 뛰어난 문장력이 잘 나타나 있다.
시상은 이백(李白)의 〈유태산 遊太山〉·〈송왕옥산인위만환왕옥 送王屋山人魏萬還王屋〉·〈여산요기위시어허주 廬山謠寄韋侍御虛舟〉, 두보(杜甫)의 〈북정 北征〉, 소식(蘇軾)의 〈적벽부 赤壁賦〉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후인들은 이 작품을 매우 칭찬했는데, 김만중이 ≪서포만필 ≫에서 ‘동방의 이소(離騷)’라고 찬양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주어 〈관동별곡〉을 모방하여 지어진 작품도 많이 나타났다. 조우인의 〈관동속별곡 關東續別曲〉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관동별곡에서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관동별곡\'의 색다른 이해 - \'가면\' 혹은 \'진실\'
이 작품은 인간의 양면적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면\'은 관찰사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얼굴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대사회적인 가면이다. 반면 \'진실\'이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얼굴을 말한다. 이는 술을 마시고 취하거나 과 사선을 동경하는 행동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갈등과 욕망을 상징한다. 이러한 내면적 심적 태도를 \'아니마(anima)\'라고 한다. 이러한 페르소나와 아니마적 송강의 성격을 산을 유람할 때에는 페르소나적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바다를 접했을 때에는 아니마적 풍취가 많이 발견된다.
* \'관동별곡\'의 시적 화자의 정서적 추이
이 노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에서 떠올린 이미지와 바다에서 떠올린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산을 보면서 떠올린 것은 백색의 이미지이다. 백색 이미지는 \'성스러움\', \'고결\', \'승화\' 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고결성의 바탕은 시적 화자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바다를 향해 가면서부터 시적 화자의 모습은 일변한다. 그 자신을 취선(醉仙)으로 표현하면서 천연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산에서 억제되고 다듬어진 위정자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얼굴이, 바다에 이르러서는 인간 의식이 저 밑에 있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두 모습은 마침내 갈등을 일으킨다. 이 점에서 이 노래는 단순한 기행 가사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깃들여 있는 두 얼굴의 표백(表白)이며, 그 갈등의 함축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관동별곡\'에서 \'공간의 이동(산에서 바다로의 나아감)과 작자의 내면 변화
산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열망[목민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바다로 접어 들면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면의 깊이로 향하는 전환을 보이고 있다. 산이 간직하고 있는 덕성을 본받아 실현하는 것은 작가의 의무이고 이상이며 목표였다. 그러기에 산의 경치를 노래하되 신하로서의 직분, 목민관으로서의 의무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바다에 와서는 사회적인 의무보다는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산을 보고는 곧고 변함없는 덕성을 본받고자 하고,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는 무한한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고자 했다.
* \'관동별곡\'에서 갈등의 양상과 극복은?
지은이는 관찰사로서의 공식적인 임무와 자연을 마냥 즐기고 싶은 신선적인 풍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신선과 만나는 꿈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우선 술을 모든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마시게 한 후에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하겠다는 말 속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에의 몰입, 도취를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 지향과 충의, 우국, 애민 등을 지향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지만 도교적 신선 지향성은 연군의 정, 애민 사상, 우국적 감정에서 연유된 관찰사의 소임에 대한 강한 자각에 의하여 극복된다.
* \'선우후락(先憂後樂)\'
\'이 술 가져다가 ~
-관동별곡 작품 해설
1580년(선조 13) 정철이 지은 가사. ≪송강가사≫와 ≪협률대성≫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가 45세 되는 해 정월에 강원도관찰사의 직함을 받고 원주에 부임하여, 3월에 내금강·외금강·해금강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는 가운데 뛰어난 경치와 그에 따른 감흥을 표현한 작품이다.
내용을 시상의 전개에 따라 나누면 4단으로 나뉜다. 1단에서는 향리에 은거하고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찰사에 제수되어 강원도 원주로 부임하는 과정을 노래하였다.
2단에서는 만폭동, 금강대, 진헐대, 개심대, 화룡연, 십이폭포 등 내금강의 절경을 읊고 있다.
3단에서는 총석정·삼일포·의상대의 일출, 경포대·죽서루 및 망양정에서 보는 동해의 경치 등 외금강·해금강과 동해안에서의 유람을 노래했다. 4단에서는 꿈속에서 신선과 더불어 노니는 것에 비유하여 작자의 풍류를 읊었다.
율격은 가사의 전형적인 4음 4보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음절수의 양상을 보면, 3·4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4·4조이다. 그 밖에 2·4조, 4·3조, 3·3조, 2·3조, 3·2조, 3·5조, 5·2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진술양식에서 작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인 신선과의 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감탄사와 생략법과 대구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우리말을 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자의 뛰어난 문장력이 잘 나타나 있다.
시상은 이백(李白)의 〈유태산 遊太山〉·〈송왕옥산인위만환왕옥 送王屋山人魏萬還王屋〉·〈여산요기위시어허주 廬山謠寄韋侍御虛舟〉, 두보(杜甫)의 〈북정 北征〉, 소식(蘇軾)의 〈적벽부 赤壁賦〉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후인들은 이 작품을 매우 칭찬했는데, 김만중이 ≪서포만필 ≫에서 ‘동방의 이소(離騷)’라고 찬양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주어 〈관동별곡〉을 모방하여 지어진 작품도 많이 나타났다. 조우인의 〈관동속별곡 關東續別曲〉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관동별곡에서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관동별곡\'의 색다른 이해 - \'가면\' 혹은 \'진실\'
이 작품은 인간의 양면적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면\'은 관찰사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얼굴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대사회적인 가면이다. 반면 \'진실\'이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얼굴을 말한다. 이는 술을 마시고 취하거나 과 사선을 동경하는 행동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갈등과 욕망을 상징한다. 이러한 내면적 심적 태도를 \'아니마(anima)\'라고 한다. 이러한 페르소나와 아니마적 송강의 성격을 산을 유람할 때에는 페르소나적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바다를 접했을 때에는 아니마적 풍취가 많이 발견된다.
* \'관동별곡\'의 시적 화자의 정서적 추이
이 노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에서 떠올린 이미지와 바다에서 떠올린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산을 보면서 떠올린 것은 백색의 이미지이다. 백색 이미지는 \'성스러움\', \'고결\', \'승화\' 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고결성의 바탕은 시적 화자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바다를 향해 가면서부터 시적 화자의 모습은 일변한다. 그 자신을 취선(醉仙)으로 표현하면서 천연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산에서 억제되고 다듬어진 위정자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얼굴이, 바다에 이르러서는 인간 의식이 저 밑에 있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두 모습은 마침내 갈등을 일으킨다. 이 점에서 이 노래는 단순한 기행 가사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깃들여 있는 두 얼굴의 표백(表白)이며, 그 갈등의 함축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관동별곡\'에서 \'공간의 이동(산에서 바다로의 나아감)과 작자의 내면 변화
산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열망[목민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바다로 접어 들면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면의 깊이로 향하는 전환을 보이고 있다. 산이 간직하고 있는 덕성을 본받아 실현하는 것은 작가의 의무이고 이상이며 목표였다. 그러기에 산의 경치를 노래하되 신하로서의 직분, 목민관으로서의 의무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바다에 와서는 사회적인 의무보다는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산을 보고는 곧고 변함없는 덕성을 본받고자 하고,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는 무한한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고자 했다.
* \'관동별곡\'에서 갈등의 양상과 극복은?
지은이는 관찰사로서의 공식적인 임무와 자연을 마냥 즐기고 싶은 신선적인 풍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신선과 만나는 꿈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우선 술을 모든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마시게 한 후에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하겠다는 말 속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에의 몰입, 도취를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 지향과 충의, 우국, 애민 등을 지향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지만 도교적 신선 지향성은 연군의 정, 애민 사상, 우국적 감정에서 연유된 관찰사의 소임에 대한 강한 자각에 의하여 극복된다.
* \'선우후락(先憂後樂)\'
\'이 술 가져다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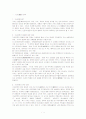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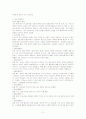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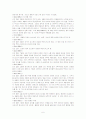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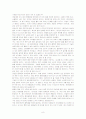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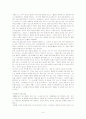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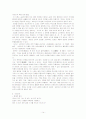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