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송강 정철(松江 鄭澈)
(1) 송강 정철의 생애
(2) 송강 정철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상
(3) 송강 정철의 작품세계
(4) 송강 정철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특징
2.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 고산 윤선도의 생애
(2) 고산 윤선도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상(고산의 자연관)
(3) 고산 윤선도의 작품 세계
(4) 고산 윤선도의 업적 및 문학사에 미친 영향
3. 면앙 송순(俛仰 宋純)
(1) 면앙 송순의 생애
(2) 면앙 송순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특징
(3) 면앙 송순의 삶의 철학
(4) 송순의 면앙정가
(1) 송강 정철의 생애
(2) 송강 정철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상
(3) 송강 정철의 작품세계
(4) 송강 정철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특징
2.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 고산 윤선도의 생애
(2) 고산 윤선도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상(고산의 자연관)
(3) 고산 윤선도의 작품 세계
(4) 고산 윤선도의 업적 및 문학사에 미친 영향
3. 면앙 송순(俛仰 宋純)
(1) 면앙 송순의 생애
(2) 면앙 송순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특징
(3) 면앙 송순의 삶의 철학
(4) 송순의 면앙정가
본문내용
사성이 되었으나 왕명으로 상신 로수신에 대한 비답을 지은 것이 화가 되어 관직을 물러나 창평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해(1581) 12월에 특지로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고, 이어 도승지, 예조참판 등을 거쳐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술을 즐겨 예의를 잃는다>는 사헌부의 계와 <꾀를 부려 화를 낳고><편협하여 남의 재능을 시기한다>는 사간원의 논핵을 당했다.
49세(1585)에 대사헌, 50세에 판돈령이 되었으나 이때는 동서 분쟁이 더욱 치열한 때여서 세태는 날로 암울해져 갔다. 송강은 선조 18년(1585) 4월에 조신의 훼방과 양사의 논척을 받고 고양에 퇴거해 있다가 창평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한 4년 동안 처의 외척 김성원의 산정을 빌려 살면서 수석과 벗을 삼고 독서와 시작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 기간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기였으나 작가로서의 생활에서는 가장 보람찬 시기였다. 자연미에 마음껏 몰입하여 감정을 시상으로 승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국에 대한 개탄 속에서 더욱 진한 전율로 느껴오는 연군지정에 온 몸을 작품 속에 녹였다. 그의 작품 중에 적지 않은 양이 이시기에 지어졌고, <사미인곡>, <속미인곡>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넷째아들인 기암이 택당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선조 20~21년 대점(현재 전남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54세(1589) 때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일자 우의정에 발탁된 송강은 서인의 영수로서 철저하게 동인을 추방했고, 좌의정에 올라 인성부원군이 되었으나 건저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사고, 양사의 논핵을 받아 파직되어 명천강계로 귀양을 다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풀려난 송강은 왕을 평양 행재소에 배알하고 의주까지 호송하였다가 9월에 양호체찰사가 되어 남하하였다. 이듬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왜군이 물러가고 더 이상 출사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논란이 일어나 그를 공박할 구실로 삼으려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강화 송강촌으로 물러나와 지내다가 빈한과 회한 속에서 이해(선조26,1593) 12월18일에 다사다난했던 생의 막을 내렸는데 향년 58세였다. 숙종 10년에 시호를 문청이라 내렸다.
자녀는 기명종명진명홍명 4남과 3녀를 두었는데, 장남 기명은 진사를 하고 문행이 있었으나 일찍 죽었고, 차남 종명(1565~1626)은 진사를 거쳐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강릉부사를 지냈다. 삼남 진명은 진사를 했으나 조사했고, 사남 홍명(1592~1650)은 증광문과에 급제, 수원부사, 대사헌 등의 요직을 지냈고, 고문에 밝았으며 김장생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송강의 유고를 수집 보관하여 후에 『송강원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장녀는 이기직에게 출가했고, 차녀는 최욱에게, 삼녀는 광주목사 임회에게 출가하였다.
교우관계를 보면 박순성혼이이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 밖에도 앞서 말한 김성원고경명백광훈 등과도 남다른 친교가 있었다. 전술한 김인후임억령기대승 등과의 사사나 앞의 여러 인사들과의 교우는 송강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들은 당대의 대학자요 대시인이고, 우리 문학사는 물론 우리 사상사에도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어서 송강이 이들과 사사, 교우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의 학문과 문학세계를 그만큼 심화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억령김성원고경명과의 친교는 정철 자신과 함께 식영정 사선을 만들어 성산가단을 크게 빛나게 하기도 하였다. 문집으로 『송강집』,『송강가사』,『송강별추록유사』등이 전하고 있으며, 후손과 그 측근자들이 비장하였던 『송강집 습유』, 『습유부록』이 전하ㅗ 있다.
(2) 송강 정철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상
1) 유교사상
유교는 충의와 인의 및 효제 등을 미덕으로 삼는 덕치교화 철학으로 조선의 전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다. 유교적 윤리관의 핵심내용은 삼강오륜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충과 제는 동양인에게 있어서 중심 덕목이자 유학자들의 최고 목표로서 행동의 근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사상적 흐름은 송강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유교사상과 관련하여 그의 작품의 저변에 깔린 사상을 유교사상아래에서 충과 효로 나누어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① 효제
송강의 작품에서 효제를 노래한 것은 <훈민가>를 비롯한 시조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훈민가> 16수는 송강이 45살 되던 선조 13년(1580)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지은 것인데, 창작 동기 및 작자의 목적이 유교의 보편화를 위한 목민가이다.
아바님 날 나시고 어마님 날 기시니
두 분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하 업 은덕을 어ㅣ 다혀 갑오리
부모 은덕은 하늘에다 비할 수 없고 바다에도 비할 수 없다. 끝이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쉽고 일상적인 시어로 직핍하였다. 어버이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 때의 <사모곡>을 연상하게 한다.
② 충의
충의적 사상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며, 이 충성은 곧 임금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애정과도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유를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의 의식사고에서 님을 향한 여인네의 일편단심은 곧잘 연군의 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송강의 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성산에서 김성원의 생활 모습을 읊은 <성산별곡>을 제외한 송강의 가사 모두가 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蓬萊山 님 겨신ㅣ 五更틴 나믄 소ㅣ
城너머 구름 디나 객창에 들이다
강남에 려옷 가면 그립거든 엇디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에 자고 있을 새벽, 들려오는 북소리에 성안의 임금을 생각하는 것은 송강의 마음속에 임금의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2) 불교사상
조선시대에 있어 불교는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 되어 그 힘이 매우 쇠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오랜 역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토착의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소멸 속에서도 그 명맥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송강의 작품에서도 불교 사상만을 전적으로 투영시킨 국문 시가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상과 융합하여 표출되면서 불교의 윤회 사상에 바탕을 둔 작품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리
49세(1585)에 대사헌, 50세에 판돈령이 되었으나 이때는 동서 분쟁이 더욱 치열한 때여서 세태는 날로 암울해져 갔다. 송강은 선조 18년(1585) 4월에 조신의 훼방과 양사의 논척을 받고 고양에 퇴거해 있다가 창평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한 4년 동안 처의 외척 김성원의 산정을 빌려 살면서 수석과 벗을 삼고 독서와 시작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 기간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시기였으나 작가로서의 생활에서는 가장 보람찬 시기였다. 자연미에 마음껏 몰입하여 감정을 시상으로 승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국에 대한 개탄 속에서 더욱 진한 전율로 느껴오는 연군지정에 온 몸을 작품 속에 녹였다. 그의 작품 중에 적지 않은 양이 이시기에 지어졌고, <사미인곡>, <속미인곡>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넷째아들인 기암이 택당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선조 20~21년 대점(현재 전남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54세(1589) 때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일자 우의정에 발탁된 송강은 서인의 영수로서 철저하게 동인을 추방했고, 좌의정에 올라 인성부원군이 되었으나 건저문제로 왕의 노여움을 사고, 양사의 논핵을 받아 파직되어 명천강계로 귀양을 다녔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풀려난 송강은 왕을 평양 행재소에 배알하고 의주까지 호송하였다가 9월에 양호체찰사가 되어 남하하였다. 이듬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왜군이 물러가고 더 이상 출사의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다가 논란이 일어나 그를 공박할 구실로 삼으려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강화 송강촌으로 물러나와 지내다가 빈한과 회한 속에서 이해(선조26,1593) 12월18일에 다사다난했던 생의 막을 내렸는데 향년 58세였다. 숙종 10년에 시호를 문청이라 내렸다.
자녀는 기명종명진명홍명 4남과 3녀를 두었는데, 장남 기명은 진사를 하고 문행이 있었으나 일찍 죽었고, 차남 종명(1565~1626)은 진사를 거쳐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강릉부사를 지냈다. 삼남 진명은 진사를 했으나 조사했고, 사남 홍명(1592~1650)은 증광문과에 급제, 수원부사, 대사헌 등의 요직을 지냈고, 고문에 밝았으며 김장생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송강의 유고를 수집 보관하여 후에 『송강원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장녀는 이기직에게 출가했고, 차녀는 최욱에게, 삼녀는 광주목사 임회에게 출가하였다.
교우관계를 보면 박순성혼이이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 밖에도 앞서 말한 김성원고경명백광훈 등과도 남다른 친교가 있었다. 전술한 김인후임억령기대승 등과의 사사나 앞의 여러 인사들과의 교우는 송강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들은 당대의 대학자요 대시인이고, 우리 문학사는 물론 우리 사상사에도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어서 송강이 이들과 사사, 교우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의 학문과 문학세계를 그만큼 심화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억령김성원고경명과의 친교는 정철 자신과 함께 식영정 사선을 만들어 성산가단을 크게 빛나게 하기도 하였다. 문집으로 『송강집』,『송강가사』,『송강별추록유사』등이 전하고 있으며, 후손과 그 측근자들이 비장하였던 『송강집 습유』, 『습유부록』이 전하ㅗ 있다.
(2) 송강 정철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사상
1) 유교사상
유교는 충의와 인의 및 효제 등을 미덕으로 삼는 덕치교화 철학으로 조선의 전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다. 유교적 윤리관의 핵심내용은 삼강오륜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충과 제는 동양인에게 있어서 중심 덕목이자 유학자들의 최고 목표로서 행동의 근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사상적 흐름은 송강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유교사상과 관련하여 그의 작품의 저변에 깔린 사상을 유교사상아래에서 충과 효로 나누어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① 효제
송강의 작품에서 효제를 노래한 것은 <훈민가>를 비롯한 시조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훈민가> 16수는 송강이 45살 되던 선조 13년(1580)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지은 것인데, 창작 동기 및 작자의 목적이 유교의 보편화를 위한 목민가이다.
아바님 날 나시고 어마님 날 기시니
두 분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하 업 은덕을 어ㅣ 다혀 갑오리
부모 은덕은 하늘에다 비할 수 없고 바다에도 비할 수 없다. 끝이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쉽고 일상적인 시어로 직핍하였다. 어버이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 때의 <사모곡>을 연상하게 한다.
② 충의
충의적 사상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며, 이 충성은 곧 임금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애정과도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유를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의 의식사고에서 님을 향한 여인네의 일편단심은 곧잘 연군의 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송강의 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성산에서 김성원의 생활 모습을 읊은 <성산별곡>을 제외한 송강의 가사 모두가 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蓬萊山 님 겨신ㅣ 五更틴 나믄 소ㅣ
城너머 구름 디나 객창에 들이다
강남에 려옷 가면 그립거든 엇디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에 자고 있을 새벽, 들려오는 북소리에 성안의 임금을 생각하는 것은 송강의 마음속에 임금의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2) 불교사상
조선시대에 있어 불교는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 되어 그 힘이 매우 쇠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오랜 역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토착의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소멸 속에서도 그 명맥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송강의 작품에서도 불교 사상만을 전적으로 투영시킨 국문 시가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상과 융합하여 표출되면서 불교의 윤회 사상에 바탕을 둔 작품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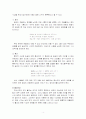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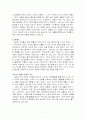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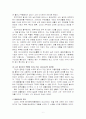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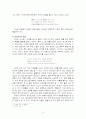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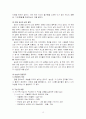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