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안학교의 개념
2. 대안학교 교육의 개념
3. 대안학교 교육의 정착 방향
(1) 검토해야 할 쟁점
(2) 대안 학교가 풀어야 할 과제
Ⅲ. 결론
참고 문헌
Ⅱ. 본론
1. 대안학교의 개념
2. 대안학교 교육의 개념
3. 대안학교 교육의 정착 방향
(1) 검토해야 할 쟁점
(2) 대안 학교가 풀어야 할 과제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이는 학교 건물이나 커리큘럼 같은 것이 아니라 공기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 문화이다. 특히 특성화학교학교들 가운데는 일반 학교처럼 권위적인 위계질서를 보이는 학교도 있고, 군대식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학교들도 적지 않다. ‘군기 잡는’ 선배들을 견디지 못해 한두 달만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다.
대안학교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군대식 위계질서 문화에 젖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가 일반학교보다 더 억압적일 수 있다. 또 교사들은 그런 문화를 묵인하기도 한다. 교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선배의 말은 듣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선배들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이다. 이미 머리통이 굵은 아이들이 몸에 밴 습성이나 의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의식과 행동이 바뀌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결국 학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대안교육이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안학교의 문제점도 부각시켜야 대안교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경우도 잘못을 자꾸 덮어두려고만 하다가 봇물 터지듯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의 이야기는 이제는 대안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입시교육을 거부한다고 해서 대안학교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안학교들이 어린 새싹 같은 존재라고 해서 감싸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포대기에 싸여 있기만 해서는 결코 튼튼하게 자랄 수 없는 법이다.
Ⅲ. 결론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일부 학부모와 교사, 교육 운동가를 중심으로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안팎에서 변화를 자극하고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는 결코 서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 체제라는 것은 그 사회 질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보수성을 띠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교육이 정체되어 썩지 않고 상수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물줄기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대안교육이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대안교육 현장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사실상 교육 문제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교육 문제인 셈이다. 대안교육은 교육의 문제가 결국 삶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자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고 보면 결국 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배어 있는 권위주의, 출세주의,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 문제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시간이 곧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참된 교육이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서로 서로 배우는 것이 아닐까.
참고 문헌
강대중(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출판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헌병호, 대안교육 격월간지「민들레」
대안학교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군대식 위계질서 문화에 젖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가 일반학교보다 더 억압적일 수 있다. 또 교사들은 그런 문화를 묵인하기도 한다. 교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선배의 말은 듣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선배들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이다. 이미 머리통이 굵은 아이들이 몸에 밴 습성이나 의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의식과 행동이 바뀌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결국 학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대안교육이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안학교의 문제점도 부각시켜야 대안교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경우도 잘못을 자꾸 덮어두려고만 하다가 봇물 터지듯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간디학교 양희창 교장의 이야기는 이제는 대안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입시교육을 거부한다고 해서 대안학교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안학교들이 어린 새싹 같은 존재라고 해서 감싸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포대기에 싸여 있기만 해서는 결코 튼튼하게 자랄 수 없는 법이다.
Ⅲ. 결론
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일부 학부모와 교사, 교육 운동가를 중심으로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안팎에서 변화를 자극하고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는 결코 서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 체제라는 것은 그 사회 질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보수성을 띠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교육이 정체되어 썩지 않고 상수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물줄기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대안교육이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대안교육 현장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사실상 교육 문제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교육 문제인 셈이다. 대안교육은 교육의 문제가 결국 삶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자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고 보면 결국 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배어 있는 권위주의, 출세주의,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 문제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시간이 곧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참된 교육이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서로 서로 배우는 것이 아닐까.
참고 문헌
강대중(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출판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헌병호, 대안교육 격월간지「민들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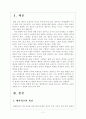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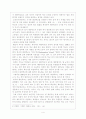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