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론
2. 형태론
3. 통사론
2. 형태론
3. 통사론
본문내용
빛이 검다. → 빛이 검어한다.
나) 그 아이가 착하다.→ 그 아이를 착해한다.
다) 나는 철수가 좋다. →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다)에서 ‘좋다’가 ‘좋아한다’로 바뀌지만 “날씨가 참 좋군!” 과 같은 예에서는 “날씨를 참 좋아하군”으로 바꿀 수 없다. 이와 같이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를 성상형용사라 부른다. 형용사에는 동사와 달리 성상형용사로 표현된 말을 지시하는 형용사를 더 들 수 있다. 제 3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와 같이 화자와 청자를 축으로 하여 성상형용사로 표현된 주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대용하는 기능을 띤 형용사를 지시형용사라 한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띠고 있는 말을 용언이라고 한다.
③ 보조 용언
용언 가운데 동사, 형용사와 같이 자립성을 띤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의존적 성격을 띤 것도 있다.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 하고 품사를 구별하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라 한다. 한편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은 본용언이다. 의존명사와 함께 준자립형식을 구성한다.
◎보조동사 : 보조동사에는 종류가 많다. 보조동사임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보조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가) 날씨가 점점 추워 온다.
① 날씨가 점점 춥다. ② 날씨가 점점 온다.
나) 먼지를 말끔히 떨어버렸다.
① 먼지를 말끔히 떨었다. ② 먼지를 말끔히 버렸다.
다) 드디어 그 문제를 풀어 내었다.
① 드디어 그 문제를 풀었다. ② 드디어 그 문제를 내었다.
본용언과 보조동사로 구별하여 문장을 만든 것으로 ①은 성립되나 ② 보조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같은 보조동사라도 상황에 따라 보조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가) 책을 서가에 꽂아 두었다.
① 책을 서가에 꽂았다. ② 책을 서가에 두었다.
그러나 ①의 의미는 책을 서가에 일정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게 배치해 두었다는 것이고 ②는 얹거나 꽂거나 어느 자리에 놓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조동사가 본용언과 결합될 때는 일정한 어미를 요구하는 제약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가다, 주다’는 연결어미 ‘어’뒤에 나타날 때만이 보조동사의 기능을 띤다. 다른 연결어미 아래 쓰이면 두 개의 본용언의 병치로 보아야 한다.
◎보조 형용사 : 보조형용사는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본용언과 의미상의 관련을 맺을 수 없다.
가) 희망 - (고)싶다 : 금강산에 가고 싶다.
나) 부정 - (지)아니하다(않다) :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
(지)못하다 : 그 분은 별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다) 추측 - (ㄴ가, 는가, 나)보다 : 저 건물이 동대문인가 보다.
(는가, 나(으)ㄹ까...) 싶다. : 지금 생각하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라) 상태 - (어)있다 :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 잇습니다.
(어)계시다 :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마) 시인 - (기는)하다 : 그 집이 크기는 하다.
부정의 보조형용사로는 ‘아니하다, 못하다’만 있고 ‘말다’가 없는 것은 형용사에는 명령형과 청유형이 없기 때문이다.
7. 2 활용
용언은 주체를 서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체언이 문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조사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용언도 문법적 기능을 여러 가지로 표시하려면 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완전굴절법이라 불렀다. 단어의 줄기 되는 부분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일을 활용 또는 끝바꿈이라고 하며 용언 외 서술격조사도 포함된다. 문장을 종결하는 것을 종결형,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연결형, 문장의 성격을 전성시킨다고 하여 전성형으로 나눈다.
어간과 어미 : 활용어의 중심 되는 줄기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어간에 가지나 잎사귀처럼 붙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가) 읽 : 는다, 느냐, 는
나) 밝 :다, 으냐, 은
다) (연필)이 : 다, 냐, 로구나, ㄴ
‘로구나’는 서술격조사와 이의 부정어인 ‘아니다’에만 사용되는데 동사에서는 ‘-는구나’, 형용사에는 ‘-구나’로 나타난다. ‘-는다, -느냐’와 ‘다, (으)냐’는 문법적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동사에 붙고 후자는 형용사, 서술격조사에 붙는다. 관형사형 ‘-는’과 ‘-(으)ㄴ’도 같이 설명된다. ‘-는’은 동사에, ‘-(으)ㄴ’은 형용사와 서술격조사에 붙는다. 만약 두 종류의 어미를 바꾸어 쓰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거나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는/ㄴ다’와 ‘-는’의 통합 여부를 동사, 형용사의 변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존재사의 활용 : 용언 가운데는 활용의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동사와 형용사의 어느 품사에 넣어야 할 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 전통문법에서 ‘존재사’라 부르기로 했던 것이 그것인데 실제로 형용사와 동사의 두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있다, 없다’는 활용방식이 평서형에서는 형용사와 같고, 관형사형에는 동사와 같으며, 의문형에서는 동사와 같고, 감탄형에서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을 한다.
활용형의 불완전성 : 대부분의 동사는 모든 어미를 취하여 활용표상의 빈 칸이 생기지 않으나 소수의 동사는 활용이 완전하지 못하여 불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있다. 이러한 동사를 불완전동사라고 한다.
가) 동생을 데리고 가거라
나) 동생을 데려 왔다.
다) 동생을 데린다.
라) 동생을 데려라
‘데리’는 ‘고, 어’의 두 어미만 취할 수 있고 다른 어미는 취할 수 없다. 불완전 동사에는 ‘대하다, 비롯하다, 관하다, 의하다, 위하다, 말미암다, 즈음하다, 더불다’도 포함된다. 활용형태가 ‘-ㄴ, -어’등에 국한되어 불완전성이 쉽게 인식된다.
7. 3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 규칙활용 :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할 때는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한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일도 많다. 형태 변이 가운데 일정한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규칙활용,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① 받침규칙에 의한 소리의 바뀜
가) 옷은~
나) 그 아이가 착하다.→ 그 아이를 착해한다.
다) 나는 철수가 좋다. →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다)에서 ‘좋다’가 ‘좋아한다’로 바뀌지만 “날씨가 참 좋군!” 과 같은 예에서는 “날씨를 참 좋아하군”으로 바꿀 수 없다. 이와 같이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를 성상형용사라 부른다. 형용사에는 동사와 달리 성상형용사로 표현된 말을 지시하는 형용사를 더 들 수 있다. 제 3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와 같이 화자와 청자를 축으로 하여 성상형용사로 표현된 주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대용하는 기능을 띤 형용사를 지시형용사라 한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띠고 있는 말을 용언이라고 한다.
③ 보조 용언
용언 가운데 동사, 형용사와 같이 자립성을 띤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의존적 성격을 띤 것도 있다.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 하고 품사를 구별하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라 한다. 한편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은 본용언이다. 의존명사와 함께 준자립형식을 구성한다.
◎보조동사 : 보조동사에는 종류가 많다. 보조동사임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보조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가) 날씨가 점점 추워 온다.
① 날씨가 점점 춥다. ② 날씨가 점점 온다.
나) 먼지를 말끔히 떨어버렸다.
① 먼지를 말끔히 떨었다. ② 먼지를 말끔히 버렸다.
다) 드디어 그 문제를 풀어 내었다.
① 드디어 그 문제를 풀었다. ② 드디어 그 문제를 내었다.
본용언과 보조동사로 구별하여 문장을 만든 것으로 ①은 성립되나 ② 보조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같은 보조동사라도 상황에 따라 보조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가) 책을 서가에 꽂아 두었다.
① 책을 서가에 꽂았다. ② 책을 서가에 두었다.
그러나 ①의 의미는 책을 서가에 일정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게 배치해 두었다는 것이고 ②는 얹거나 꽂거나 어느 자리에 놓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보조동사가 본용언과 결합될 때는 일정한 어미를 요구하는 제약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가다, 주다’는 연결어미 ‘어’뒤에 나타날 때만이 보조동사의 기능을 띤다. 다른 연결어미 아래 쓰이면 두 개의 본용언의 병치로 보아야 한다.
◎보조 형용사 : 보조형용사는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본용언과 의미상의 관련을 맺을 수 없다.
가) 희망 - (고)싶다 : 금강산에 가고 싶다.
나) 부정 - (지)아니하다(않다) :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
(지)못하다 : 그 분은 별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다) 추측 - (ㄴ가, 는가, 나)보다 : 저 건물이 동대문인가 보다.
(는가, 나(으)ㄹ까...) 싶다. : 지금 생각하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라) 상태 - (어)있다 : 하루 종일 이곳에 앉아 잇습니다.
(어)계시다 :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마) 시인 - (기는)하다 : 그 집이 크기는 하다.
부정의 보조형용사로는 ‘아니하다, 못하다’만 있고 ‘말다’가 없는 것은 형용사에는 명령형과 청유형이 없기 때문이다.
7. 2 활용
용언은 주체를 서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체언이 문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조사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용언도 문법적 기능을 여러 가지로 표시하려면 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완전굴절법이라 불렀다. 단어의 줄기 되는 부분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일을 활용 또는 끝바꿈이라고 하며 용언 외 서술격조사도 포함된다. 문장을 종결하는 것을 종결형,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연결형, 문장의 성격을 전성시킨다고 하여 전성형으로 나눈다.
어간과 어미 : 활용어의 중심 되는 줄기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어간에 가지나 잎사귀처럼 붙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가) 읽 : 는다, 느냐, 는
나) 밝 :다, 으냐, 은
다) (연필)이 : 다, 냐, 로구나, ㄴ
‘로구나’는 서술격조사와 이의 부정어인 ‘아니다’에만 사용되는데 동사에서는 ‘-는구나’, 형용사에는 ‘-구나’로 나타난다. ‘-는다, -느냐’와 ‘다, (으)냐’는 문법적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동사에 붙고 후자는 형용사, 서술격조사에 붙는다. 관형사형 ‘-는’과 ‘-(으)ㄴ’도 같이 설명된다. ‘-는’은 동사에, ‘-(으)ㄴ’은 형용사와 서술격조사에 붙는다. 만약 두 종류의 어미를 바꾸어 쓰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거나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는/ㄴ다’와 ‘-는’의 통합 여부를 동사, 형용사의 변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존재사의 활용 : 용언 가운데는 활용의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 동사와 형용사의 어느 품사에 넣어야 할 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 전통문법에서 ‘존재사’라 부르기로 했던 것이 그것인데 실제로 형용사와 동사의 두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있다, 없다’는 활용방식이 평서형에서는 형용사와 같고, 관형사형에는 동사와 같으며, 의문형에서는 동사와 같고, 감탄형에서는 형용사와 같은 활용을 한다.
활용형의 불완전성 : 대부분의 동사는 모든 어미를 취하여 활용표상의 빈 칸이 생기지 않으나 소수의 동사는 활용이 완전하지 못하여 불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있다. 이러한 동사를 불완전동사라고 한다.
가) 동생을 데리고 가거라
나) 동생을 데려 왔다.
다) 동생을 데린다.
라) 동생을 데려라
‘데리’는 ‘고, 어’의 두 어미만 취할 수 있고 다른 어미는 취할 수 없다. 불완전 동사에는 ‘대하다, 비롯하다, 관하다, 의하다, 위하다, 말미암다, 즈음하다, 더불다’도 포함된다. 활용형태가 ‘-ㄴ, -어’등에 국한되어 불완전성이 쉽게 인식된다.
7. 3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 규칙활용 :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할 때는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한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일도 많다. 형태 변이 가운데 일정한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규칙활용,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① 받침규칙에 의한 소리의 바뀜
가) 옷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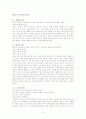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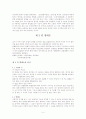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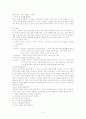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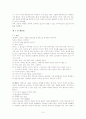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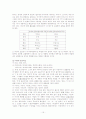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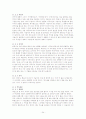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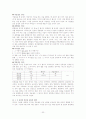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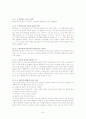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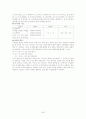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