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전남지역의 민속극적 전통
(1)풍물굿과 민속극
(2)장례놀이와 민속극
(3)무당굿과 민속극
(4)치병제의와 민속극
(5)마을 공동제의와 민속극
3. 전남지역의 광대[탈] 전승
(1)풍물굿 속의 광대[탈]
(2)무당굿 속의 광대[탈]
4. 맺음말
2. 전남지역의 민속극적 전통
(1)풍물굿과 민속극
(2)장례놀이와 민속극
(3)무당굿과 민속극
(4)치병제의와 민속극
(5)마을 공동제의와 민속극
3. 전남지역의 광대[탈] 전승
(1)풍물굿 속의 광대[탈]
(2)무당굿 속의 광대[탈]
4. 맺음말
본문내용
반적으로 광대 또는 잡색이라고 하는데, 광대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된다. 전남 북부에서는 잡색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만 여타의 지역에서는 광대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뒷치배를 통칭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어 뒷치배 전부를 광대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 빈도로 본다면 풍물굿에서 놀이를 담당하는 연희자를 광대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광대는 탈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풍물굿의 광대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놀이를 펼칠 때에 몇몇 배역들이 얼굴에 탈을 쓰고 나와 노는데, 그 탈을 광대라고 부른다. 전남에서는 탈이나 가면이란 말보다 광대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대는 대개 바가지나 종이로 만들며, 영광같은 곳에는 나무로 만든 탈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리고 완도 생일도에는 발에 광대를 쓰고서 노는 발광대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광대를 쓰고 노는 독립된 연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광대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제79호호 지정되어 있는 발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다. 그동안 학계에서 보고된 바가 없지만 전남의 광대[탈] 전승으로서 새롭게 주목해야할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설양굿에서도 탈이 사용된다. 현재 삼설양굿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지 않아 탈의 연극적 기능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탈이 남아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무극 속에서의 탈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삼설양굿에 나오는 탈은 가면극의 경우와 달리 배역에 따른 탈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탈이 등장하는 연희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광대[탈] 전승 맥락 속에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
(1)풍물굿 속의 광대[탈]
1) 화순담양 광대놀이 속의 광대[탈]
풍물굿에서 광대(잡색)는 매구패의 활동을 돕고 마당밟이의 진행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연극적 행위를 통해 관객을 웃기고 즐겁게 하기도 한다. 이런 광대의 역할은 결코 부수적이지 않은데 그들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 “굿은 할멈이 다한다. 할멈하고 양반이 잘하면 굿판이 재밌고, 못하믄 재미가 없다.”(화순 능주면 관영리), “잡색이 놀아야 걸궁이 볼 만하제. 그런게 없으믄 뭔 재미로 볼 것인가”(화순 능주면 관영리), “마당밟이에서 가장 웃기는 장면은 할미광대가 아무데나 쉬하는 것하고, 남자 노비광대가 양반 놀리는 것이다.”(화순 한천면 한계리) 등 김혜정, 앞의 글, 289쪽.
의 표현에 풍물굿 광대들의 연극적 역할이 설명되어 있다.
전남의 풍물굿 광대놀이에서 광대[탈]를 쓰는 배역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 연희 내용도 다양하다. 대포수창부조리중양반영감할미각시 등의 배역이 있는데, 지역마다 그 배역이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영감과 할미가 광대를 많이 쓰며, 지역에 따라 조리중이나 포수, 각시가 광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배역 이름 없이 남장 또는 여장을 하고서 나와 노는 역할이 있는데 이 때도 종이로 광대를 만들어 쓰고 나와 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므로 광대의 종류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총괄할 만큼 현지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탈을 쓰고 노는 놀이 중에서 대표적 사례를 들어 광대[탈] 전승의 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화순군 능주면과 담양군 금성면에서 필자가 조사한 영감할미놀이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화순의 영감할미놀이> 1998년 2월 10일, 2월 20일, 2월 25일 현지조사, 제보자 : 최자근(남, 80), 양소자(남, 69)
양반[영감]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긴 수염을 달고 긴 담뱃대를 들고 다닌다. 양반광대는 대부분 키가 큰 사람이 하며, 젊잖게 춤추고 다닌다. 탈을 썼다. 각시는 여장남자로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한다. 역시 탈을 쓴다. 할미는 늙었다고 배를 다 내놓고 다니고, 등에는 천뭉치나 바가지를 넣어서 곱사흉내를 내고 다닌다. 허리는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부지깽이를 들고 다니기도 한다. 흰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탈을 쓴다.
영감이 각시와 놀아나고 양반과 부부지간인 할미가 말리고 다닌다. 영감과 각시는 음란한 춤을 추면서 놀고, 할미는 이를 말리면서 쫓아 다닌다. 할미는 각시광대와 노는 영감을 말리고 특히 각시를 부지깽이나 지팡이로 때리지만, 영감은 오히려 그러는 할미를 때릴려고 한다.
할미는 아무데나 앉아서 소변보는 흉내를 내는데, 할미가 양반보고 나 “쉬할라우”하면 양반이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라기도 한다. 영감이 오줌누는 할미의 치마도 떠들어 보고 “오줌이 어만 데로 간다.”고 하고, “노망났냐”고 놀리기도 한다.
할미와 영감은 부부 사이로서, 입도 맞추고 어깨동무도 하고 다닌다. 영감이 “여보 여보” 하면서 할미를 찾아다니기도 하며, 할미가 “양반(영감) 어디갔소”하면서 마당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할미와 영감은 함께 자는 것을 흉내 내기도 한다. 영감을 거적대기 위에다 반듯이 눕혀놓고 할미가 배 위로 올라타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잠자리를 흉내낸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뱃다고 바가치를 배에 엎어가지고 다니든가 애기모양의 허새비를 포대기에 싸서 배에 묶고 다닌다.
할미가 애낳는 흉내도 낸다. 애는 짚과 헝겁으로 만든 허새비다. 애를 낳는다고 하면 양반이 치마를 떠들어 보고 애 나온다고 소리치면서 야단법석을 떤다. 이 때 조리중이나 대포수도 산고났다고 관객들에게 알리고 다닌다. 영감이 애를 받아서 “애나왔다” 외치면서 “잉애 잉애 잉애” 소리를 낸다. 영감이 애를 어르면서 “아이고 내새끼 인자 나왔냐”하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동동동동”하고 노래도 한다. 영감이 애어르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화둥둥 내아들 어화둥둥 내아들
두부장수 아들인가 니모반듯 잘생겼네
지름장수 딸년인가 미끄덩 미끄덩 잘생겼네
영감이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아들을 낳네, 딸을 낳네, 오랜만에 아들을 난게 왜 이렇게 오줌골이 죄냐.”라고 하면서 다닌다. 할미는 젖준다고 애를 데리고 가서 젖주는 흉내도 낸다. 또 “이야 영감아 내아들 주라. 내아들 주라.” 하고
광대는 탈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풍물굿의 광대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놀이를 펼칠 때에 몇몇 배역들이 얼굴에 탈을 쓰고 나와 노는데, 그 탈을 광대라고 부른다. 전남에서는 탈이나 가면이란 말보다 광대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대는 대개 바가지나 종이로 만들며, 영광같은 곳에는 나무로 만든 탈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리고 완도 생일도에는 발에 광대를 쓰고서 노는 발광대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광대를 쓰고 노는 독립된 연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광대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제79호호 지정되어 있는 발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다. 그동안 학계에서 보고된 바가 없지만 전남의 광대[탈] 전승으로서 새롭게 주목해야할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설양굿에서도 탈이 사용된다. 현재 삼설양굿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지 않아 탈의 연극적 기능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탈이 남아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 무극 속에서의 탈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삼설양굿에 나오는 탈은 가면극의 경우와 달리 배역에 따른 탈의 분화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탈이 등장하는 연희라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광대[탈] 전승 맥락 속에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
(1)풍물굿 속의 광대[탈]
1) 화순담양 광대놀이 속의 광대[탈]
풍물굿에서 광대(잡색)는 매구패의 활동을 돕고 마당밟이의 진행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연극적 행위를 통해 관객을 웃기고 즐겁게 하기도 한다. 이런 광대의 역할은 결코 부수적이지 않은데 그들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 “굿은 할멈이 다한다. 할멈하고 양반이 잘하면 굿판이 재밌고, 못하믄 재미가 없다.”(화순 능주면 관영리), “잡색이 놀아야 걸궁이 볼 만하제. 그런게 없으믄 뭔 재미로 볼 것인가”(화순 능주면 관영리), “마당밟이에서 가장 웃기는 장면은 할미광대가 아무데나 쉬하는 것하고, 남자 노비광대가 양반 놀리는 것이다.”(화순 한천면 한계리) 등 김혜정, 앞의 글, 289쪽.
의 표현에 풍물굿 광대들의 연극적 역할이 설명되어 있다.
전남의 풍물굿 광대놀이에서 광대[탈]를 쓰는 배역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 연희 내용도 다양하다. 대포수창부조리중양반영감할미각시 등의 배역이 있는데, 지역마다 그 배역이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영감과 할미가 광대를 많이 쓰며, 지역에 따라 조리중이나 포수, 각시가 광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배역 이름 없이 남장 또는 여장을 하고서 나와 노는 역할이 있는데 이 때도 종이로 광대를 만들어 쓰고 나와 놀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므로 광대의 종류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 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총괄할 만큼 현지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탈을 쓰고 노는 놀이 중에서 대표적 사례를 들어 광대[탈] 전승의 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화순군 능주면과 담양군 금성면에서 필자가 조사한 영감할미놀이를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화순의 영감할미놀이> 1998년 2월 10일, 2월 20일, 2월 25일 현지조사, 제보자 : 최자근(남, 80), 양소자(남, 69)
양반[영감]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긴 수염을 달고 긴 담뱃대를 들고 다닌다. 양반광대는 대부분 키가 큰 사람이 하며, 젊잖게 춤추고 다닌다. 탈을 썼다. 각시는 여장남자로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한다. 역시 탈을 쓴다. 할미는 늙었다고 배를 다 내놓고 다니고, 등에는 천뭉치나 바가지를 넣어서 곱사흉내를 내고 다닌다. 허리는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부지깽이를 들고 다니기도 한다. 흰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탈을 쓴다.
영감이 각시와 놀아나고 양반과 부부지간인 할미가 말리고 다닌다. 영감과 각시는 음란한 춤을 추면서 놀고, 할미는 이를 말리면서 쫓아 다닌다. 할미는 각시광대와 노는 영감을 말리고 특히 각시를 부지깽이나 지팡이로 때리지만, 영감은 오히려 그러는 할미를 때릴려고 한다.
할미는 아무데나 앉아서 소변보는 흉내를 내는데, 할미가 양반보고 나 “쉬할라우”하면 양반이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라기도 한다. 영감이 오줌누는 할미의 치마도 떠들어 보고 “오줌이 어만 데로 간다.”고 하고, “노망났냐”고 놀리기도 한다.
할미와 영감은 부부 사이로서, 입도 맞추고 어깨동무도 하고 다닌다. 영감이 “여보 여보” 하면서 할미를 찾아다니기도 하며, 할미가 “양반(영감) 어디갔소”하면서 마당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할미와 영감은 함께 자는 것을 흉내 내기도 한다. 영감을 거적대기 위에다 반듯이 눕혀놓고 할미가 배 위로 올라타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잠자리를 흉내낸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뱃다고 바가치를 배에 엎어가지고 다니든가 애기모양의 허새비를 포대기에 싸서 배에 묶고 다닌다.
할미가 애낳는 흉내도 낸다. 애는 짚과 헝겁으로 만든 허새비다. 애를 낳는다고 하면 양반이 치마를 떠들어 보고 애 나온다고 소리치면서 야단법석을 떤다. 이 때 조리중이나 대포수도 산고났다고 관객들에게 알리고 다닌다. 영감이 애를 받아서 “애나왔다” 외치면서 “잉애 잉애 잉애” 소리를 낸다. 영감이 애를 어르면서 “아이고 내새끼 인자 나왔냐”하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동동동동”하고 노래도 한다. 영감이 애어르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화둥둥 내아들 어화둥둥 내아들
두부장수 아들인가 니모반듯 잘생겼네
지름장수 딸년인가 미끄덩 미끄덩 잘생겼네
영감이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아들을 낳네, 딸을 낳네, 오랜만에 아들을 난게 왜 이렇게 오줌골이 죄냐.”라고 하면서 다닌다. 할미는 젖준다고 애를 데리고 가서 젖주는 흉내도 낸다. 또 “이야 영감아 내아들 주라. 내아들 주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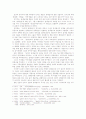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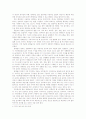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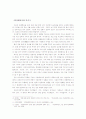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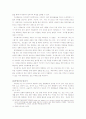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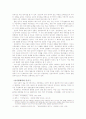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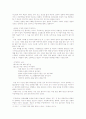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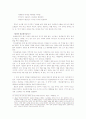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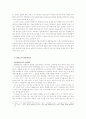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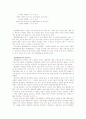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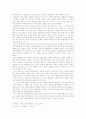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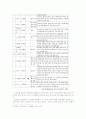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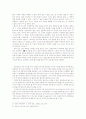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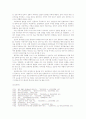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