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펼치며
1. 방언과 표준어
(1) 방언
(2) 표준어
(3) 방언과 표준어
2. 각 지역의 방언
(1) 충청도 방언
1. 충청도 방언
2. 충청도 방언의 특징
(2) 강원도 방언
(3) 전라도 방언
(4) 경상도 방언
(5) 제주도 방언
Ⅲ. 나가며
※ 참고문헌
Ⅱ. 펼치며
1. 방언과 표준어
(1) 방언
(2) 표준어
(3) 방언과 표준어
2. 각 지역의 방언
(1) 충청도 방언
1. 충청도 방언
2. 충청도 방언의 특징
(2) 강원도 방언
(3) 전라도 방언
(4) 경상도 방언
(5) 제주도 방언
Ⅲ. 나가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 없다는 논리가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어를 서울말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표준어 자체가 인위적이고 추상적인 실체라서 그 정체를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이희승(1932)은 표준어를 ‘㉠인위적으로 제정한 말이지만 그 기초는 실제한 언어 위에 두며, ㉡현대 서울말이지만 그것이 아니며, ㉢모든 방언을 대표하는 말이면서 어느 것과도 동일한 말이 아니라’고 보았고 다시 이희승(1955)에서는 ‘표준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국가 중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지방의 말로서 각 지방을 통하여 잘 이해되고 각 지방을 향하여 항상 전파될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민족이나 국가의 공식 용어로 쓰기에 가장 적당한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② 표준어의 발생
표준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에는 수도나 문화적 중심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서울말, 영국의 런던어, 프랑스의 파리어, 중국의 베이징어 등. 위의 책, p. 44.
하지만 여러 방언 가운데 그 나라의 국가적·민족적 의식과 함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우위성이 있는 세력을 가진 문자나 언어가 표준어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의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이 작품에서 사용한 피렌체시의 상류사회 언어. 위의 책, p. 44
(3) 방언과 표준어
지금까지 방언과 표준어의 정의와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사실들을 요약해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책, p. 43
표준어
방언
있어야 할 말
이념적, 추상적 말
인위적 말
객관성 추구
특정 지역어를 바탕으로 함
전국적으로 널리 쓰임
의식적인 학습의 대상이 되는 언어
있는 그대로의 말
구체적, 실재적 말
자연적 말
주관성 반영
모든 지역어를 바탕으로 함
각 층위의 화자들에 한해 쓰임
2. 각 지역의 방언
(1) 충청도 방언
1. 충청도 방언
충청도 방언은 흔히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억양과 느린 속도로 기억된다. 국어 방언학의 초창기에는 충청 방언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채 1960년대까지 경기 혹은 중부 방언권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 특유의 보편적인 방언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분석, 기술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편승하여 충청 방언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충청 방언은 경기 방언과 남부 방언의 중간 위치에서 혼합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충청 방언 중에서도 특히 충남방언의 독자성이 인정되면서 연구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상, 전라 방언 등 다른 방언권에 비해 미흡하며, 음운론과 형태론에 치우쳐있다.
2. 충청도 방언의 특징
2-1. 어휘
충청 방언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은 접미 파생어, 중간자음 유지, 독특한 어휘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먼저 접미 파생어는 \'-아지, -앵이, -애기, -박, -팍, -대기\' 등 접미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가 대표적이다. \'-아지\'와 결합한 것으로는 모가지(목+아지)/바가지(박+아지)등이 있고, \'-앵이\'와 결합한 것으로는 퇴깽이(토끼)/꼬랭이(꼬리)/염생이(염소)/호맹이(호미)등이 있다. 다음으로 \'-애기\'와 결합한 것은 지푸래기(짚)/종재기(종지)/땀때기(땀띠)등이 있고, ‘-박’이나 ‘-팍’과 결합한 것으로는 무르팍(무릎)/돌팍(돌)/마빡(이마)/되빡(되)등이 있다. ‘-대기’와 결합한 것으로는 밭때기(밭)/가마때기(가마니)/귀때기(귀)/거적때기(거적)등이 있다.『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한영목, 이회출판사, 1999, 109-110p
② 중간자음을 유지하는 현상에서는 대표적으로 /ㅅ/, /ㅂ/, /ㄱ/을 유지하는 어휘가 많이 발견된다. /-ㅅ-/유지 단어는 무수(무우)/여수(여우)/마실간다(마을간다)등이 있고, /-ㅂ-/유지 단어에는 또바리(또아리)/새뱅이(새우)/버버리(벙어리)가 있다. /-ㄱ-/유지 단어는 낭구(나무)/벌거지(벌레)/멀구(머루)/싱구다(심다)등이 있다.『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한영목, 이회출판사, 1999, 106-108p
③ 독특한 어휘는 의미가 표준어와 같되, 형태가 다른 어휘를 말한다. 대근하다(힘들다)/겅거니(반찬)/역뿌러(일부러)등 다양한 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다(그렇다)’는 충청도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휘로, 어떤 질문에 대한 사실적인 긍정으로 확인하는데 쓰인다. 장형부정부사 ‘아니’와는 공존하지 못하고 ‘기여’/‘안기여’등 종결어미로 쓰인다.『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한영목, 이회출판사, 1999, 44-45p
2-2. 문법
충청 방언의 자음, 모음 체계는 표준어와 같지만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① 자음변이를 살펴보면, 먼저 전라 방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강하다. 꽹이(괭이)/떤지다(던지다)/뻔디기(번데기)/쌈다(삶다)/쭈리다(줄이다)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구개음화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ㄱ→ㅈ/현상에서 지둥(기둥)/엿질금(엿기름)/지지개(기지개)/질다(길다)등이 있고, /ㅎ→ㅅ/현상에서는 세빠닥(혀바닥)/숭하다(흉하다)/심(힘)등이 있다. 형태소 내에 유기음화는 일정하지 않다. 공시적인 ‘자음+/ㅎ/\'이 약화, 탈락되는데 비해 충청 방언에서는 유기음이 실현된다. 예를 들면, 혼차(혼자)/덤풀(덤불)/사쿠다(삭이다)/가찹다(가깝다)/쿠린내(구린내)등이 있다. 이 지역 방언에서 폐구조음성이 강하여서 자음군 단순화에서 대체로 변자음이 남고, 설단성 자음이 삭제된다. 또한 한국어의 범언어적 현상과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삼뽀(산보)/맥끼다(맡기다)/짱구다(잠그다)/생키다(삼키다)와 같은 어휘에서 볼 때 자음 동화 현상이 적극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잔네(자네)/끈치다(그치다)등에서 알 수 있듯 /ㄴ/첨가 현상을 보이고, 굴른다(구르다)/길르다(기르다)/몰른다(모르다)에서처럼 소위 ’르‘불규칙 동사의 경우 /ㄹ/음이 첨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② 모음 변이에서는 고모음화, 저모음화,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가 실현된다. 고모음화는 비다(베다)/지비(제비)/시상(세상)등 /ㅔ→ㅣ/현상과, 으른(어른)/읍따(없다)/
이에 따라 이희승(1932)은 표준어를 ‘㉠인위적으로 제정한 말이지만 그 기초는 실제한 언어 위에 두며, ㉡현대 서울말이지만 그것이 아니며, ㉢모든 방언을 대표하는 말이면서 어느 것과도 동일한 말이 아니라’고 보았고 다시 이희승(1955)에서는 ‘표준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국가 중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지방의 말로서 각 지방을 통하여 잘 이해되고 각 지방을 향하여 항상 전파될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민족이나 국가의 공식 용어로 쓰기에 가장 적당한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② 표준어의 발생
표준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에는 수도나 문화적 중심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서울말, 영국의 런던어, 프랑스의 파리어, 중국의 베이징어 등. 위의 책, p. 44.
하지만 여러 방언 가운데 그 나라의 국가적·민족적 의식과 함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우위성이 있는 세력을 가진 문자나 언어가 표준어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의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이 작품에서 사용한 피렌체시의 상류사회 언어. 위의 책, p. 44
(3) 방언과 표준어
지금까지 방언과 표준어의 정의와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사실들을 요약해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책, p. 43
표준어
방언
있어야 할 말
이념적, 추상적 말
인위적 말
객관성 추구
특정 지역어를 바탕으로 함
전국적으로 널리 쓰임
의식적인 학습의 대상이 되는 언어
있는 그대로의 말
구체적, 실재적 말
자연적 말
주관성 반영
모든 지역어를 바탕으로 함
각 층위의 화자들에 한해 쓰임
2. 각 지역의 방언
(1) 충청도 방언
1. 충청도 방언
충청도 방언은 흔히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억양과 느린 속도로 기억된다. 국어 방언학의 초창기에는 충청 방언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채 1960년대까지 경기 혹은 중부 방언권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 특유의 보편적인 방언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분석, 기술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편승하여 충청 방언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충청 방언은 경기 방언과 남부 방언의 중간 위치에서 혼합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충청 방언 중에서도 특히 충남방언의 독자성이 인정되면서 연구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상, 전라 방언 등 다른 방언권에 비해 미흡하며, 음운론과 형태론에 치우쳐있다.
2. 충청도 방언의 특징
2-1. 어휘
충청 방언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은 접미 파생어, 중간자음 유지, 독특한 어휘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① 먼저 접미 파생어는 \'-아지, -앵이, -애기, -박, -팍, -대기\' 등 접미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가 대표적이다. \'-아지\'와 결합한 것으로는 모가지(목+아지)/바가지(박+아지)등이 있고, \'-앵이\'와 결합한 것으로는 퇴깽이(토끼)/꼬랭이(꼬리)/염생이(염소)/호맹이(호미)등이 있다. 다음으로 \'-애기\'와 결합한 것은 지푸래기(짚)/종재기(종지)/땀때기(땀띠)등이 있고, ‘-박’이나 ‘-팍’과 결합한 것으로는 무르팍(무릎)/돌팍(돌)/마빡(이마)/되빡(되)등이 있다. ‘-대기’와 결합한 것으로는 밭때기(밭)/가마때기(가마니)/귀때기(귀)/거적때기(거적)등이 있다.『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한영목, 이회출판사, 1999, 109-110p
② 중간자음을 유지하는 현상에서는 대표적으로 /ㅅ/, /ㅂ/, /ㄱ/을 유지하는 어휘가 많이 발견된다. /-ㅅ-/유지 단어는 무수(무우)/여수(여우)/마실간다(마을간다)등이 있고, /-ㅂ-/유지 단어에는 또바리(또아리)/새뱅이(새우)/버버리(벙어리)가 있다. /-ㄱ-/유지 단어는 낭구(나무)/벌거지(벌레)/멀구(머루)/싱구다(심다)등이 있다.『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한영목, 이회출판사, 1999, 106-108p
③ 독특한 어휘는 의미가 표준어와 같되, 형태가 다른 어휘를 말한다. 대근하다(힘들다)/겅거니(반찬)/역뿌러(일부러)등 다양한 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다(그렇다)’는 충청도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휘로, 어떤 질문에 대한 사실적인 긍정으로 확인하는데 쓰인다. 장형부정부사 ‘아니’와는 공존하지 못하고 ‘기여’/‘안기여’등 종결어미로 쓰인다.『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한영목, 이회출판사, 1999, 44-45p
2-2. 문법
충청 방언의 자음, 모음 체계는 표준어와 같지만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① 자음변이를 살펴보면, 먼저 전라 방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강하다. 꽹이(괭이)/떤지다(던지다)/뻔디기(번데기)/쌈다(삶다)/쭈리다(줄이다)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구개음화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ㄱ→ㅈ/현상에서 지둥(기둥)/엿질금(엿기름)/지지개(기지개)/질다(길다)등이 있고, /ㅎ→ㅅ/현상에서는 세빠닥(혀바닥)/숭하다(흉하다)/심(힘)등이 있다. 형태소 내에 유기음화는 일정하지 않다. 공시적인 ‘자음+/ㅎ/\'이 약화, 탈락되는데 비해 충청 방언에서는 유기음이 실현된다. 예를 들면, 혼차(혼자)/덤풀(덤불)/사쿠다(삭이다)/가찹다(가깝다)/쿠린내(구린내)등이 있다. 이 지역 방언에서 폐구조음성이 강하여서 자음군 단순화에서 대체로 변자음이 남고, 설단성 자음이 삭제된다. 또한 한국어의 범언어적 현상과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삼뽀(산보)/맥끼다(맡기다)/짱구다(잠그다)/생키다(삼키다)와 같은 어휘에서 볼 때 자음 동화 현상이 적극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잔네(자네)/끈치다(그치다)등에서 알 수 있듯 /ㄴ/첨가 현상을 보이고, 굴른다(구르다)/길르다(기르다)/몰른다(모르다)에서처럼 소위 ’르‘불규칙 동사의 경우 /ㄹ/음이 첨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② 모음 변이에서는 고모음화, 저모음화,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가 실현된다. 고모음화는 비다(베다)/지비(제비)/시상(세상)등 /ㅔ→ㅣ/현상과, 으른(어른)/읍따(없다)/
키워드
추천자료
 [인문과학] 국어 문법
[인문과학] 국어 문법 언어와 문법
언어와 문법 학교문법의 방향 및 교육방법 제시
학교문법의 방향 및 교육방법 제시 인터넷상에서 어휘 '폭력' 사용영역의 변화 연구
인터넷상에서 어휘 '폭력' 사용영역의 변화 연구 [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의 어휘) 의미, 방언어휘(방언의 어휘) 특성, 황해도 방...
[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어휘(방언의 어휘) 의미, 방언어휘(방언의 어휘) 특성, 황해도 방... 남북한어휘(남한과 북한의 어휘)의 선행연구, 남북한어휘(남한과 북한의 어휘)의 차이, 남북...
남북한어휘(남한과 북한의 어휘)의 선행연구, 남북한어휘(남한과 북한의 어휘)의 차이, 남북... 텍스트의 분석 이론, 상호텍스트성, 미적 텍스트성, 워터마킹 텍스트, 칼럼 분석과 텍스트, ...
텍스트의 분석 이론, 상호텍스트성, 미적 텍스트성, 워터마킹 텍스트, 칼럼 분석과 텍스트, ... [오류, 오류분석]오류 분석의 4단계, 발음교정, 수학교육의 오류, 부진문항, 실학의 오류, 불...
[오류, 오류분석]오류 분석의 4단계, 발음교정, 수학교육의 오류, 부진문항, 실학의 오류, 불... [표현][창의적 언어표현]표현과 창의적 언어표현, 표현과 언어학습, 표현과 어휘교육, 표현과...
[표현][창의적 언어표현]표현과 창의적 언어표현, 표현과 언어학습, 표현과 어휘교육, 표현과... 논문 요약_ 여성결혼이민자의 원활한 학부모 역할을 위한 어휘 선정 연구_공지연,심혜령 2009
논문 요약_ 여성결혼이민자의 원활한 학부모 역할을 위한 어휘 선정 연구_공지연,심혜령 2009 읽기 교재 분석의 실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고급 교재
읽기 교재 분석의 실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고급 교재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학술 텍스트의 완화 및 강화 표현 연구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학술 텍스트의 완화 및 강화 표현 연구 [한국어 문법 교육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교육 방안 연구 - 담화표지 ‘아니’를 ...
[한국어 문법 교육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교육 방안 연구 - 담화표지 ‘아니’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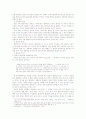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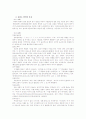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