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통혼례의 유례
2. 전통혼례의 절차 (四禮중심으로)
1) 의혼
2) 납채
3) 납폐
4) 초행
5) 소례
6) 대례
3. 신방엿보기 (신방지키기)
4. 동상례 (신랑 매달기)
5. 신행
1) 삼일우귀
2) 당일우귀
3) 묵신행
4) 신행길에서의 여러 행위 의례
6. 구고례
1) 폐백할 때 절하는 순서
2) 큰절과 평절의 차이
3) 대추와 편포의 의미
7. 시집살이
8. 근친
9. 명혼
10. 재취, 삼취
11. 보쌈
12. 민며느리
13. 데릴사위
14. 맺음말
15. 참고문헌
2. 전통혼례의 절차 (四禮중심으로)
1) 의혼
2) 납채
3) 납폐
4) 초행
5) 소례
6) 대례
3. 신방엿보기 (신방지키기)
4. 동상례 (신랑 매달기)
5. 신행
1) 삼일우귀
2) 당일우귀
3) 묵신행
4) 신행길에서의 여러 행위 의례
6. 구고례
1) 폐백할 때 절하는 순서
2) 큰절과 평절의 차이
3) 대추와 편포의 의미
7. 시집살이
8. 근친
9. 명혼
10. 재취, 삼취
11. 보쌈
12. 민며느리
13. 데릴사위
14. 맺음말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가하고 따지다가 결국은 신랑을 지목하고서 벌로 신랑의 발목을 끈으로 묶고 발바닥을 몽둥이(홍두깨 등)로 때린다. 그러면 신부집에서 용서하라고 음식을 내와 사정하거나 신부가 직접 나와 약간의 장기를 보여주며 신랑과 고통을 함께 한다. 신랑의 발에 묶인 끈을 직접 풀어 주기도 한다.
동상례는 얼굴 익히기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신랑이 심하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다.
5. 신행(新行)
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집으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행을 다른 말로 우귀(于歸) 라고도 한다. 신행할 때는 신부의 신행길을 보조할 친정집 사람들이 함께 간다. 신랑의 초행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따르는데, 대체로 신부 집을 대표하는 상객(신부의 부인이나 조부), 신부의 시중을 드는 수모(신부에게 딸려 단장을 꾸며 주고 예절을 거행하게 받들어 주는 여자), 짐꾼등이 따라 간다. 이때 신부의 교전비도 함께 가는데 교전비는 상객과 수모, 짐꾼들이 신행 후 돌아갈 때 함께 가지 않고 신부의 시댁에 남아 신부의 수발을 든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시집은 며느리를 따라온 교전비 치송이 어려워 시댁에 누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 삼일우귀(三日于歸)
혼례 후 3일째 되는 날 신랑과 신부 일행이 신랑집으로 떠나는데 이를 삼일우귀, 또는 삼일신행이라 한다.
2) 당일우귀(當日于歸)
혼례 후 그날 바로 신랑집으로 가는 경우를 당일우귀라 한다.
3) 묵신행
혼례 후 신랑만 먼저 가고 해를 묵혀 1년 정도 지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묵신행이라 한다.
양반 가문의 신부는 신랑을 홀로 보낸 후 친정에 남아 있다가, 다시 좋은 날을 받아 신행을 한다. 시댁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통은 일 년이 걸리기도 하고, 길면 삼 년도 걸린다. 물론 양가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몇 달 만에 신행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일년 정도는 묵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풍습을 사람들을 묵신행이라 불렀다.
신행은 지역마다 그리고 집안의 특성상, 위의 여려 형태의 신행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분의 차이(양반, 상민)에 의한 택함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신행길에서의 여러 행위 의례
신행은 신부가 시집에 가서 시집 식구들과 만나고 적응하기 위한 의례이기 때문에 신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의례와 관행들이 시행된다. 이러한 의례나 관행들은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복된 가정을 꾸리기를 기원하는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신부가 시가에 무사히 도착하여 시집 식구들과 원만하게 통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① 신부는 집을 떠나기 전에 부엌에 가서 솥뚜껑을 세 번 들었다 놓고 작별을 고한 다음 길을 떠난다.
② 신부의 가마가 출발하려고 하면 목화씨와 콩, 소금을 가마에 뿌려 잡귀가 범치 못하게 한다. ( 부유한 집에서는 잡귀가 범치 못하도록 호랑이가 그려진 담요를 가마 위에 얹고 간다.)
③ 쌀을 한 주먹 넣어 만든 ‘새미쌀’을 여러 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가마 속에 넣고 가다 다리, 물가, 샘, 굿은 곳 등을 지날 때 던지거나 나무에 걸어 놓고 가면 잡귀가 그것을 먹고 떨어진다고 한다.
④ 신부의 가마가 시댁 문전에 당도하면 잡귀가 붙지 못하도록 상을 차리고 문전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징을 친다. 그러면 가마가 불을 넘어 들어 온다. 이 불을 넘어 들어오면서 신부는 길에서 따라 붙었을 잡귀를 쫓아내고 친정에서 익힌 모든 생활관습과 문화를 버려야 한다.
⑤ 신부의 가마가 시댁에 이르면 문전 한가운데 피워놓은 불 위로 가마채로 넘어간다. 이때 바가지를 깨거나 딱총을 쏘기도 하고, 콩과 팥, 소금이나 목화씨를 뿌려 부정을 쫓는다. 시어머니가 치마를 가마 위에 얹기도 한다.
⑥ 신부의 가마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장독을 끌어안기도 한다. 이는 며느리가 말대답을 않고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뜻이다.
⑦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 시댁 지붕 꼭대기를 보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는 과부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⑧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면 신부 가마에 깔았던 짚방석을 지붕 위에 던진다. 이것은 신부가 도착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숨어있는 의미는 친정과의 절연, 시가와의 통합이다. 신부는 친정집에서 익힌 문화와 관습을 모두 버리고 시가집의 가풍을 익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에게서 쫓아내야 할 가장 큰 잡귀는 친정집에서 몸에 익혔던 생활관습이나 문화적 속성이며, 이를 교정하는 과정이 바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시집살이로 표현되는 것이다.
위의 ①에서 ⑧까지의 의례는 대체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행위의 의례가 조금씩 다르므로 시간적 중복이 있는 부분은 번호를 달리하여 넣었다.
6. 구고례(舅姑禮)
신부가 신행 와서 시부모를 위시하여 시댁 어른들과 가까운 친척에게 인사 드리는 것을 구고례라 한다. 또는 폐백(幣帛)이라고도 한다.
구고례를 할 때는 보통 신랑집 대청마루에 병풍을 치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신부집에서 보내온 폐백으로 상을 차린 후, 시부모에게 사배반(四拜半)의 절을 올린다. 시아버지는 동편에, 시어머니는 서편에 앉아 신부의 절을 받는다. 시조부모가 계셔도 시부모에게 먼저 한다.
신부가 시부모에게 사배반의 절을 한 다음 자리에 앉으면 시아버지는 대추 몇 개를 집어 신부의 치마 앞에 던져 주며 \"아들 많이 나라“는 덕담을 해준다. 이때 수모는 그 대추를 집어 신부의 원삼 큰 소매 속에 넣어 준다. 시어머니는 편포(片脯)나 포(脯)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어루만진다.
만일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폐백상에 대추를 사용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폐백을 한다. 폐백이 끝나면 사당에 고축(告祝)한 후에 시어머니가 “이것은 너의 시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고 대추 몇 개를 그릇에 담아 신부에게 준다. 시조부모가 살아 계시면 폐백이 끝난 후에 시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폐백을 하게 한다.
시부모에게 폐백을 하고 나면 폐백은 수모가 물리고 빈 상만 놓아 둔 채 다른 친척들에게(촌수나 항렬순서로) 폐백을 한다. 같은 항렬이면 평절로 서로 맞절을 하여 예를 갖춘다.
1) 폐백할
동상례는 얼굴 익히기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신랑이 심하게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다.
5. 신행(新行)
신부가 혼례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집으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행을 다른 말로 우귀(于歸) 라고도 한다. 신행할 때는 신부의 신행길을 보조할 친정집 사람들이 함께 간다. 신랑의 초행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따르는데, 대체로 신부 집을 대표하는 상객(신부의 부인이나 조부), 신부의 시중을 드는 수모(신부에게 딸려 단장을 꾸며 주고 예절을 거행하게 받들어 주는 여자), 짐꾼등이 따라 간다. 이때 신부의 교전비도 함께 가는데 교전비는 상객과 수모, 짐꾼들이 신행 후 돌아갈 때 함께 가지 않고 신부의 시댁에 남아 신부의 수발을 든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시집은 며느리를 따라온 교전비 치송이 어려워 시댁에 누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 삼일우귀(三日于歸)
혼례 후 3일째 되는 날 신랑과 신부 일행이 신랑집으로 떠나는데 이를 삼일우귀, 또는 삼일신행이라 한다.
2) 당일우귀(當日于歸)
혼례 후 그날 바로 신랑집으로 가는 경우를 당일우귀라 한다.
3) 묵신행
혼례 후 신랑만 먼저 가고 해를 묵혀 1년 정도 지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묵신행이라 한다.
양반 가문의 신부는 신랑을 홀로 보낸 후 친정에 남아 있다가, 다시 좋은 날을 받아 신행을 한다. 시댁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통은 일 년이 걸리기도 하고, 길면 삼 년도 걸린다. 물론 양가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몇 달 만에 신행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일년 정도는 묵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풍습을 사람들을 묵신행이라 불렀다.
신행은 지역마다 그리고 집안의 특성상, 위의 여려 형태의 신행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분의 차이(양반, 상민)에 의한 택함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신행길에서의 여러 행위 의례
신행은 신부가 시집에 가서 시집 식구들과 만나고 적응하기 위한 의례이기 때문에 신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의례와 관행들이 시행된다. 이러한 의례나 관행들은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복된 가정을 꾸리기를 기원하는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신부가 시가에 무사히 도착하여 시집 식구들과 원만하게 통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① 신부는 집을 떠나기 전에 부엌에 가서 솥뚜껑을 세 번 들었다 놓고 작별을 고한 다음 길을 떠난다.
② 신부의 가마가 출발하려고 하면 목화씨와 콩, 소금을 가마에 뿌려 잡귀가 범치 못하게 한다. ( 부유한 집에서는 잡귀가 범치 못하도록 호랑이가 그려진 담요를 가마 위에 얹고 간다.)
③ 쌀을 한 주먹 넣어 만든 ‘새미쌀’을 여러 주머니 만들어 가지고 가마 속에 넣고 가다 다리, 물가, 샘, 굿은 곳 등을 지날 때 던지거나 나무에 걸어 놓고 가면 잡귀가 그것을 먹고 떨어진다고 한다.
④ 신부의 가마가 시댁 문전에 당도하면 잡귀가 붙지 못하도록 상을 차리고 문전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징을 친다. 그러면 가마가 불을 넘어 들어 온다. 이 불을 넘어 들어오면서 신부는 길에서 따라 붙었을 잡귀를 쫓아내고 친정에서 익힌 모든 생활관습과 문화를 버려야 한다.
⑤ 신부의 가마가 시댁에 이르면 문전 한가운데 피워놓은 불 위로 가마채로 넘어간다. 이때 바가지를 깨거나 딱총을 쏘기도 하고, 콩과 팥, 소금이나 목화씨를 뿌려 부정을 쫓는다. 시어머니가 치마를 가마 위에 얹기도 한다.
⑥ 신부의 가마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장독을 끌어안기도 한다. 이는 며느리가 말대답을 않고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뜻이다.
⑦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 시댁 지붕 꼭대기를 보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는 과부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⑧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면 신부 가마에 깔았던 짚방석을 지붕 위에 던진다. 이것은 신부가 도착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숨어있는 의미는 친정과의 절연, 시가와의 통합이다. 신부는 친정집에서 익힌 문화와 관습을 모두 버리고 시가집의 가풍을 익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에게서 쫓아내야 할 가장 큰 잡귀는 친정집에서 몸에 익혔던 생활관습이나 문화적 속성이며, 이를 교정하는 과정이 바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시집살이로 표현되는 것이다.
위의 ①에서 ⑧까지의 의례는 대체로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행위의 의례가 조금씩 다르므로 시간적 중복이 있는 부분은 번호를 달리하여 넣었다.
6. 구고례(舅姑禮)
신부가 신행 와서 시부모를 위시하여 시댁 어른들과 가까운 친척에게 인사 드리는 것을 구고례라 한다. 또는 폐백(幣帛)이라고도 한다.
구고례를 할 때는 보통 신랑집 대청마루에 병풍을 치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신부집에서 보내온 폐백으로 상을 차린 후, 시부모에게 사배반(四拜半)의 절을 올린다. 시아버지는 동편에, 시어머니는 서편에 앉아 신부의 절을 받는다. 시조부모가 계셔도 시부모에게 먼저 한다.
신부가 시부모에게 사배반의 절을 한 다음 자리에 앉으면 시아버지는 대추 몇 개를 집어 신부의 치마 앞에 던져 주며 \"아들 많이 나라“는 덕담을 해준다. 이때 수모는 그 대추를 집어 신부의 원삼 큰 소매 속에 넣어 준다. 시어머니는 편포(片脯)나 포(脯)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어루만진다.
만일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폐백상에 대추를 사용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폐백을 한다. 폐백이 끝나면 사당에 고축(告祝)한 후에 시어머니가 “이것은 너의 시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고 대추 몇 개를 그릇에 담아 신부에게 준다. 시조부모가 살아 계시면 폐백이 끝난 후에 시부모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폐백을 하게 한다.
시부모에게 폐백을 하고 나면 폐백은 수모가 물리고 빈 상만 놓아 둔 채 다른 친척들에게(촌수나 항렬순서로) 폐백을 한다. 같은 항렬이면 평절로 서로 맞절을 하여 예를 갖춘다.
1) 폐백할
추천자료
 전통적무역의 수출절차
전통적무역의 수출절차 벤처기업과 창업,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의 성패 요인, 인터넷 유망사업, 창업이란, 창업체크...
벤처기업과 창업,정보통신기술, 벤처기업의 성패 요인, 인터넷 유망사업, 창업이란, 창업체크...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벤처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분석(IT벤처창업과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벤처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분석(IT벤처창업과 ... [결혼][결혼풍습][결혼관][결혼문화][혼례][예식][결혼식][결혼조건]결혼의 개념으로 규정짓...
[결혼][결혼풍습][결혼관][결혼문화][혼례][예식][결혼식][결혼조건]결혼의 개념으로 규정짓... [중국][중국문화]중국내 소수민족의 환경과 주거문화, 중국의 주거문화, 중국의 민족구성과 ...
[중국][중국문화]중국내 소수민족의 환경과 주거문화, 중국의 주거문화, 중국의 민족구성과 ... [중국][중국문화][중국의 문화][중국 전통]중국의 전통의상 치파오, 중국의 전통가옥(주거문...
[중국][중국문화][중국의 문화][중국 전통]중국의 전통의상 치파오, 중국의 전통가옥(주거문... [좋은수업][전통적인수업][좋은수업의 제고 방안]좋은수업의 정의, 좋은수업의 성격, 좋은수...
[좋은수업][전통적인수업][좋은수업의 제고 방안]좋은수업의 정의, 좋은수업의 성격, 좋은수... [정보기술산업, IT산업]정보기술산업(IT산업)과 남북경제통합, ADR(재판외 분쟁해결절차)제도...
[정보기술산업, IT산업]정보기술산업(IT산업)과 남북경제통합, ADR(재판외 분쟁해결절차)제도... 중소기업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특징, 중소기업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현성과,...
중소기업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특징, 중소기업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현성과,... 겨울 전통놀이(민속놀이) 사례 팽이치기, 제기차기, 겨울 전통놀이(민속놀이) 사례 실뜨기놀...
겨울 전통놀이(민속놀이) 사례 팽이치기, 제기차기, 겨울 전통놀이(민속놀이) 사례 실뜨기놀... 민속놀이(전통놀이) 사례 콘티찐빵놀이, 장기놀이, 민속놀이(전통놀이) 사례 깃대쓰러뜨리기...
민속놀이(전통놀이) 사례 콘티찐빵놀이, 장기놀이, 민속놀이(전통놀이) 사례 깃대쓰러뜨리기... [전통놀이 사례][민속놀이][소먹이놀음][산대놀이][범놀이]전통놀이(민속놀이) 사례 소먹이놀...
[전통놀이 사례][민속놀이][소먹이놀음][산대놀이][범놀이]전통놀이(민속놀이) 사례 소먹이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개인(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무관)을 대상으로 사...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개인(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무관)을 대상으로 사... [한국전통문화] 상장풍속에 담겨 있는 정신문화 - 한국인의 사생관념(장례의 형태), 효사상과...
[한국전통문화] 상장풍속에 담겨 있는 정신문화 - 한국인의 사생관념(장례의 형태), 효사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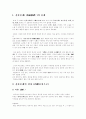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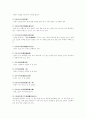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