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파 김천택
1) 생애와 신분
2) 시조 작품
(1) 이념의 세계를 노래한 작품들
(2) 소외와 좌절을 노래한 작품들
(3) 구원을 노래한 작품들
3) 김천택 시조의 특징
2. 김수장
1) 김수장의 생애
2) 작품세계
(1) 가금자적(歌琴自適)생활을 추구하는 시조
(2) 수분절제(守分節制) 생활을 추구한 시조
(3) 남녀성정(男女性情)을 노래한 시조
3) 김수장 시조의 특징
3. 운애(雲崖) 박효관과 주옹(周翁) 안민영
1) 생애(生涯)
(1) 운애(雲崖) 박효관
(2) 주옹(周翁) 안민영
2) 박효관과 안민영의 작품세계
(1) 박효관의 시조
(2) 박효관 시조의 특징
(3) 안민영의 시조
- ① 스승과 나눈 멋스러움, ② 기녀와 여인을 향한 연정
4. 가집
1) 청구영언
2) 해동가요
3) 가곡원류 - (1) 편찬동기, (2) 편찬체제
(3) 가곡원류의 특징 및 문학사적 의의
4) 금옥총부
Ⅲ. 결론
Ⅳ. 연구 후 감상 정리
참고문헌
Ⅱ. 본론
1. 남파 김천택
1) 생애와 신분
2) 시조 작품
(1) 이념의 세계를 노래한 작품들
(2) 소외와 좌절을 노래한 작품들
(3) 구원을 노래한 작품들
3) 김천택 시조의 특징
2. 김수장
1) 김수장의 생애
2) 작품세계
(1) 가금자적(歌琴自適)생활을 추구하는 시조
(2) 수분절제(守分節制) 생활을 추구한 시조
(3) 남녀성정(男女性情)을 노래한 시조
3) 김수장 시조의 특징
3. 운애(雲崖) 박효관과 주옹(周翁) 안민영
1) 생애(生涯)
(1) 운애(雲崖) 박효관
(2) 주옹(周翁) 안민영
2) 박효관과 안민영의 작품세계
(1) 박효관의 시조
(2) 박효관 시조의 특징
(3) 안민영의 시조
- ① 스승과 나눈 멋스러움, ② 기녀와 여인을 향한 연정
4. 가집
1) 청구영언
2) 해동가요
3) 가곡원류 - (1) 편찬동기, (2) 편찬체제
(3) 가곡원류의 특징 및 문학사적 의의
4) 금옥총부
Ⅲ. 결론
Ⅳ. 연구 후 감상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분사회의 질곡상태에서 시조로서 정치사회적인 좌절과 소외를 딛고자한 자기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 김천택 시조의 특징
신분은 중세에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다. 김천택에 있어서도 갈등의 근원적 문제는 바로 이 \'신분\'문제였다. 그래서 김천택은 시조를 통해 \'신분\'의 문제를 형상화 했고, 따라서 그에게 있어 시조는 절실한 자기표현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김천택의 시조에서는 유교를 표출한 시조가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비록 김천택 자신의 신분이 중인이었지만, 당대의 지배 이념은 유교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상승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분제에 억압당해 뜻이 있어도 펼칠 수 없는 중인임이 틀림이 없었고 이에 대한 현실적 소외와 좌절감을 토로하는 시조도 많이 지었다. 그리고 그의 시조 중에서 상당수가 술과 자연을 읊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실적 좌절감이 자연스럽게 술과 자연으로 발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천택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자, 새로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그 현실적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술\'과 \'자연\'이다. 물론 이 두 소재는 사대부 시조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김천택의 경우와는 다르다.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은둔하고 싶어 자연을 찾은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2. 김수장
1) 김수장(金壽長)의 생애
1690(숙종16)~?. 자는 자평(子平), 호는 십주(十州, 十洲) 또는 노가재(老歌齋)이며 조선 후기의 시조작가, 가인(歌人)이다. 완산(完山: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그의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숙종조(肅宗朝)에 기성(騎省)의 서리를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김천택(金天澤)과 더불어 숙종. 영조 때를 대표해서 쌍벽을 이루는 가인이다. 1746년 <해동가요(海東歌謠)>를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1755년 제 1차 편찬사업을 완료(을해본)하였으며, 1763년(계미본)과 1769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개수(改修)하여 완전한 가집(歌集)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해동가요는 김천택의 <청구영언(靑丘永言)>. 박효관(朴孝寬)의 <가곡원류(歌曲源流)>와 더불어 3대 가집으로 꼽히고 있다. 1760년에 서울 화개동의 집을 노가재(老歌齋)라 부르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쳐 노가재가단(老歌齋歌壇)을 형성하였다. <해동가요(海東歌謠)> 을해본과 계미본, 그리고 <청구가요(靑丘歌謠)>와 기타의 가집에 도합 129수의 시조 작품이 실려 전한다. 그의 작품은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 경향을 일변 답습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치밀한 상상력과 구상적인 수법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노출하는 표현방법을 통해 서민층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부귀와 공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풍류 속에서 흥취와 호기를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가객으로서의 긍지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곡 활동과 가집 편찬은 음악과 국문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집편찬으로 인하여 비로소 종래의 흩어져 있던 노래들이 한 곳에 모아짐과 동시에 곡조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가사나 곡조들은 편찬자인 가객 자신들이 실천적으로 영위하던 것들이었으므로 당대는 물론 그 앞 시대 노래들의 실체를 짐작할 만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김천택이 이러한 가집편찬의 막을 열었고 김수장이 그 뒤를 이음으로써 노래 장르의 관습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김수장은 김천택과 더불어 조선조 가곡(歌曲)과 사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중인출신 가객들이 지니고 있던 사회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나름의 개성을 독특하게 드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김수장은 노래를 부른 가객이었고, 창사를 만든 시인이었으며 남의 노래나 창사를 비평해준 비평가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가 남긴 창사들은 작품수와 다양한 소재, 확고한 주제의식, 폭넓은 표현 기법 등의 측면에서 여타 가객들과 차원을 달리한다. 또한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비평적 기록들은 그가 동류들의 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심의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노래에 대한 그의 철저한 직업의식을 입증하기도 한다.
2) 작품세계
김수장은 작품수가 남달리 많은 만큼 인생무상, 충효, 안빈낙도 등 유가적(儒家的)인 것과 남녀애정, 서민생활, 사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시조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자연을 벗하여 노래와 가야금을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가금자적(歌琴自適)생활과 세상살이에 조심하면서 분수 있고 충효,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권유한 수분절제(守分節制)생활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금자적(歌琴自適)생활을 추구하는 시조
① (원문) 心性(심성)이 게여름으로 書(서) 을 못 일우고
稟質(품질)이 으로 富貴(부귀)를 모르거다
七十(칠십)우려 어든거시 一長歌(일장가)인가노라.
(주씨본해동가요 519)
(해석) 마음과 성품이 게으르므로 큰 학자, 장군이 되지 못하고
품성과 재질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민첩하지 못하므로 부귀를 몰랐도다.
나이 칠십이 되어 겨우 얻은 것이 일가장가인가 하노라.
위의 시조는 가금자적하는 생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조이다. 입신출세를 못한 것과 부귀를 이루지 못한 것을 모두 자신의 심성과 품질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가객으로서의 삶을 만족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느낌을 준다.
② (원문)효제(孝悌)로 를 무어 충신(忠信)으로 돗글 달아
안연(顔淵) 자로(子路) 노(櫓) 주워 셰워 두고
우리도 공부자(孔夫子) 뫼옵고 학해중(學海中)에 놀아라.
(해석) 효제로 대를 묶어 충신으로 돛을 달아
안연과 자로에게 노를 주어 젓게 하고
우리도 공부자(공자의 높임말) 모시고 학문의 넓은바다에서 놀아라.
위의 작품은 유교의 실천 도리를 상징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효제와 충신으로 돛을 달아 안자와 자로에게 노를 젓게 한다는 것이다. 안연은 공자의 수제자로 유교에서 오성으로 추앙 받는 인물이며, 자로 역시 공자의 제자로 부모에 효도가 지극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고왔던 노자와 더불어 그들의 스승인 공자까지 모시고 한없이
3) 김천택 시조의 특징
신분은 중세에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다. 김천택에 있어서도 갈등의 근원적 문제는 바로 이 \'신분\'문제였다. 그래서 김천택은 시조를 통해 \'신분\'의 문제를 형상화 했고, 따라서 그에게 있어 시조는 절실한 자기표현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김천택의 시조에서는 유교를 표출한 시조가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비록 김천택 자신의 신분이 중인이었지만, 당대의 지배 이념은 유교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상승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분제에 억압당해 뜻이 있어도 펼칠 수 없는 중인임이 틀림이 없었고 이에 대한 현실적 소외와 좌절감을 토로하는 시조도 많이 지었다. 그리고 그의 시조 중에서 상당수가 술과 자연을 읊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실적 좌절감이 자연스럽게 술과 자연으로 발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천택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자, 새로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그 현실적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술\'과 \'자연\'이다. 물론 이 두 소재는 사대부 시조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김천택의 경우와는 다르다.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은둔하고 싶어 자연을 찾은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2. 김수장
1) 김수장(金壽長)의 생애
1690(숙종16)~?. 자는 자평(子平), 호는 십주(十州, 十洲) 또는 노가재(老歌齋)이며 조선 후기의 시조작가, 가인(歌人)이다. 완산(完山: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그의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숙종조(肅宗朝)에 기성(騎省)의 서리를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김천택(金天澤)과 더불어 숙종. 영조 때를 대표해서 쌍벽을 이루는 가인이다. 1746년 <해동가요(海東歌謠)>를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1755년 제 1차 편찬사업을 완료(을해본)하였으며, 1763년(계미본)과 1769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개수(改修)하여 완전한 가집(歌集)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해동가요는 김천택의 <청구영언(靑丘永言)>. 박효관(朴孝寬)의 <가곡원류(歌曲源流)>와 더불어 3대 가집으로 꼽히고 있다. 1760년에 서울 화개동의 집을 노가재(老歌齋)라 부르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쳐 노가재가단(老歌齋歌壇)을 형성하였다. <해동가요(海東歌謠)> 을해본과 계미본, 그리고 <청구가요(靑丘歌謠)>와 기타의 가집에 도합 129수의 시조 작품이 실려 전한다. 그의 작품은 양반 사대부들의 작품 경향을 일변 답습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치밀한 상상력과 구상적인 수법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노출하는 표현방법을 통해 서민층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부귀와 공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풍류 속에서 흥취와 호기를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가객으로서의 긍지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곡 활동과 가집 편찬은 음악과 국문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집편찬으로 인하여 비로소 종래의 흩어져 있던 노래들이 한 곳에 모아짐과 동시에 곡조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가사나 곡조들은 편찬자인 가객 자신들이 실천적으로 영위하던 것들이었으므로 당대는 물론 그 앞 시대 노래들의 실체를 짐작할 만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김천택이 이러한 가집편찬의 막을 열었고 김수장이 그 뒤를 이음으로써 노래 장르의 관습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김수장은 김천택과 더불어 조선조 가곡(歌曲)과 사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대부분의 중인출신 가객들이 지니고 있던 사회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나름의 개성을 독특하게 드러낸 인물이기도 하다. 김수장은 노래를 부른 가객이었고, 창사를 만든 시인이었으며 남의 노래나 창사를 비평해준 비평가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가 남긴 창사들은 작품수와 다양한 소재, 확고한 주제의식, 폭넓은 표현 기법 등의 측면에서 여타 가객들과 차원을 달리한다. 또한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비평적 기록들은 그가 동류들의 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심의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노래에 대한 그의 철저한 직업의식을 입증하기도 한다.
2) 작품세계
김수장은 작품수가 남달리 많은 만큼 인생무상, 충효, 안빈낙도 등 유가적(儒家的)인 것과 남녀애정, 서민생활, 사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시조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자연을 벗하여 노래와 가야금을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가금자적(歌琴自適)생활과 세상살이에 조심하면서 분수 있고 충효,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권유한 수분절제(守分節制)생활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금자적(歌琴自適)생활을 추구하는 시조
① (원문) 心性(심성)이 게여름으로 書(서) 을 못 일우고
稟質(품질)이 으로 富貴(부귀)를 모르거다
七十(칠십)우려 어든거시 一長歌(일장가)인가노라.
(주씨본해동가요 519)
(해석) 마음과 성품이 게으르므로 큰 학자, 장군이 되지 못하고
품성과 재질이 세상 물정에 어둡고 민첩하지 못하므로 부귀를 몰랐도다.
나이 칠십이 되어 겨우 얻은 것이 일가장가인가 하노라.
위의 시조는 가금자적하는 생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조이다. 입신출세를 못한 것과 부귀를 이루지 못한 것을 모두 자신의 심성과 품질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가객으로서의 삶을 만족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느낌을 준다.
② (원문)효제(孝悌)로 를 무어 충신(忠信)으로 돗글 달아
안연(顔淵) 자로(子路) 노(櫓) 주워 셰워 두고
우리도 공부자(孔夫子) 뫼옵고 학해중(學海中)에 놀아라.
(해석) 효제로 대를 묶어 충신으로 돛을 달아
안연과 자로에게 노를 주어 젓게 하고
우리도 공부자(공자의 높임말) 모시고 학문의 넓은바다에서 놀아라.
위의 작품은 유교의 실천 도리를 상징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효제와 충신으로 돛을 달아 안자와 자로에게 노를 젓게 한다는 것이다. 안연은 공자의 수제자로 유교에서 오성으로 추앙 받는 인물이며, 자로 역시 공자의 제자로 부모에 효도가 지극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고왔던 노자와 더불어 그들의 스승인 공자까지 모시고 한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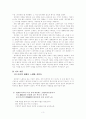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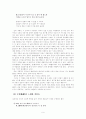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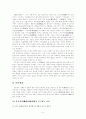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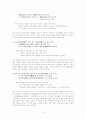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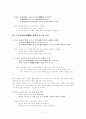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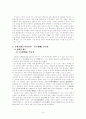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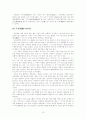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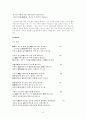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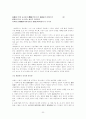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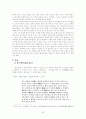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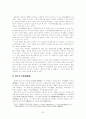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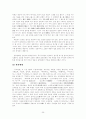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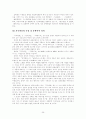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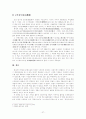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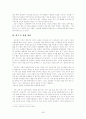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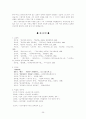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