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들뢰즈 가타리>
1. 유물론적 욕망이론은 변혁에 회의적인 포스트모던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혁의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다. 하버마스가 이성을 통한 해방을 추구한다면 들뢰즈와 가타리는 감성의 역동에 기대를 건다.
2. 들뢰즈와 가타리는 데카르트 이래의 의식적 주체개념을 거부하고, 의식철학을 존재론적으로 해체해버린 라캉의 공헌을 인정한다. 헤겔의 대립된 힘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힘들의 신학적 통일성 속에 흡수하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이러한 변증법의 한계를 니체의 계보학에서 찾는다. (이는 푸코와 공유하는 특성)
3. 들뢰즈와 가타리는 푸코와는 다르게 모더니티의 경제적 현현인 자본주의를 파시즘에 비유할 만큼 비판적이면서도, 자본주의 경제 특유의 역동에 따라 해방된 욕망의 에너지로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본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실체(substance)와 니체의 삶(life)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시켰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에게서 조직이나 발전의 판에 앞서는 조성판을 찾아내며, 니체에게서는 동일성에 앞서며, 경계나 울타리에 대한 유목적 관계를 통해 주어진, 가벼운 또는 탈영토화된 대지를 찾아낸다. 들뢰즈는 출발때부터 부정의 철학자가 아니라 긍정의 철학자였으며, 애도와 부재의 철학자, 슬픔과 피로한 아이러니의 철학자가 아니라 유머와 삶의 철학자였다.
<유물론적 욕망개념>
1. 욕망을 결핍이나 결여로 개념화하는 모든 전통적 관점을 거부하고, 무의식적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으로 본다. 욕망을 상실된 대상이나 결핍에 대한 수동적 반작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으로 파악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욕망을 개념화했고, 이에 따를 때 결핍은 결코 욕망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에 의해 유발되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2. 욕망은 무의식적 리비도의 흐름이고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는 니체가 의지의 복수성을 역설한 것처럼 그들도 욕망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3. 욕망은 고정된 표상체계에 구속될 수 없는 역동적 에너지의 흐름이다.
<욕망의 통제와 영토개념>
-영토화와 탈영토화-
이러한 욕망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을 코드화 혹은 영토화라고 하고, 억압과 통제를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욕망 특유의 분열적 흐름을 탈영토화 혹은 탈코드화라고 한다.
이러한 탈주의 흐름을 포획하여 다시 억압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재코드화 혹은 재영토화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억압과 통제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초코드화라고 한다.
원시시대의 경우 다양한 부족과 더불어 영토가 존재하는바, 전면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기구의 출현과 함께 성립된 전제군주사회는 모든 것을 군주에게 예속시키는 초영토화의 사회이며 이러한 전제군주사회를 편집증적 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도 국가사회이긴 하지만 화폐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이중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출현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서 해방된 탈영토화된 사회이다. 따라서 전제군주사회의 초영토화가 편집증적인데 비해 자본주의 사회의 탈영토화된 흐름은 분열증적이다.
이러한 탈영토화된 욕망의 에너지를 변혁에 동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탈영토화된 분열적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시장원리라는 철저한 자유경쟁의 규범에 따라 재영토화하고 법률제도, 교육제도, 관료제도, 특히 가족제도와 같은 오이디푸스화 기구를 통해 욕망의 흐름을 재영토화시킨다. 이
1. 유물론적 욕망이론은 변혁에 회의적인 포스트모던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혁의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일종의 몸부림이다. 하버마스가 이성을 통한 해방을 추구한다면 들뢰즈와 가타리는 감성의 역동에 기대를 건다.
2. 들뢰즈와 가타리는 데카르트 이래의 의식적 주체개념을 거부하고, 의식철학을 존재론적으로 해체해버린 라캉의 공헌을 인정한다. 헤겔의 대립된 힘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힘들의 신학적 통일성 속에 흡수하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이러한 변증법의 한계를 니체의 계보학에서 찾는다. (이는 푸코와 공유하는 특성)
3. 들뢰즈와 가타리는 푸코와는 다르게 모더니티의 경제적 현현인 자본주의를 파시즘에 비유할 만큼 비판적이면서도, 자본주의 경제 특유의 역동에 따라 해방된 욕망의 에너지로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본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실체(substance)와 니체의 삶(life)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시켰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에게서 조직이나 발전의 판에 앞서는 조성판을 찾아내며, 니체에게서는 동일성에 앞서며, 경계나 울타리에 대한 유목적 관계를 통해 주어진, 가벼운 또는 탈영토화된 대지를 찾아낸다. 들뢰즈는 출발때부터 부정의 철학자가 아니라 긍정의 철학자였으며, 애도와 부재의 철학자, 슬픔과 피로한 아이러니의 철학자가 아니라 유머와 삶의 철학자였다.
<유물론적 욕망개념>
1. 욕망을 결핍이나 결여로 개념화하는 모든 전통적 관점을 거부하고, 무의식적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으로 본다. 욕망을 상실된 대상이나 결핍에 대한 수동적 반작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으로 파악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욕망을 개념화했고, 이에 따를 때 결핍은 결코 욕망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에 의해 유발되는 이차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2. 욕망은 무의식적 리비도의 흐름이고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는 니체가 의지의 복수성을 역설한 것처럼 그들도 욕망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3. 욕망은 고정된 표상체계에 구속될 수 없는 역동적 에너지의 흐름이다.
<욕망의 통제와 영토개념>
-영토화와 탈영토화-
이러한 욕망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을 코드화 혹은 영토화라고 하고, 억압과 통제를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욕망 특유의 분열적 흐름을 탈영토화 혹은 탈코드화라고 한다.
이러한 탈주의 흐름을 포획하여 다시 억압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재코드화 혹은 재영토화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억압과 통제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초코드화라고 한다.
원시시대의 경우 다양한 부족과 더불어 영토가 존재하는바, 전면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기구의 출현과 함께 성립된 전제군주사회는 모든 것을 군주에게 예속시키는 초영토화의 사회이며 이러한 전제군주사회를 편집증적 사회라고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도 국가사회이긴 하지만 화폐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이중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출현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적 가치와 규범에서 해방된 탈영토화된 사회이다. 따라서 전제군주사회의 초영토화가 편집증적인데 비해 자본주의 사회의 탈영토화된 흐름은 분열증적이다.
이러한 탈영토화된 욕망의 에너지를 변혁에 동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탈영토화된 분열적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시장원리라는 철저한 자유경쟁의 규범에 따라 재영토화하고 법률제도, 교육제도, 관료제도, 특히 가족제도와 같은 오이디푸스화 기구를 통해 욕망의 흐름을 재영토화시킨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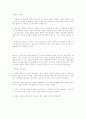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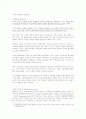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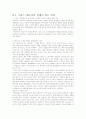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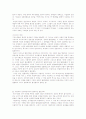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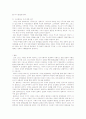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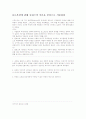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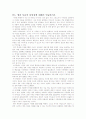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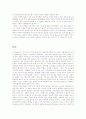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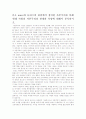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