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곳, 아오스타 마을
3. 우생학의 시초-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프랜시스 골턴
4. 데이비드 스타 조던과 우생학적 불임화
5. 우생학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동질성과 변이
6. 분기학의 등장-진화의 나무를 베다
7.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견- “폐어는 연어보다 소와 더 가깝다”
8.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2.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곳, 아오스타 마을
3. 우생학의 시초-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프랜시스 골턴
4. 데이비드 스타 조던과 우생학적 불임화
5. 우생학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동질성과 변이
6. 분기학의 등장-진화의 나무를 베다
7.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견- “폐어는 연어보다 소와 더 가깝다”
8.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본문내용
을 빌리면, 그것은 마치 “빨간 점이 있는 모든 동물”이 한 범주에 속한다는 말이거나 “시끄러운 모든 포유동물은 한 범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런 범주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과학적으로는 무의미하며 진화적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범주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산꼭대기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진화적으로 동일한 ‘산어류山魚類’라는 집단에 속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상상해보자. 산에 사는 어류, 그러니까 산어류에는 산염소와 산두꺼비, 산독수리, 그리고 건강하고 수염을 기르고 위스키를 즐기는 산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모든 생물이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우연히도 그 고도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비슷한 외피를 갖도록 진화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외피가 비늘이 아니라 격자무늬라고 해보자. 모두가 격자무늬를 갖고 있다. 격자무늬 독수리, 격자무늬 두꺼비, 격자무늬 사람. 이렇게 서식지(산꼭대기)와 피부 유형(격자무늬)이 같다 보니 이들은 동일한 종류의 생물처럼 보인다. 모두 산어류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한 종류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어류에 대해 해 온 일이 바로 이와 같다. 수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어류”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몰아넣은 것이다. 실상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면, 비늘로 된 의상 밑에 산꼭대기 산어류들 만큼이나 서로 다른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숨어 있다. “어류”라는 범주가 이 모든 차이를 가리고 있다.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덮어버리고, 지능을 깎아 내린다. 그 범주는 가까운 사촌들을 우리에게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거리 감각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상상 속 사다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제일 윗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과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인 일은 어류란 내내 우리의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8.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생태학자 조너선 밸컴은 <<물고기는 알고 있다: 물속에 사는 우리 사촌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써서, 물고기들의 인지가 얼마나 폭넓고 복잡한지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물고기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색을 보며, 특정한 기억 과제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이고, 도구를 사용하며, 바흐의 음악과 블루스를 구별할 줄 안다고 한다. 게다가 어떤 종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한다. 나는 그에게 농담하듯 물었다. \"하, 이제 모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선 먹기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러자 그가 \"예\"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단어다. 우리가 그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 계속 속 편히 살기 위해,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과 훨씬 더 멀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에모리 대학의 유명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이것이 인간이 항상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상상 속 사다리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것 말이다. 드 발은 과학자들이 나머지 동물들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집단이라고 지적한다. 어떤 인지과제에서 동물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ㅡ예를 들어 특정한 새 종들은 수천 개의 씨앗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있다ㅡ그들은 그것을 지능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치부한다. 이와 같은 수많은 언어적 수법을 드 발은 \"언어적 거세\"라고 표현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동물들의 중요성을 박탈하는 방식이자, 우리 인간이 정상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단어들을 발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산꼭대기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진화적으로 동일한 ‘산어류山魚類’라는 집단에 속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상상해보자. 산에 사는 어류, 그러니까 산어류에는 산염소와 산두꺼비, 산독수리, 그리고 건강하고 수염을 기르고 위스키를 즐기는 산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 모든 생물이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우연히도 그 고도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비슷한 외피를 갖도록 진화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외피가 비늘이 아니라 격자무늬라고 해보자. 모두가 격자무늬를 갖고 있다. 격자무늬 독수리, 격자무늬 두꺼비, 격자무늬 사람. 이렇게 서식지(산꼭대기)와 피부 유형(격자무늬)이 같다 보니 이들은 동일한 종류의 생물처럼 보인다. 모두 산어류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한 종류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어류에 대해 해 온 일이 바로 이와 같다. 수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어류”라는 하나의 단어 아래 몰아넣은 것이다. 실상 물속 세상을 들여다보면, 비늘로 된 의상 밑에 산꼭대기 산어류들 만큼이나 서로 다른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숨어 있다. “어류”라는 범주가 이 모든 차이를 가리고 있다.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덮어버리고, 지능을 깎아 내린다. 그 범주는 가까운 사촌들을 우리에게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거리 감각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상상 속 사다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제일 윗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과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인 일은 어류란 내내 우리의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8.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생태학자 조너선 밸컴은 <<물고기는 알고 있다: 물속에 사는 우리 사촌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써서, 물고기들의 인지가 얼마나 폭넓고 복잡한지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물고기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색을 보며, 특정한 기억 과제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이고, 도구를 사용하며, 바흐의 음악과 블루스를 구별할 줄 안다고 한다. 게다가 어떤 종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한다. 나는 그에게 농담하듯 물었다. \"하, 이제 모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선 먹기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러자 그가 \"예\"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단어다. 우리가 그 복잡성을 감추기 위해, 계속 속 편히 살기 위해, 우리가 실제보다 그들과 훨씬 더 멀다고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에모리 대학의 유명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이것이 인간이 항상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상상 속 사다리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것 말이다. 드 발은 과학자들이 나머지 동물들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집단이라고 지적한다. 어떤 인지과제에서 동물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ㅡ예를 들어 특정한 새 종들은 수천 개의 씨앗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있다ㅡ그들은 그것을 지능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치부한다. 이와 같은 수많은 언어적 수법을 드 발은 \"언어적 거세\"라고 표현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동물들의 중요성을 박탈하는 방식이자, 우리 인간이 정상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단어들을 발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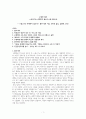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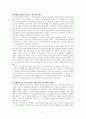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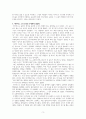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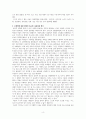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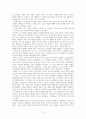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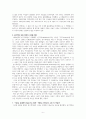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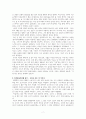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