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어사의 시대구분
2. 고대국어 문법
3. 중세국어 문법
4. 근대국어 문법
5. 현대국어 문법
6. 의견
2. 고대국어 문법
3. 중세국어 문법
4. 근대국어 문법
5. 현대국어 문법
6. 의견
본문내용
시키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의 곡용 어미로 간주하여 체언과 함께 설명하고 용언 어미에 해당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에 소속시킨다. 현대 한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관형사는 설정하지 않고 명사와 수사 및 대명사로 귀속시킨다. 결국 중세 한국어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의 8개가 된다.
(1) 체언과 조사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 안에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양이 달라지는 일을 곡용이라고 부르고, 이때 체언에 연결되는 요소를 격조사 또는 곡용어미라고 부른다. 격조사는 원칙적으로 문장 안의 체언류와 서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격조사는 체언 어간의 끝소리가 자음이면 ‘-ㅣ’로 표시하고, 모음 ‘ㅣ’ 또는 하향 이중 모음이면 표시하지 않으며, 그 밖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 어간 모음과 ‘ㅣ’가 합하여 하향 이중 모음 형태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를 들면 미(+ㅣ), 불휘(불휘+0), 어미(어미+0)등이 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체언 어간 끝음절이 평성의 ‘ㅣ’ 또는 평성의 하향 이중 모음일 때, 그 주격형은 이 음절에 사성 표시인 점 2개를 찍어 어간 단독형과 구분하는 표기법을 썼다. 예를 들어보면, 너희(어간 단독형)→너:희(주격형), 바리(어간 단독형)→바:리(주격형) 등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주격 조사 ‘-가’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문헌에 등장한다. 처음에는 주로 ‘ㅣ’나 하향 이중모음 뒤에서 쓰이기 시작하다가 확산되었다. 존칭의 주격조사인 ‘-셔’는 15세기의 <원각격(언해)>서문에 처음 보이며, 목적격 조사에는 ‘-를//을//ㄹ’이 있는데 모음조화에 의하여 양성모음 뒤에는 주로 ‘-/’이, 음성모음 뒤에는 주로 ‘-/을’이 연결되었다. 부사격 조사 중 낙착점 처소 부사격에는 ‘-애/에/예, -/의’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애’는 양성모음 뒤에, ‘-에’는 음성모음 뒤에, ‘-예’는 ‘ㅣ’모음과 하향 이중 모음 뒤에 왔다. 부사격 조사 중, 사람 뒤에 오는 여격조사에는 ‘-/, -(의//ㅅ)그, -게/긔, 려’등이 있으며 출발점 처소 부사격 조사에는 ‘-에셔, -에이셔/애이셔, -라셔, 브터, 로(셔)’등이 있으며 지향점 처소 부사격에는 ‘-(으/)로’, 도구의 부사격에는 ‘-(으/)로, -(으/)로’, 비교의 부사격에는 ‘-와/과, -(와/과)로, -(/으)론, -이, -에/애’, 변성의 부사격에는 ‘-(으/)로’, 동반의 부사격에는 ‘-와/과’등이 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주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비존칭의 유정물에 사용되었고, ‘-ㅅ’은 무정물 체언 뒤나 높임의 자질이 있는 유정물로서 주로 유성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다. ‘-ㅣ’는 모음 뒤, 특히 한자어나 인칭 대명사 ‘나, 너, 저, 누’에 연결 되었다. 호격조사 ‘-아’는 높임의 자질이 없는 체언 아래에, ‘-야’는 끝소리가 모음인 체언에, ‘-(ㅣ/이)여’는 비존칭 자질의 명사 뒤에 연결되며 영탄과 격식의 의미가 있다. ‘하’는 높임의 자질을 갖는 체언 뒤에 연결되어 쓰였다. 서술격조사는 ‘-(ㅣ/이)라’와 그 어미 변화형밖에 없다.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을 용언화 한다. 끝소리가 자음이면 ‘-ㅣ’, 모음 ‘ㅣ’ 는 하향 이중 모음이면 표시하지 않으며(φ), 그 밖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간 모음과 ‘ㅣ’가 합하여 하향 이중 모음 형태를 취한다. 서술격 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 뒤에도 연결 된다. 접속조사에는 ‘ㄹ’이나 모음 뒤에 오는 ‘-와’, ‘ㄹ’이외의 자음 뒤에서는 ‘-과’가, ‘-(ㅣ/이)며’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예는 별로 많지 않지만 ‘나쟈 바먀’등에서처럼 ‘-야 ’도 쓰였다.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로는 ‘-은//는/, -(으/)란, -(으)랑’[대조], ‘-만, -’[단독], ‘-두고, -두곤/도곤’, ‘-(이/으/)라와’[비교], ‘-(에/애/의/)셔, -의그셔, -로셔, -(로)브터’[출발], ‘-장’[도착], ‘-(이)사/야//아’[특수], ‘-곳/옷, -//봇’[한정], ‘-곰/옴, -식’[분배], ‘-곰, -ㄱ/ㄴ/ㆁ/ㅁ’[강세], ‘-잇’[강세], ‘-가/아/야, -고/구, -오’[의문]등이 있다. 명사에는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는데 의존 명사의 특징은 관형어를 앞세운다는 점과 뒤에 오는 격조사가 제약된다는 점이 있다. 의존 명사에는 ‘것, 곧, 장, 녁, 닷/탓, 덛, /따, 듸/, 만, 바, 분, ,
(1) 체언과 조사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 안에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양이 달라지는 일을 곡용이라고 부르고, 이때 체언에 연결되는 요소를 격조사 또는 곡용어미라고 부른다. 격조사는 원칙적으로 문장 안의 체언류와 서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격조사는 체언 어간의 끝소리가 자음이면 ‘-ㅣ’로 표시하고, 모음 ‘ㅣ’ 또는 하향 이중 모음이면 표시하지 않으며, 그 밖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 어간 모음과 ‘ㅣ’가 합하여 하향 이중 모음 형태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를 들면 미(+ㅣ), 불휘(불휘+0), 어미(어미+0)등이 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체언 어간 끝음절이 평성의 ‘ㅣ’ 또는 평성의 하향 이중 모음일 때, 그 주격형은 이 음절에 사성 표시인 점 2개를 찍어 어간 단독형과 구분하는 표기법을 썼다. 예를 들어보면, 너희(어간 단독형)→너:희(주격형), 바리(어간 단독형)→바:리(주격형) 등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주격 조사 ‘-가’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문헌에 등장한다. 처음에는 주로 ‘ㅣ’나 하향 이중모음 뒤에서 쓰이기 시작하다가 확산되었다. 존칭의 주격조사인 ‘-셔’는 15세기의 <원각격(언해)>서문에 처음 보이며, 목적격 조사에는 ‘-를//을//ㄹ’이 있는데 모음조화에 의하여 양성모음 뒤에는 주로 ‘-/’이, 음성모음 뒤에는 주로 ‘-/을’이 연결되었다. 부사격 조사 중 낙착점 처소 부사격에는 ‘-애/에/예, -/의’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애’는 양성모음 뒤에, ‘-에’는 음성모음 뒤에, ‘-예’는 ‘ㅣ’모음과 하향 이중 모음 뒤에 왔다. 부사격 조사 중, 사람 뒤에 오는 여격조사에는 ‘-/, -(의//ㅅ)그, -게/긔, 려’등이 있으며 출발점 처소 부사격 조사에는 ‘-에셔, -에이셔/애이셔, -라셔, 브터, 로(셔)’등이 있으며 지향점 처소 부사격에는 ‘-(으/)로’, 도구의 부사격에는 ‘-(으/)로, -(으/)로’, 비교의 부사격에는 ‘-와/과, -(와/과)로, -(/으)론, -이, -에/애’, 변성의 부사격에는 ‘-(으/)로’, 동반의 부사격에는 ‘-와/과’등이 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주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비존칭의 유정물에 사용되었고, ‘-ㅅ’은 무정물 체언 뒤나 높임의 자질이 있는 유정물로서 주로 유성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었다. ‘-ㅣ’는 모음 뒤, 특히 한자어나 인칭 대명사 ‘나, 너, 저, 누’에 연결 되었다. 호격조사 ‘-아’는 높임의 자질이 없는 체언 아래에, ‘-야’는 끝소리가 모음인 체언에, ‘-(ㅣ/이)여’는 비존칭 자질의 명사 뒤에 연결되며 영탄과 격식의 의미가 있다. ‘하’는 높임의 자질을 갖는 체언 뒤에 연결되어 쓰였다. 서술격조사는 ‘-(ㅣ/이)라’와 그 어미 변화형밖에 없다.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을 용언화 한다. 끝소리가 자음이면 ‘-ㅣ’, 모음 ‘ㅣ’ 는 하향 이중 모음이면 표시하지 않으며(φ), 그 밖의 모음으로 끝나면 어간 모음과 ‘ㅣ’가 합하여 하향 이중 모음 형태를 취한다. 서술격 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 뒤에도 연결 된다. 접속조사에는 ‘ㄹ’이나 모음 뒤에 오는 ‘-와’, ‘ㄹ’이외의 자음 뒤에서는 ‘-과’가, ‘-(ㅣ/이)며’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예는 별로 많지 않지만 ‘나쟈 바먀’등에서처럼 ‘-야 ’도 쓰였다.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로는 ‘-은//는/, -(으/)란, -(으)랑’[대조], ‘-만, -’[단독], ‘-두고, -두곤/도곤’, ‘-(이/으/)라와’[비교], ‘-(에/애/의/)셔, -의그셔, -로셔, -(로)브터’[출발], ‘-장’[도착], ‘-(이)사/야//아’[특수], ‘-곳/옷, -//봇’[한정], ‘-곰/옴, -식’[분배], ‘-곰, -ㄱ/ㄴ/ㆁ/ㅁ’[강세], ‘-잇’[강세], ‘-가/아/야, -고/구, -오’[의문]등이 있다. 명사에는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는데 의존 명사의 특징은 관형어를 앞세운다는 점과 뒤에 오는 격조사가 제약된다는 점이 있다. 의존 명사에는 ‘것, 곧, 장, 녁, 닷/탓, 덛, /따, 듸/, 만, 바, 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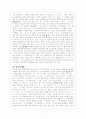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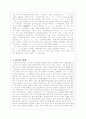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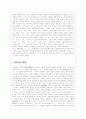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