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처용가
2. 원앙생가
4. 제망매가
5. 모죽지랑가
< 참고도서>
2. 원앙생가
4. 제망매가
5. 모죽지랑가
< 참고도서>
본문내용
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몸을 더럽혔겠습니까? 그 분은 다만 매일 밤 단정하게 앉아서 한결같이 아미타불을 외면서 16관 ‘관’이란 보는 것, 염관하는 것을 뜻하며 석가모니가 극락정토를 염원하던 수행법.
을 짓고 관이 다 되어 미혹을 깨치고 달관하여, 밝은 달이 창으로 들어오면 때때로 그 위에 올라 가부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성을 다하였으니, 비록 극락으로 가려고 아니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 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첫 발자국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사가 하는 일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극락)으로 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엄장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는 물러 나와 바로 원효법사에게 가서 도 닦는 묘법을 간곡하게 물었다. 원효는 정관법 사고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번뇌의 유혹을 없애는 것
을 지어 그를 지도하자, 엄장은 그제야 몸을 깨끗이 하고 잘못을 뉘우쳐 자신을 꾸짖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도를 닦아 역시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엄장을 깨우친 부인은 바로 분황사의 계집종으로 부처님의 열아홉 응신 중셍의 제도와 교회를 위한 관음보살의 19종의 모습인데 <<법화경>>보문품의 19설법에 취한 것이다. 응산이란 삼신의 하나이다.
가운데 해남이다. 광덕이 서방으로 가기 전 도를 닦으면서 지은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원앙생가이다. -
2) 원앙생가의 원문과 그 번역
< 원앙생가의 원문>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遺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多可荳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阿邪
此身遺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 원앙생가의 해독>
① 박경주 원앙생가의 작가와 문학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박경주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논문 국어교육12호 249~266
<중세어 해독>
하 이뎨
서방 녀러 가샤리고
무량수불전에
닛곰 함 고샤셔
다딤 기프샨 조ㅣ 라ㅣ
두 손 모도 고조바
원왕생원왕생
그릴 사 잇다 고샤셔
아으 이 몸 기텨두고
사십팔대원 일고샬가
<현대어 의역>
달이여 이제
서쪽을 지나서 가십니까
무량수불전에
알리는 말씀 한껏 사뢰소서
다짐 깊으신 존엥게 바라되
두 손 곧추 모아
원왕생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버려두고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② 김완진 해독 http://cafe13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eENZ&fldid=2V8b&contentval=0001izzzzzzzzzzzzzzzzzzzzzzzzz&nenc=WZDooUuNgKEZRAfwbOdiNw00&dataid=106&fenc=zBP.Qo_XSRg0&docid=CDd7QMK5
<중세어 해독>
라리 엇뎨역 / 西方 장 가시리고. / 無量壽佛前의 / 곰 함 고쇼셔.
다딤 기프신 옷 라 울워러, / 두 손 모도 고조 / 願往生願往生
그리리 잇다 고쇼셔. / 아야 이 모다 기텨 두고 / 四十八大願 일고실가.
<현대어 의역>
달님이여, 이제 / 서방까지 가셔서 / 무량수불 전에 / 일러다가 사뢰소서
\'다짐(誓)깊으신 부처를 우러러 / 두 손을 모아 올려 /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뢰소서 / 아, 이 몸을 남겨 두고 / 사십팔대원을 이루실까
4. 제망매가
1) 삼국유사에 기록된 제망매가의 설화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리면서 지은 향가로 삼국유사 권 5 감통 제 7(感通第七)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명사의 도솔가> 삼국유사 일연지음 김원중 옮김 을유문화사 530~532
경덕왕 19년 경자년 4워 초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이 지나도 사라자지지 않았다. 천문을 맡은 관리가 아뢰었다.
“인연 있는 승려를 청하여 산화공덕 공덕이란 연기와 윤회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 행위의 하나이고, 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산화공덕이다.
을 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원전에다 깨끗이 단을 만들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승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 때 월명사가 밭 사이로 난 남쪽 길을 가고 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단을 열고 기도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월명사가 말하였다.
“신승은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단지 향가만을 알 뿐 범성 찬불가인 범패로서 범어로 하는 염불이다.
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이미 인연 있는 승려로 지목 되었으니, 향가를 짓는다 해도 좋소.”
이에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여기에 산화가를 부를 제
솟아나게 한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을 받들어
미륵좌수를 모셔라.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은 후 해의 괴이함은 곧 사라졌다. 왕은 이것을 가려 좋은 차 한 봉지와 수정염주 108개를 내려주었다. 이때 갑자기 모습이 말쑥한 동자 하나가 나타나 공손히 꿇어앉자 차와 염주를 받들어 궁전 서쪽의 작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은 그를 안 대궐의 심부름꾼으로 여겼고, 왕은 법사의 시종이라고 여겼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다. 왕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뒤를 쫓게 하니, 동자는 내원의 탑 안으로 사라졌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상 앞에 있었다.
이에 월명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이처럼 부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정에서나 민간에서나 모르는 이가 없었다. 왕은 월명사를 더욱 존중해 다시 비단 100필을 주어 큰 정성을 기렸다.
월명사는 또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려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문득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이 때 불렀던 향가가 제망매가이다.
2) 제망매가의 원문과 해독
< 제망매가의 원문>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層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一等隱枝良出古
去如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陀刹良逢乎吾道修良待是古如
< 제망매가의 해독>
① 박창원 제망매가의 해독과 고대국어의 몇 의문 벅창원 1995 한일학총논문(1995년) 국학자료원 발행 415~445
生死길흔
이에 이샤 매 次 이고
나 가닷 말(마)도
모다 니르고 가니(시)고
어느 가 이른 매
이에뎌에 라
을 짓고 관이 다 되어 미혹을 깨치고 달관하여, 밝은 달이 창으로 들어오면 때때로 그 위에 올라 가부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성을 다하였으니, 비록 극락으로 가려고 아니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 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첫 발자국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사가 하는 일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극락)으로 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엄장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는 물러 나와 바로 원효법사에게 가서 도 닦는 묘법을 간곡하게 물었다. 원효는 정관법 사고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번뇌의 유혹을 없애는 것
을 지어 그를 지도하자, 엄장은 그제야 몸을 깨끗이 하고 잘못을 뉘우쳐 자신을 꾸짖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도를 닦아 역시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엄장을 깨우친 부인은 바로 분황사의 계집종으로 부처님의 열아홉 응신 중셍의 제도와 교회를 위한 관음보살의 19종의 모습인데 <<법화경>>보문품의 19설법에 취한 것이다. 응산이란 삼신의 하나이다.
가운데 해남이다. 광덕이 서방으로 가기 전 도를 닦으면서 지은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원앙생가이다. -
2) 원앙생가의 원문과 그 번역
< 원앙생가의 원문>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遺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多可荳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阿邪
此身遺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 원앙생가의 해독>
① 박경주 원앙생가의 작가와 문학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박경주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4 논문 국어교육12호 249~266
<중세어 해독>
하 이뎨
서방 녀러 가샤리고
무량수불전에
닛곰 함 고샤셔
다딤 기프샨 조ㅣ 라ㅣ
두 손 모도 고조바
원왕생원왕생
그릴 사 잇다 고샤셔
아으 이 몸 기텨두고
사십팔대원 일고샬가
<현대어 의역>
달이여 이제
서쪽을 지나서 가십니까
무량수불전에
알리는 말씀 한껏 사뢰소서
다짐 깊으신 존엥게 바라되
두 손 곧추 모아
원왕생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버려두고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② 김완진 해독 http://cafe13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eENZ&fldid=2V8b&contentval=0001izzzzzzzzzzzzzzzzzzzzzzzzz&nenc=WZDooUuNgKEZRAfwbOdiNw00&dataid=106&fenc=zBP.Qo_XSRg0&docid=CDd7QMK5
<중세어 해독>
라리 엇뎨역 / 西方 장 가시리고. / 無量壽佛前의 / 곰 함 고쇼셔.
다딤 기프신 옷 라 울워러, / 두 손 모도 고조 / 願往生願往生
그리리 잇다 고쇼셔. / 아야 이 모다 기텨 두고 / 四十八大願 일고실가.
<현대어 의역>
달님이여, 이제 / 서방까지 가셔서 / 무량수불 전에 / 일러다가 사뢰소서
\'다짐(誓)깊으신 부처를 우러러 / 두 손을 모아 올려 /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고 사뢰소서 / 아, 이 몸을 남겨 두고 / 사십팔대원을 이루실까
4. 제망매가
1) 삼국유사에 기록된 제망매가의 설화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리면서 지은 향가로 삼국유사 권 5 감통 제 7(感通第七)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명사의 도솔가> 삼국유사 일연지음 김원중 옮김 을유문화사 530~532
경덕왕 19년 경자년 4워 초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이 지나도 사라자지지 않았다. 천문을 맡은 관리가 아뢰었다.
“인연 있는 승려를 청하여 산화공덕 공덕이란 연기와 윤회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 행위의 하나이고, 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산화공덕이다.
을 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원전에다 깨끗이 단을 만들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승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 때 월명사가 밭 사이로 난 남쪽 길을 가고 있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단을 열고 기도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월명사가 말하였다.
“신승은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단지 향가만을 알 뿐 범성 찬불가인 범패로서 범어로 하는 염불이다.
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였다.
“이미 인연 있는 승려로 지목 되었으니, 향가를 짓는다 해도 좋소.”
이에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불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여기에 산화가를 부를 제
솟아나게 한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을 받들어
미륵좌수를 모셔라.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은 후 해의 괴이함은 곧 사라졌다. 왕은 이것을 가려 좋은 차 한 봉지와 수정염주 108개를 내려주었다. 이때 갑자기 모습이 말쑥한 동자 하나가 나타나 공손히 꿇어앉자 차와 염주를 받들어 궁전 서쪽의 작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은 그를 안 대궐의 심부름꾼으로 여겼고, 왕은 법사의 시종이라고 여겼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다. 왕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뒤를 쫓게 하니, 동자는 내원의 탑 안으로 사라졌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상 앞에 있었다.
이에 월명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이처럼 부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정에서나 민간에서나 모르는 이가 없었다. 왕은 월명사를 더욱 존중해 다시 비단 100필을 주어 큰 정성을 기렸다.
월명사는 또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재를 올려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문득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종이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이 때 불렀던 향가가 제망매가이다.
2) 제망매가의 원문과 해독
< 제망매가의 원문>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層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一等隱枝良出古
去如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陀刹良逢乎吾道修良待是古如
< 제망매가의 해독>
① 박창원 제망매가의 해독과 고대국어의 몇 의문 벅창원 1995 한일학총논문(1995년) 국학자료원 발행 415~445
生死길흔
이에 이샤 매 次 이고
나 가닷 말(마)도
모다 니르고 가니(시)고
어느 가 이른 매
이에뎌에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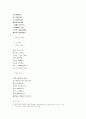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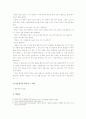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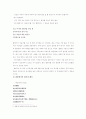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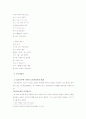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