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소리의 전반적 이해
2 판소리의 기원과 발생
3 판소리와 주변 양식
4 판소리의 음악적 측면
5 판소리 사설과 신재효
6 판소리계 소설
참고문헌
2 판소리의 기원과 발생
3 판소리와 주변 양식
4 판소리의 음악적 측면
5 판소리 사설과 신재효
6 판소리계 소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천상에서 하강한 선녀로 보고 지상에의 탄생과 시련 고난 그리고 극적 반전을 거쳐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해 놓았는데 유충렬전과 같은 영웅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평민의 발랄함이나 현실에서의 실감나는 묘사가 신재효의 적극적 개작으로 해서 크게 상처가 난 것은 사실이다.
그밖에 인물을 자의적으로 나름대로 함부로 탈락시킨 것도 그의 잘못으로 꼽기도 한다. 房子와 같은 인물이 그의 사설에서는 사라지는 일은 대표적 예이다.춘향전의 방자는 작중인물로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양반에 기생하는 천한 신분이나 상전인 이도령이나 춘향을 예사로 조롱하고 골탕먹이는가 하면 민중의식을 감춘채 은근히 양반을 욕하는 구실이 사람들에게 적잖은 재미와 익살을 가져다 주었다.그런데 신재효는 그 인물을 지워버렸다.그럼 기존의 사설을 이렇게 함부로 고친 까닭은 무엇일까.여기서 중인층로서 당시 신재효 개인의 사정을 살펴야할 것이다.조선후기 돈많고 문자를 아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재효로서는 끝내 양반의 신분에 올라설수는 없었다.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벌써 양반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판소리계의 수장격이 된 그로서는 이전부터 중구난방으로 흘러온 판소리와 그 사설을 정리하고 가다듬어 후대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에 사로잡혔을지 모른다.그런 의식은 그가 남긴 판소리 6마당의 설별에서도 잘 드러난다.그가 정착시킨 판소리 여섯마당(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흥보가 적벽가 변강쇠가 )가 한결같이 유교주의적 덕목인 忠 孝 烈 友愛를 주제로 삼고있음은 주목할 점이다.다시말해 그는 사설개작과정에서 양반이 지향하는 의식세계를 의식했고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합리성과 논리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우침을 주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다.특히 그는 광대들의 중심인물로서 위치를 거듭 생각했다.이미 당시 광대중의 일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반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평민보다 상층들을 더 의식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신재효로서는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사설에 반영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민중의 입장에서 쓰여진 사설을 전아하고 품위있게 고쳐 양반의 입맛과 취향에 고쳐나간 일은 신재효 개인의 사정과 함께 당대 광대들이 처한 미묘한 입장을 암시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판소리사에서 신재효의 업적을 과소 평가할수는 없다.그의 노력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판소리 사설의 정착과정을 알수 없었을 것이다.또 그가 춘향가를 남창과 동창으로 나누어 부르게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신재효는 창과 인물에 따른 배역분담이 필요함을 스스로 터득했고 이를 사설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그는 사설의 개작을 통해 이른바 상층과 하층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융합할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매우 고심했던 것으로 비친다.그의 앞시대의 사설이 골계와 비속함으로 흘러갔다면 그는 거기에다 비장함과 전아함이 깃들게 하여 판소리 사설의 균형감을 살리는데 힘을 기울였다.결국 판소리 사설의 개작의 의미는 민중과 양반의 대립적 의식을 없애 계층과 신분을 떠나 보다 많은 이가 판소리를 감상하고 즐길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두었다.이는 그가 판소리 이론을 정립하고 직접 광대를 지도하고 뒷바라지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크게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다.
6 판소리계 소설
문체
사설이 <-가>의 명칭으로 불렸다면 판소리계 소설은 <-전>으로 불려진 경우가 많았다.판소리사설이 소리판의 창본으로 쓰이다 어느 시점부터 쓰임새가 달라져 소설로 바뀌어 나간 것으로 짐작된다.본래 판소리는 12마당이었다고 했으므로 12편의 사설이 있을터이고 따라서 적어도 그만큼의 판소리 소설을 예상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없어져 확인이 어렵다.宋晩載가 觀優戱에서 말한 판소리 12마당이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타령 배비장 타령 강릉매화전 옹고집타령 장끼타령 왈자타령 가짜신선타령 (정노식은 왈짜타령대신에 무숙이 타령을 , 가짜 신선타령 대신에 숙영낭자전을 넣고있다) 등인데 그가운데 소설로 바뀌어 지금까지 소설로 남아있는 것으로 춘향전 흥보전 심청전 토끼전 (별주부전 )화용도(적벽가의 정착 )배비장전 옹고집전 장끼전 숙영낭자전등이 있다.이들 작품 이외에도 두껍전 옥단춘전 괴똥전등을 판소리계 소설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그밖에 소설본은 아니지만 신재효가 채록해놓은 변강쇠가가 전하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설이 문자로 고정시킨 것이므로 문체에서도 공연을 목적으로 했던 사설의 여러 특징이 먼저 눈에 띈다.단순한 서술체문장에서 보기 어려운 율문적 문장체는 곧 창의 대본이었음을 말해준다.장편구비서사시로 사설의 장르를 분류하는 사람도 있지만 워낙 노래를 위한 바탕글에 목적을 두다보니 자연 문장길이가 짧아지고 3-4음을 기본으로한 리듬이 알맞게 되었다. 문법 구조상 이야기식의 문장이 되지못하고 숨의 후지에 의한 제약과 함께 노래의 율동을 돕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전하기 위해 문장이 짧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또다른 까닭이었다.
廣寒眞景 조컨이다 오작교가 더욱 좃타
방가위지 湖南으로 第一城이로다
오작교 분명하면 견우직녀 어디있나
일언승지의 풍월이 업실소냐
도련임이 글두귀를 지여스되
고명오락션이여 광한옥계누라
차문쳔상수직이요 지홍금일 아거누라
판소리 사설은 아니리와 창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창의 부분에 율문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리 부분은 산문위주로 처리될 것이나 자세히 보면 아니리 부분도 산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율문에 더 가깝게 되어있다. 이는 판소리 소설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는다.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유창한 문장으로 보기보다는 시가라고 하는 편이 덜 어색할 정도로 주로 3-4음을 기본으로 한 이야기로 처리되고 있다.마치 장편 구비서사시를 보는 기분이다.
아울러 판소리계 소설은 여러 삽입가요를 아주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여러 양식의 복합수용체라는 느낌마저준다.그런데 바탕글조차 율문위주로 흐르다보니 어떤 시가형식이 삽입되더라도 그리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아래는 그런 대목중의 하나이다.
애고 애고 설운지고 그리하여 또 못되거든 이때 말나 초조焦燥 하여 죽은후의 넉시라도 삼슈갑산 졔비되어 도련님계신
그밖에 인물을 자의적으로 나름대로 함부로 탈락시킨 것도 그의 잘못으로 꼽기도 한다. 房子와 같은 인물이 그의 사설에서는 사라지는 일은 대표적 예이다.춘향전의 방자는 작중인물로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양반에 기생하는 천한 신분이나 상전인 이도령이나 춘향을 예사로 조롱하고 골탕먹이는가 하면 민중의식을 감춘채 은근히 양반을 욕하는 구실이 사람들에게 적잖은 재미와 익살을 가져다 주었다.그런데 신재효는 그 인물을 지워버렸다.그럼 기존의 사설을 이렇게 함부로 고친 까닭은 무엇일까.여기서 중인층로서 당시 신재효 개인의 사정을 살펴야할 것이다.조선후기 돈많고 문자를 아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재효로서는 끝내 양반의 신분에 올라설수는 없었다.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벌써 양반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판소리계의 수장격이 된 그로서는 이전부터 중구난방으로 흘러온 판소리와 그 사설을 정리하고 가다듬어 후대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에 사로잡혔을지 모른다.그런 의식은 그가 남긴 판소리 6마당의 설별에서도 잘 드러난다.그가 정착시킨 판소리 여섯마당(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흥보가 적벽가 변강쇠가 )가 한결같이 유교주의적 덕목인 忠 孝 烈 友愛를 주제로 삼고있음은 주목할 점이다.다시말해 그는 사설개작과정에서 양반이 지향하는 의식세계를 의식했고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합리성과 논리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우침을 주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졌다.특히 그는 광대들의 중심인물로서 위치를 거듭 생각했다.이미 당시 광대중의 일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반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평민보다 상층들을 더 의식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신재효로서는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사설에 반영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민중의 입장에서 쓰여진 사설을 전아하고 품위있게 고쳐 양반의 입맛과 취향에 고쳐나간 일은 신재효 개인의 사정과 함께 당대 광대들이 처한 미묘한 입장을 암시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판소리사에서 신재효의 업적을 과소 평가할수는 없다.그의 노력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판소리 사설의 정착과정을 알수 없었을 것이다.또 그가 춘향가를 남창과 동창으로 나누어 부르게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신재효는 창과 인물에 따른 배역분담이 필요함을 스스로 터득했고 이를 사설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그는 사설의 개작을 통해 이른바 상층과 하층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융합할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매우 고심했던 것으로 비친다.그의 앞시대의 사설이 골계와 비속함으로 흘러갔다면 그는 거기에다 비장함과 전아함이 깃들게 하여 판소리 사설의 균형감을 살리는데 힘을 기울였다.결국 판소리 사설의 개작의 의미는 민중과 양반의 대립적 의식을 없애 계층과 신분을 떠나 보다 많은 이가 판소리를 감상하고 즐길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두었다.이는 그가 판소리 이론을 정립하고 직접 광대를 지도하고 뒷바라지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크게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다.
6 판소리계 소설
문체
사설이 <-가>의 명칭으로 불렸다면 판소리계 소설은 <-전>으로 불려진 경우가 많았다.판소리사설이 소리판의 창본으로 쓰이다 어느 시점부터 쓰임새가 달라져 소설로 바뀌어 나간 것으로 짐작된다.본래 판소리는 12마당이었다고 했으므로 12편의 사설이 있을터이고 따라서 적어도 그만큼의 판소리 소설을 예상할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없어져 확인이 어렵다.宋晩載가 觀優戱에서 말한 판소리 12마당이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변강쇠타령 배비장 타령 강릉매화전 옹고집타령 장끼타령 왈자타령 가짜신선타령 (정노식은 왈짜타령대신에 무숙이 타령을 , 가짜 신선타령 대신에 숙영낭자전을 넣고있다) 등인데 그가운데 소설로 바뀌어 지금까지 소설로 남아있는 것으로 춘향전 흥보전 심청전 토끼전 (별주부전 )화용도(적벽가의 정착 )배비장전 옹고집전 장끼전 숙영낭자전등이 있다.이들 작품 이외에도 두껍전 옥단춘전 괴똥전등을 판소리계 소설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그밖에 소설본은 아니지만 신재효가 채록해놓은 변강쇠가가 전하고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설이 문자로 고정시킨 것이므로 문체에서도 공연을 목적으로 했던 사설의 여러 특징이 먼저 눈에 띈다.단순한 서술체문장에서 보기 어려운 율문적 문장체는 곧 창의 대본이었음을 말해준다.장편구비서사시로 사설의 장르를 분류하는 사람도 있지만 워낙 노래를 위한 바탕글에 목적을 두다보니 자연 문장길이가 짧아지고 3-4음을 기본으로한 리듬이 알맞게 되었다. 문법 구조상 이야기식의 문장이 되지못하고 숨의 후지에 의한 제약과 함께 노래의 율동을 돕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전하기 위해 문장이 짧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또다른 까닭이었다.
廣寒眞景 조컨이다 오작교가 더욱 좃타
방가위지 湖南으로 第一城이로다
오작교 분명하면 견우직녀 어디있나
일언승지의 풍월이 업실소냐
도련임이 글두귀를 지여스되
고명오락션이여 광한옥계누라
차문쳔상수직이요 지홍금일 아거누라
판소리 사설은 아니리와 창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창의 부분에 율문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리 부분은 산문위주로 처리될 것이나 자세히 보면 아니리 부분도 산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율문에 더 가깝게 되어있다. 이는 판소리 소설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는다.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유창한 문장으로 보기보다는 시가라고 하는 편이 덜 어색할 정도로 주로 3-4음을 기본으로 한 이야기로 처리되고 있다.마치 장편 구비서사시를 보는 기분이다.
아울러 판소리계 소설은 여러 삽입가요를 아주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여러 양식의 복합수용체라는 느낌마저준다.그런데 바탕글조차 율문위주로 흐르다보니 어떤 시가형식이 삽입되더라도 그리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아래는 그런 대목중의 하나이다.
애고 애고 설운지고 그리하여 또 못되거든 이때 말나 초조焦燥 하여 죽은후의 넉시라도 삼슈갑산 졔비되어 도련님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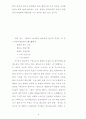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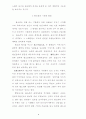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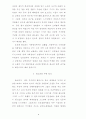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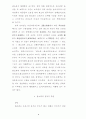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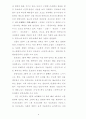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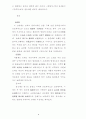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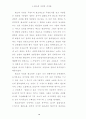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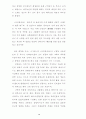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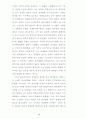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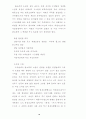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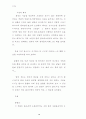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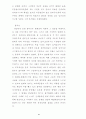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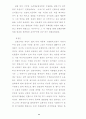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