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 동향
(1) 주민구성문제
(2) 지리 고증
(3) 대외 관계
2. 연구 동향
(1) 주민구성문제
(2) 지리 고증
(3) 대외 관계
본문내용
한 실증적 연구가 늦었던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관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한다. 양국이 계속 평화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보았고, 이로써 양국은 왕래가 빈번했으리라는 것이다. 이어 박시형의 이러한 서술을 보다 적극화하여 양국의 교섭이 {삼국사기}보다 더 빈번했을 것이라고 하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고의로 발해를 말살하려다가 그만 부주의하여 남기게 된 실책의 소산이라 하고, 당시 동방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여 있었던지 간에 적어도 이백수십년간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던 동족의 두 나라가 이와 같이 몰 교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도 하여 교섭이 빈번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발해사}는 {삼국사기} 보다는 좀더 왕래가 많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족인 두 나라가 수백 년간 내왕이 매우 적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7세기 중엽 이후 심한 사대주의 외세의존 정책에 매달린 신라봉건 통치계급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였다. 대립적인 면이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은 {협계태씨족보}이다. 여기에는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 있어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발해 무왕 19년 봄 2월에 발해 수군이 출동하여 신라군사와 합세하여 일본병선 300척을 물리쳤다고 하며, 발해 원왕(元王)[大虔晃] 8년에 황룡사 탑이 무너졌다고 발해에 알렸다고 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본기)가 성덕왕 30년과 경문왕 8년에 일본병선이 침입했다는 내용과 황룡사탑이 벼락을 맞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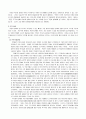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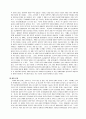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