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택영(金澤榮)의 시와 유민의식(遺民意識)
1) 삶과 의식
2) 시와 유민의식
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
나. 현실인식과 주변
다. 역사의식과 망명절의(亡命節義)
라. ‘가송입당(駕宋入唐)’의 시풍
1) 삶과 의식
2) 시와 유민의식
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
나. 현실인식과 주변
다. 역사의식과 망명절의(亡命節義)
라. ‘가송입당(駕宋入唐)’의 시풍
본문내용
된 시가 신운이 깃든 시라는 것이다.
그는 또 시란 허경(虛景)과 실경(實景)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情)과 경(景)이 융합을 이루어야 살아있는 홍취를 지닌 좋은 작품이 된다고 하였다.
묘오(妙悟)와 영감으로 천연한 감흥을 얻은 다음에 함축적이고 시선한 시어로 정경(情景)이 융합한 선적인 경지의 언외지의(言外之義)를 지닌 시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자신의 시에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대체로 그의 시는 사회적인 문제를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 많은 만큼 주지적 논리를 우선한 송시풍의 작품보다 주정적 정감을 중시한 당시풍의 흥취를 재현한 것이 많다고 하겠다. 이건창도 이것을 지적하여 그 때 사람들이 이치를 따지는 시를 많이 지어서 흥취를 중시하는 시가 거의 없었는데 김택영의 시는 영롱하고 뛰어나게 오묘한 생각과 침울하고 웅장하며 오만한 기상과 고상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색깔과 거듭되는 씩씩한 음조와 세차게 일어났다가 갑자기 꺾이는 절개와 멀고 맑은 운치와 한가하고 그윽한 태도로 神과 景이 모이고 흥이 형상에 나타나서 선인들도 들여다보지 못한 곳을 그는 거의 깨우쳤다고 하여
‘신과 경이 모이고 흥이 형상에 나타난’시를 썼다고 했다.
요컨대 그의 시는 현실 문제보다 순수하고 세련된 개인적 정감을 표현하는 데 기울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풍을 지닌 작품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미의식을 살펴보자.
손녀가 시집갈 날이 잡혀 느낌이 있어 짓다(孫女出閣有期感賦)
내가 네 아비를 잃고 눈물을 참아온지 지금 십년이다.
네가 커서 벌써 시집가게 되었으니 얽히고 설킨 사연이 없겠느냐.
문에 들어올 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아서 두눈에 주르르 흐르는 눈물
밝은 날에도 이렇게 슬프니 서늘한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오네.
눈물을 닦고 너의 머리를 어루만져 오래 살기를 축원한다.
네 얼굴은 애비를 닮았고 네 재주도 또한 그러하다.
진실로 혈맥을 전하는데 반드시 남자여야만 좋은 것인가.
이로써 너의 아비도 위로가 되리니 아비가 죽었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동쪽 저자에서 무늬 있는 비단을 사고 서쪽 가게에서 꽃 비녀를 사서
원앙같이 오순도순 일흔 둘까지 살아 뜰앞의 계수나무같이 단란하거라.
너는 네 갈 곳으로 갈 것이니 내 슬픔도 조금 덜어질 것이다.
다만 바라는 것은 네 목숨이 길어서 저 남산에 매어있는 것 같았으면.
自吾喪汝父 忍淚今十年 汝長已及嫁 曷不重纏綿 入門若異世 雙淚流漣漣
白日爲慘淡 悲風來自天 拭淚摩汝頂 祝汝長壽年 汝貌旣肖父 汝才且亦然
苟能傳血 何必男獨賢 以慰汝父 勿使嘆重泉 楚楚林有瑞 才譽衆所憐
是生寧馨兒 眼光炯靑蓮 誓與我相好 約婚方戒涓 東市買文錦 西市買花鈿
鴛鴦七十二 桂樹團庭前 汝往信得所 吾悲可少 但願汝長命 如彼錮南山
(金澤榮全集1, 卷4, 239쪽)
이 시는 52살(1901, 신축년)에 지은 것으로 손녀(죽은 장자 光濂의 딸)가 정혼을 한 뒤에 아들과 소년에 대한 슬픔을 누르면서 손녀가 단란하고 오래 살기를 비는 내용이다. 그의 장자 광렴(光濂)은 조취부인 왕씨 소생으로 그의 맏형에게 양자로 갔는데 임병식(林昺植)의 처가 된 딸 하나를 낳고 22살에 병사했다.
처음 넉 줄에는 십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픔을 참아오다가 아들이 남긴 손녀가 시집을 가게 됐으니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눈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다른 세상 같다느니 밝은 날이라느니 하는 말은 손녀가 자라서 시집가게 된 날을 이르는 말이다. 다음 넉 줄은 손녀에게 보내는 축원이다. 손녀를 보고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손녀에게 아들의 혈맥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가운데 다섯 줄은 신랑 임병식의 자질을 칭찬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당부하였다. 끝의 두 줄은 아비 잃고 섦게 자란 손녀가 시집을 가고나면 자신의 슬픔도 덜어질 거싱라면서 부디 오래 살기를 기원하였다. 그는 10살에 조혼했던 초취부인 왕씨를 서른살에 잃었고, 이런 개인적 불행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슬픔을 극복하여 응결시킨 것이 이시의 정서다. 비록 겉으로는 사실을 나열한 듯하지만 내면으로 흐르는 깊은 슬픔의 정서가 녹아있는 것이다. 그의 시를 일러 송시의 설리(說理)와 당시의 정감(情感)을 겸하여 ‘가송입당(駕宋入唐)’
했다는 말은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하겠다.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풍은 송시적 설리(說理)와 직설적 감흥을 표현한 시도 많지만 이른바 ‘가송입당(駕宋入唐)’의 특징,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唐詩)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를 쓰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김택영은 한말사가(韓末四家)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개성 출신으로 이건창의 추천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늦게 급제하여 편사국 주사가 되었지만 나라가 망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여러 역사서와 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조의 마지막 한시 작가라고 할 만 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삶과 의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유민(遺民)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고려와 개성에 대한 애착, 시문으로 이름을 떨치겠다는 강한 포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과 역사기록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국외로 망명하여 절의를 지킨 점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을 그의 한시 작품에 관련시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고려와 개성에 연관된 산천과 인물, 나아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유민의식을 드러내었다.
둘째, 그는 조선말기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현실인식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주변에 대한 정감을 매우 절실하고 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만큼 그는 조선조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더 의식했는데, 이것은 배척받았던 개성사람이 지닌 유민의식의 한계일 것이다. 셋째, 역사에 대한 의식을 시로 표현하여 민족 수난의 역사를 증언하고 민족의 각성과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망명절의를 드러내었다.
넷째, 그의 시풍은 송시적 특징과 당시적 특징을 절충한 ‘가송입당(駕宋入唐)’,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적 경향을 띤다고 하겠다.
끝으로 그는 한국 한시의 종장을 장식하는 시인으로서 중국에 망명하여 중국 시인에게 손색이 없는 작품을 썼다고 할 것이다.
그는 또 시란 허경(虛景)과 실경(實景)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情)과 경(景)이 융합을 이루어야 살아있는 홍취를 지닌 좋은 작품이 된다고 하였다.
묘오(妙悟)와 영감으로 천연한 감흥을 얻은 다음에 함축적이고 시선한 시어로 정경(情景)이 융합한 선적인 경지의 언외지의(言外之義)를 지닌 시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자신의 시에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대체로 그의 시는 사회적인 문제를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 많은 만큼 주지적 논리를 우선한 송시풍의 작품보다 주정적 정감을 중시한 당시풍의 흥취를 재현한 것이 많다고 하겠다. 이건창도 이것을 지적하여 그 때 사람들이 이치를 따지는 시를 많이 지어서 흥취를 중시하는 시가 거의 없었는데 김택영의 시는 영롱하고 뛰어나게 오묘한 생각과 침울하고 웅장하며 오만한 기상과 고상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색깔과 거듭되는 씩씩한 음조와 세차게 일어났다가 갑자기 꺾이는 절개와 멀고 맑은 운치와 한가하고 그윽한 태도로 神과 景이 모이고 흥이 형상에 나타나서 선인들도 들여다보지 못한 곳을 그는 거의 깨우쳤다고 하여
‘신과 경이 모이고 흥이 형상에 나타난’시를 썼다고 했다.
요컨대 그의 시는 현실 문제보다 순수하고 세련된 개인적 정감을 표현하는 데 기울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풍을 지닌 작품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미의식을 살펴보자.
손녀가 시집갈 날이 잡혀 느낌이 있어 짓다(孫女出閣有期感賦)
내가 네 아비를 잃고 눈물을 참아온지 지금 십년이다.
네가 커서 벌써 시집가게 되었으니 얽히고 설킨 사연이 없겠느냐.
문에 들어올 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아서 두눈에 주르르 흐르는 눈물
밝은 날에도 이렇게 슬프니 서늘한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오네.
눈물을 닦고 너의 머리를 어루만져 오래 살기를 축원한다.
네 얼굴은 애비를 닮았고 네 재주도 또한 그러하다.
진실로 혈맥을 전하는데 반드시 남자여야만 좋은 것인가.
이로써 너의 아비도 위로가 되리니 아비가 죽었다고 탄식하지 말아라.
동쪽 저자에서 무늬 있는 비단을 사고 서쪽 가게에서 꽃 비녀를 사서
원앙같이 오순도순 일흔 둘까지 살아 뜰앞의 계수나무같이 단란하거라.
너는 네 갈 곳으로 갈 것이니 내 슬픔도 조금 덜어질 것이다.
다만 바라는 것은 네 목숨이 길어서 저 남산에 매어있는 것 같았으면.
自吾喪汝父 忍淚今十年 汝長已及嫁 曷不重纏綿 入門若異世 雙淚流漣漣
白日爲慘淡 悲風來自天 拭淚摩汝頂 祝汝長壽年 汝貌旣肖父 汝才且亦然
苟能傳血 何必男獨賢 以慰汝父 勿使嘆重泉 楚楚林有瑞 才譽衆所憐
是生寧馨兒 眼光炯靑蓮 誓與我相好 約婚方戒涓 東市買文錦 西市買花鈿
鴛鴦七十二 桂樹團庭前 汝往信得所 吾悲可少 但願汝長命 如彼錮南山
(金澤榮全集1, 卷4, 239쪽)
이 시는 52살(1901, 신축년)에 지은 것으로 손녀(죽은 장자 光濂의 딸)가 정혼을 한 뒤에 아들과 소년에 대한 슬픔을 누르면서 손녀가 단란하고 오래 살기를 비는 내용이다. 그의 장자 광렴(光濂)은 조취부인 왕씨 소생으로 그의 맏형에게 양자로 갔는데 임병식(林昺植)의 처가 된 딸 하나를 낳고 22살에 병사했다.
처음 넉 줄에는 십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픔을 참아오다가 아들이 남긴 손녀가 시집을 가게 됐으니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눈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다른 세상 같다느니 밝은 날이라느니 하는 말은 손녀가 자라서 시집가게 된 날을 이르는 말이다. 다음 넉 줄은 손녀에게 보내는 축원이다. 손녀를 보고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손녀에게 아들의 혈맥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가운데 다섯 줄은 신랑 임병식의 자질을 칭찬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당부하였다. 끝의 두 줄은 아비 잃고 섦게 자란 손녀가 시집을 가고나면 자신의 슬픔도 덜어질 거싱라면서 부디 오래 살기를 기원하였다. 그는 10살에 조혼했던 초취부인 왕씨를 서른살에 잃었고, 이런 개인적 불행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슬픔을 극복하여 응결시킨 것이 이시의 정서다. 비록 겉으로는 사실을 나열한 듯하지만 내면으로 흐르는 깊은 슬픔의 정서가 녹아있는 것이다. 그의 시를 일러 송시의 설리(說理)와 당시의 정감(情感)을 겸하여 ‘가송입당(駕宋入唐)’
했다는 말은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하겠다.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의 시풍은 송시적 설리(說理)와 직설적 감흥을 표현한 시도 많지만 이른바 ‘가송입당(駕宋入唐)’의 특징,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唐詩)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를 쓰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김택영은 한말사가(韓末四家)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개성 출신으로 이건창의 추천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늦게 급제하여 편사국 주사가 되었지만 나라가 망하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여러 역사서와 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조의 마지막 한시 작가라고 할 만 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삶과 의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유민(遺民)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고려와 개성에 대한 애착, 시문으로 이름을 떨치겠다는 강한 포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과 역사기록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국외로 망명하여 절의를 지킨 점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을 그의 한시 작품에 관련시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고려와 개성에 연관된 산천과 인물, 나아가 국토와 인물에 대한 사랑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유민의식을 드러내었다.
둘째, 그는 조선말기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현실인식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주변에 대한 정감을 매우 절실하고 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만큼 그는 조선조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더 의식했는데, 이것은 배척받았던 개성사람이 지닌 유민의식의 한계일 것이다. 셋째, 역사에 대한 의식을 시로 표현하여 민족 수난의 역사를 증언하고 민족의 각성과 조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망명절의를 드러내었다.
넷째, 그의 시풍은 송시적 특징과 당시적 특징을 절충한 ‘가송입당(駕宋入唐)’, 다시 말해 송시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의 정감과 신운이 감도는 시적 경향을 띤다고 하겠다.
끝으로 그는 한국 한시의 종장을 장식하는 시인으로서 중국에 망명하여 중국 시인에게 손색이 없는 작품을 썼다고 할 것이다.
추천자료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정지상 김부식 박인량의 시 세계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고전문학작가론-최치원과 이규보의 비교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무신집권기 문인의 활동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한국 고전작가 시험대비 서브노트 조선시대 기녀문학
조선시대 기녀문학 조위한의 <최척전>
조위한의 <최척전>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그리움의 시인|최치원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한국 한시속의 삶과 의식<<책속의 권필 요약본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2011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 칠언시 감상) 근대전환기의 문학가 매천(梅泉) 황현(黃玹)
근대전환기의 문학가 매천(梅泉) 황현(黃玹) 2013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칠언시)
2013년 2학기 한문고전강독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오언시와칠언시) 장르별 문학 이론 - 시(詩 - 시의 정의와 특성, 시의 요소와 갈래, 시의 운율, 시의 언어와 ...
장르별 문학 이론 - 시(詩 - 시의 정의와 특성, 시의 요소와 갈래, 시의 운율, 시의 언어와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한문고전강독 공통] 漢詩를 종류별로 구분, 각각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되, 그것에 해당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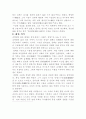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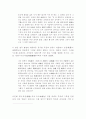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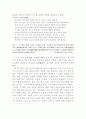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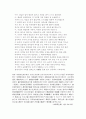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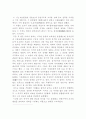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