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정미학
1. 서정소설
2. 언어의 시적 특질
(1) 비유적 표현법
(2) 암시적 표현법
Ⅲ. 표상을 통한
미의식 세계
1. 나귀
2. 메밀꽃
3. 장터
4. 들길
5. 개울
6. 주막
Ⅳ. 미적 구조
1. 민족의 서정적 공감대
2. Comedy 구조
3. 순환적인 구조
Ⅴ. 문체적 특성
1. 이미지
2. 감각어
3. 개인어
4. 첩어 ․ 상징부사 ․ 형용어
5. 생략어법
6. 문장 종지형
7. 나열형
8. 한어투 ․ 방언 ․ 비칭어
9. 감정의 용해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Ⅱ. 서정미학
1. 서정소설
2. 언어의 시적 특질
(1) 비유적 표현법
(2) 암시적 표현법
Ⅲ. 표상을 통한
미의식 세계
1. 나귀
2. 메밀꽃
3. 장터
4. 들길
5. 개울
6. 주막
Ⅳ. 미적 구조
1. 민족의 서정적 공감대
2. Comedy 구조
3. 순환적인 구조
Ⅴ. 문체적 특성
1. 이미지
2. 감각어
3. 개인어
4. 첩어 ․ 상징부사 ․ 형용어
5. 생략어법
6. 문장 종지형
7. 나열형
8. 한어투 ․ 방언 ․ 비칭어
9. 감정의 용해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겨울이지만 마음속에는 봄과 여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밤은 이중의 구조를 갖고 있다. 밤길이 거의 끝났을 때는 새벽이다. ‘봄’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성서방네 처녀를 다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봄은 동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재생할 수 있었다.
Ⅴ. 문체적 특성
작품에서의 문체는 작가가 작품에서 사용한 언어적 특징으로 문장 및 수사적인 특징이면서,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작가의 개성적 문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효석의 문체는 대체적으로 유려하며 세련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이나 부담감 없이 읽혀질 수 있는 매우 정감어린 문체로 공감된다. 난삽하거나 생경한 어휘가 없이 평이한 일상구어를 표현의 바탕으로 삼았으면서도, 통속에 따르지 않으면서 신선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이동희,「한국소설문체론고」, 국학자료원, 1997
이효석이 이룩한 가장 탁월한 문학적 성과는 섬세한 언어 구사와 시적인 문체의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체는 전대의 작가들이 이룩한 문체 미학 내지 소설 미학을 거부하는 독자적인 이탈을 보여주는 개성적인 문체이다. 그것은 우리의 산문에 시적 정서의 표현을 도입하여, 그것을 서정적 미학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1. 이미지
이효석은 산문 속의 이미지 처리에도 솜씨가 뛰어났다. 이미지라고 하면 대체로 시각적 이미지를 가리키지만, 청각이라든가 촉각 같은 다른 감각기관과 관계되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이미지는 언제나 한 감각기관에 관계되어 있기 쉽지만, 이효석의 경우에는 한 이미지에 두어 감각기관이 동시에 개입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모밀밭께로 흘러간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달밤의 메밀꽃 풍경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효석은 독자들이 “달의 숨소리”와 나귀의 방울소리를 듣게 하고, 손으로 달빛을 잡거나 달빛 때문에 숨이 막힘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소금 맛을 상상하게 하고, 메밀의 붉은 대궁을 향기로 환원하여 맡을 수 있게 한다. 이 구절에서 이효석은 우리로 하여금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동원하여 달빛과 메밀꽃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 기관의 이미지가 적절히 교차를 이루면서 작품을 시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다.
2. 감각어
감각어의 구사가 매우 능숙하며 감각의 밀도가 원색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효석의 감각어는 색채어가 주를 이룬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모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3. 개인어
일상어에서 흔히 쓰지 않는 한국 고유어의 관용어법이나 의성어, 의태어의 수많은 등장은 이효석의 소설을 읽는데 묘미를 느끼게 하고 또한 시적 분위기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 소두영이「모밀꽃 필 무렵」에서만 개인어를 조사해 보았는데도, 상당수의 어휘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효석 특유의 개인어로 판명되고 있다. 소두영, <이효석의 문체연구>, 숙대 논문집, 1977
「모밀꽃 필 무렵」에서 이러한 어휘를 일부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윳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칩칩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치 않다.
까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아이는 앙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나귀는 건등하면 미끄러졌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세인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하였다.
또한 다른 작품의 언어와 달리, 이효석의 언어에서 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묘사법이 다음과 같이 시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4. 첩어(疊語) 상징부사 형용어
첩용부사(疊用副詞)는 이효석의 문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려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어갈 수 있겠죠.
이효석의 작품은 문장의 기능어라고 할 수 있는 상징부사와 형용어의 활용이 탁월하다.
다음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는 작품 속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현에서는 상징부사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려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또한 부사 형용사를 포괄하는 형용어의 구사에서도 문체미학적인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아직두 서름서름한 사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
Ⅴ. 문체적 특성
작품에서의 문체는 작가가 작품에서 사용한 언어적 특징으로 문장 및 수사적인 특징이면서,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작가의 개성적 문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효석의 문체는 대체적으로 유려하며 세련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이나 부담감 없이 읽혀질 수 있는 매우 정감어린 문체로 공감된다. 난삽하거나 생경한 어휘가 없이 평이한 일상구어를 표현의 바탕으로 삼았으면서도, 통속에 따르지 않으면서 신선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이동희,「한국소설문체론고」, 국학자료원, 1997
이효석이 이룩한 가장 탁월한 문학적 성과는 섬세한 언어 구사와 시적인 문체의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체는 전대의 작가들이 이룩한 문체 미학 내지 소설 미학을 거부하는 독자적인 이탈을 보여주는 개성적인 문체이다. 그것은 우리의 산문에 시적 정서의 표현을 도입하여, 그것을 서정적 미학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1. 이미지
이효석은 산문 속의 이미지 처리에도 솜씨가 뛰어났다. 이미지라고 하면 대체로 시각적 이미지를 가리키지만, 청각이라든가 촉각 같은 다른 감각기관과 관계되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 이미지는 언제나 한 감각기관에 관계되어 있기 쉽지만, 이효석의 경우에는 한 이미지에 두어 감각기관이 동시에 개입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모밀밭께로 흘러간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달밤의 메밀꽃 풍경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효석은 독자들이 “달의 숨소리”와 나귀의 방울소리를 듣게 하고, 손으로 달빛을 잡거나 달빛 때문에 숨이 막힘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소금 맛을 상상하게 하고, 메밀의 붉은 대궁을 향기로 환원하여 맡을 수 있게 한다. 이 구절에서 이효석은 우리로 하여금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동원하여 달빛과 메밀꽃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 기관의 이미지가 적절히 교차를 이루면서 작품을 시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다.
2. 감각어
감각어의 구사가 매우 능숙하며 감각의 밀도가 원색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효석의 감각어는 색채어가 주를 이룬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모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3. 개인어
일상어에서 흔히 쓰지 않는 한국 고유어의 관용어법이나 의성어, 의태어의 수많은 등장은 이효석의 소설을 읽는데 묘미를 느끼게 하고 또한 시적 분위기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 소두영이「모밀꽃 필 무렵」에서만 개인어를 조사해 보았는데도, 상당수의 어휘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효석 특유의 개인어로 판명되고 있다. 소두영, <이효석의 문체연구>, 숙대 논문집, 1977
「모밀꽃 필 무렵」에서 이러한 어휘를 일부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윳병이나 받고 고깃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칩칩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치 않다.
까스러진 목 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아이는 앙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나귀는 건등하면 미끄러졌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세인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하였다.
또한 다른 작품의 언어와 달리, 이효석의 언어에서 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묘사법이 다음과 같이 시적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이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4. 첩어(疊語) 상징부사 형용어
첩용부사(疊用副詞)는 이효석의 문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려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어갈 수 있겠죠.
이효석의 작품은 문장의 기능어라고 할 수 있는 상징부사와 형용어의 활용이 탁월하다.
다음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는 작품 속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현에서는 상징부사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려 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또한 부사 형용사를 포괄하는 형용어의 구사에서도 문체미학적인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아직두 서름서름한 사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
추천자료
 1970년대 한국의 현대미술에 관하여 연구
1970년대 한국의 현대미술에 관하여 연구 - 1960년대 국문학사 -
- 1960년대 국문학사 - 나혜석문학작품
나혜석문학작품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다큐멘터리]다큐멘터리의 진실성과 공공성에 관한 사례 고찰(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의 사실...
[다큐멘터리]다큐멘터리의 진실성과 공공성에 관한 사례 고찰(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의 사실... 평택 신 개발지 개발정보 및 투자전략
평택 신 개발지 개발정보 및 투자전략 [소설][소설의 본질][소설의 외형구조][소설의 시점][소설의 인물유형][소설의 개선 방향]소...
[소설][소설의 본질][소설의 외형구조][소설의 시점][소설의 인물유형][소설의 개선 방향]소... (현대문학강독)청록파시인 3인의 시세계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조지훈,박목...
(현대문학강독)청록파시인 3인의 시세계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조지훈,박목... 디자인테마를 경영하라 스타벅스
디자인테마를 경영하라 스타벅스 [고대][철학][수필][소설][음악][수학][장신구][고대의 철학][고대의 수필][고대의 소설][고...
[고대][철학][수필][소설][음악][수학][장신구][고대의 철학][고대의 수필][고대의 소설][고... 전통 정조로써 저항하다 - 김소월
전통 정조로써 저항하다 - 김소월 김지하
김지하  남도의 문학과 문화
남도의 문학과 문화 현대시의 정신과 감각 레포트
현대시의 정신과 감각 레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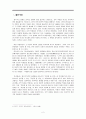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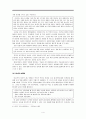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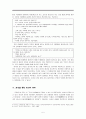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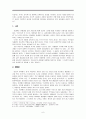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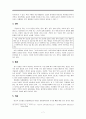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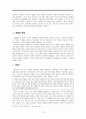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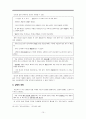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