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설의 기원
1. 소설사의 기원 추적
2. 고전소설의 효시와 그 시기
3. 고전소설 형성의 양상과 갈래
4. 소설의 기원을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는가?
5.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허균의 홍길동전에 대한 다른 시각
Ⅱ. 고전소설 시대의 소설관
1. 소설의 천시와 배격
2. 소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Ⅲ-1. 소설의 본질
1. 설화에서의 자아
2. 소설에서의 자아
Ⅲ-2. 설화에서 소설까지
1. <온달>설화와 전상국의 <우리 시대의 온달>,
김승옥의 <무진기행>비교
2. <아기장수>설화와 현길언의 <용마의 꿈>
3. <아기장수>설화와 김동리의 <황토기>
4. <아기장수>설화와 김승옥의 <力士>
5. <아기장수>설화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
1. 소설사의 기원 추적
2. 고전소설의 효시와 그 시기
3. 고전소설 형성의 양상과 갈래
4. 소설의 기원을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는가?
5. 김시습의 금오신화와 허균의 홍길동전에 대한 다른 시각
Ⅱ. 고전소설 시대의 소설관
1. 소설의 천시와 배격
2. 소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Ⅲ-1. 소설의 본질
1. 설화에서의 자아
2. 소설에서의 자아
Ⅲ-2. 설화에서 소설까지
1. <온달>설화와 전상국의 <우리 시대의 온달>,
김승옥의 <무진기행>비교
2. <아기장수>설화와 현길언의 <용마의 꿈>
3. <아기장수>설화와 김동리의 <황토기>
4. <아기장수>설화와 김승옥의 <力士>
5. <아기장수>설화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
본문내용
압적 현실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牧使) : 고려 중기 이후와 조선 때, 관찰사 아래에서 지방의 각 목을 맡아 다스리던
정삼품 외직 문관
좌수(座首) : 조선 때,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진상(進上) :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임금·고관에게 바침
동헌(東軒) : 고을 원이나 감사·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대청이나 집
3. <아기장수>설화와 김동리의 <황토기>
가. 줄거리
황토골에 힘이 장사인 억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힘이 세어 전설을 의식한 마을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억쇠는 주막에서 득보라는 사내를 알게 되고 둘 다 남들보다 힘이 센 그들은 금방 친해졌다. 그들은 틈만 나면 둘이 붙어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싸움질만 하였다. 득보는 억쇠에게 분이라는 계집을 붙여주면서 데리고 살라 한다. 그러나 분이의 마음은 늘 득보에게 가 있는 것이었다. 억쇠는 늙은 어머니와 한 점 혈육이 없는 것을 생각하여 용모와 행실이 바른 설희라는 여자를 얻어 함께 살게 된다. 설희는 득보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자였다. 득보마저 설희에게 마음이 쏠리자 분이는 억쇠의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애를 밴 설희를 죽이고, 자고 있던 득보마저 칼로 찌르고 사라진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득보는 깨어나 분이를 기다리다가, 그녀를 찾아 마을을 떠난다. 얼마 후 득보는 딸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나. <아기장수>전설과 <황토기>의 비교
아기장수전설
황토기
결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그 뜻을 펴지 못한 채 비극적 결말.
장사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숨기거나 자해로 결국은 비극적 결말.
풍수
묘터에 의한 후손의 영향력에
대한 임종의 운명론적 사상.
용냇가의 온전치 못한 명당으로 비극적 결말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
비극 해명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발생
원인, 조선 후기 민중 봉기.
일제 억압 속의 우리 민족의
숙명적 비극 암시.
4. <아기장수>설화와 김승옥의 <力士>
가. 줄거리
‘나’는 공원에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젊은이(이야기 속의 화자, 이하의 ‘나’)는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과 희곡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잠에서 깨어 보니 자신의 방이 매우 낯설어 어리둥절해 한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나’자신이 친구의 권유로 일주일 전 창신동의 빈민가에서 하숙을 옮겼음을 깨닫는다. 즉, 창신동 빈민가에서 살던 \'나\'는 깨끗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게 된다. 이른바 \'가풍(家風)\'을 중시하여 조그만 행동도 \'규칙적인 생활주의\'에 따라야 하는 새 하숙집에서 \'나\'는 왠지 모를 반발을 느끼면서 창신동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은 막벌이 노동자인 서 씨인데,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서, 한밤중에 몰래 동대문에 올라가 무거운 돌 하나를 옮겨 두는, 초인적인 일을 한다. 그러한 서 씨를 생각하면서 \'나\'는 새 하숙집의 규칙을 깨뜨리는 행동을 해 보지만, 하숙집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그 젊은이는 “어느 쪽이 틀려 있을까요?” 라고 내게 묻지만 나로서도 알 수 없다.
나. <아기장수>전설과 <역사>의 비교
아기장수
力士
주인공
아기장수
서 씨
공통점
주인공이 주위의 환경이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
차이점(전달방식)
아기장수를 통해 전달 받음.
‘나’라는 인물 통해 ‘나’라는 인물이
서 씨를 보는 것을 통해 전해 받음.
5. <아기장수>설화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
가. 줄거리
이 소설의 주인공인 때밀이인 일봉은 대대로 천하장사 집안에서 태어난 장사다. 그는 조상들이 바다에서 많이 죽었다는 이유로 배를 타지 않고 레슬러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한다. 서울에 오자마자 그는 서울이라는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잔치의 함성과 자랑스러운 승리와 늠름한 황소를 끌고 가던 지난날의 영광은 모두 욕탕의 비누거품 속에 사라진 것 같았지, 아니 어쩌면 읍내를 떠나던 날 그런 것들은 안개 속에 없어졌을지도 몰라”(p15) 그는 처음으로 찾아간 체육관에서 그는 레슬링이 미리 짜고 붙는다는 사기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 때부터일까. 그의 꿈은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 그는 레슬러가 되겠다는 꿈을 접어버리고 때밀이가 된다. 돈을 받고 손님의 때를 밀어주는 일봉은 그 순간만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돈을 주면 자신의 몫을 하는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때를 밀다 우연히 따루마 감독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는 바로 애자라는 여자와 함께 에로영화 작업을 시작한다. 애자의 이런 연출들은 돈을 받기 위함이다. 돈이 아니면 이런 연출 따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일봉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서울 오기 전 꾸었던 꿈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노예가 되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살기 위한 돈을 받기 위한 당당한 몸부림이 있을 뿐이다.
건강한 육체의 젊은이 일봉은 땀 흘려 돈 벌기보다는 쉽게 돈을 버는 쪽을 택한다.
... <생략>...
나. <아기장수>전설과 <장사의 꿈>의 비교
아기장수
장사의 꿈
공통점
‘아기장수’와 마찬가지로 능력을 발휘 못하는 비극적 운명.
차이점
아기장수의 죽음을 맞는 비극적 결말.
1. 자연으로 복귀 결심한 일봉의
생명력 회복
2. 여인의 등장 (애자)
※참고자료 -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설화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平岡王) 때에 사람이다. 얼굴은 울퉁불퉁 우습게 생겼지만 속마음은 밝아 홀어머니를 밥을 빌어다 봉양하며 살고 있었다. 다 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거리를 오가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이라고 했다.
평강왕에게는 어린 딸로서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어려서 몹시 울어, 부왕이 자꾸 울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농담을 하곤 하였다. 시집갈 나이가 되어 부왕이 귀족인 상부 고씨 집에 시집보내려 하자 공주는 부왕의 평소 말대로 온달에게 가겠노라고 우겼다. 격노한 부왕은 공주를 궁궐에서 내
목사(牧使) : 고려 중기 이후와 조선 때, 관찰사 아래에서 지방의 각 목을 맡아 다스리던
정삼품 외직 문관
좌수(座首) : 조선 때,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鄕廳)의 우두머리
진상(進上) :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임금·고관에게 바침
동헌(東軒) : 고을 원이나 감사·병사(兵使)·수사(水使) 등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대청이나 집
3. <아기장수>설화와 김동리의 <황토기>
가. 줄거리
황토골에 힘이 장사인 억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힘이 세어 전설을 의식한 마을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억쇠는 주막에서 득보라는 사내를 알게 되고 둘 다 남들보다 힘이 센 그들은 금방 친해졌다. 그들은 틈만 나면 둘이 붙어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싸움질만 하였다. 득보는 억쇠에게 분이라는 계집을 붙여주면서 데리고 살라 한다. 그러나 분이의 마음은 늘 득보에게 가 있는 것이었다. 억쇠는 늙은 어머니와 한 점 혈육이 없는 것을 생각하여 용모와 행실이 바른 설희라는 여자를 얻어 함께 살게 된다. 설희는 득보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자였다. 득보마저 설희에게 마음이 쏠리자 분이는 억쇠의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애를 밴 설희를 죽이고, 자고 있던 득보마저 칼로 찌르고 사라진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득보는 깨어나 분이를 기다리다가, 그녀를 찾아 마을을 떠난다. 얼마 후 득보는 딸을 데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나. <아기장수>전설과 <황토기>의 비교
아기장수전설
황토기
결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그 뜻을 펴지 못한 채 비극적 결말.
장사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숨기거나 자해로 결국은 비극적 결말.
풍수
묘터에 의한 후손의 영향력에
대한 임종의 운명론적 사상.
용냇가의 온전치 못한 명당으로 비극적 결말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
비극 해명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발생
원인, 조선 후기 민중 봉기.
일제 억압 속의 우리 민족의
숙명적 비극 암시.
4. <아기장수>설화와 김승옥의 <力士>
가. 줄거리
‘나’는 공원에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젊은이(이야기 속의 화자, 이하의 ‘나’)는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과 희곡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잠에서 깨어 보니 자신의 방이 매우 낯설어 어리둥절해 한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나’자신이 친구의 권유로 일주일 전 창신동의 빈민가에서 하숙을 옮겼음을 깨닫는다. 즉, 창신동 빈민가에서 살던 \'나\'는 깨끗한 양옥집으로 하숙을 옮기게 된다. 이른바 \'가풍(家風)\'을 중시하여 조그만 행동도 \'규칙적인 생활주의\'에 따라야 하는 새 하숙집에서 \'나\'는 왠지 모를 반발을 느끼면서 창신동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이 떠오르는 인물은 막벌이 노동자인 서 씨인데, 그는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서, 한밤중에 몰래 동대문에 올라가 무거운 돌 하나를 옮겨 두는, 초인적인 일을 한다. 그러한 서 씨를 생각하면서 \'나\'는 새 하숙집의 규칙을 깨뜨리는 행동을 해 보지만, 하숙집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그 젊은이는 “어느 쪽이 틀려 있을까요?” 라고 내게 묻지만 나로서도 알 수 없다.
나. <아기장수>전설과 <역사>의 비교
아기장수
力士
주인공
아기장수
서 씨
공통점
주인공이 주위의 환경이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
차이점(전달방식)
아기장수를 통해 전달 받음.
‘나’라는 인물 통해 ‘나’라는 인물이
서 씨를 보는 것을 통해 전해 받음.
5. <아기장수>설화와 황석영의 <장사의 꿈>
가. 줄거리
이 소설의 주인공인 때밀이인 일봉은 대대로 천하장사 집안에서 태어난 장사다. 그는 조상들이 바다에서 많이 죽었다는 이유로 배를 타지 않고 레슬러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한다. 서울에 오자마자 그는 서울이라는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잔치의 함성과 자랑스러운 승리와 늠름한 황소를 끌고 가던 지난날의 영광은 모두 욕탕의 비누거품 속에 사라진 것 같았지, 아니 어쩌면 읍내를 떠나던 날 그런 것들은 안개 속에 없어졌을지도 몰라”(p15) 그는 처음으로 찾아간 체육관에서 그는 레슬링이 미리 짜고 붙는다는 사기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 때부터일까. 그의 꿈은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 그는 레슬러가 되겠다는 꿈을 접어버리고 때밀이가 된다. 돈을 받고 손님의 때를 밀어주는 일봉은 그 순간만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돈을 주면 자신의 몫을 하는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때를 밀다 우연히 따루마 감독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는 바로 애자라는 여자와 함께 에로영화 작업을 시작한다. 애자의 이런 연출들은 돈을 받기 위함이다. 돈이 아니면 이런 연출 따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일봉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서울 오기 전 꾸었던 꿈은 다 사라지고 없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노예가 되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살기 위한 돈을 받기 위한 당당한 몸부림이 있을 뿐이다.
건강한 육체의 젊은이 일봉은 땀 흘려 돈 벌기보다는 쉽게 돈을 버는 쪽을 택한다.
... <생략>...
나. <아기장수>전설과 <장사의 꿈>의 비교
아기장수
장사의 꿈
공통점
‘아기장수’와 마찬가지로 능력을 발휘 못하는 비극적 운명.
차이점
아기장수의 죽음을 맞는 비극적 결말.
1. 자연으로 복귀 결심한 일봉의
생명력 회복
2. 여인의 등장 (애자)
※참고자료 -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설화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平岡王) 때에 사람이다. 얼굴은 울퉁불퉁 우습게 생겼지만 속마음은 밝아 홀어머니를 밥을 빌어다 봉양하며 살고 있었다. 다 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거리를 오가니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바보 온달이라고 했다.
평강왕에게는 어린 딸로서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어려서 몹시 울어, 부왕이 자꾸 울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농담을 하곤 하였다. 시집갈 나이가 되어 부왕이 귀족인 상부 고씨 집에 시집보내려 하자 공주는 부왕의 평소 말대로 온달에게 가겠노라고 우겼다. 격노한 부왕은 공주를 궁궐에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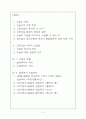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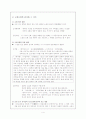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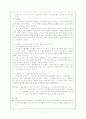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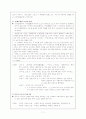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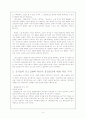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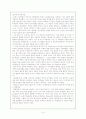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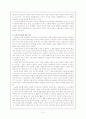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