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미인(月下美人)의 고독감이 잘 표출되었고, 인생의 무상함을 3장 구조의 짧은 시행(45자 내외의 시어)에 효과적으로 반영해 놓은 걸작이라 하겠다. <一到滄海>라고 비유된 일회성(一回性)인생 그것은 누구나 애달픈 인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別金慶元 (김경원과 헤어지며)
三世金綠成 尾(삼세금록성 미)삼세에 맺은 인연 짝을 이루어
此中生死兩心智(차중생사량심지)이승에서 생사야 우리만 알리
楊洲 若吾無負(양주 약오무부)양주에 맺은 언약 어찌 어기랴
恐 環知杜 之(공 환지두 지)두목 같은 풍채라 걱정일 뿐을
그녀가 교류했던 남정네들은 당대 이렇다 하는 벼슬아치요, 선비며, 풍류객들이었다. 두자미 같은 풍채와 이태백 같은 시재(詩才)에 소동파의 문재(文才)를 갖췄다는 저 유명한 부운거사 김경원을 비롯해서 직제학, 장악원 첨정 한성부판윤을 지낸 양곡(陽谷) 소세양, 성리학의 태두 화담(花潭) 서경덕, 30년 면벽참선(面壁參禪)한 만석선사, 명문가로 당대 제일의 풍류객 이석, 벽계군수를 지낸 콧대 높은 벽계수 이창곤, 천하의 풍류객인 명창으로 선전관을 지낸 이사종같은 위인들과 한 없는 풍류를 즐겼다. 그러나 한 지아비를 섬기지 못하는 원천적 그리움과 서린 한으로 가슴을 항상 출렁이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으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김경원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월보(月)라는 매파가 맺어 준 전생의 짝이건만 그가 워낙 잘난 것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절세가인인 진랑도 그랬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이 탈까 걱정에서다. 그렇다고 전전긍긍 , 박빙(薄氷) 위를 걷듯 조심하고 공력을 들인 것이다.
한 줄기 긴 물굽이가 골짜기 틈 사이에서 뿜어 나와,
백길이나 되는 용추로 쏟아져서 들어가는 구나.
거꾸로 엎어지며 날리는 샘이 구름이 아닌가 싶고,
성난 폭포 가로 드리운 모습 흰 무지개인가.
우박이 날리고 벼락이 달리다 골짜기에서 멈추고,
구슬 방아에서 옥이 부서져 맑은 하늘을 뒤덥네.
구경꾼들아, 여산이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다오.
해동에서는 천마산이 으뜸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진랑의 한시는 시조보다 폭이 넓어서 사랑 노래만은 아니다. 송도사람으로서 고려를 회고하는 시도 지었으니, 만월대에 올라 망한 나라의 쓸쓸한 자취를 더듬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 뿐만 아니라 <박연시>에서는 박연폭포의 장관을 묘사하면서 여성답지 않은 기백을 보였다. 황진이는 천한 기생이라 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 이 시에서 박연폭포는 경치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힘차고 울림이 큰 경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국의 으뜸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인 뜻을 아울러 지닌다. 기녀의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미천한 처지를 뒤집어놓자는 방외인문학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 시와 관련되어 서경덕과의 로맨스가 전해진다. 송도삼절 조선시대 개성의 뛰어난 세 존재. 즉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
이라고 하는 서경덕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개성 동문 밖 화담에 초막을 짓고 진리를 탐구했다. 그런 고매한 학자이고 보니 어린 진랑이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존경은 사모로, 사모는 흠모로 바뀌어 진랑은 화담의 제자가 되겠다며 글 공부를 빌미로 함께 숙식을 시작했다. 한 방에서 침식을 같이 하기를 여러 날, 젊은 진랑은 낮에는 요조숙녀의 제자로, 밤에는 요부색귀(妖婦色鬼)로 둔갑하여 유혹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화담한 고매한 인품에 진랑은 그를 더욱 존경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로맨스의 주인공인 지속선사 지족암(知足唵)의 지속선사, 또는 만석선사다. 30년을 면벽참선으로 성불이 된 스님이다.
는 진랑으로 인하여 실절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 밖 출입을 모르고 합장하고 염불만 외던 삭발스님을 유혹하여 실절까지 하게 만든 것은 진랑의 재주와 미모가 뛰어 났음을 말해준다.
③ 매창(梅窓)
㈎ 전기적 사실
이계랑(李桂, 1573~1610)은 조선 선조대와 연산군대에 시재(詩才)로서 명성을 날렸던 전북 부안의 명기(名妓)이다. 시조와 한시 그리고 거문고에 뛰어났던 매창은 부안지방은 물론 서울에까지도 명성을 날렸으며 그러한 재능을 이정한 文士들과 시로써 교유하여 현재 시조 1수와 60여 편의 한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기녀로서 후손도 없이 살다 간 그녀의 작품은 곧바로 기록되어 전해지지 못하다가 그녀의 재능과 시재를 아끼는 부안지방의 아전(衙前)들이 전해져 오는 그녀의 시를 모아 『梅窓潗』을 발간하였고 비로소 그녀의 작품이 전해지게 되었다.
매창은 1573년에 부안의 아전인 이양종(李洋從『朝鮮歷代女流文集』의 해설을 쓴 작자는 李陽從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金東旭本 『梅窓潗』(金億이 필사한 것을 또다른 사람이 베낀 문헌)을 원형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기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가 서녀였다고 하는 일부기록을 참고한다면 아전과 기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주와 정이 많았다>라는 평을 들었던 매창은 그야 말로 뛰어난 재와 정을 갖춘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희경, 허균, 한준겸, 심광세등을 만나게 된다. 인복이 많은 여자인 것이다. 그런 그녀였기에 지금도 그녀는 사후에도 복을 누린다. 지금도 그녀의 고향에는 매향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백일전을 여는 등 그녀와 관련된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으며 묘소도 관리해주고, 제향을 받들며, 묘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현에 매창의 무덤이 있고, 그 부근 개암사 일대에 그녀의 아름다운 일화와 함께 시비가 세워져 있다.
를 지켜 주고 있다.
㈏ 매창의 문학
서울에서 세 해의 꿈이러니
호남에서 또 한 해의 봄을 보내네
돈이면 옛 정도 바꿔 놓는가
한밤중에 외로이 애를 태우네 시 번역은 『매창시연구』(허경진 엮음, 평민사, 1986)과 『한국의 女流詩人』(金智勇, 영강출판사, 1991)에 의거하였음.
기녀가 된 후 그녀는 진사(進仕)인 서우관(徐雨觀)의 사랑을 받아 그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고 한다. 위의 시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梨花雨 흣날닐제 울며
別金慶元 (김경원과 헤어지며)
三世金綠成 尾(삼세금록성 미)삼세에 맺은 인연 짝을 이루어
此中生死兩心智(차중생사량심지)이승에서 생사야 우리만 알리
楊洲 若吾無負(양주 약오무부)양주에 맺은 언약 어찌 어기랴
恐 環知杜 之(공 환지두 지)두목 같은 풍채라 걱정일 뿐을
그녀가 교류했던 남정네들은 당대 이렇다 하는 벼슬아치요, 선비며, 풍류객들이었다. 두자미 같은 풍채와 이태백 같은 시재(詩才)에 소동파의 문재(文才)를 갖췄다는 저 유명한 부운거사 김경원을 비롯해서 직제학, 장악원 첨정 한성부판윤을 지낸 양곡(陽谷) 소세양, 성리학의 태두 화담(花潭) 서경덕, 30년 면벽참선(面壁參禪)한 만석선사, 명문가로 당대 제일의 풍류객 이석, 벽계군수를 지낸 콧대 높은 벽계수 이창곤, 천하의 풍류객인 명창으로 선전관을 지낸 이사종같은 위인들과 한 없는 풍류를 즐겼다. 그러나 한 지아비를 섬기지 못하는 원천적 그리움과 서린 한으로 가슴을 항상 출렁이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으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김경원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월보(月)라는 매파가 맺어 준 전생의 짝이건만 그가 워낙 잘난 것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절세가인인 진랑도 그랬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이 탈까 걱정에서다. 그렇다고 전전긍긍 , 박빙(薄氷) 위를 걷듯 조심하고 공력을 들인 것이다.
한 줄기 긴 물굽이가 골짜기 틈 사이에서 뿜어 나와,
백길이나 되는 용추로 쏟아져서 들어가는 구나.
거꾸로 엎어지며 날리는 샘이 구름이 아닌가 싶고,
성난 폭포 가로 드리운 모습 흰 무지개인가.
우박이 날리고 벼락이 달리다 골짜기에서 멈추고,
구슬 방아에서 옥이 부서져 맑은 하늘을 뒤덥네.
구경꾼들아, 여산이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다오.
해동에서는 천마산이 으뜸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진랑의 한시는 시조보다 폭이 넓어서 사랑 노래만은 아니다. 송도사람으로서 고려를 회고하는 시도 지었으니, 만월대에 올라 망한 나라의 쓸쓸한 자취를 더듬은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 뿐만 아니라 <박연시>에서는 박연폭포의 장관을 묘사하면서 여성답지 않은 기백을 보였다. 황진이는 천한 기생이라 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 이 시에서 박연폭포는 경치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힘차고 울림이 큰 경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동국의 으뜸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인 뜻을 아울러 지닌다. 기녀의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며, 미천한 처지를 뒤집어놓자는 방외인문학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 시와 관련되어 서경덕과의 로맨스가 전해진다. 송도삼절 조선시대 개성의 뛰어난 세 존재. 즉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
이라고 하는 서경덕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개성 동문 밖 화담에 초막을 짓고 진리를 탐구했다. 그런 고매한 학자이고 보니 어린 진랑이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존경은 사모로, 사모는 흠모로 바뀌어 진랑은 화담의 제자가 되겠다며 글 공부를 빌미로 함께 숙식을 시작했다. 한 방에서 침식을 같이 하기를 여러 날, 젊은 진랑은 낮에는 요조숙녀의 제자로, 밤에는 요부색귀(妖婦色鬼)로 둔갑하여 유혹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화담한 고매한 인품에 진랑은 그를 더욱 존경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로맨스의 주인공인 지속선사 지족암(知足唵)의 지속선사, 또는 만석선사다. 30년을 면벽참선으로 성불이 된 스님이다.
는 진랑으로 인하여 실절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문 밖 출입을 모르고 합장하고 염불만 외던 삭발스님을 유혹하여 실절까지 하게 만든 것은 진랑의 재주와 미모가 뛰어 났음을 말해준다.
③ 매창(梅窓)
㈎ 전기적 사실
이계랑(李桂, 1573~1610)은 조선 선조대와 연산군대에 시재(詩才)로서 명성을 날렸던 전북 부안의 명기(名妓)이다. 시조와 한시 그리고 거문고에 뛰어났던 매창은 부안지방은 물론 서울에까지도 명성을 날렸으며 그러한 재능을 이정한 文士들과 시로써 교유하여 현재 시조 1수와 60여 편의 한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기녀로서 후손도 없이 살다 간 그녀의 작품은 곧바로 기록되어 전해지지 못하다가 그녀의 재능과 시재를 아끼는 부안지방의 아전(衙前)들이 전해져 오는 그녀의 시를 모아 『梅窓潗』을 발간하였고 비로소 그녀의 작품이 전해지게 되었다.
매창은 1573년에 부안의 아전인 이양종(李洋從『朝鮮歷代女流文集』의 해설을 쓴 작자는 李陽從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金東旭本 『梅窓潗』(金億이 필사한 것을 또다른 사람이 베낀 문헌)을 원형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기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가 서녀였다고 하는 일부기록을 참고한다면 아전과 기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주와 정이 많았다>라는 평을 들었던 매창은 그야 말로 뛰어난 재와 정을 갖춘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희경, 허균, 한준겸, 심광세등을 만나게 된다. 인복이 많은 여자인 것이다. 그런 그녀였기에 지금도 그녀는 사후에도 복을 누린다. 지금도 그녀의 고향에는 매향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백일전을 여는 등 그녀와 관련된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으며 묘소도 관리해주고, 제향을 받들며, 묘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현에 매창의 무덤이 있고, 그 부근 개암사 일대에 그녀의 아름다운 일화와 함께 시비가 세워져 있다.
를 지켜 주고 있다.
㈏ 매창의 문학
서울에서 세 해의 꿈이러니
호남에서 또 한 해의 봄을 보내네
돈이면 옛 정도 바꿔 놓는가
한밤중에 외로이 애를 태우네 시 번역은 『매창시연구』(허경진 엮음, 평민사, 1986)과 『한국의 女流詩人』(金智勇, 영강출판사, 1991)에 의거하였음.
기녀가 된 후 그녀는 진사(進仕)인 서우관(徐雨觀)의 사랑을 받아 그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고 한다. 위의 시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梨花雨 흣날닐제 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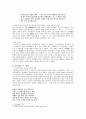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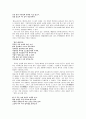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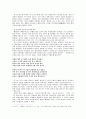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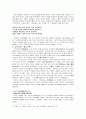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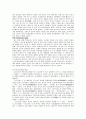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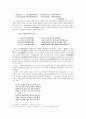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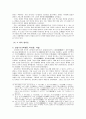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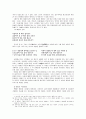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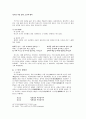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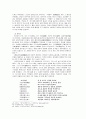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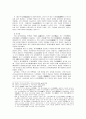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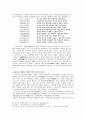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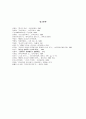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