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가사문학의 전환기
Ⅲ. 노계의 생애와 그의 가사
1. 노계의 생애
2. 노계 가사
1) 선상탄(船上嘆)
2) 누항사(陋巷詞)
3) 태평사(太平詞)
4) 사제곡
5) 독락당
6) 영남가
7) 노계가
Ⅳ. <누항사>의 내용 고찰
Ⅴ. 형식과 표현양상에 나타난 노계 가사의 후기가사적 요소
1. 형식
2. 표현양상
1) 사실적 표현
2) 해학적 표현
Ⅵ. 노계가사의 관념적 한계
Ⅶ. 결론
Ⅱ. 가사문학의 전환기
Ⅲ. 노계의 생애와 그의 가사
1. 노계의 생애
2. 노계 가사
1) 선상탄(船上嘆)
2) 누항사(陋巷詞)
3) 태평사(太平詞)
4) 사제곡
5) 독락당
6) 영남가
7) 노계가
Ⅳ. <누항사>의 내용 고찰
Ⅴ. 형식과 표현양상에 나타난 노계 가사의 후기가사적 요소
1. 형식
2. 표현양상
1) 사실적 표현
2) 해학적 표현
Ⅵ. 노계가사의 관념적 한계
Ⅶ. 결론
본문내용
없으나 그의 행장에 “명당여신(明達如神)하여 가르치지 아니해도 자능통해(自能通解)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13세 때에 지었다는 한시 <대승음(戴勝吟)>에는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32세(1592)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천의 의병장 정세아의 별시위가 되어 활약하였다. 28세 때에는 경상도 좌병사 성윤뮨의 막하에 들어가 많은 공을 세웠으며 이 때 성윤문의 명에 의하여 <태평사(太平詞)>를 지었다. 39세 때에는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 선전관을 잠깐 지낸 뒤, 조라포 만호가 되어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들을 정성껏 무휼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임무를 마치고 귀향하자 사졸들이 그의 청렴결백하고 고고한 인품과 은덕에 감사하여 송덕비를 세웠다.
의병활동과 미관말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남아의 대사업은 문장임”을 깨닫고 공맹의 제서와 주자의 부주에 잠심하여 침식을 잊으며 깊은 밤에는 묵상으로 천고의 성현을 생각하였고 꿈속에서 주공을 만나 성(誠) 경(敬) 충(忠) 효(孝) 4자를 얻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등 유학자로서의 자수에 진력하였다. 그리고 한음 이덕형,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지산 조호익과 같은 거유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에 심취하였다.
51세 때에 용지에 있는 사제로 한음을 찾아가 종유하면서 그를 대신하여 <사제곡(莎堤曲)>을 지었고 <누항사(陋巷詞)>를 지어 자기의 곤궁한 생활상을 노래하였다. 57세 때에는 한강이 동래 온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구 검단동 금호강변의 소유정에 들린 적이 있는데 이 때 <소유정가(小有亭歌)>를 노래 불렀고 59세 때에는 한강이 울산 초정으로 온욕 갈 때, 따라가 시조 2수를 지었다. 69세 때에는 여헌을 따라 입암을 노닐면서 시조 입암 29곡을 지었으며 여헌으로부터 “무하옹은 늙음을 모르고 발분망식하여 유학에 힘쓰는 동방의 인호”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강호의 명망있는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학에 정진하다가 70세 때에 용양위부호군으로 우로를 받았고 안찰사로 내려온 상국 ‘이명’이 노계를 ‘독행특립지사‘로 계를 올리자 인조는 군에 명하여 미육을 내리고 그 자손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75세 때에는 영남 안찰사의 덕치를 찬양하는 <영남가(嶺南歌)>를 지었고 76세 때에는 노계곡에 유거하면서 <노계가(蘆溪歌)>를 지었다.
이와 같이 노계는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서 가정을 잊고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학자들이 지향하는 충효와 안빈낙도를 몸소 실천하면서 은거구도적인 삶을 살았다. 가사 <누항사>와 <경전가> 등 일부 한시에 가난으로 겪게 된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노계는 의식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사대부에 속했으나 현실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몸소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던 향반계층으로서 전쟁 후의 극심한 궁핍으로 인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다소의 심적 갈등을 일으킨 것 같다. 그러나 노계는 가난이라는 현실 문제를 유교적 이상인 안빈낙도 사상으로써 극복하고 자연을 안식처로 삼아 초탈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는 67수의 시조와 9편의 가사를 남기고 있는데 시조는 <오륜가>와 같이 교훈적인 내용을 주로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사는 고사 성어와 한문 어구를 많이 사용하여 참신성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으나 구체적인 경험을 일상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사실성을 띨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구상이 웅장하면서 문체가 질박하고 유려하기 때문에 정철, 윤선도와 함께 3대 시가 작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 노계 가사
1) 선상탄(船上嘆)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실
을사(乙巳) 삼하(三夏)애 진동영(鎭東營) 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예 병이 깁다 안자실랴 ?
일장검(一長劍) 비기 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나
여기진목(勵氣瞋目)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
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 창파(滄波) 긴 하과 빗칠쇠
(중략)
준피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야라
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 섬멸(殲滅)랴
오왕성덕(吾王聖德)이 욕병생(欲竝生)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요순군민(堯舜郡民) 되야이셔
일월광화(日月光華) 조복조(朝腹朝)얏거든
전선(戰船) 던 우리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晩)고
추월춘풍(秋月春風)에 놉히 베고 누어 이셔
또한, <선상탄>은 <태평사>와 함께 가사 문학사상 몇 안 되는 전쟁 가사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선조 38년(1605), 박인로가 통주사로 부산에 가서 왜적의 침입을 막고 있을 때 지은 전쟁가사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이지만, 전쟁의 아픔과 왜적에 대한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은 때 지어졌다. 임진왜란 때 직접 전란에 참여한 작자가 왜적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을 뼈져리게 되새기며, 왜적에 대한 근심을 덜고 고향으로 돌아가 놀이배를 타고 즐겼으면 하는 뜻과 우국충정의 의지를 함께 표현한 것이다. 배의 유래와 무인다운 기개, 그리고 왜적의 항복으로 하루빨리 태평성대가 오기를 기원하는 내용도 아울러 표현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가사가 현실을 관념적으로 다룬 데 반해, 이 작품은 전쟁의 시련에 처한 민족 전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가사가 개인적 서정이나 사상의 표출만이 아니라 집단적 의지의 표현에도 적합한 양식임을 실증하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 한문투의 수식이 많고 직서적인 표현이 많은 것이 결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전쟁문학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속된 감정에 흐르지 않고, 적을 위압하는 무사의 투지와 우국충정(憂國衷情)의 기개 및 용기를 담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작가가 타고 있는 배를 중심 소재로 내세워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도 특이하다.
2) 누항사(陋巷詞)
어리고 우활 산 이 우 더니 업다. 길흉화복을 하날긔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깁푼곳의 초막(草幕)을 지어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딥히 셥히 되야,
셔흡 밥 닷 흡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뷘
32세(1592)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천의 의병장 정세아의 별시위가 되어 활약하였다. 28세 때에는 경상도 좌병사 성윤뮨의 막하에 들어가 많은 공을 세웠으며 이 때 성윤문의 명에 의하여 <태평사(太平詞)>를 지었다. 39세 때에는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 선전관을 잠깐 지낸 뒤, 조라포 만호가 되어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들을 정성껏 무휼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임무를 마치고 귀향하자 사졸들이 그의 청렴결백하고 고고한 인품과 은덕에 감사하여 송덕비를 세웠다.
의병활동과 미관말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남아의 대사업은 문장임”을 깨닫고 공맹의 제서와 주자의 부주에 잠심하여 침식을 잊으며 깊은 밤에는 묵상으로 천고의 성현을 생각하였고 꿈속에서 주공을 만나 성(誠) 경(敬) 충(忠) 효(孝) 4자를 얻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등 유학자로서의 자수에 진력하였다. 그리고 한음 이덕형,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지산 조호익과 같은 거유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에 심취하였다.
51세 때에 용지에 있는 사제로 한음을 찾아가 종유하면서 그를 대신하여 <사제곡(莎堤曲)>을 지었고 <누항사(陋巷詞)>를 지어 자기의 곤궁한 생활상을 노래하였다. 57세 때에는 한강이 동래 온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구 검단동 금호강변의 소유정에 들린 적이 있는데 이 때 <소유정가(小有亭歌)>를 노래 불렀고 59세 때에는 한강이 울산 초정으로 온욕 갈 때, 따라가 시조 2수를 지었다. 69세 때에는 여헌을 따라 입암을 노닐면서 시조 입암 29곡을 지었으며 여헌으로부터 “무하옹은 늙음을 모르고 발분망식하여 유학에 힘쓰는 동방의 인호”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강호의 명망있는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학에 정진하다가 70세 때에 용양위부호군으로 우로를 받았고 안찰사로 내려온 상국 ‘이명’이 노계를 ‘독행특립지사‘로 계를 올리자 인조는 군에 명하여 미육을 내리고 그 자손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75세 때에는 영남 안찰사의 덕치를 찬양하는 <영남가(嶺南歌)>를 지었고 76세 때에는 노계곡에 유거하면서 <노계가(蘆溪歌)>를 지었다.
이와 같이 노계는 임진왜란 때는 의병으로서 가정을 잊고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학자들이 지향하는 충효와 안빈낙도를 몸소 실천하면서 은거구도적인 삶을 살았다. 가사 <누항사>와 <경전가> 등 일부 한시에 가난으로 겪게 된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노계는 의식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사대부에 속했으나 현실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몸소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던 향반계층으로서 전쟁 후의 극심한 궁핍으로 인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다소의 심적 갈등을 일으킨 것 같다. 그러나 노계는 가난이라는 현실 문제를 유교적 이상인 안빈낙도 사상으로써 극복하고 자연을 안식처로 삼아 초탈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는 67수의 시조와 9편의 가사를 남기고 있는데 시조는 <오륜가>와 같이 교훈적인 내용을 주로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사는 고사 성어와 한문 어구를 많이 사용하여 참신성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으나 구체적인 경험을 일상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사실성을 띨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구상이 웅장하면서 문체가 질박하고 유려하기 때문에 정철, 윤선도와 함께 3대 시가 작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 노계 가사
1) 선상탄(船上嘆)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실
을사(乙巳) 삼하(三夏)애 진동영(鎭東營) 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예 병이 깁다 안자실랴 ?
일장검(一長劍) 비기 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나
여기진목(勵氣瞋目)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
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 창파(滄波) 긴 하과 빗칠쇠
(중략)
준피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야라
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 섬멸(殲滅)랴
오왕성덕(吾王聖德)이 욕병생(欲竝生)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요순군민(堯舜郡民) 되야이셔
일월광화(日月光華) 조복조(朝腹朝)얏거든
전선(戰船) 던 우리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晩)고
추월춘풍(秋月春風)에 놉히 베고 누어 이셔
또한, <선상탄>은 <태평사>와 함께 가사 문학사상 몇 안 되는 전쟁 가사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선조 38년(1605), 박인로가 통주사로 부산에 가서 왜적의 침입을 막고 있을 때 지은 전쟁가사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이지만, 전쟁의 아픔과 왜적에 대한 적개심이 가라앉지 않은 때 지어졌다. 임진왜란 때 직접 전란에 참여한 작자가 왜적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을 뼈져리게 되새기며, 왜적에 대한 근심을 덜고 고향으로 돌아가 놀이배를 타고 즐겼으면 하는 뜻과 우국충정의 의지를 함께 표현한 것이다. 배의 유래와 무인다운 기개, 그리고 왜적의 항복으로 하루빨리 태평성대가 오기를 기원하는 내용도 아울러 표현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가사가 현실을 관념적으로 다룬 데 반해, 이 작품은 전쟁의 시련에 처한 민족 전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가사가 개인적 서정이나 사상의 표출만이 아니라 집단적 의지의 표현에도 적합한 양식임을 실증하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 한문투의 수식이 많고 직서적인 표현이 많은 것이 결점이라 할 수 있지만, 전쟁문학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속된 감정에 흐르지 않고, 적을 위압하는 무사의 투지와 우국충정(憂國衷情)의 기개 및 용기를 담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작가가 타고 있는 배를 중심 소재로 내세워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도 특이하다.
2) 누항사(陋巷詞)
어리고 우활 산 이 우 더니 업다. 길흉화복을 하날긔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깁푼곳의 초막(草幕)을 지어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딥히 셥히 되야,
셔흡 밥 닷 흡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뷘
추천자료
 가사의 형태론적 고찰
가사의 형태론적 고찰 가사의 시적 담화양식과 교과서 적용
가사의 시적 담화양식과 교과서 적용 [인문과학] 유상계 가사 특징과 대표작품 분석
[인문과학] 유상계 가사 특징과 대표작품 분석 유상계 가사 특징과 대표작품 분석
유상계 가사 특징과 대표작품 분석  가사(가사문학)와 서민가사, 가사(가사문학)와 풍수가사, 가사(가사문학)와 종교가사, 가사(...
가사(가사문학)와 서민가사, 가사(가사문학)와 풍수가사, 가사(가사문학)와 종교가사, 가사(... 가사개념형식시대사
가사개념형식시대사 불교가사의 정체성과 미래
불교가사의 정체성과 미래 [세상읽기와논술 B형]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실...
[세상읽기와논술 B형]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실... 2016년 1학기 가사노동시간관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6년 1학기 가사노동시간관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가사노동․시간관리2A>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
<가사노동․시간관리2A>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 2017년 1학기 가사노동시간관리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1학기 가사노동시간관리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1학기 가사노동시간관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1학기 가사노동시간관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아스트로의 노래문학적 연구
아스트로의 노래문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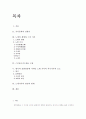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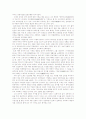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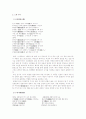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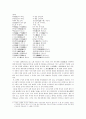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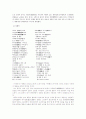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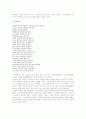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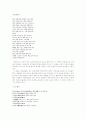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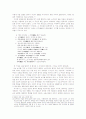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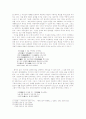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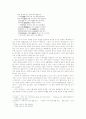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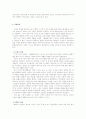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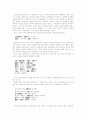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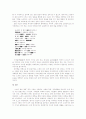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