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기국어(15~16세기) 표기법
1) 개요
2) 표기 원칙에 대한 견해 불일치
3) 사잇소리
4) 한자어
5) 16세기 표기 혼돈 양상
2. 근대국어(17세기~19세기) 표기법
1) 개요
2) 변화 양상
3) 중철과 분철 표기
4) 어두자음군
5) ‘ㅅ’과 ‘ㄷ’ 종성 표기
6) 기타 (근대국어에 와서 중기국어와 달라진 표기)
3. 현대국어(갑오경장~오늘날) 정서법
1) 개화기의 표기법
2)일제시대의 표기법
3)어간 고정의 표기
4) 문교부 고시 「한글 맞춤법」의 표기법
◆참고 문헌◆
1) 개요
2) 표기 원칙에 대한 견해 불일치
3) 사잇소리
4) 한자어
5) 16세기 표기 혼돈 양상
2. 근대국어(17세기~19세기) 표기법
1) 개요
2) 변화 양상
3) 중철과 분철 표기
4) 어두자음군
5) ‘ㅅ’과 ‘ㄷ’ 종성 표기
6) 기타 (근대국어에 와서 중기국어와 달라진 표기)
3. 현대국어(갑오경장~오늘날) 정서법
1) 개화기의 표기법
2)일제시대의 표기법
3)어간 고정의 표기
4) 문교부 고시 「한글 맞춤법」의 표기법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 힘입어 상류 계층의 전유물이던 문자 생활은 평민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들을 이끌어 갈 표기법의 대 원칙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그러나 그러한 양상 속에서도 근대국어는 중기국어의 전통 아래 그 나름대로의 표기체계를 보이고 있음.
2) 변화 양상
훈민정음 28자모 중 소멸문자 ‘ㆆ, ㅿ, ㆁ, ㆍ’ & 변이음을 표기한 문자 순경음 ‘ㅸ’
이중 ‘ㆆ’과 ‘ㅸ’는 근대국어 이전에 이미 소멸, ‘ㆍ’는 그 용법에 변동은 있었지만 문자 자체는 19세기까지 씌어짐
다만 ‘ㅿ’과 ‘ㆁ’이 중기국어 말기와 근대국어 초기에 걸쳐서 그 쓰임이 마무리되고 있었음
① ㅿ- ‘ㅿ’의 음가 소멸은 이미 16세기 말기에 일어났는데 앞에서 말한 문자 표기의 보수성 등으로 17세기 문헌에서도 그 표기가 가끔 나타남
- ‘ㅿ’가 국어의 음성 충열에서 ‘ㅅ’음의 변이음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그 음가를 소실하게 되자 ‘ㅿ’를 대신할 대체 요소가 필요하게 됨
-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 ‘ㅿ’에 대해 유무성음 대립에 의한 짝으로 존재하던 ‘ㅅ’의 대체 현상:
이 현상은 ‘ㅅ’음 어사가 유성음 환경에서 ‘ㅿ’음으로 바뀐 국어의 보편적 음운 변화를 거의 겪지 않고 그대로 ‘ㅅ’음으로 유지해 온 영남 방언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음(영남 방언에서도 ‘짓다’의 활용형으로 ‘짓어’가 아닌 ‘지어’를 쓰는 것으로 미루어 한 때 잠깐 ‘ㅿ’형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국어에서 ‘ㅿ’보유 어사인 ‘아(弟), 다(笑), 다(奪)’등은 근대국어에 와서 ‘ㅿ>ㅅ’ 교체를 보임
(1) 세 아 쳐 <삼강행실도 중간 효, 27>
(2) 다 디 못야 하 우니 보니 민망더라 <계축일기 p.37>
(3) 놀애 부르며 우슴 우어 <두중 1: 29>
(4) 대군을 아 려 오리라 <계축일기 p.98>
(1)의 ‘아’은 중간본에 나타난 어형인데 초간본에서는 ‘아’로 표기되어 있어 ‘ㅿ>ㅅ’ 교체현상을 볼 수 있음. (2)(3)의 ‘우니, 우슴’의 예는 ‘ㅿ>ㅅ’ 인데 ‘ㅿ>ㅇ’형인 아래와 같은 예도 나타나 극심한 표기법의 혼란을 보여 줌.
(5) 우음(笑) <동문유해 상 25>
(6) 회롱에 말로 우이다 <한청문감 181a>
(7) 우이이다(被笑話) <한청문감 211a>
㉡‘ㅿ’를 대신한 표기는 ‘ㅇ’:
실제로 ‘ㅿ’는 그 음가가 소실된 것이니까 ‘ㅇ’이야말로 진정한 ‘ㅿ’의 대체 표기라 할 것. 16세기 국어에서는 강세첨미사 ‘-’에서 ‘ㅿ’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으나 17세기로 오면서 ‘-’에서 ‘ㅿ’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으나 17세기로 오면서 ‘-’는 곧 ‘-아’, ‘-야’로 바뀌었다가 ‘-야’로 굳어짐
(8) 人이라아 吉고 <주역언해 1:46>
(9) 나의 風度야 업다야 야마 <해동가요 p.74>
(10) 세샹 마세 談薄야야 보야흐로 됴니 <어제소학언해 5:78>
결론적으로 ‘ㅿ’는 ㅿ>ㅇ의 단계를 밟는 과정과 함께 때로는 해당어사의 저층에 잠재해 있던 ‘ㅅ’음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 ‘ㅿ’의 음가 소멸이 임진란 이전에 확실히 마무리된 것에 비해 ‘ㅿ’의 표기는 17세기에서는 상당수 확인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예는 모음 ‘ㆍ’와 ‘ㅏ’계열에 선행하는 단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역시 문자의 보수성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11) 아 <노걸대언해 31>
(12) 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 6:22>
(13) <노걸대언해 46>
(14) 귀여 <박통사언해중간 상 43>
(15) 기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 7:19>
‘ㆁ’이 초성으로 쓰인 예는 중기국어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결국 소멸되었으며 그 표기도 ‘ㅇ’으로 대체
그러나 서술격 ‘다’류에는 17세기까지 그 표기의 몇 예가 남아 있음. 이는 앞에서 설명한 ‘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자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닌가함
종성의 경우 17세기 문헌에서 ‘ㆁ’ 표기를 상당히 찾을 수 있으나 ‘ㅇ’과 혼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ㆁ’의 표기예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헌: 1676년에 간행된 첩해신어
(16) 이다 <첩해신어 4:3> 너기이다 (4:5)
뵈오잇가 (4:6) 도라가이다 (6:5)
중기국어에 나타나던 방점 표기가 17세기에 와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 시기 표기법의 특징
16세기 후반의 일부 문헌에서부터 방점 표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은 17세기 초엽부터는 보편화되었던 것.
다만 시기적으로는 근대국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헌이지만 1909년 지석영이 저술한 언문에 국어 한자음의 고저 장단의 성조가 방점으로 일일이 표기되어 있어 이 책이 성조를 표기한 최후의 문헌이 아닌가함
이 책에는 지석영의 한자음에 대한 고저관, 중국의 전통적 4성과 고저의 관계 등이 논술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는 해당 성조음에 둥근 고리점으로 방점 표시를 하고 있다.
(17) 대한인민이 무론 경향 귀천하고 일용물에 용하는 <언문 서>
大韓人民 無論 京鄕 歸賤 日用事物 行用
⇒지금까지 논술해 온 과정을 거쳐 17세기의 문자 체계는 중기국어에 있던 ‘ㅿ’, ‘ㆁ’, 방점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으로 정리
3) 중철과 분철 표기
종성 표기는 8종성 쪽으로 통일되어 감. 16세기에 와서 나타난 중철 표기가 17세기에 와서 더욱 심해짐
이러한 표기법은 일종의 과도기적 양상을 띰. 17세기 이후 18, 19세기로 가면서 국어 표기법은 음소문자를 바탕으로 한 표음 표기의 큰 흐름에다 형태를 고려할 분철 표기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
매우 비경제적인 중철 표기가 많이 나타난 까닭은 형태소 표기를 뚜렷이 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
정음 초기부터 2원적으로 제시된 종성법과 이를 수렴한 8종성은 명확한 형태소 표현에는 미비한 점이 있는데(ㅿ, ㅈ, ㅊ, ㅅ의 혼동 문제) 연철 표기의 곡용, 활용에서 그 미흡함이 드러남. 이를 중철 표기로나마 보완하고자 한 것
17세기의 중철 표기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18) 체언 곡용에서: 왼녁크로 <언해두창집요 11>, 흙글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 2:75>, 리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 1:27>
(19) 용언 활용에서: 먹기고 <마경초집언해 상 85>,
☞그러나 그러한 양상 속에서도 근대국어는 중기국어의 전통 아래 그 나름대로의 표기체계를 보이고 있음.
2) 변화 양상
훈민정음 28자모 중 소멸문자 ‘ㆆ, ㅿ, ㆁ, ㆍ’ & 변이음을 표기한 문자 순경음 ‘ㅸ’
이중 ‘ㆆ’과 ‘ㅸ’는 근대국어 이전에 이미 소멸, ‘ㆍ’는 그 용법에 변동은 있었지만 문자 자체는 19세기까지 씌어짐
다만 ‘ㅿ’과 ‘ㆁ’이 중기국어 말기와 근대국어 초기에 걸쳐서 그 쓰임이 마무리되고 있었음
① ㅿ- ‘ㅿ’의 음가 소멸은 이미 16세기 말기에 일어났는데 앞에서 말한 문자 표기의 보수성 등으로 17세기 문헌에서도 그 표기가 가끔 나타남
- ‘ㅿ’가 국어의 음성 충열에서 ‘ㅅ’음의 변이음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그 음가를 소실하게 되자 ‘ㅿ’를 대신할 대체 요소가 필요하게 됨
-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 ‘ㅿ’에 대해 유무성음 대립에 의한 짝으로 존재하던 ‘ㅅ’의 대체 현상:
이 현상은 ‘ㅅ’음 어사가 유성음 환경에서 ‘ㅿ’음으로 바뀐 국어의 보편적 음운 변화를 거의 겪지 않고 그대로 ‘ㅅ’음으로 유지해 온 영남 방언으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음(영남 방언에서도 ‘짓다’의 활용형으로 ‘짓어’가 아닌 ‘지어’를 쓰는 것으로 미루어 한 때 잠깐 ‘ㅿ’형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국어에서 ‘ㅿ’보유 어사인 ‘아(弟), 다(笑), 다(奪)’등은 근대국어에 와서 ‘ㅿ>ㅅ’ 교체를 보임
(1) 세 아 쳐 <삼강행실도 중간 효, 27>
(2) 다 디 못야 하 우니 보니 민망더라 <계축일기 p.37>
(3) 놀애 부르며 우슴 우어 <두중 1: 29>
(4) 대군을 아 려 오리라 <계축일기 p.98>
(1)의 ‘아’은 중간본에 나타난 어형인데 초간본에서는 ‘아’로 표기되어 있어 ‘ㅿ>ㅅ’ 교체현상을 볼 수 있음. (2)(3)의 ‘우니, 우슴’의 예는 ‘ㅿ>ㅅ’ 인데 ‘ㅿ>ㅇ’형인 아래와 같은 예도 나타나 극심한 표기법의 혼란을 보여 줌.
(5) 우음(笑) <동문유해 상 25>
(6) 회롱에 말로 우이다 <한청문감 181a>
(7) 우이이다(被笑話) <한청문감 211a>
㉡‘ㅿ’를 대신한 표기는 ‘ㅇ’:
실제로 ‘ㅿ’는 그 음가가 소실된 것이니까 ‘ㅇ’이야말로 진정한 ‘ㅿ’의 대체 표기라 할 것. 16세기 국어에서는 강세첨미사 ‘-’에서 ‘ㅿ’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으나 17세기로 오면서 ‘-’에서 ‘ㅿ’를 마지막까지 볼 수 있었으나 17세기로 오면서 ‘-’는 곧 ‘-아’, ‘-야’로 바뀌었다가 ‘-야’로 굳어짐
(8) 人이라아 吉고 <주역언해 1:46>
(9) 나의 風度야 업다야 야마 <해동가요 p.74>
(10) 세샹 마세 談薄야야 보야흐로 됴니 <어제소학언해 5:78>
결론적으로 ‘ㅿ’는 ㅿ>ㅇ의 단계를 밟는 과정과 함께 때로는 해당어사의 저층에 잠재해 있던 ‘ㅅ’음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 ‘ㅿ’의 음가 소멸이 임진란 이전에 확실히 마무리된 것에 비해 ‘ㅿ’의 표기는 17세기에서는 상당수 확인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예는 모음 ‘ㆍ’와 ‘ㅏ’계열에 선행하는 단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역시 문자의 보수성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11) 아 <노걸대언해 31>
(12) 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 6:22>
(13) <노걸대언해 46>
(14) 귀여 <박통사언해중간 상 43>
(15) 기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 7:19>
‘ㆁ’이 초성으로 쓰인 예는 중기국어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결국 소멸되었으며 그 표기도 ‘ㅇ’으로 대체
그러나 서술격 ‘다’류에는 17세기까지 그 표기의 몇 예가 남아 있음. 이는 앞에서 설명한 ‘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자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닌가함
종성의 경우 17세기 문헌에서 ‘ㆁ’ 표기를 상당히 찾을 수 있으나 ‘ㅇ’과 혼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ㆁ’의 표기예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헌: 1676년에 간행된 첩해신어
(16) 이다 <첩해신어 4:3> 너기이다 (4:5)
뵈오잇가 (4:6) 도라가이다 (6:5)
중기국어에 나타나던 방점 표기가 17세기에 와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 시기 표기법의 특징
16세기 후반의 일부 문헌에서부터 방점 표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은 17세기 초엽부터는 보편화되었던 것.
다만 시기적으로는 근대국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헌이지만 1909년 지석영이 저술한 언문에 국어 한자음의 고저 장단의 성조가 방점으로 일일이 표기되어 있어 이 책이 성조를 표기한 최후의 문헌이 아닌가함
이 책에는 지석영의 한자음에 대한 고저관, 중국의 전통적 4성과 고저의 관계 등이 논술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는 해당 성조음에 둥근 고리점으로 방점 표시를 하고 있다.
(17) 대한인민이 무론 경향 귀천하고 일용물에 용하는 <언문 서>
大韓人民 無論 京鄕 歸賤 日用事物 行用
⇒지금까지 논술해 온 과정을 거쳐 17세기의 문자 체계는 중기국어에 있던 ‘ㅿ’, ‘ㆁ’, 방점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으로 정리
3) 중철과 분철 표기
종성 표기는 8종성 쪽으로 통일되어 감. 16세기에 와서 나타난 중철 표기가 17세기에 와서 더욱 심해짐
이러한 표기법은 일종의 과도기적 양상을 띰. 17세기 이후 18, 19세기로 가면서 국어 표기법은 음소문자를 바탕으로 한 표음 표기의 큰 흐름에다 형태를 고려할 분철 표기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
매우 비경제적인 중철 표기가 많이 나타난 까닭은 형태소 표기를 뚜렷이 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
정음 초기부터 2원적으로 제시된 종성법과 이를 수렴한 8종성은 명확한 형태소 표현에는 미비한 점이 있는데(ㅿ, ㅈ, ㅊ, ㅅ의 혼동 문제) 연철 표기의 곡용, 활용에서 그 미흡함이 드러남. 이를 중철 표기로나마 보완하고자 한 것
17세기의 중철 표기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18) 체언 곡용에서: 왼녁크로 <언해두창집요 11>, 흙글 <동국신속삼강행실도효 2:75>, 리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 1:27>
(19) 용언 활용에서: 먹기고 <마경초집언해 상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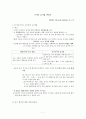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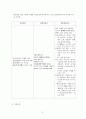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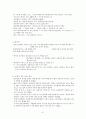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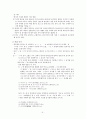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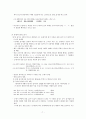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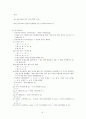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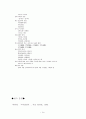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