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고대국어
1.1 언문이치의 생활
1.2 삼국의 언어
Ⅲ. 중세국어
2.1 의미관계
2.1.1 유의어
2.1.2 동음이의어
2.1.3 반의어
2.2 한자어
2.3 차용어
2.4 음상의 차이에 의한 어휘분화
2.5 의성의태어
2.6 쌍형어
2.7 어휘에 의한 경어법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Ⅱ. 고대국어
1.1 언문이치의 생활
1.2 삼국의 언어
Ⅲ. 중세국어
2.1 의미관계
2.1.1 유의어
2.1.2 동음이의어
2.1.3 반의어
2.2 한자어
2.3 차용어
2.4 음상의 차이에 의한 어휘분화
2.5 의성의태어
2.6 쌍형어
2.7 어휘에 의한 경어법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몽고어에서 [용사]를 의미하는 말이다.
2.4 음상의 차이에 의한 어휘분화
모음 조화에 따라 모음이 바뀌면서 어휘가 분화하는 양상은 현대국어보다 중세국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는 완전히 분화하기도 한다. 그 예로 ‘밧다’는 옷이나 갓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벗는 경우에 쓰이고, ‘벗다’는 수고나 생사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쓰인다. 또 ‘마리’는 거의 존귀한 인물의 머리를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2.5 의성의태어
국어에서 의성의태어가 발달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자음과 모음의 대립에 의해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말이 풍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이미 후기 중세국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볍게 질책을 할 때 내는 소리]
엥[윗 사람에 대하여 고맙고도 감동스러워 내는 소리]
너운너운[가볍게 나는 모양]
촉촉~축축
2.6 쌍형어
중세국어에서 의미가 같고 형태가 유사해서 문법론으로나 음운론으로 두 형태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쌍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를 쌍형어라고 한다.
겨다~견다
드틀~듣글
15세기 문헌에서 두 형태는 공존하였다. 기원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두 방언에서 ‘듣글’과 ‘드틀’로 변화를 하였으며, 문헌을 편찬할 당시에 다른 방언에서 사용되던 어형이 차용되면서 문헌에서 함께 나타나면서 공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2.7 어휘에 의한 경어법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어법이 발달했었다. 주체를 높이는 말로 ‘잇다’에 대하여 ‘겨시다’가 나타나고, 객체를 높이는 말로 ‘니르다’에 대해 ‘다,
2.4 음상의 차이에 의한 어휘분화
모음 조화에 따라 모음이 바뀌면서 어휘가 분화하는 양상은 현대국어보다 중세국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부는 완전히 분화하기도 한다. 그 예로 ‘밧다’는 옷이나 갓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벗는 경우에 쓰이고, ‘벗다’는 수고나 생사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쓰인다. 또 ‘마리’는 거의 존귀한 인물의 머리를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2.5 의성의태어
국어에서 의성의태어가 발달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자음과 모음의 대립에 의해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말이 풍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이미 후기 중세국어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볍게 질책을 할 때 내는 소리]
엥[윗 사람에 대하여 고맙고도 감동스러워 내는 소리]
너운너운[가볍게 나는 모양]
촉촉~축축
2.6 쌍형어
중세국어에서 의미가 같고 형태가 유사해서 문법론으로나 음운론으로 두 형태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쌍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를 쌍형어라고 한다.
겨다~견다
드틀~듣글
15세기 문헌에서 두 형태는 공존하였다. 기원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두 방언에서 ‘듣글’과 ‘드틀’로 변화를 하였으며, 문헌을 편찬할 당시에 다른 방언에서 사용되던 어형이 차용되면서 문헌에서 함께 나타나면서 공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2.7 어휘에 의한 경어법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어법이 발달했었다. 주체를 높이는 말로 ‘잇다’에 대하여 ‘겨시다’가 나타나고, 객체를 높이는 말로 ‘니르다’에 대해 ‘다,
추천자료
 국어학의 특질
국어학의 특질 국어과 교육 정책의 변천
국어과 교육 정책의 변천 [인문과학] 중세국어의 음운
[인문과학] 중세국어의 음운 대한제국시대의 국어연구
대한제국시대의 국어연구 고등국어 쓰기 교육영역 현황 및 내용 체계
고등국어 쓰기 교육영역 현황 및 내용 체계 국어의 역사(김무림) 요약, 정리
국어의 역사(김무림) 요약, 정리 [국어][기본어휘][국어 부정문 유형][국어 부정문 구조][국어 의문문 유형][국어 의문문 특징...
[국어][기본어휘][국어 부정문 유형][국어 부정문 구조][국어 의문문 유형][국어 의문문 특징... 국어과 교육과정변천
국어과 교육과정변천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를 통한 근대소설 교육의 실제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를 통한 근대소설 교육의 실제 근대 극복의 기획과 페미니즘 [권명아 소개]
근대 극복의 기획과 페미니즘 [권명아 소개] 근대소설 교육의 실제 작품명 -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근대소설 교육의 실제 작품명 -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국어사(國語史)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성 {국어학사와 국어사, 국어사의 시...
국어사(國語史)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성 {국어학사와 국어사, 국어사의 시... [인문과학] 국어사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성
[인문과학] 국어사의 시대 구분 방법과 각 시기의 언어적 특성 개화기 당시의 어문정리운동
개화기 당시의 어문정리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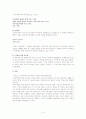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