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래시제에 대한 논의
2. 후기 중세국어(15세기)에서 미래시제: -리-
2.1. -리-의 쓰임
2.1.1 의도
2.1.2 추정
2.1.3. 기타
3. 근대국어에서 미래시제: ‘-리-’, ‘-ㄹ 것이-’, ‘-겟-’
3.1. ‘-리-’의 쓰임
3.2. ‘-ㄹ 것이-’의 쓰임
3.3 ‘-겟-’의 쓰임
4. 현대국어에서 미래시제: -리-, -(으)ㄹ 것-. -겠-
4.1. ‘-겠-’의 쓰임
4.1.의미 기능
4.1.1.의도
4.1.2.추정
4.1.3.그 밖의 쓰임
4.2. ‘-ㄹ 것이-’와의 차이(현장성)
5. 맺음말
6. 참고문헌
2. 후기 중세국어(15세기)에서 미래시제: -리-
2.1. -리-의 쓰임
2.1.1 의도
2.1.2 추정
2.1.3. 기타
3. 근대국어에서 미래시제: ‘-리-’, ‘-ㄹ 것이-’, ‘-겟-’
3.1. ‘-리-’의 쓰임
3.2. ‘-ㄹ 것이-’의 쓰임
3.3 ‘-겟-’의 쓰임
4. 현대국어에서 미래시제: -리-, -(으)ㄹ 것-. -겠-
4.1. ‘-겠-’의 쓰임
4.1.의미 기능
4.1.1.의도
4.1.2.추정
4.1.3.그 밖의 쓰임
4.2. ‘-ㄹ 것이-’와의 차이(현장성)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의문에 쓰이는 -리-는 변화를 겪지 않는다.
(이병기, 1997). 따라서 이 시기에 ‘-리-’의 문법적 지위가 15세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의도
유모를 각별이 리라 (109) / 셩인을 일즉이 호리라 (109)
(6) 추정
이번 큰 거조다 업싶리라(341) / 부귀를 가지리라(739) / 몸이 영하 되리라(748)
(7) 수사의문
신짜의 도리되야 어이 긔망리요(121) / 엇지 다 형용리요(134) / 션비 밑잎이야 엇더시리요(134)
3.2. ‘-ㄹ 것이-’의 쓰임
‘-ㄹ 것이’는 주로 16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여 주로 연결형에서 ‘-리-’를 대체하며 세력을 확대해 간 듯하다(이병기, 1997). 『읍혈록』에 보이는 ‘-ㄹ 것이-’는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하나의 형태로서의 쓰임이 굳어진 듯하다.
(8) 추정 가. 다 슈뎌이 많이 잇싶 거시로되(107)
나. 사싶 의복을 못 닙을 거시니(132)
다. 제 인픔을 아링다오믈 알힝니라(360)
라. 집을 망일 거시라(865)
마. 죠수가 추쟈 주론 사링이 될 거시오(1201)
(8)과 같이 ‘-ㄹ’ 과 ‘것’ 사이의 단어 경계가 형태소 경계 정도로 약화되어 그 결합이 더욱 긴밀해져, 연결형뿐 아니라 종결형에서도 추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ㄹ 것이-’에서 ‘ㅅ’이 탈락된 ‘-ㄹ거-’, ‘-ㄹ꺼-’, ‘-ㄹ게-’ 등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것’이 계사 ‘이-’와 결합하여 ‘ㅅ’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예는 19세기 말엽의 자료에 보인다: 이 네가 연 게냐(화음계몽언해 상.6).
3.3 ‘-겟-’의 쓰임
어원으로는 ‘-게 잇-’, ‘-가 잇-’그리고 ‘-게 엿-’의 세 견해가 제시되는데 실제 문헌에 나타난 증거를 토대로 할 때 ‘-게 하엿-’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본다(나진석, 1953; 허웅, 1982; 이기갑, 1987)
-게 엿-은 원래 사역형으로 ‘’가 줄어 ‘-게엿-’이 되고 다시 모음충돌로 ‘여’가 탈락하여 ‘-겠-’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진석(1953)에 의하면 ‘-게 하였-’은 18세기 전반기에 형성되었고, ‘-겠-’은 19세기 초 이미 궁중용어로도 쓰인 것을 볼 때 18세기 후반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
(9) 가. 이 나라히 오날이 잇게 야시니<한듕록 6:50)
나. 샹업시 일이 와 아와 실 다 큰 명이 나게 엿다 고(의유, 동명일긔)
다. 요란니 못겟다 시고(한중 5:40)
라. 방
(이병기, 1997). 따라서 이 시기에 ‘-리-’의 문법적 지위가 15세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의도
유모를 각별이 리라 (109) / 셩인을 일즉이 호리라 (109)
(6) 추정
이번 큰 거조다 업싶리라(341) / 부귀를 가지리라(739) / 몸이 영하 되리라(748)
(7) 수사의문
신짜의 도리되야 어이 긔망리요(121) / 엇지 다 형용리요(134) / 션비 밑잎이야 엇더시리요(134)
3.2. ‘-ㄹ 것이-’의 쓰임
‘-ㄹ 것이’는 주로 16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여 주로 연결형에서 ‘-리-’를 대체하며 세력을 확대해 간 듯하다(이병기, 1997). 『읍혈록』에 보이는 ‘-ㄹ 것이-’는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하나의 형태로서의 쓰임이 굳어진 듯하다.
(8) 추정 가. 다 슈뎌이 많이 잇싶 거시로되(107)
나. 사싶 의복을 못 닙을 거시니(132)
다. 제 인픔을 아링다오믈 알힝니라(360)
라. 집을 망일 거시라(865)
마. 죠수가 추쟈 주론 사링이 될 거시오(1201)
(8)과 같이 ‘-ㄹ’ 과 ‘것’ 사이의 단어 경계가 형태소 경계 정도로 약화되어 그 결합이 더욱 긴밀해져, 연결형뿐 아니라 종결형에서도 추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ㄹ 것이-’에서 ‘ㅅ’이 탈락된 ‘-ㄹ거-’, ‘-ㄹ꺼-’, ‘-ㄹ게-’ 등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것’이 계사 ‘이-’와 결합하여 ‘ㅅ’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예는 19세기 말엽의 자료에 보인다: 이 네가 연 게냐(화음계몽언해 상.6).
3.3 ‘-겟-’의 쓰임
어원으로는 ‘-게 잇-’, ‘-가 잇-’그리고 ‘-게 엿-’의 세 견해가 제시되는데 실제 문헌에 나타난 증거를 토대로 할 때 ‘-게 하엿-’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본다(나진석, 1953; 허웅, 1982; 이기갑, 1987)
-게 엿-은 원래 사역형으로 ‘’가 줄어 ‘-게엿-’이 되고 다시 모음충돌로 ‘여’가 탈락하여 ‘-겠-’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진석(1953)에 의하면 ‘-게 하였-’은 18세기 전반기에 형성되었고, ‘-겠-’은 19세기 초 이미 궁중용어로도 쓰인 것을 볼 때 18세기 후반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
(9) 가. 이 나라히 오날이 잇게 야시니<한듕록 6:50)
나. 샹업시 일이 와 아와 실 다 큰 명이 나게 엿다 고(의유, 동명일긔)
다. 요란니 못겟다 시고(한중 5:40)
라.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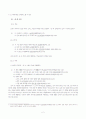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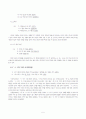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