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 1. 인물간의 관계
Ⅱ. 1. 1. 철학과 학생으로서의 이명준
Ⅱ. 1. 2. 밀실 속에서의 인물들
Ⅱ. 1. 3. 광장 속에서의 인물들
Ⅱ . 2. 남․북 이데올로기의 비판
Ⅱ. 3. 사랑의 문제
Ⅱ. 4. 중립국과 명준의 죽음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Ⅱ. 1. 인물간의 관계
Ⅱ. 1. 1. 철학과 학생으로서의 이명준
Ⅱ. 1. 2. 밀실 속에서의 인물들
Ⅱ. 1. 3. 광장 속에서의 인물들
Ⅱ . 2. 남․북 이데올로기의 비판
Ⅱ. 3. 사랑의 문제
Ⅱ. 4. 중립국과 명준의 죽음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의 자생적인 의지에서 발생하여야 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것은 동구에서 수입된 위로부터의 운동이며, 관이 주도하는 ‘혁명이 아니고 혁명을 흉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 이명준이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최후로 비판하는 것은 먼저 월북한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가장 뚜렷하게 제시된다.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쏘비에트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중략)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 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읍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읍니다. 이남에 있을 땐,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아니 있긴 해도 그건 너무나 더럽고 처참한 광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거기서 탈출하신 건 옳았읍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읍니다.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이 무거운 공기. 어디서 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압착돼 나옵니까? 인민이라구요? 인민이 어디 있읍니까? 자기 정권을 세운 기쁨으로 넘치는 웃음을 얼굴에 지닌 그런 인민이 어디 있읍니까?” 최인훈, 앞의 책, p.128.
남한의 자본주의가 ‘풍문’이듯이 북한의 혁명 또한 ‘풍문’이다. ‘풍문’속에서 살아가는 남한의 대중에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있을 수 없고, ’풍문‘을 듣고 행동하는 북한의 대중들에게 혁명을 하기 위한 뜨거운 피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단 하나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진다는 말로 작가는 양 이데올로기를 다같이 비판하고 있다. 김경윤, 「최인훈 소설 연구-작가의식의 내면화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논문, 1984, pp.44~47.
Ⅱ. 3. 사랑의 문제
한편, 광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주제인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대한 기대의 한 표상으로 제기되었다면, ‘사랑’은 인간에 대한 기대의 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광장’으로 표상되는 공적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데올로기’차원을 거론하고 있다면, ‘밀실’로 상징되는 사적 가치의 차원에서 ‘사랑’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준의 월북이나 중립국행에는 여성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 개입되어 있다.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위기감을 느낀 이명준이 윤애를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아비판의 상처를 은혜와의 사랑으로 견디고자 하는 것은 모두 ‘사랑’에 대한 기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 인식 태도와 서술 방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0, pp.32~33.
‘사랑이란 말의 내포 속에다 인간은 그랬으면 하는 희망의 모든 걸 투영했다. 그런 오류와 헛된 희망과 미신으로 가득찬 언어가 바로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체계를 구축해 놓은 철학자가 노년에 가서 허심 탄회한 저술을 발표하고, 그 결장에서 ‘사랑’을 가져온다. 언어의 바리에이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쏘비에트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중략)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 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읍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읍니다. 이남에 있을 땐,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아니 있긴 해도 그건 너무나 더럽고 처참한 광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거기서 탈출하신 건 옳았읍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읍니다.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이 무거운 공기. 어디서 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압착돼 나옵니까? 인민이라구요? 인민이 어디 있읍니까? 자기 정권을 세운 기쁨으로 넘치는 웃음을 얼굴에 지닌 그런 인민이 어디 있읍니까?” 최인훈, 앞의 책, p.128.
남한의 자본주의가 ‘풍문’이듯이 북한의 혁명 또한 ‘풍문’이다. ‘풍문’속에서 살아가는 남한의 대중에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있을 수 없고, ’풍문‘을 듣고 행동하는 북한의 대중들에게 혁명을 하기 위한 뜨거운 피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단 하나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진다는 말로 작가는 양 이데올로기를 다같이 비판하고 있다. 김경윤, 「최인훈 소설 연구-작가의식의 내면화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논문, 1984, pp.44~47.
Ⅱ. 3. 사랑의 문제
한편, 광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주제인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대한 기대의 한 표상으로 제기되었다면, ‘사랑’은 인간에 대한 기대의 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광장’으로 표상되는 공적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데올로기’차원을 거론하고 있다면, ‘밀실’로 상징되는 사적 가치의 차원에서 ‘사랑’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준의 월북이나 중립국행에는 여성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 개입되어 있다.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위기감을 느낀 이명준이 윤애를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자아비판의 상처를 은혜와의 사랑으로 견디고자 하는 것은 모두 ‘사랑’에 대한 기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 인식 태도와 서술 방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0, pp.32~33.
‘사랑이란 말의 내포 속에다 인간은 그랬으면 하는 희망의 모든 걸 투영했다. 그런 오류와 헛된 희망과 미신으로 가득찬 언어가 바로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체계를 구축해 놓은 철학자가 노년에 가서 허심 탄회한 저술을 발표하고, 그 결장에서 ‘사랑’을 가져온다. 언어의 바리에이
추천자료
 현대소설의 흐름(대중소설)
현대소설의 흐름(대중소설) 고전 소설론
고전 소설론 한국전쟁기 소설의 사회현실과 문학작품과의 조응관계 및 반성적 시각
한국전쟁기 소설의 사회현실과 문학작품과의 조응관계 및 반성적 시각 현대소설론 - 소설속의 공간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 에서의 공간)
현대소설론 - 소설속의 공간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 에서의 공간)  1920년대 소설 속 죽음의 양상
1920년대 소설 속 죽음의 양상 [현대소설 공통] 다음 소설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등장인물의 특징과 갈등양상, 형상화방...
[현대소설 공통] 다음 소설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등장인물의 특징과 갈등양상, 형상화방... 현대소설론- 소설한편을 읽고 등장인물의 특징과 갈등양상, 형상화방식 등을 분석한 후 감상...
현대소설론- 소설한편을 읽고 등장인물의 특징과 갈등양상, 형상화방식 등을 분석한 후 감상... (현대소설론 공통) 다음 두 연작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두 명(연작소설 두 편)을 골라...
(현대소설론 공통) 다음 두 연작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두 명(연작소설 두 편)을 골라... [한국현대소설론] 1950년대 전후 소설 - 1950년대 시대개관과 1950년대 소설가들과 그의 작품들
[한국현대소설론] 1950년대 전후 소설 - 1950년대 시대개관과 1950년대 소설가들과 그의 작품들 현대소설론 = 다음 단편소설 중 두 편을 선택하여 읽은 후 작품에 드러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현대소설론 = 다음 단편소설 중 두 편을 선택하여 읽은 후 작품에 드러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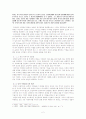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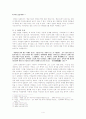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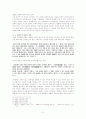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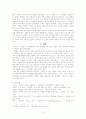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