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사 검토와 연구 방법
Ⅱ. 기녀와 시조의 관계
1. 기녀의 사회적 역할
2. 기녀시조의 발생과정과 특성
Ⅲ. 이별의 수용태도와 주체적 자아인식
1. 이별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수용태도와 의미
2. 주체적 인식 및 의의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사 검토와 연구 방법
Ⅱ. 기녀와 시조의 관계
1. 기녀의 사회적 역할
2. 기녀시조의 발생과정과 특성
Ⅲ. 이별의 수용태도와 주체적 자아인식
1. 이별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수용태도와 의미
2. 주체적 인식 및 의의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본문내용
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있으라고 하였다면 굳이 가겠느냐’라고 함으로써 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님을 떠나보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는 妓女의 時調에서도 일반 부녀자들이 보여주는 志操와 節槪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다. 아래의 두 작품은 妓女라는 신분에서 오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남성들을 상대해야 하지만, 貞操를 지키려는 節槪 妓女의 節槪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조선시대 상층 사대부가문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도덕과 규범이 점차 하층 민간여성에게까지 전파되었고, 특수 계층인 妓女 역시 이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가 돋보이고 있다.
長松으로 를 무어 大同江에 흘니 여
柳一枝 휘여다가 구지구지 야시니
어듸셔 妄伶에거슨 소헤 들나 니
(韓國時調大事典 3556)
위의 時調는 求之의 작품으로, 求之는 平壤의 妓女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다른 기록이 없다. 작가의 꿋꿋한 志操를 과시하는 사랑의 노래다. 큰 소나무로 배를 만들어 대동강 푸른 물에 띄어놓고 강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다가 굳게 배를 묶어 놓았는데 어디서 나타난 망령된 것이 물살이 세게 흐르는 늪으로 들어가랴 하느냐는 내용이다. 대동강에 떠 있는 배는 작자 자신이고 버드나무 한 가지는 작자의 情人이다. 냇가의 버들가지에 굳게 매였다는 말은, 자신은 님의 사랑의 손길에 매였으며, 자기 자신 또한 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망령스런 것’이란 ‘자신을 유혹하는 남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비록 妓女의 몸이기는 하지만 님에게 바친 貞操는 지킨다는 節槪를 노래하고 있다. 김지현, 앞의 논문, 60쪽.
妓女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節槪를 지킨다는 것은 많은 남성들을 접대해야 할 妓女의 신분 상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기녀는 법률적으로 남편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관료에게 수청드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녀가 지조를 지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간혹 기녀의 수절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경우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기녀담으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조광국, 한국문화와 기녀, 월인, 2006, 216쪽.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님에 대한 節槪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부녀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 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妓女들에게는 한 남자를 一夫從事해야 하는 다른 여인들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妓女들이 한 남자에게 節槪를 지킨다고 맹세하는 것은 주위의 요구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솔이 솔이라 여 무 솔만 너겨더니
천수절벽에 낙락장송 긔로다
길아 樵童의 졉낫시야 걸어 볼줄 이시랴
(韓國時調大事典, 2395)
위의 時調는 妓女 松伊의 작품으로, 松伊는 자신의 이름을 音借하여 時調 속에서 부르고 있다. 자기는 절벽에 우뚝 선 푸르고 곧은 소나무와 같아 웬만한 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다는 태도에서 오만할 정도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물론 妓女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貞操를 줄 수 없다는 신분적 저항감이나 사회적 불만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에 대한 반발과 그러한 약점을 보상받고자 하는 상대적인 인식에서 나아가 인간 본연의 정신적 성취감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 자아의식의 발로로 봐야할 것이다. ‘솔이’는 자신의 이름인 ‘松伊’를 우리말로 고쳐 부른 것으로 소나무와 같이 자신의 높은 志操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몸은 비록 妓女이지만 작자의 뜻은 누구보다도 고고하고 의연한 것님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 ‘소나무’이기에 더더욱 志操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다짐이 당당하게 나타나 있으며 표현 또한 문학성이 돋보인다. 李和榮, 시조에 나타난 기녀들의 존재의식 탐구 -절대적 님에서 주체적 자아까지-, 韓國言語文學46, 한국언어문학회, 2001, 133쪽.
이렇듯 妓女작가들이 보이는 志操와 節槪는 사회적인 요구나 강요, 의무에서라기보다는 妓女 자신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부녀자들에게서 보이는 貞節 意識이 당시 사회의 공통적인 정서라면, 일부 妓女들의 時調에서 보이는 貞節 意識은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千里에 맛낫다가 千里에 離別니
千里 속에 千里 님 보거고나
야 다시금 生覺니 눈물 계워 노라.
(韓國時調大事典, 1069)
康江月의 時調이다. 字는 天心이고, 孟山의 妓女로 알려져 있다.『樂學拾零』과 서울대본 『樂府』에만 3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두 가집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樂學拾零』의 작가 목록에 “字天心 孟山妓”라고 기록한 것밖에 참고할 것이 없다. 수록문헌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의 妓女라 믿어진다. 黃忠基, 앞의 책. 145쪽.
康江月의 대표적 시로 알려진 이 時調는 님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千里\'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님과의 만남과 이별이 매우 힘들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 때 \'千里\'라는 거리는 실질적이고 자연적인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 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느낀 심리적인 거리이다. 님과의 만남과 사랑은 千里라는 거리가 말해주듯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한 님조차도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 현실에서는 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 작품은 千里라는 단어의 반복 사용으로 불가능한 애정의 면모를 절실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千里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창으로 부를 때의 노래적인 요소를 고려한 듯한 태도가 보인다.
2. 주체적 인식 및 의의
이별을 노래하고 있는 妓女時調에 등장하는 여성적 자아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태도가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그녀들의 인식 자체가 수동적이라 평하는 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시각이다. 전통 사회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녀들의 태도를 수동적인 자아로만 인식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聖恩를 아조 닛고 高堂鶴髮 모로고져
獄中에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는 妓女의 時調에서도 일반 부녀자들이 보여주는 志操와 節槪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다. 아래의 두 작품은 妓女라는 신분에서 오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남성들을 상대해야 하지만, 貞操를 지키려는 節槪 妓女의 節槪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조선시대 상층 사대부가문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도덕과 규범이 점차 하층 민간여성에게까지 전파되었고, 특수 계층인 妓女 역시 이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가 돋보이고 있다.
長松으로 를 무어 大同江에 흘니 여
柳一枝 휘여다가 구지구지 야시니
어듸셔 妄伶에거슨 소헤 들나 니
(韓國時調大事典 3556)
위의 時調는 求之의 작품으로, 求之는 平壤의 妓女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다른 기록이 없다. 작가의 꿋꿋한 志操를 과시하는 사랑의 노래다. 큰 소나무로 배를 만들어 대동강 푸른 물에 띄어놓고 강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다가 굳게 배를 묶어 놓았는데 어디서 나타난 망령된 것이 물살이 세게 흐르는 늪으로 들어가랴 하느냐는 내용이다. 대동강에 떠 있는 배는 작자 자신이고 버드나무 한 가지는 작자의 情人이다. 냇가의 버들가지에 굳게 매였다는 말은, 자신은 님의 사랑의 손길에 매였으며, 자기 자신 또한 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망령스런 것’이란 ‘자신을 유혹하는 남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비록 妓女의 몸이기는 하지만 님에게 바친 貞操는 지킨다는 節槪를 노래하고 있다. 김지현, 앞의 논문, 60쪽.
妓女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節槪를 지킨다는 것은 많은 남성들을 접대해야 할 妓女의 신분 상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기녀는 법률적으로 남편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관료에게 수청드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녀가 지조를 지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간혹 기녀의 수절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경우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기녀담으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조광국, 한국문화와 기녀, 월인, 2006, 216쪽.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님에 대한 節槪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부녀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 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妓女들에게는 한 남자를 一夫從事해야 하는 다른 여인들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妓女들이 한 남자에게 節槪를 지킨다고 맹세하는 것은 주위의 요구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였음을 알 수 있다.
솔이 솔이라 여 무 솔만 너겨더니
천수절벽에 낙락장송 긔로다
길아 樵童의 졉낫시야 걸어 볼줄 이시랴
(韓國時調大事典, 2395)
위의 時調는 妓女 松伊의 작품으로, 松伊는 자신의 이름을 音借하여 時調 속에서 부르고 있다. 자기는 절벽에 우뚝 선 푸르고 곧은 소나무와 같아 웬만한 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다는 태도에서 오만할 정도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물론 妓女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貞操를 줄 수 없다는 신분적 저항감이나 사회적 불만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에 대한 반발과 그러한 약점을 보상받고자 하는 상대적인 인식에서 나아가 인간 본연의 정신적 성취감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 자아의식의 발로로 봐야할 것이다. ‘솔이’는 자신의 이름인 ‘松伊’를 우리말로 고쳐 부른 것으로 소나무와 같이 자신의 높은 志操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몸은 비록 妓女이지만 작자의 뜻은 누구보다도 고고하고 의연한 것님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 ‘소나무’이기에 더더욱 志操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다짐이 당당하게 나타나 있으며 표현 또한 문학성이 돋보인다. 李和榮, 시조에 나타난 기녀들의 존재의식 탐구 -절대적 님에서 주체적 자아까지-, 韓國言語文學46, 한국언어문학회, 2001, 133쪽.
이렇듯 妓女작가들이 보이는 志操와 節槪는 사회적인 요구나 강요, 의무에서라기보다는 妓女 자신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부녀자들에게서 보이는 貞節 意識이 당시 사회의 공통적인 정서라면, 일부 妓女들의 時調에서 보이는 貞節 意識은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千里에 맛낫다가 千里에 離別니
千里 속에 千里 님 보거고나
야 다시금 生覺니 눈물 계워 노라.
(韓國時調大事典, 1069)
康江月의 時調이다. 字는 天心이고, 孟山의 妓女로 알려져 있다.『樂學拾零』과 서울대본 『樂府』에만 3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두 가집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樂學拾零』의 작가 목록에 “字天心 孟山妓”라고 기록한 것밖에 참고할 것이 없다. 수록문헌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의 妓女라 믿어진다. 黃忠基, 앞의 책. 145쪽.
康江月의 대표적 시로 알려진 이 時調는 님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千里\'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님과의 만남과 이별이 매우 힘들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 때 \'千里\'라는 거리는 실질적이고 자연적인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 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느낀 심리적인 거리이다. 님과의 만남과 사랑은 千里라는 거리가 말해주듯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한 님조차도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 현실에서는 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 작품은 千里라는 단어의 반복 사용으로 불가능한 애정의 면모를 절실하게 그리고 있다. 또한 千里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창으로 부를 때의 노래적인 요소를 고려한 듯한 태도가 보인다.
2. 주체적 인식 및 의의
이별을 노래하고 있는 妓女時調에 등장하는 여성적 자아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태도가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그녀들의 인식 자체가 수동적이라 평하는 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시각이다. 전통 사회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녀들의 태도를 수동적인 자아로만 인식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聖恩를 아조 닛고 高堂鶴髮 모로고져
獄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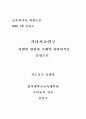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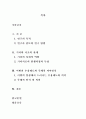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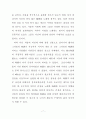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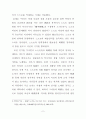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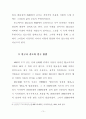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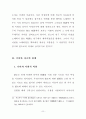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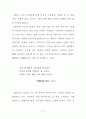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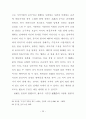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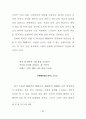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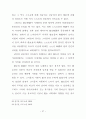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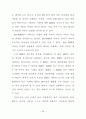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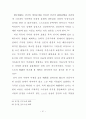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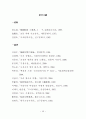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