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낭만주의의 의미와 우리나라 낭만주의의 수용
3. 낭만주의 특징과 낭만주의 시인별 작품
3.1. 한국 낭만주의 시의 특징
3.2. 낭만주의 시인별 주요 작품
3.2.1 주요한의 <불놀이>
3.2.2 홍사용의 <나는 王이로소이다>
3.2.3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4. 낭만주의 시의 한계와 평가
<참고문헌>
2. 낭만주의의 의미와 우리나라 낭만주의의 수용
3. 낭만주의 특징과 낭만주의 시인별 작품
3.1. 한국 낭만주의 시의 특징
3.2. 낭만주의 시인별 주요 작품
3.2.1 주요한의 <불놀이>
3.2.2 홍사용의 <나는 王이로소이다>
3.2.3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4. 낭만주의 시의 한계와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無情)한 물결이 그 그림자를 멈출 리가 있으랴?....
아아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건마는, 가신 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이 설움 살라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겨울에는 말랐던 꽃이 어느덧 피었더라마는 사랑의 봄은 또다시 안 돌아오는가, 차라리 속시원히 오늘밤 이 물 속에…… 그러면 행여나 불쌍히 여겨줄 이나 있을까…… 할 적에 퉁, 탕 불티를 날리면서 튀어나는 매화포, 펄떡 정신(精神)을 차리니 우구우구 떠드는 구경꾼의 소리가 저를 비웃는 듯, 꾸짖는 듯,
좀더 강렬(强烈)한 열정(熱情)에 살고 싶다, 저기 저 횃불처럼 엉기는 연기(煙氣), 숨막히는 불꽃의 고통(苦痛) 속에서라도 더욱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고 뜻밖에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나의 마음…….
- <불노리>의 일부 -
<불노리>의 중심적인 심상은 사월 초파일 밤의 연등제 속에서 ‘가신 님’에 대한 회상으로 시적 화자가 남다르게 겪는 비애의 감정이다. 시의 문맥에서 ‘가신 님’은 물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에 놓인 사사로운 존재이다. 그렇지만 당시 현실의 여건상 시인이 설정한 사별의 님은 시인으로 하여금 묵은 삶의 질서와 감정을 벗어나 남다른 감정 체험을 환기 시키는 중요한 매개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노리>에서 ‘가신 님’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화자의 감정을 정리하는 복잡한 상징성을 함축한 대상으로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의 낭만주의적인 시에서 나타나는 ‘님’의 의미는 대체로 이와 같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 현실에서 소외된 자아의 내면화된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신 님’은 삶의 희망이 거세된 자아의 정체성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가신 님’을 생각하는 화자의 슬픔은 축제의 밤과 대비되면서 더욱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의 비탄과 좌절감에 잠기다가, 다음 순간 ‘우구구 떠드는 구경군의 소리가 저를 비웃는 듯, 꾸짖는 듯’한 현실을 깨달으며 스스로의 번민과 연민이 다시 생의 환희를 받아들이면서 “고통 속에서라도 더욱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는 심정을 읊조리고 있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탄에 젖어 있던 감정으로부터 강렬한 생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계기가 합리적 이성에 의한 관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노리’하는 객관적 현실의 광경을 화자가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고 지각적 충동에 의해서 바로 감정적 초월을 일으키는 낭만주의적 발상이다. 시인은 관념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인상을 매개로 한 예술적 직관에 의해서 새로운 초월의 세계를 미적 감정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불노리>의 지배적인 감정은 슬픔이지만 슬픔에 섞여 생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갈망이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불노리>의 낭만적 슬픔은 현실에 매여 있는 에너지가 새로운 출구를 찾아 들끓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극적 감정이 새로운 희망의 욕구로 반전하는 장면은 횃불, 매화포 소리, 군중의 환호에 찬 광경 등을 배치함으로써 내면의 어둠에서 현실의 밝음으로 유도되는 배경이 되며 이러한 시적 의장은 정적인 의미공간에 새로운 긴장과 극적인 효과를 유기적으로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낭만적 감정은 이렇게 과거의 질서 속에서는 절망과 비애로 나타나는 심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희망과 신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인 것이다. 이영섭,『한국 현대시 형성 연구』2000, 국학자료원, pp.19~21.
따라서 주요한은 <불놀이>에서의 낭만적 발상은 이후 낭만주의의 시를 이끄는 선두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2 홍사용의 <나는 王이로소이다>
홍사용은《백조》의 간행 경비로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백조파 동인의 주역이었다. 홍사용은《백조》파의 다른 시인들과는 달리 서구 지향적인 자유시에의 경도와 회월과 월탄, 상화 등의 퇴폐적 낭만성 등을 거부하며 전통 지향적 맥락에서 순수서정시를 쓰려고 노력했다. 이것은《백조》(2호)에 六號雜記에서 잘 드러난다.
“무엇을 흉내낸다고 민족적 리듬까지 죽여버리고 아무 뜻도 없는 변주옥을 만들어냄은 매우 유감이올시다. 이런 점은 신시에서 더욱 많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누가 잘못함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행방이 불분명하고 사상이 불건강한 우리 문단 자신의 죄이겠지요. 그러나 될 수만 있거든 아무쪼록 순정한 감정을 그대로
아아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건마는, 가신 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이 설움 살라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겨울에는 말랐던 꽃이 어느덧 피었더라마는 사랑의 봄은 또다시 안 돌아오는가, 차라리 속시원히 오늘밤 이 물 속에…… 그러면 행여나 불쌍히 여겨줄 이나 있을까…… 할 적에 퉁, 탕 불티를 날리면서 튀어나는 매화포, 펄떡 정신(精神)을 차리니 우구우구 떠드는 구경꾼의 소리가 저를 비웃는 듯, 꾸짖는 듯,
좀더 강렬(强烈)한 열정(熱情)에 살고 싶다, 저기 저 횃불처럼 엉기는 연기(煙氣), 숨막히는 불꽃의 고통(苦痛) 속에서라도 더욱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고 뜻밖에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나의 마음…….
- <불노리>의 일부 -
<불노리>의 중심적인 심상은 사월 초파일 밤의 연등제 속에서 ‘가신 님’에 대한 회상으로 시적 화자가 남다르게 겪는 비애의 감정이다. 시의 문맥에서 ‘가신 님’은 물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에 놓인 사사로운 존재이다. 그렇지만 당시 현실의 여건상 시인이 설정한 사별의 님은 시인으로 하여금 묵은 삶의 질서와 감정을 벗어나 남다른 감정 체험을 환기 시키는 중요한 매개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노리>에서 ‘가신 님’은 과거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화자의 감정을 정리하는 복잡한 상징성을 함축한 대상으로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의 낭만주의적인 시에서 나타나는 ‘님’의 의미는 대체로 이와 같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 현실에서 소외된 자아의 내면화된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신 님’은 삶의 희망이 거세된 자아의 정체성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가신 님’을 생각하는 화자의 슬픔은 축제의 밤과 대비되면서 더욱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의 비탄과 좌절감에 잠기다가, 다음 순간 ‘우구구 떠드는 구경군의 소리가 저를 비웃는 듯, 꾸짖는 듯’한 현실을 깨달으며 스스로의 번민과 연민이 다시 생의 환희를 받아들이면서 “고통 속에서라도 더욱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는 심정을 읊조리고 있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탄에 젖어 있던 감정으로부터 강렬한 생에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계기가 합리적 이성에 의한 관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노리’하는 객관적 현실의 광경을 화자가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고 지각적 충동에 의해서 바로 감정적 초월을 일으키는 낭만주의적 발상이다. 시인은 관념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인상을 매개로 한 예술적 직관에 의해서 새로운 초월의 세계를 미적 감정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불노리>의 지배적인 감정은 슬픔이지만 슬픔에 섞여 생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갈망이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불노리>의 낭만적 슬픔은 현실에 매여 있는 에너지가 새로운 출구를 찾아 들끓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극적 감정이 새로운 희망의 욕구로 반전하는 장면은 횃불, 매화포 소리, 군중의 환호에 찬 광경 등을 배치함으로써 내면의 어둠에서 현실의 밝음으로 유도되는 배경이 되며 이러한 시적 의장은 정적인 의미공간에 새로운 긴장과 극적인 효과를 유기적으로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낭만적 감정은 이렇게 과거의 질서 속에서는 절망과 비애로 나타나는 심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희망과 신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인 것이다. 이영섭,『한국 현대시 형성 연구』2000, 국학자료원, pp.19~21.
따라서 주요한은 <불놀이>에서의 낭만적 발상은 이후 낭만주의의 시를 이끄는 선두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2 홍사용의 <나는 王이로소이다>
홍사용은《백조》의 간행 경비로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백조파 동인의 주역이었다. 홍사용은《백조》파의 다른 시인들과는 달리 서구 지향적인 자유시에의 경도와 회월과 월탄, 상화 등의 퇴폐적 낭만성 등을 거부하며 전통 지향적 맥락에서 순수서정시를 쓰려고 노력했다. 이것은《백조》(2호)에 六號雜記에서 잘 드러난다.
“무엇을 흉내낸다고 민족적 리듬까지 죽여버리고 아무 뜻도 없는 변주옥을 만들어냄은 매우 유감이올시다. 이런 점은 신시에서 더욱 많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누가 잘못함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행방이 불분명하고 사상이 불건강한 우리 문단 자신의 죄이겠지요. 그러나 될 수만 있거든 아무쪼록 순정한 감정을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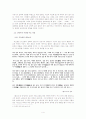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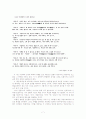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