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객체 높임법
2. 2. 1.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2. 2. 2. 객체 높임법의 실현 양상
2. 2. 3. 특수 어휘에 의한 객체 높임
2. 2. 4. 객체 높임법에 대한 다른 견해
3. 맺음말
<그림 1> 허웅의 15세기 국어 높임법 체계
<그림 2> 고영근의 15세기 국어의 존비법과 공대법
<표 1>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허웅, 1975:691)
<표 2>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와 모음(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
2. 객체 높임법
2. 2. 1.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2. 2. 2. 객체 높임법의 실현 양상
2. 2. 3. 특수 어휘에 의한 객체 높임
2. 2. 4. 객체 높임법에 대한 다른 견해
3. 맺음말
<그림 1> 허웅의 15세기 국어 높임법 체계
<그림 2> 고영근의 15세기 국어의 존비법과 공대법
<표 1>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허웅, 1975:691)
<표 2>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와 모음(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
본문내용
15세기 국어의 객체 높임법 또는 겸손법
1. 머리말
고등학교『문법』교과서(2010:173)에서는 높임법을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라고 한다.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높임의 대상이 듣는 이일 경우에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둘째, 높이는 대상이 문장의 주체(주로 주어로 나타난다.)인 경우에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셋째,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로 표현되는 대상일 경우에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높임법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상대, 주체, 객체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으며, 신분상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도, 상황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먼저 허웅(1975:655~656)에서 15세기 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림 1> 허웅의 15세기 국어 높임법 체계
높임
들을이를 높임 상대 높임
안높임
높임법 직접 높임
주체를 높임- 주체 높임
말에 등장된 사람을 높임
간접 높임
객체를 높임- 객체 높임
이에 비해 고영근(2011:322-339)에서는 현행 학교 문법의 국어의 높임 표현을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고영근에서는 허웅의 높임법을 ‘사람과 관련된 문법 범주’의 하나인 ‘결어법’과 ‘존비법’으로 처리한다. 고영근(2011:305)에서는 종결어미로써 한 문장을 맺는 활용법을 결어법이라 한다. 이 결어법에는 한 문장을 진술, 물음, 시킴 등으로 끝맺는 기능적 범주인 문체법과 한 문장을 해라, 하게, 합쇼 등으로 끝맺는 사회적 범주라고 한다. 그러나 두 범주는 독립된 것이 아니다. 존비법은 다시 존비법은 다시 ‘라체, 야써체, 쇼
1. 머리말
고등학교『문법』교과서(2010:173)에서는 높임법을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라고 한다.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높임의 대상이 듣는 이일 경우에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둘째, 높이는 대상이 문장의 주체(주로 주어로 나타난다.)인 경우에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셋째,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로 표현되는 대상일 경우에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높임법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상대, 주체, 객체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으며, 신분상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도, 상황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먼저 허웅(1975:655~656)에서 15세기 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림 1> 허웅의 15세기 국어 높임법 체계
높임
들을이를 높임 상대 높임
안높임
높임법 직접 높임
주체를 높임- 주체 높임
말에 등장된 사람을 높임
간접 높임
객체를 높임- 객체 높임
이에 비해 고영근(2011:322-339)에서는 현행 학교 문법의 국어의 높임 표현을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고영근에서는 허웅의 높임법을 ‘사람과 관련된 문법 범주’의 하나인 ‘결어법’과 ‘존비법’으로 처리한다. 고영근(2011:305)에서는 종결어미로써 한 문장을 맺는 활용법을 결어법이라 한다. 이 결어법에는 한 문장을 진술, 물음, 시킴 등으로 끝맺는 기능적 범주인 문체법과 한 문장을 해라, 하게, 합쇼 등으로 끝맺는 사회적 범주라고 한다. 그러나 두 범주는 독립된 것이 아니다. 존비법은 다시 존비법은 다시 ‘라체, 야써체, 쇼
추천자료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대하여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 대하여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의 법적과제와 대응방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의 법적과제와 대응방안 한일의 특허분쟁과 대응전략
한일의 특허분쟁과 대응전략 민법에 관한 정리-의의, 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법에 관한 정리-의의, 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특허법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특허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서술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서술 피해자 소송법상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피해자 소송법상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 [성, 사랑, 사회 A형]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성, 사랑, 사회 A형]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와 객체의 개념과 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객체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와 객체의 개념과 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 객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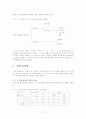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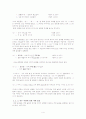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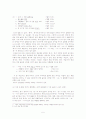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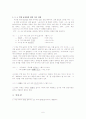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