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고전소설의 특징
1. 고전소설은 서사 구조와 장면의 특질을 모두 가진다
2. 고전소설의 경우 모두 그 캐릭터의 의미가 중심적으로 부각된다
3. 고전소설에서 나타난 특정 사건의 등장
4. 고전소설의 경우 신이성, 환상성이 그 큰 특징
Ⅲ. 고전소설의 의의
Ⅳ.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현실성
1.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인물의 개성이 부각
2. 인물이 추상적 규범에 의해 재단되지 않음
3. 인물의 외적이고 공식적인 면모보다 사적인 면모가 관심대상
4. 인물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상화
Ⅴ.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가부장 사회
Ⅵ.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사회적 성격
Ⅶ.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와 연극
1. 갈등구조
2. 주요인물분석
Ⅷ. 결론
참고문헌
Ⅱ. 고전소설의 특징
1. 고전소설은 서사 구조와 장면의 특질을 모두 가진다
2. 고전소설의 경우 모두 그 캐릭터의 의미가 중심적으로 부각된다
3. 고전소설에서 나타난 특정 사건의 등장
4. 고전소설의 경우 신이성, 환상성이 그 큰 특징
Ⅲ. 고전소설의 의의
Ⅳ.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현실성
1.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인물의 개성이 부각
2. 인물이 추상적 규범에 의해 재단되지 않음
3. 인물의 외적이고 공식적인 면모보다 사적인 면모가 관심대상
4. 인물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상화
Ⅴ.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가부장 사회
Ⅵ.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사회적 성격
Ⅶ.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와 연극
1. 갈등구조
2. 주요인물분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네 근본을 들으니 불과 길가의 아이로 노파의 양육한 바라 하거늘, 감히 내 말에 답하지 않으니 중히 다스릴 것이로되, 나이 어리다 하매 용서하나니 이리와 의건(衣巾)을 벗기라.”(…) 윤혜가 천만 뜻밖에 이런 상황을 당하니 옥 같은 얼굴이 찬 재 같아서 한마디 못하고 생에게 후린 바 되어 눈물이 줄줄 흐른다. 생이 가 거동을 더욱 연애하여 은근히 달래어 촛불을 물리치고 잠자리에 나아가니 윤혜 망극하여 크게 울고 왈, “차마 나를 이런 곳에 밀칠 줄 알리오. 내 비록 미천하나 장씨댁 시녀가 아니니 임의로 무례하지 못하리라.” 인하여 얼굴을 벽에 부딪쳐 죽으려 서두니 놀라며 두려워하는 거동이 생의 마음을 흔든다. 학사가 큰손으로 그 몸을 후리쳐 안고 왈, “네 근본이 비록 양반댁 규수라도 이때를 당해서는 속절없으니 부질없이 굴지 말고 훌륭한 낭군의 첩이 되어 부귀를 누리라.” 말을 마치며 핍박하여 나아가니 윤혜 비록 죽을힘을 다해 물리치나 생은 한참 나이요 미인 길들이기에 익숙한지라, 어찌 나이 어린 여자를 이기지 못하리오. 즐거운 마음 교칠 같구나. 윤혜 낙담하고 상혼(傷魂)하여 일신을 안접지 못하게 떨고 몸빛이 흙 같으니, 생은 절대미인의 아름다운 몸을 어루매만 가지 풍류가 형언할 바 없더라.
어처구니없는 폭력적 강간이다. 흙빛이 되어 떨고 있는 어린 여인을 완력으로 범하며 환희를 느끼고 있는 저 사람. 그러면서도 너무나 당당 거만한 저 적반하장(賊反荷杖)!
이 야만적인 현수문의 행위 이상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 있으니, 그 상황을 둘러싼 주변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그것이다. 현수문은 윤혜를 남 몰래 범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 하소저에게 뜻을 밝혀 동의를 얻는다. 그리고 외사촌 장생 형제와는 이 일을 놓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긴다. 이러한 주변사람들의 태도는 현수문이 완력으로 윤혜를 겁간한 뒤에도 변하지 않는다. 하소저와 장생 형제는 물론이고 추후에 그 일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 곧 현경문, 장시랑, 장부인, 현택지 등이 모두 현수문의 행동을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고 ‘있을 만한 일’로 받아들인다. 그 일을 화제로 하여 서로 웃고 즐기기까지 한다.
Ⅵ.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사회적 성격
<현씨양웅쌍린기>는 장편소설 작품이지만, 그 기본 갈등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 작품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갈등은 남녀갈등, 부부갈등으로서, 현수문과 윤소저가 하나의 대립쌍을 이루고, 현경문과 주소저가 또 다른 대립쌍을 이룬다. 그 네 인물이 갈등의 기본 당사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여러 주변인물들--후부인, 육소저, 형아, 일부 시비, 현택지 등--이 부수적으로 갈등에 가담한다. 서로 교체되면서 서술되고 있는 두 쌍의 갈등은 섬세한 심리분석과 개연성있는 상황설정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실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작품의 갈등구조상 주목되는 것은 ‘가문간의 갈등’이라는 요소가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녀갈등’, ‘혼사갈등’을 문제삼는 대다수 장편소설에 있어 남녀의 결합이 가문간의 결합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결합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가문의 선양이라는 의미지향이 표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있어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중심부에 놓이지 않는다. 현수문 형제나 주소저, 윤소저는 가문의 대표자나 가문 결합의 매개자로서 작품에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갖춘 개인으로 부각된다. 그들은 가문의 명예라는 가치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과 가치관에 입각해 스스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부딪치는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작품 속의 인물이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 전개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이 작품이 추상적인 관념의 차원이 아닌 구체적 현실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個我로서의 인간이 현실 속에서 피부로 부딪는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작품의 갈등이 그 본질에 있어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외견상 인물들의 서로 다른 성격에 따른 개인적 갈등이라는 면모가 부각되지만, 그 싸움의 중심부에는 실상 사회제도관념이라는 요소가 가로놓여 있다. 각 인물은 사회제도나 관념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있으면서 거기 대해 서로 다른 대응방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대응방식이 맞부딪침으로써 갈등이 성립된다. 이제 그 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수문과 윤소저의 갈등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첫 만남의 상황에서 뚜렷이 드러난다.--부모가 맺어준 부인 하소저와 금슬을 이루고 同樂하던 현수문은 비범한 인물이지만 여색을 탐하는 기질이 있었다. 그는 외가인 장시랑 댁에 갔다가 우연히 베를 짜는 여인을 발견하고서는 그 방에 들어가 말을 붙이려 한다. 그러나 놀란 여인은 말대답을 하지 않는다. 여인의 미모에 끌려 그녀를 취할 마음을 먹은 현수문은 유모로부터 그녀가 어려서 길에서 주워 기른 근본을 모르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서는 “연 더옥 오리니 졔 각여도 용부슉의 졍실 되니의셔 낫지 아니랴”(제1권, p.173) 하고 즐거워한다. 그는 집에 돌아와 부인 하소저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 동의를 얻으며, 밤에 다시 외가로 와서 장생 형제에게 그녀를 취할 계획을 밝히고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긴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홀로 있는 방으로 당당히 찾아 들어가 그녀를 핍박하여 관계를 맺으려 한다. 그 여인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만 결국은 현수문의 완력에 굴복당하고 만다. 그 정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일위 남 은연이 드러오니 윤혜 대경실여 급히 몸을 두로혀 나고져 남 문을 당여 안니 어로 가리오. 아모리 줄 모더니 이 소 엄히 여 왈 “네 근본을 드니 블과 노변 질로 셜구의 양휵 배라 거 감히 노야의 말을 답지 아니니 O히 다릴 거시로 나히 어리다 용셔니 아와 의건을 벗기라.”(…) 혜 쳔만 의외예 이 경상을 당니 옥면이 찬 여 일언을 못고 의 원비의 후리인 되여 옥뉘 방방니 이 그 거동을 더옥 년여 은근이 달여
어처구니없는 폭력적 강간이다. 흙빛이 되어 떨고 있는 어린 여인을 완력으로 범하며 환희를 느끼고 있는 저 사람. 그러면서도 너무나 당당 거만한 저 적반하장(賊反荷杖)!
이 야만적인 현수문의 행위 이상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 있으니, 그 상황을 둘러싼 주변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그것이다. 현수문은 윤혜를 남 몰래 범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 하소저에게 뜻을 밝혀 동의를 얻는다. 그리고 외사촌 장생 형제와는 이 일을 놓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긴다. 이러한 주변사람들의 태도는 현수문이 완력으로 윤혜를 겁간한 뒤에도 변하지 않는다. 하소저와 장생 형제는 물론이고 추후에 그 일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 곧 현경문, 장시랑, 장부인, 현택지 등이 모두 현수문의 행동을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고 ‘있을 만한 일’로 받아들인다. 그 일을 화제로 하여 서로 웃고 즐기기까지 한다.
Ⅵ.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쌍린기(현씨양웅전)의 사회적 성격
<현씨양웅쌍린기>는 장편소설 작품이지만, 그 기본 갈등구조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이 작품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갈등은 남녀갈등, 부부갈등으로서, 현수문과 윤소저가 하나의 대립쌍을 이루고, 현경문과 주소저가 또 다른 대립쌍을 이룬다. 그 네 인물이 갈등의 기본 당사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여러 주변인물들--후부인, 육소저, 형아, 일부 시비, 현택지 등--이 부수적으로 갈등에 가담한다. 서로 교체되면서 서술되고 있는 두 쌍의 갈등은 섬세한 심리분석과 개연성있는 상황설정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실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작품의 갈등구조상 주목되는 것은 ‘가문간의 갈등’이라는 요소가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녀갈등’, ‘혼사갈등’을 문제삼는 대다수 장편소설에 있어 남녀의 결합이 가문간의 결합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결합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가문의 선양이라는 의미지향이 표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 있어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중심부에 놓이지 않는다. 현수문 형제나 주소저, 윤소저는 가문의 대표자나 가문 결합의 매개자로서 작품에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갖춘 개인으로 부각된다. 그들은 가문의 명예라는 가치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과 가치관에 입각해 스스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부딪치는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작품 속의 인물이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 전개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이 작품이 추상적인 관념의 차원이 아닌 구체적 현실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個我로서의 인간이 현실 속에서 피부로 부딪는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작품의 갈등이 그 본질에 있어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외견상 인물들의 서로 다른 성격에 따른 개인적 갈등이라는 면모가 부각되지만, 그 싸움의 중심부에는 실상 사회제도관념이라는 요소가 가로놓여 있다. 각 인물은 사회제도나 관념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있으면서 거기 대해 서로 다른 대응방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대응방식이 맞부딪침으로써 갈등이 성립된다. 이제 그 갈등의 양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수문과 윤소저의 갈등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첫 만남의 상황에서 뚜렷이 드러난다.--부모가 맺어준 부인 하소저와 금슬을 이루고 同樂하던 현수문은 비범한 인물이지만 여색을 탐하는 기질이 있었다. 그는 외가인 장시랑 댁에 갔다가 우연히 베를 짜는 여인을 발견하고서는 그 방에 들어가 말을 붙이려 한다. 그러나 놀란 여인은 말대답을 하지 않는다. 여인의 미모에 끌려 그녀를 취할 마음을 먹은 현수문은 유모로부터 그녀가 어려서 길에서 주워 기른 근본을 모르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서는 “연 더옥 오리니 졔 각여도 용부슉의 졍실 되니의셔 낫지 아니랴”(제1권, p.173) 하고 즐거워한다. 그는 집에 돌아와 부인 하소저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 동의를 얻으며, 밤에 다시 외가로 와서 장생 형제에게 그녀를 취할 계획을 밝히고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긴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홀로 있는 방으로 당당히 찾아 들어가 그녀를 핍박하여 관계를 맺으려 한다. 그 여인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만 결국은 현수문의 완력에 굴복당하고 만다. 그 정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일위 남 은연이 드러오니 윤혜 대경실여 급히 몸을 두로혀 나고져 남 문을 당여 안니 어로 가리오. 아모리 줄 모더니 이 소 엄히 여 왈 “네 근본을 드니 블과 노변 질로 셜구의 양휵 배라 거 감히 노야의 말을 답지 아니니 O히 다릴 거시로 나히 어리다 용셔니 아와 의건을 벗기라.”(…) 혜 쳔만 의외예 이 경상을 당니 옥면이 찬 여 일언을 못고 의 원비의 후리인 되여 옥뉘 방방니 이 그 거동을 더옥 년여 은근이 달여
추천자료
 [고전소설][운영전][고전문학][고전][소설]고전소설 운영전의 특징, 고전소설 운영전의 소개,...
[고전소설][운영전][고전문학][고전][소설]고전소설 운영전의 특징, 고전소설 운영전의 소개,... [고전소설][고대소설][영화화][게임화][시트콤화][동화화]고전소설(고대소설)의 영화화와 고...
[고전소설][고대소설][영화화][게임화][시트콤화][동화화]고전소설(고대소설)의 영화화와 고... [고소설][고전소설]고소설(고전소설)과 동화, 고소설(고전소설)과 영화, 고소설(고전소설)과 ...
[고소설][고전소설]고소설(고전소설)과 동화, 고소설(고전소설)과 영화, 고소설(고전소설)과 ... 고전소설(고소설) 춘향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심청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홍...
고전소설(고소설) 춘향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심청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홍... [판소리계 고전소설][흥부전]판소리계 고전소설 흥부전, 판소리계 고전소설 양반전, 판소리계...
[판소리계 고전소설][흥부전]판소리계 고전소설 흥부전, 판소리계 고전소설 양반전, 판소리계... [판소리계 고전소설 장끼전]판소리계 고전소설 장끼전의 줄거리, 판소리계 고전소설 장끼전의...
[판소리계 고전소설 장끼전]판소리계 고전소설 장끼전의 줄거리, 판소리계 고전소설 장끼전의... [고전소설(고소설)]고전소설(고소설)의 분류, 고전소설(고소설)의 연구, 고전소설(고소설)의 ...
[고전소설(고소설)]고전소설(고소설)의 분류, 고전소설(고소설)의 연구, 고전소설(고소설)의 ... [고전소설]고전소설의 성격, 고전소설의 소재, 고전소설의 구성,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
[고전소설]고전소설의 성격, 고전소설의 소재, 고전소설의 구성,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 고소설(고전소설) 임진록 작품분석, 고소설(고전소설) 사씨남정기, 고소설(고전소설) 위경천...
고소설(고전소설) 임진록 작품분석, 고소설(고전소설) 사씨남정기, 고소설(고전소설) 위경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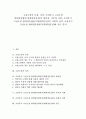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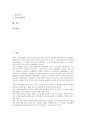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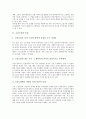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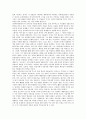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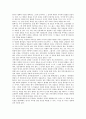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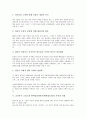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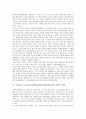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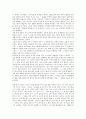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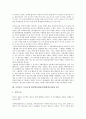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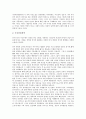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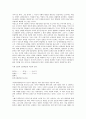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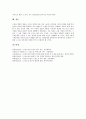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