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말
1. 가슴에 묻은 모정 - 어머니
2. 말의 느낌을 살리다 - 말(말의 운용)
3. 역사 속으로- 역사
4. 붉은 광기 - 성[性]과 폭력성
Ⅲ. 나오는 말
Ⅳ. 참고자료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Ⅱ. 본말
1. 가슴에 묻은 모정 - 어머니
2. 말의 느낌을 살리다 - 말(말의 운용)
3. 역사 속으로- 역사
4. 붉은 광기 - 성[性]과 폭력성
Ⅲ. 나오는 말
Ⅳ. 참고자료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본문내용
之(갈 지)’자 대신으로 손색이 없다.
‘ㄹ’이라는 글자가 가진 특성을 살려 짧지만 움직임을 느낄 주는 시 <남도>. 전반적인 시 분위기가 밝다. 시집 『물 속의 불』에 실린 시들 중 몇 안 되는 밝은 느낌의 시다.
춤꾼 이씨 이대흠, Op. cit., 31쪽.
북은 치는 것이 아니여
타는 것이제
더덩더덩 덩따쿵따
가락을 따라감서 손을 움직이면
어긋나는 것이여
가락이 몬야 쩌만치 가불제
떵따쿵따 덩따쿵따
그냥 가락에 몸을 얹어사제
춤도 추는 것이 아니여
아아리아아리라아앙 하먼
아리랑이랑 고대로 흘러가고
쓰으리쓰으리라아랑 하먼
쓰리랑이랑 고대로 쓸려가고
아리리가 났네 하먼
아라리 뒤쫓지 말고
먼첨 아리리가 나부러사 써
귀로 듣는 아라리에 몸 맞추지 말고
이녁 몸 속 아라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제
- 민요와 사투리, 그리고 우리 춤 <춤꾼 이씨>.
아리랑의 가락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법이 춤꾼 이씨의 말을 빌어 소개된다. 이씨는 악기도, 춤도 그 자체에 얽매여 연주되고 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락에 맞춰 흐름을 타면서 연주되고 춰져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춤꾼답게 춤에 대해 좀 더 알려주고 있는데, 마지막 3연에 가서 춤은 흐름을 타는 것마저 뛰어넘어 가락 그 자체가 몸을 빌어 터져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사투리를 통한 구성진 춤 교습은 엄격함과 엄숙함 대신 친숙함을 유발한다. 노래 한 가닥 구성지게 뽑으며 어깻짓 할 것 같은 이씨의 춤은 격렬하거나 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투박한 듯하면서도 멋스럽다. 민중의 노래 민요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의 춤은 정답고 정겹다.
민요를 다루고 그에 걸맞은 우리네 춤을 다루는 시 <춤꾼 이씨>는, 목소리가 구수한 시인과 닮아있다. 친근함과 소박함이 묻어나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이씨의 말투에서 춤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때 묻지 않은 마음이 묻어난다.
시를 읽다보면 김홍도의 풍속화를 담고 있는 빛바랜 누런 천의 색감이 떠오른다. 흙의 색과도 흡사한 빛바랜 누런색은, 질리지 않는 편안함을 준다.
춤 교습이 끝난 뒤 이씨가 질박한 사투리로 우스갯소리 하나 던질 것 같다.
(3)역사 속으로 - 역사
연리지 3 이대흠, Op. cit., 27쪽.
육사 교수 지낸 이인수 씨는
박정희 시절 유신 반대로 옥에 갇혔을 때
지금은 북으로 간 이인모 노인과 한 방을 쓴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한쪽에서 빨갱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
다른 쪽에서 반동 새끼라고 대꾸를 하며
아침이 걸기도 하였다는데
잎보다 먼저 꽃 피는 진달래나
잎 먼저 내미는 감나무나
욕으로 시작하여 욕으로 끝났을 그 둘의 대화도
봄 깊은 이 나라의 산과 들 같았으리
밤이 되면 추우니
빨갱이 새끼와 반동 새끼가
등을 꼭 붙이고 잠을 잤다는데
감옥에서 이인수 씨와 이인모 노인은 같은 방을 쓰게 된다. 이인수 씨와 이인모 씨는 사상이 서로 달랐다. 이인수 씨가 이인모 노인에게 ‘빨갱이’ 라고 욕을 하면 이인모 노인은 이인수 씨에게 ‘반동’ 이라고 대꾸를 했다.
화자는 잎보다 먼저 꽃 피는 진달래와 꽃보다 잎을 먼저 내미는 감나무 이야기를 그들에게 빗대어 표현한다. 잎보다 먼저 꽃 피는 진달래는 진달래의 삶의 방식이고, 꽃 보다 잎 먼저 내미는 감나무는 감나무의 삶의 방식이다. 다른 꽃보다 꽃을 먼저 나오게 하는 식물은 다른 식물보다 일찍 개화하여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고, 부지런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감나무의 입장에서 진달래를 보는 것과 진달래의 입장에서 감나무를 보고 싸우는 일에는 끝이 없게 된다.
‘밤이 되면 추우니 빨갱이와 반동이 등을 꼭 붙이고 잤다’ 는 문장은 시의 제목 ‘연리지’와도 관련성이 있다.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그 나무가 되는 동안 부딪쳐야 하는 많은 일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면 밤에는 등으로 체온을 나눠야 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얼어 죽을 일이 없으므로 또 싸울 것이다. 그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만한 틈이 생기면 싸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은 모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다. 시 속의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같이 부딪칠 일은 적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서 연리지처럼 생활할 일이 없겠지만, 감옥을 나오면서 얻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감옥 안에서 느낀 그대로를 느꼈다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물 속의 불 -
붉은 심장을 가진 나무 이대흠, Op. cit., 98~99쪽.
6
이제 보니 봄이라는 계절은
잎이 돋는 시절이 아니구나
새순 나고 꽃 피는 것이 아니라
흰 목련 피는 꽃에 붉은 피 묻어
그것이 봄이구나
이제 보니 폭도라는 말은
함부로 주먹질하는 잡놈이 아니구나
죄 없이 죽은 자의 시신 아래에
흘린 피를 마다하지 않는
눈부신 연보라 흰 꽃
쑥부쟁이 그가 바로 폭도로구나
이제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적이 보내 내정을 염탐하는 자가 아니구나
민중들의 가슴에
수신기를 대고 청진기를 대고
상처를 도청하는 자로구나
화자는 나무가 붉은 심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나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이야기 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형태의 단어 사용하여 화자와 일정한 템포로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화자의 어머니는 마루에서 대포소리를 듣고 놀라셨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두려워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에는 구수한 사투리가 쓰였다. 반복적인 형태의 시어 들이 등장하고, 짧은 압축은 긴박성을 느끼게 하고 사투리의 단어들은 우리가 화자의 고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날은 총알로 된 비가 내렸다.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군인들을 피해 도망 다녔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숨든, 같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맞게 된다. 군인들의 발걸음에는 눈물도 없는 듯 저벅저벅 소리가 난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ㄹ’이라는 글자가 가진 특성을 살려 짧지만 움직임을 느낄 주는 시 <남도>. 전반적인 시 분위기가 밝다. 시집 『물 속의 불』에 실린 시들 중 몇 안 되는 밝은 느낌의 시다.
춤꾼 이씨 이대흠, Op. cit., 31쪽.
북은 치는 것이 아니여
타는 것이제
더덩더덩 덩따쿵따
가락을 따라감서 손을 움직이면
어긋나는 것이여
가락이 몬야 쩌만치 가불제
떵따쿵따 덩따쿵따
그냥 가락에 몸을 얹어사제
춤도 추는 것이 아니여
아아리아아리라아앙 하먼
아리랑이랑 고대로 흘러가고
쓰으리쓰으리라아랑 하먼
쓰리랑이랑 고대로 쓸려가고
아리리가 났네 하먼
아라리 뒤쫓지 말고
먼첨 아리리가 나부러사 써
귀로 듣는 아라리에 몸 맞추지 말고
이녁 몸 속 아라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제
- 민요와 사투리, 그리고 우리 춤 <춤꾼 이씨>.
아리랑의 가락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법이 춤꾼 이씨의 말을 빌어 소개된다. 이씨는 악기도, 춤도 그 자체에 얽매여 연주되고 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락에 맞춰 흐름을 타면서 연주되고 춰져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춤꾼답게 춤에 대해 좀 더 알려주고 있는데, 마지막 3연에 가서 춤은 흐름을 타는 것마저 뛰어넘어 가락 그 자체가 몸을 빌어 터져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사투리를 통한 구성진 춤 교습은 엄격함과 엄숙함 대신 친숙함을 유발한다. 노래 한 가닥 구성지게 뽑으며 어깻짓 할 것 같은 이씨의 춤은 격렬하거나 과하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투박한 듯하면서도 멋스럽다. 민중의 노래 민요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의 춤은 정답고 정겹다.
민요를 다루고 그에 걸맞은 우리네 춤을 다루는 시 <춤꾼 이씨>는, 목소리가 구수한 시인과 닮아있다. 친근함과 소박함이 묻어나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이씨의 말투에서 춤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때 묻지 않은 마음이 묻어난다.
시를 읽다보면 김홍도의 풍속화를 담고 있는 빛바랜 누런 천의 색감이 떠오른다. 흙의 색과도 흡사한 빛바랜 누런색은, 질리지 않는 편안함을 준다.
춤 교습이 끝난 뒤 이씨가 질박한 사투리로 우스갯소리 하나 던질 것 같다.
(3)역사 속으로 - 역사
연리지 3 이대흠, Op. cit., 27쪽.
육사 교수 지낸 이인수 씨는
박정희 시절 유신 반대로 옥에 갇혔을 때
지금은 북으로 간 이인모 노인과 한 방을 쓴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한쪽에서 빨갱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
다른 쪽에서 반동 새끼라고 대꾸를 하며
아침이 걸기도 하였다는데
잎보다 먼저 꽃 피는 진달래나
잎 먼저 내미는 감나무나
욕으로 시작하여 욕으로 끝났을 그 둘의 대화도
봄 깊은 이 나라의 산과 들 같았으리
밤이 되면 추우니
빨갱이 새끼와 반동 새끼가
등을 꼭 붙이고 잠을 잤다는데
감옥에서 이인수 씨와 이인모 노인은 같은 방을 쓰게 된다. 이인수 씨와 이인모 씨는 사상이 서로 달랐다. 이인수 씨가 이인모 노인에게 ‘빨갱이’ 라고 욕을 하면 이인모 노인은 이인수 씨에게 ‘반동’ 이라고 대꾸를 했다.
화자는 잎보다 먼저 꽃 피는 진달래와 꽃보다 잎을 먼저 내미는 감나무 이야기를 그들에게 빗대어 표현한다. 잎보다 먼저 꽃 피는 진달래는 진달래의 삶의 방식이고, 꽃 보다 잎 먼저 내미는 감나무는 감나무의 삶의 방식이다. 다른 꽃보다 꽃을 먼저 나오게 하는 식물은 다른 식물보다 일찍 개화하여 자신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고, 부지런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감나무의 입장에서 진달래를 보는 것과 진달래의 입장에서 감나무를 보고 싸우는 일에는 끝이 없게 된다.
‘밤이 되면 추우니 빨갱이와 반동이 등을 꼭 붙이고 잤다’ 는 문장은 시의 제목 ‘연리지’와도 관련성이 있다.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그 나무가 되는 동안 부딪쳐야 하는 많은 일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면 밤에는 등으로 체온을 나눠야 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얼어 죽을 일이 없으므로 또 싸울 것이다. 그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만한 틈이 생기면 싸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나무들은 모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다. 시 속의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같이 부딪칠 일은 적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서 연리지처럼 생활할 일이 없겠지만, 감옥을 나오면서 얻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감옥 안에서 느낀 그대로를 느꼈다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물 속의 불 -
붉은 심장을 가진 나무 이대흠, Op. cit., 98~99쪽.
6
이제 보니 봄이라는 계절은
잎이 돋는 시절이 아니구나
새순 나고 꽃 피는 것이 아니라
흰 목련 피는 꽃에 붉은 피 묻어
그것이 봄이구나
이제 보니 폭도라는 말은
함부로 주먹질하는 잡놈이 아니구나
죄 없이 죽은 자의 시신 아래에
흘린 피를 마다하지 않는
눈부신 연보라 흰 꽃
쑥부쟁이 그가 바로 폭도로구나
이제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적이 보내 내정을 염탐하는 자가 아니구나
민중들의 가슴에
수신기를 대고 청진기를 대고
상처를 도청하는 자로구나
화자는 나무가 붉은 심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나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이야기 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형태의 단어 사용하여 화자와 일정한 템포로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화자의 어머니는 마루에서 대포소리를 듣고 놀라셨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두려워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에는 구수한 사투리가 쓰였다. 반복적인 형태의 시어 들이 등장하고, 짧은 압축은 긴박성을 느끼게 하고 사투리의 단어들은 우리가 화자의 고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날은 총알로 된 비가 내렸다.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군인들을 피해 도망 다녔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숨든, 같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맞게 된다. 군인들의 발걸음에는 눈물도 없는 듯 저벅저벅 소리가 난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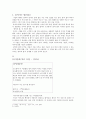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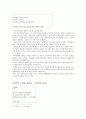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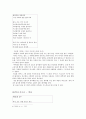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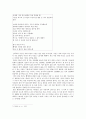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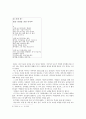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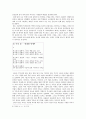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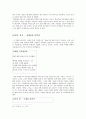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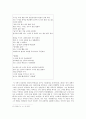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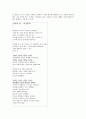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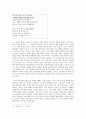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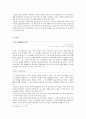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