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1. 시조의 명칭
1.1. 문헌상에 ‘시조’가 등장하기 이전
1.2. 문헌상에‘시조’가 등장한 초기
1.3. 근대 이후의 시조
1.4. 명칭표기의 문제점
2. 시조의 발생과 역사적 전개과정
2.1. 시조의 발생
2.2. 시조의 발생 시기
2.3. 시조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시조의 형식과 구조
3.1. 시조의 형식
3.2. 시조의 구조
4. 시조의 문학적 분류
4.1. 시조의 형식적 분류
4.2. 시조의 계층적 분류(향유층)
4.3. 시조의 내용적 분류
5. 시조의 악곡과 향유방식
Ⅲ. 나가며
1. 시조의 명칭
1.1. 문헌상에 ‘시조’가 등장하기 이전
1.2. 문헌상에‘시조’가 등장한 초기
1.3. 근대 이후의 시조
1.4. 명칭표기의 문제점
2. 시조의 발생과 역사적 전개과정
2.1. 시조의 발생
2.2. 시조의 발생 시기
2.3. 시조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시조의 형식과 구조
3.1. 시조의 형식
3.2. 시조의 구조
4. 시조의 문학적 분류
4.1. 시조의 형식적 분류
4.2. 시조의 계층적 분류(향유층)
4.3. 시조의 내용적 분류
5. 시조의 악곡과 향유방식
Ⅲ. 나가며
본문내용
받아들여 탐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가가 들어온 시기로 봤을 때 이 견해는 무리가 있다.
2) 재래 연원설 (또는 한국문학 기원설)
① 신가(신요)기원설(이희승, 이태극)
특정 지역에서 채록된 神歌가 시조의 3장 형식과 매우 흡사하고 이러한 노랫가락이 민요와도 유사하므로 이것이 시조의 연원이라는 주장이다.
→ 상식적으로 사대부들이 무당의 노랫가락을 즐겨 들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태극 역시 스스로 신가기원설에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록된 신가의 창작 시기가 먼저 살펴지고 그것이 시조 발생 이전의 것일 때야 비교가 가능하며 그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구비 전승되어 온 문학의 경우 시대에 따라 그 변모가 심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전하는 형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② 향가기원설(天台山人, 서원섭, 이영지, 이태극)
향가가 의미상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4구가 초장, 5-8구가 중장, 9-10구가 종장이 되었고, <均如傳>의 향가에 대해 최행귀가 언급한 ‘三句六名’이 시조의 3장 형식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 재래 연원설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이 바로 향가기원설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三句六名’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실정에서 단순한 뉘앙스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다음으로 향가와 시조의 형식 상 공통분모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시대적 시기에 비약이 따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③ 민요기원설(이병기, 이태극, 조윤제, 유중선, 조동일)
민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들이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짧은 민요가 시조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본다면 다른 모든 시가 또한 근원적으로는 민요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짧은 두 도막 형식의 민요가 어떻게 여섯 도막의 3장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④ 고려가요기원설(속요기원설(조윤제)+별곡기원설(정병욱))
정병욱은 「시조 부흥론의 반성과 전망」에서 별곡체(고려속요, 고려가요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련의 가요군)가 붕괴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고정옥은 「국어문학요강」에서 고려가요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음. 주요한 단서로는 <滿殿春別詞>의 제2연과 제5연, <井邑詞>의 여음을 제외한 부분 등이 제시 김대행, 앞의 책, 48면.
되고 있다.
→ 고려가요가 대체로 3음보 격이고 그 형식이 4음보의 시조와는 이질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滿殿春別詞>의 형식은 고려가요에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고려가요 전체의 보편적 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조가 가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면 정읍사의 여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하여 해석하는 것 역시 그 유사성을 찾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⑤ 음악기원설(최동원, 김대행, 권두환, 성호경)
시조가 음악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중요시하여, 주로 고려 시대 음악의 형식과 시조의 노랫말이 갖는 3분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시조의 형식 중 5장의 가곡으로 전승된 것도 있으므로 3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획일적인 관점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음악적 연구 성과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2.2. 시조의 발생 시기
3장 6구의 시조 형식이 형성된 시기나 시조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태이다. 가집 『청구영언』이나 『가곡원류』에는 고구려의 을파소, 백제의 성충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후대인의 의작(擬作)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므로 삼국시대에 이미 시조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조의 형성시기 문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역사적 정황에 의거해 판단하는 ‘고려 말 형성론’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16세기 형성론’ 으로 형성시기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한편 고려 말기에 완성된 시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조가 점진적인 발달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 조윤제는 ‘고려 중기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하여도 좋을 듯하다’ 조윤제, 『국문학개설』, 119면 재인용.
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조로 발생 시기를 잡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6세기 형성론의 문제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안고 있는 논리적 경직성에 있다. 실증주의적 태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가능한 현상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다시 새로운 입론을 펴야 한다. 반면에 고려 말 형성론의 경우, 향유층의 연속성에서 그 논리적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
시조발생시기
주장자
이유
삼국시대
김종식
가집에 수록된 작품에 근거
고려조
조윤제, 이태극, 박성의, 김태준, 정병욱, 김병국, 최동원, 진동혁, 박을수, 최장수, 서원섭, 전규태
고려중엽의 별곡이 고려 말에 시조로 분화(김태준), 경기체가와 속가의 거리를 극복하고자 중엽쯤 발생(조윤제), 소박하면서도 정제된 형식이 성리학자들에게 적합, 한시절구에 담을 수 있는 시의를 담기에 적합
조선조
이능우, 김수업, 성호경
16세기 초 작품들이 음보율상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전에 완성된 형태가 나오지 않았고, 정치적 안정기인 16세기에 정착, 진본 청구영언에 없는 고려조 작품은 인정할 수 없음.
(입증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증주의적 태도에 근거한 입장이다. 가집에 수록된 16세기 이전의 모든 작가와 작품들을 후대의 위작으로 보면서, 그 역사적 실재성을 부정)
이정자, 『시조문학연구론』, 국학자료원, 2003, 38면.
2.3. 시조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1기 시조의 형성기 (고려조)
시조는 고려 중엽에 시작되어 여말에 와서 그 형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때, 시조의 기원은 고려가요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연원에는 외래설과 재래설이 있는데, 외래설 보다는 재래 기원설에 비중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몸이/ 죽어죽어// 一白番/ 고쳐죽어
白骨이/ 塵土되여// 넉시라도/ 잇고업고
님向한/ 一片丹心이야// 가
2) 재래 연원설 (또는 한국문학 기원설)
① 신가(신요)기원설(이희승, 이태극)
특정 지역에서 채록된 神歌가 시조의 3장 형식과 매우 흡사하고 이러한 노랫가락이 민요와도 유사하므로 이것이 시조의 연원이라는 주장이다.
→ 상식적으로 사대부들이 무당의 노랫가락을 즐겨 들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태극 역시 스스로 신가기원설에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록된 신가의 창작 시기가 먼저 살펴지고 그것이 시조 발생 이전의 것일 때야 비교가 가능하며 그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구비 전승되어 온 문학의 경우 시대에 따라 그 변모가 심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전하는 형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② 향가기원설(天台山人, 서원섭, 이영지, 이태극)
향가가 의미상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4구가 초장, 5-8구가 중장, 9-10구가 종장이 되었고, <均如傳>의 향가에 대해 최행귀가 언급한 ‘三句六名’이 시조의 3장 형식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 재래 연원설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이 바로 향가기원설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三句六名’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실정에서 단순한 뉘앙스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다음으로 향가와 시조의 형식 상 공통분모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시대적 시기에 비약이 따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③ 민요기원설(이병기, 이태극, 조윤제, 유중선, 조동일)
민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들이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짧은 민요가 시조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본다면 다른 모든 시가 또한 근원적으로는 민요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짧은 두 도막 형식의 민요가 어떻게 여섯 도막의 3장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④ 고려가요기원설(속요기원설(조윤제)+별곡기원설(정병욱))
정병욱은 「시조 부흥론의 반성과 전망」에서 별곡체(고려속요, 고려가요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련의 가요군)가 붕괴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고정옥은 「국어문학요강」에서 고려가요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음. 주요한 단서로는 <滿殿春別詞>의 제2연과 제5연, <井邑詞>의 여음을 제외한 부분 등이 제시 김대행, 앞의 책, 48면.
되고 있다.
→ 고려가요가 대체로 3음보 격이고 그 형식이 4음보의 시조와는 이질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滿殿春別詞>의 형식은 고려가요에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고려가요 전체의 보편적 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조가 가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면 정읍사의 여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하여 해석하는 것 역시 그 유사성을 찾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⑤ 음악기원설(최동원, 김대행, 권두환, 성호경)
시조가 음악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중요시하여, 주로 고려 시대 음악의 형식과 시조의 노랫말이 갖는 3분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시조의 형식 중 5장의 가곡으로 전승된 것도 있으므로 3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획일적인 관점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음악적 연구 성과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2.2. 시조의 발생 시기
3장 6구의 시조 형식이 형성된 시기나 시조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태이다. 가집 『청구영언』이나 『가곡원류』에는 고구려의 을파소, 백제의 성충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후대인의 의작(擬作)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므로 삼국시대에 이미 시조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시조의 형성시기 문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역사적 정황에 의거해 판단하는 ‘고려 말 형성론’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16세기 형성론’ 으로 형성시기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한편 고려 말기에 완성된 시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조가 점진적인 발달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 조윤제는 ‘고려 중기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하여도 좋을 듯하다’ 조윤제, 『국문학개설』, 119면 재인용.
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조로 발생 시기를 잡는 것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6세기 형성론의 문제는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안고 있는 논리적 경직성에 있다. 실증주의적 태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가능한 현상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때마다 다시 새로운 입론을 펴야 한다. 반면에 고려 말 형성론의 경우, 향유층의 연속성에서 그 논리적 개연성을 찾을 수 있다.
시조발생시기
주장자
이유
삼국시대
김종식
가집에 수록된 작품에 근거
고려조
조윤제, 이태극, 박성의, 김태준, 정병욱, 김병국, 최동원, 진동혁, 박을수, 최장수, 서원섭, 전규태
고려중엽의 별곡이 고려 말에 시조로 분화(김태준), 경기체가와 속가의 거리를 극복하고자 중엽쯤 발생(조윤제), 소박하면서도 정제된 형식이 성리학자들에게 적합, 한시절구에 담을 수 있는 시의를 담기에 적합
조선조
이능우, 김수업, 성호경
16세기 초 작품들이 음보율상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전에 완성된 형태가 나오지 않았고, 정치적 안정기인 16세기에 정착, 진본 청구영언에 없는 고려조 작품은 인정할 수 없음.
(입증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증주의적 태도에 근거한 입장이다. 가집에 수록된 16세기 이전의 모든 작가와 작품들을 후대의 위작으로 보면서, 그 역사적 실재성을 부정)
이정자, 『시조문학연구론』, 국학자료원, 2003, 38면.
2.3. 시조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1기 시조의 형성기 (고려조)
시조는 고려 중엽에 시작되어 여말에 와서 그 형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때, 시조의 기원은 고려가요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연원에는 외래설과 재래설이 있는데, 외래설 보다는 재래 기원설에 비중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몸이/ 죽어죽어// 一白番/ 고쳐죽어
白骨이/ 塵土되여// 넉시라도/ 잇고업고
님向한/ 一片丹心이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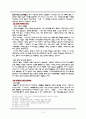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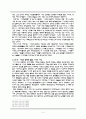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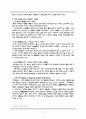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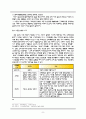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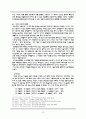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