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갑오혁명과 연계된 시 작품 『금강』
3. 동학 자체를 소재로 한 시 작품
4. 구전민요와 시 작품
5. 동학의 현대시
2. 갑오혁명과 연계된 시 작품 『금강』
3. 동학 자체를 소재로 한 시 작품
4. 구전민요와 시 작품
5. 동학의 현대시
본문내용
시에 나타나는 동학
목차
1. 서론
2. 갑오혁명과 연계된 시 작품 『금강』
3. 동학 자체를 소재로 한 시 작품
4. 구전민요와 시 작품
5. 동학의 현대시
1. 서론
일제의 암흑기가 지나고 해방을 맞아, 4.19를 맞게 되면서, 그것이 지닌 정신사적 의미,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민중, 민권 운동은 좀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게 했고, 그 현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도 하였다. 동학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즉, 그때까지 일반적으로 불리던 ‘동학란’이 ‘난’의 이름을 버리고 ‘혁명’ 으로 또는 ‘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문학에 있어서도 동학은 새롭게 바뀌었다. 봉건주의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대항해 온 동학 정신의 문제는 무엇이며, 동학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오늘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는 동학이 전개했던 민족, 민권 운동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운동 가운데 갑오혁명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갑오 동학 혁명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을 ‘혁명’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운동’ 으로 봐야하는지의 견해이다. 갑오혁명을, 동학이 지닌 종교성이나 사상성에 의해서 야기된 혁명이며, 또 동학 동학교도들에 의해서 주도된 ‘동학 혁명’으로 보는 견해 『東學 革命인가 東學 運動인가』(청아 출판사, 1984)
와, 이것을, 동학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적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혁명이기보다는, 조선조 후기를 맥맥히 이어오던 민란의 요소가 주맥을 이루는 것이고, 동학은 그 민란에서 나온 하나의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또 다른 의견이다. 이러한 다른 견해는 문학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갑오혁명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그 주제명에서 동학의 종교적인 성격이나 사상을 근거로 한 사회 개혁의 혁명을 문학 작품에 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갑오혁명을 역사적시대적 상황의 추세에 의하여 일어난 사회 개혁 및 혁명으로 다루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시 속에 나타난 동학 (손진은)
동학에 관련된 시 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동학혁명 당시에 백성들의 입에서 구전되던 민요와 시들이다. 이에는 노랫말의 첫 자를 따서 소위 「파랑새 謠」, 「가보세 謠」및 「개남아 謠」라고 불리우는 민요, 그리고 「칼노래 謠」 등이 있다. 특히 대중적 호소력과 서정성을 갗춘 「파랑새 謠」빛나는 은유감각으로 해의 간지를 빛대어 시대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
「가보세 謠」. 당시에 가장 전투적인 면모를 과시하면서 농민군을 이끌어 민중들 사이에서 전봉준 못지 않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동학의 지도자 김개남 장군에 대한 민중의 정서를 담은 「개남아 謠」등의 민요는 현상적으로 실패한 싸움 앞에서 내뱉는 민중들의 한탄을 주조로 하면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어졌다. 그러나 다른 장르와는 달리 이러한 노래 이후로 시에서는 동학 혁명에 대한 형상화 작업이 자취를 감추게 디며 1947넌 조운의 시조「古阜 斗星山」에 이르러서야 겨우 명맥을 잇게 된다. 현재 동학관련 작품은 약250여 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럼 앞으로 갑오혁명을 소재로 한 문학 시 작품과 갑오혁명이 아닌, 동학 그 자체를 소재로 다룬 시 작품에 대하여 알아본 뒤, 현대시에서의 동학 시 작품, 동학의 시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2. 갑오혁명과 연계된 시 작품 『금강』
대부분 문학의 제재로 선택된 ‘동학’은 ‘동학혁명’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문학에 있어 인식되고 있는 동학은 곧 동학혁명이 지닌 역사성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인식에서 우리는 ‘동학’ 이 곧 ‘동학혁명’ 이라는 등식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현대 한국문학에 이르러 갑오 동학혁명이 곧 동학의 대명사와 같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민중민권 운동과 동학의 갑오혁명이 그 정신사적인 면에서 같은 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문학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런 작품으로 대표적인 시로는 1967년 발표된 신동엽의 장편 서사시 『금강』이 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중의 실체로서 갑오 동학 혁명을 조명하고, 이러한 민중의 실체를 419 가 보여준 민권의 자각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노래한 서사시 『금강』은 동학을 본격적인 문학에 수용한 그 첫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장편 서사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은 1862년 진주농민란 으로부터 1960년대 당대의 현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역사적 배경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 즉 동학혁명이 된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얼개는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사실과 ‘신하늬’ 로 상징되는 허구적 장치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짱을
목차
1. 서론
2. 갑오혁명과 연계된 시 작품 『금강』
3. 동학 자체를 소재로 한 시 작품
4. 구전민요와 시 작품
5. 동학의 현대시
1. 서론
일제의 암흑기가 지나고 해방을 맞아, 4.19를 맞게 되면서, 그것이 지닌 정신사적 의미,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민중, 민권 운동은 좀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게 했고, 그 현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도 하였다. 동학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다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즉, 그때까지 일반적으로 불리던 ‘동학란’이 ‘난’의 이름을 버리고 ‘혁명’ 으로 또는 ‘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문학에 있어서도 동학은 새롭게 바뀌었다. 봉건주의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대항해 온 동학 정신의 문제는 무엇이며, 동학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이고, 오늘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는 동학이 전개했던 민족, 민권 운동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운동 가운데 갑오혁명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갑오 동학 혁명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을 ‘혁명’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운동’ 으로 봐야하는지의 견해이다. 갑오혁명을, 동학이 지닌 종교성이나 사상성에 의해서 야기된 혁명이며, 또 동학 동학교도들에 의해서 주도된 ‘동학 혁명’으로 보는 견해 『東學 革命인가 東學 運動인가』(청아 출판사, 1984)
와, 이것을, 동학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적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혁명이기보다는, 조선조 후기를 맥맥히 이어오던 민란의 요소가 주맥을 이루는 것이고, 동학은 그 민란에서 나온 하나의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또 다른 의견이다. 이러한 다른 견해는 문학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갑오혁명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그 주제명에서 동학의 종교적인 성격이나 사상을 근거로 한 사회 개혁의 혁명을 문학 작품에 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갑오혁명을 역사적시대적 상황의 추세에 의하여 일어난 사회 개혁 및 혁명으로 다루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시 속에 나타난 동학 (손진은)
동학에 관련된 시 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동학혁명 당시에 백성들의 입에서 구전되던 민요와 시들이다. 이에는 노랫말의 첫 자를 따서 소위 「파랑새 謠」, 「가보세 謠」및 「개남아 謠」라고 불리우는 민요, 그리고 「칼노래 謠」 등이 있다. 특히 대중적 호소력과 서정성을 갗춘 「파랑새 謠」빛나는 은유감각으로 해의 간지를 빛대어 시대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
「가보세 謠」. 당시에 가장 전투적인 면모를 과시하면서 농민군을 이끌어 민중들 사이에서 전봉준 못지 않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동학의 지도자 김개남 장군에 대한 민중의 정서를 담은 「개남아 謠」등의 민요는 현상적으로 실패한 싸움 앞에서 내뱉는 민중들의 한탄을 주조로 하면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어졌다. 그러나 다른 장르와는 달리 이러한 노래 이후로 시에서는 동학 혁명에 대한 형상화 작업이 자취를 감추게 디며 1947넌 조운의 시조「古阜 斗星山」에 이르러서야 겨우 명맥을 잇게 된다. 현재 동학관련 작품은 약250여 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럼 앞으로 갑오혁명을 소재로 한 문학 시 작품과 갑오혁명이 아닌, 동학 그 자체를 소재로 다룬 시 작품에 대하여 알아본 뒤, 현대시에서의 동학 시 작품, 동학의 시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2. 갑오혁명과 연계된 시 작품 『금강』
대부분 문학의 제재로 선택된 ‘동학’은 ‘동학혁명’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문학에 있어 인식되고 있는 동학은 곧 동학혁명이 지닌 역사성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인식에서 우리는 ‘동학’ 이 곧 ‘동학혁명’ 이라는 등식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해방이후 현대 한국문학에 이르러 갑오 동학혁명이 곧 동학의 대명사와 같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민중민권 운동과 동학의 갑오혁명이 그 정신사적인 면에서 같은 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문학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런 작품으로 대표적인 시로는 1967년 발표된 신동엽의 장편 서사시 『금강』이 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중의 실체로서 갑오 동학 혁명을 조명하고, 이러한 민중의 실체를 419 가 보여준 민권의 자각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노래한 서사시 『금강』은 동학을 본격적인 문학에 수용한 그 첫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장편 서사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은 1862년 진주농민란 으로부터 1960년대 당대의 현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역사적 배경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 즉 동학혁명이 된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얼개는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사실과 ‘신하늬’ 로 상징되는 허구적 장치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960년 4월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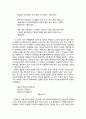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