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개여울〉, 〈제비〉, 〈강촌 江村〉 등이 있고, 1923년 같은 잡지에 실린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삭주구성 朔州龜城〉, 〈가는 길〉, 〈산 山〉, 《배재》 2호의 〈접동〉, 《신천지 新天地》의 〈왕십리 往十里〉 등이 있다.
그 뒤 김억을 위시한 《영대 靈臺》 동인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이 무렵에 발표한 대표적 작품들을 게재지별로 살펴보면, 《영대》에 〈밭고랑 위에서〉(1924), 〈꽃촉 (燭)불 켜는 밤〉(1925), 〈무신 無信〉(1925) 등을, 《동아일보》에 〈나무리벌노래〉(1924), 〈옷과 밥과 자유〉(1925)를, 《조선문단 朝鮮文壇》에 〈물마름〉(1925)을, 《문명 文明》에 〈지연 紙鳶〉(1925)을 발표하고 있다.
소월의 시작활동은 1925년 시집 《진달래꽃》을 내고 1925년 5월 《개벽》에 시론 〈시혼 詩魂〉을 발표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집에는 그동안 써두었던 전 작품 126편이 수록되었다. 이 시집은 그의 전반기의 작품경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당시 시단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킨 작품집으로서 한국시단의 이정표 구실을 한다.
3. 작품경향
내용면 : 민담, 민요, 향토적인 소재를 제재로 수용하면서 민중적 정감과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여성적 정조(情調)와 민요적 율조로서 표출하고 있다. 생에 대한 깨달음은 〈산유화〉·〈첫치마〉·〈금잔디〉·〈달맞이〉 등에서 피고 지는 꽃의 생명원리, 태어나고 죽는 인생원리,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원리에 관한 통찰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 〈진달래꽃〉·〈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먼후일〉·〈꽃촉불 켜는 밤〉·〈못잊어〉 등에서는 만나고 떠나는 사랑의 원리를 통한 삶의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민요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생에 대한 인식은 시론 〈시혼〉에서 역설적 상황을 지닌 ‘음영의 시학’이라는, 상징시학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법면 : 3음보격의 율격을 자유롭게 구사한 그의 시의 율격은 대개가 삼음보격을 지닌 7·5조의 정형시로서 자수율보다는 자연스런 호흡률 위주로 표현하였으며, 음성상징, 호음조, 소리의 공명 등을 이용하여, 시에 언어의 탄력성과 입체감을 부여하면서도 민요적 전통을 가진 독창적인 율격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또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화자(女性話者)의 목소리를 통하여 향토적 소재와 설화적 내용을 민요적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족적 정감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초기 : 시대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적 아픔을 드러낸 서정시 위주의 창작을 주로 하였는데 대표적인 시로 <진달래꽃>, <먼 후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못잊어>, <산유화>, <접동새> 등을 들수 있다.
후기 : 초기 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일 땅이 있었다면([개벽]40호, 1923.10) >, <나무리 벌의 노래>, <옷과 밥과 자유(1925)> 등에서 현실참여적 시각을 간간히 보여왔던 시인은 시집 [진달래꽃] 이후 후기 시에서 식민지하 민족의 빈궁이나 한계상황으로 관심의 폭을 더욱 넓히게 되는데 이 시기의 시에는 시인의 현실인식과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민족혼에 대한 신뢰와 현실긍정적인 경향을 보인 대표적인 시로는 〈들도리〉(1925)·〈건강(健康)한 잠〉(1934)·〈상쾌(爽快)한 아침〉(1934)를, 삶의 고뇌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로는 〈돈과 밥과 맘과 들〉(1926)·〈팔벼개 노래〉(1927)·〈돈타령〉(1934)·〈삼수갑산(三水甲山)―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次岸曙先生三水甲山韻)〉(1934)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 예술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인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시비가 서울 남산에 세워져 있다. 저서로 생전에 출간한 《진달래꽃》 외에 사후에 김억이 엮은 《소월시초 素月詩抄》(1939), 하동호(河東鎬)·백순재(白淳在) 공편의 《못잊을 그사람》(1966)이 있다.
4. 작품세계
1. 향토적 표현 기교 : 향토색 짙은 지명이나 풍물, 그리고 소박한 사투리을 구사하여 향토성을 짙게 풍겼다.
2. 전통적 시정(詩情) : 사모의 정이나 한(恨)의 정조(情調), 자아의 슬픔, 생의 무상 등 전통적 정서를 민요적 가락으로 표현했다
3. 전통적 낭만주의 : 서구풍(西歐風)에 물들지 않은 향토적서민적 생활 감정을 여성적 취향으로 표현하여 당시 우리 민족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4. 전통적 율조 : 세련된 시어(詩語)를 구사하고, 민요의 75조, 34 또는 44조의 정형성(定型性)을 중시하였으며, 호소하듯하는 애조띤 가락으로 한(恨)과 애수와 연 모(戀慕), 그리고 무상감(無常感)을 노래했다.
5. 유교적 인륜주의(人倫主義) : 유교적 인륜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점은 전통적 시인 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가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끝내 자연과의 동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5. 주요작품
진달래꽃([개벽] 제25호 1922. 7.)
산유화([영대] 3호 1924.10.)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일 땅이 있었더면
(진달내꼿 매문사 1925.12.)
초혼(진달내꼿 매문사 1925.12.)
옷과 밥과 자유(평양서 발행된 동인지 [백치(白
6.작품 중 “진달래꽃”
<감상>
유교적 휴머니즘을 사상적 배경으로, 낭만주의적 서정을 민요풍인 75조의 기본 리듬에다용해시켜서 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승화된 이별의 한’을 아름답게 표현한 순정적인 서정시다.
「산화공덕(散花功德)」의 마음이 물씬 풍기는 데, 산화공덕이란(불교에서는‘散華’라고 씀)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걸음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시에서 진달래꽃을 뿌려, 가는 걸음에 영화의 축복을 비는 것은 원망(怨望)을 초극한 고귀한 애정의 발로이다.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진달래꽃> -
<발표> 개벽 7월호 1922년 <제재> 이
그 뒤 김억을 위시한 《영대 靈臺》 동인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이 무렵에 발표한 대표적 작품들을 게재지별로 살펴보면, 《영대》에 〈밭고랑 위에서〉(1924), 〈꽃촉 (燭)불 켜는 밤〉(1925), 〈무신 無信〉(1925) 등을, 《동아일보》에 〈나무리벌노래〉(1924), 〈옷과 밥과 자유〉(1925)를, 《조선문단 朝鮮文壇》에 〈물마름〉(1925)을, 《문명 文明》에 〈지연 紙鳶〉(1925)을 발표하고 있다.
소월의 시작활동은 1925년 시집 《진달래꽃》을 내고 1925년 5월 《개벽》에 시론 〈시혼 詩魂〉을 발표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집에는 그동안 써두었던 전 작품 126편이 수록되었다. 이 시집은 그의 전반기의 작품경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당시 시단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킨 작품집으로서 한국시단의 이정표 구실을 한다.
3. 작품경향
내용면 : 민담, 민요, 향토적인 소재를 제재로 수용하면서 민중적 정감과 전통적인 한(恨)의 정서를 여성적 정조(情調)와 민요적 율조로서 표출하고 있다. 생에 대한 깨달음은 〈산유화〉·〈첫치마〉·〈금잔디〉·〈달맞이〉 등에서 피고 지는 꽃의 생명원리, 태어나고 죽는 인생원리,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원리에 관한 통찰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 〈진달래꽃〉·〈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먼후일〉·〈꽃촉불 켜는 밤〉·〈못잊어〉 등에서는 만나고 떠나는 사랑의 원리를 통한 삶의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민요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생에 대한 인식은 시론 〈시혼〉에서 역설적 상황을 지닌 ‘음영의 시학’이라는, 상징시학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법면 : 3음보격의 율격을 자유롭게 구사한 그의 시의 율격은 대개가 삼음보격을 지닌 7·5조의 정형시로서 자수율보다는 자연스런 호흡률 위주로 표현하였으며, 음성상징, 호음조, 소리의 공명 등을 이용하여, 시에 언어의 탄력성과 입체감을 부여하면서도 민요적 전통을 가진 독창적인 율격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또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화자(女性話者)의 목소리를 통하여 향토적 소재와 설화적 내용을 민요적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족적 정감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
초기 : 시대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적 아픔을 드러낸 서정시 위주의 창작을 주로 하였는데 대표적인 시로 <진달래꽃>, <먼 후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못잊어>, <산유화>, <접동새> 등을 들수 있다.
후기 : 초기 시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일 땅이 있었다면([개벽]40호, 1923.10) >, <나무리 벌의 노래>, <옷과 밥과 자유(1925)> 등에서 현실참여적 시각을 간간히 보여왔던 시인은 시집 [진달래꽃] 이후 후기 시에서 식민지하 민족의 빈궁이나 한계상황으로 관심의 폭을 더욱 넓히게 되는데 이 시기의 시에는 시인의 현실인식과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민족혼에 대한 신뢰와 현실긍정적인 경향을 보인 대표적인 시로는 〈들도리〉(1925)·〈건강(健康)한 잠〉(1934)·〈상쾌(爽快)한 아침〉(1934)를, 삶의 고뇌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로는 〈돈과 밥과 맘과 들〉(1926)·〈팔벼개 노래〉(1927)·〈돈타령〉(1934)·〈삼수갑산(三水甲山)―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次岸曙先生三水甲山韻)〉(1934) 등을 들 수 있다.
1981년 예술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인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시비가 서울 남산에 세워져 있다. 저서로 생전에 출간한 《진달래꽃》 외에 사후에 김억이 엮은 《소월시초 素月詩抄》(1939), 하동호(河東鎬)·백순재(白淳在) 공편의 《못잊을 그사람》(1966)이 있다.
4. 작품세계
1. 향토적 표현 기교 : 향토색 짙은 지명이나 풍물, 그리고 소박한 사투리을 구사하여 향토성을 짙게 풍겼다.
2. 전통적 시정(詩情) : 사모의 정이나 한(恨)의 정조(情調), 자아의 슬픔, 생의 무상 등 전통적 정서를 민요적 가락으로 표현했다
3. 전통적 낭만주의 : 서구풍(西歐風)에 물들지 않은 향토적서민적 생활 감정을 여성적 취향으로 표현하여 당시 우리 민족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4. 전통적 율조 : 세련된 시어(詩語)를 구사하고, 민요의 75조, 34 또는 44조의 정형성(定型性)을 중시하였으며, 호소하듯하는 애조띤 가락으로 한(恨)과 애수와 연 모(戀慕), 그리고 무상감(無常感)을 노래했다.
5. 유교적 인륜주의(人倫主義) : 유교적 인륜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점은 전통적 시인 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가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끝내 자연과의 동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5. 주요작품
진달래꽃([개벽] 제25호 1922. 7.)
산유화([영대] 3호 1924.10.)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대일 땅이 있었더면
(진달내꼿 매문사 1925.12.)
초혼(진달내꼿 매문사 1925.12.)
옷과 밥과 자유(평양서 발행된 동인지 [백치(白
6.작품 중 “진달래꽃”
<감상>
유교적 휴머니즘을 사상적 배경으로, 낭만주의적 서정을 민요풍인 75조의 기본 리듬에다용해시켜서 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승화된 이별의 한’을 아름답게 표현한 순정적인 서정시다.
「산화공덕(散花功德)」의 마음이 물씬 풍기는 데, 산화공덕이란(불교에서는‘散華’라고 씀)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걸음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시에서 진달래꽃을 뿌려, 가는 걸음에 영화의 축복을 비는 것은 원망(怨望)을 초극한 고귀한 애정의 발로이다.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진달래꽃> -
<발표> 개벽 7월호 1922년 <제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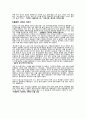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