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목차
1. 악장문학의 개념
2. 장르적 논쟁과 특수성
3. 형성배경
4. 성격
5. 악장종류
6. 수록 문헌
7. 작자층
8. 작품 연대 별 악장의 전개과정
-참고자료
2. 장르적 논쟁과 특수성
3. 형성배경
4. 성격
5. 악장종류
6. 수록 문헌
7. 작자층
8. 작품 연대 별 악장의 전개과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군사가 속출하자,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上秦하면서 회군허락을 요청하나 우왕과 최영에 의해 거절 당한다. 이에 동북변으로 말머리를 돌리면서 ‘임금 측근의 악인을 제거 하여 생령을 편하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회귀한다. 정동방곡은 이러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한 참언적 성격의 노래이다.
※ 무공곡과 문덕곡의 연주에도 선후 차례가 있었다. 이는 창업한 임금의 덕에 따라 연주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自虎通議에는 “왕자의 음악이 먼저하고 뒤에 함이 있는 것은 각각 그들의 해당하는 덕을 높여서이니, 이것은 문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면 먼저 문덕을 하는 것이니, 우모를 잡고 춤을 추는 것을 이름이고, 무공으로 천하를 얻었으면 먼저 무덕을 하는 것이니, 간척을 잡고 춤을 추는 것을 이른다.”라고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태조가 재위시 에는 무공곡을 연주하고 문덕곡을 나중에 했지만 사후에는 신하들 사이에 선후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문덕곡을 먼저 연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3) 「文德曲」문덕곡
*연도 : 1393년(태조2년)
*작가 : 정도전
*구성 : 개언로(開言路) ·보공신(保功臣) ·정경계(正經界) ·정례악(定禮樂)의 4장
*형식 : 칠언한시에 토가 달린 4장 6행의 현토체
*주제 : 태조의 문덕을 찬양
1393년(태조 2)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송도가(頌禱歌). 칠언 한시에 토가 달린 4장 행의 현토체이다.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조와 ≪삼봉집 三峯集≫에 한시가 전하 며,≪악학궤범≫에는 현토(懸吐)된 가사가 전한다. 조선창업 후에 태조의 문덕(文德)을 찬양하고자 〈몽금척 夢金尺〉·〈수보록 受寶蘿〉과 함께 지어진 노래이며 그 뒤 악장으로 불렸다.
이 노래는 개언로(開言路)·보공신(保功臣)·정경계(正經界)·정예악(定禮樂) 등 4장으로 되어 있다. 개언로장에서는 태조가 민정을 파악하고자 언로를 크게 열고 널리 여론을 청취함으로써 그 덕이 순(舜)임금과 같다고 하였다. 보공신장에서는 꾀와 힘을 다하여 조선창업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잘 보살피는 무궁한 덕을 읊었다.
정경계장에서는 고려시대에 무너진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널리 골라 창고가 꽉 차게 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게 된 치덕을 노래했다. 정예악장에서는 정치의 요체가 되는 예악을 새로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 바르고 화평하게 한 덕을 읊고 있다.
한시의 압운(押韻)을 보면, 제1·2장은 상평성(上平聲) 동운(東韻)을 취하고 있다. 제3장은 하평성(下平聲) 우운(尤韻)을, 제4장은 입성(入聲) 통운(通韻)을 취하고 있다. 즉 절구운(絶句韻)이 아니라 각 장 매구운(每句韻)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덕곡〉은 압운과 평측으로 볼 때 칠언절구가 아니라 칠언고시(七言古詩) 내지 칠언단시(七言短詩)이다. 그리고 매구운을 쓴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지어진 노래의 가사임을 알 수 있다.
각 장의 6행 중 제1∼4행은 전대절(前大節), 제5·6행은 후소절(後小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5행 앞에는 ‘개언로군불견(開言路君不見)가’, ‘보공신군불견(保功臣君不見)가’, ‘정경계군불견(正經界君不見)가’, ‘정예악군불견(定禮樂君不見)가’ 등의 전렴(前斂)이 온다. 제6행 앞에는 ‘아으’라는 감탄구가 오는 것이 특징이다.
〈문덕곡〉은 처음에는 한시였다가 후에 무악화(舞樂化)되어 춤과 함께 노래되면서 무악에 맞추기 위하여 현토를 수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춤은 춤이라기보다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정재(呈才)라 할 수 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정도전이 태조의 명에 따라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악학궤범≫의 성종조 향악정재도의(鄕樂呈才圖儀)에 비로소 무의(舞儀)가 보인다.
그러나 춤의 구성이 성기고 소박하며, 의물(儀物)을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왕이 환궁하는 날에 그 대가(大駕)를 맞을 때 길에서 춤추며 노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재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성종 이후 언제까지 〈문덕곡〉의 노래와 정재가 행하여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정재가 크게 떨쳤던 순조 때의 ≪진찬의궤 進饌儀軌≫와 고종 때의 ≪정재무도홀기 呈才舞圖笏記≫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도 재연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노랫말과 간단한 춤추는 절차만이 전할 뿐 그 음악적 내용과 춤의 모습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삼봉의 악장가운데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의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文治를 가장 극명히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각 장마다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문덕곡은 開言路ㆍ保功臣ㆍ正經界ㆍ定禮樂등 4장으로 이루어진 7言 絶句 한시체 이며 매 장의 2구는 후렴구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후렴구에 나타난 임금에 대한 칭송은 일견 阿諛的인 문자로 볼 소지가 있으나, 문덕곡은 治國의 方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노래이다. 이는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정치를 함에 있어서 덕치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것으로 정도전의 정치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태조를 무조건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성계가 정도전의 「문덕곡」을 듣고는 “공덕을 노래로 불러서 칭송하는 것이 실제에 지나쳐서 이 가곡을 들을 때 마다 짐의 마음이 부끄럽다“라고 한 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악장이 무조건적인 칭송의 문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開言路>의 끝 2 구는 후렴구인데 순임금과 태조의 덕을 동등한 것으로 찬미하고 있다. 여기서의 표현은 阿諛로만 비판 하기 보다는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 자긍심의 발로로 보고, 신하가 자신의 의도를 은근히 표현하는 諫諍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순임금도 桀紂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후렴구는 마지막구를 반복하여 다시 음악의 절주에 맞추는데 驚戒之詞의 의미를 띈다. 즉 군왕이 항상 체득하고 갖춰야할 요건이나 덕목을 관현의 반주에 맞추어 잊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이다.
<保功臣>은 두 번째 장으로서 임금과 신하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도전 은『삼봉집』권3에서 군신의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正己格君’이야말로 治 典
※ 무공곡과 문덕곡의 연주에도 선후 차례가 있었다. 이는 창업한 임금의 덕에 따라 연주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自虎通議에는 “왕자의 음악이 먼저하고 뒤에 함이 있는 것은 각각 그들의 해당하는 덕을 높여서이니, 이것은 문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면 먼저 문덕을 하는 것이니, 우모를 잡고 춤을 추는 것을 이름이고, 무공으로 천하를 얻었으면 먼저 무덕을 하는 것이니, 간척을 잡고 춤을 추는 것을 이른다.”라고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태조가 재위시 에는 무공곡을 연주하고 문덕곡을 나중에 했지만 사후에는 신하들 사이에 선후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문덕곡을 먼저 연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3) 「文德曲」문덕곡
*연도 : 1393년(태조2년)
*작가 : 정도전
*구성 : 개언로(開言路) ·보공신(保功臣) ·정경계(正經界) ·정례악(定禮樂)의 4장
*형식 : 칠언한시에 토가 달린 4장 6행의 현토체
*주제 : 태조의 문덕을 찬양
1393년(태조 2)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송도가(頌禱歌). 칠언 한시에 토가 달린 4장 행의 현토체이다.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조와 ≪삼봉집 三峯集≫에 한시가 전하 며,≪악학궤범≫에는 현토(懸吐)된 가사가 전한다. 조선창업 후에 태조의 문덕(文德)을 찬양하고자 〈몽금척 夢金尺〉·〈수보록 受寶蘿〉과 함께 지어진 노래이며 그 뒤 악장으로 불렸다.
이 노래는 개언로(開言路)·보공신(保功臣)·정경계(正經界)·정예악(定禮樂) 등 4장으로 되어 있다. 개언로장에서는 태조가 민정을 파악하고자 언로를 크게 열고 널리 여론을 청취함으로써 그 덕이 순(舜)임금과 같다고 하였다. 보공신장에서는 꾀와 힘을 다하여 조선창업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잘 보살피는 무궁한 덕을 읊었다.
정경계장에서는 고려시대에 무너진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널리 골라 창고가 꽉 차게 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게 된 치덕을 노래했다. 정예악장에서는 정치의 요체가 되는 예악을 새로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 바르고 화평하게 한 덕을 읊고 있다.
한시의 압운(押韻)을 보면, 제1·2장은 상평성(上平聲) 동운(東韻)을 취하고 있다. 제3장은 하평성(下平聲) 우운(尤韻)을, 제4장은 입성(入聲) 통운(通韻)을 취하고 있다. 즉 절구운(絶句韻)이 아니라 각 장 매구운(每句韻)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덕곡〉은 압운과 평측으로 볼 때 칠언절구가 아니라 칠언고시(七言古詩) 내지 칠언단시(七言短詩)이다. 그리고 매구운을 쓴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의도적으로 지어진 노래의 가사임을 알 수 있다.
각 장의 6행 중 제1∼4행은 전대절(前大節), 제5·6행은 후소절(後小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5행 앞에는 ‘개언로군불견(開言路君不見)가’, ‘보공신군불견(保功臣君不見)가’, ‘정경계군불견(正經界君不見)가’, ‘정예악군불견(定禮樂君不見)가’ 등의 전렴(前斂)이 온다. 제6행 앞에는 ‘아으’라는 감탄구가 오는 것이 특징이다.
〈문덕곡〉은 처음에는 한시였다가 후에 무악화(舞樂化)되어 춤과 함께 노래되면서 무악에 맞추기 위하여 현토를 수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춤은 춤이라기보다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정재(呈才)라 할 수 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정도전이 태조의 명에 따라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악학궤범≫의 성종조 향악정재도의(鄕樂呈才圖儀)에 비로소 무의(舞儀)가 보인다.
그러나 춤의 구성이 성기고 소박하며, 의물(儀物)을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왕이 환궁하는 날에 그 대가(大駕)를 맞을 때 길에서 춤추며 노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정재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성종 이후 언제까지 〈문덕곡〉의 노래와 정재가 행하여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정재가 크게 떨쳤던 순조 때의 ≪진찬의궤 進饌儀軌≫와 고종 때의 ≪정재무도홀기 呈才舞圖笏記≫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도 재연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노랫말과 간단한 춤추는 절차만이 전할 뿐 그 음악적 내용과 춤의 모습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삼봉의 악장가운데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의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한 文治를 가장 극명히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각 장마다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문덕곡은 開言路ㆍ保功臣ㆍ正經界ㆍ定禮樂등 4장으로 이루어진 7言 絶句 한시체 이며 매 장의 2구는 후렴구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후렴구에 나타난 임금에 대한 칭송은 일견 阿諛的인 문자로 볼 소지가 있으나, 문덕곡은 治國의 方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노래이다. 이는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정치를 함에 있어서 덕치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것으로 정도전의 정치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태조를 무조건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성계가 정도전의 「문덕곡」을 듣고는 “공덕을 노래로 불러서 칭송하는 것이 실제에 지나쳐서 이 가곡을 들을 때 마다 짐의 마음이 부끄럽다“라고 한 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악장이 무조건적인 칭송의 문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開言路>의 끝 2 구는 후렴구인데 순임금과 태조의 덕을 동등한 것으로 찬미하고 있다. 여기서의 표현은 阿諛로만 비판 하기 보다는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 자긍심의 발로로 보고, 신하가 자신의 의도를 은근히 표현하는 諫諍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순임금도 桀紂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후렴구는 마지막구를 반복하여 다시 음악의 절주에 맞추는데 驚戒之詞의 의미를 띈다. 즉 군왕이 항상 체득하고 갖춰야할 요건이나 덕목을 관현의 반주에 맞추어 잊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이다.
<保功臣>은 두 번째 장으로서 임금과 신하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도전 은『삼봉집』권3에서 군신의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正己格君’이야말로 治 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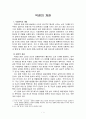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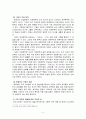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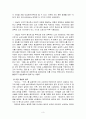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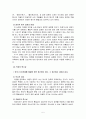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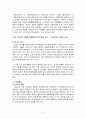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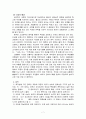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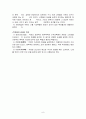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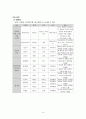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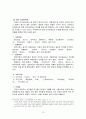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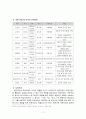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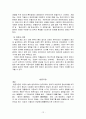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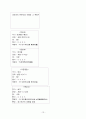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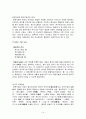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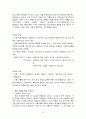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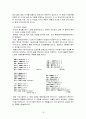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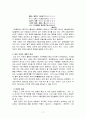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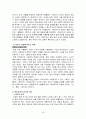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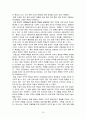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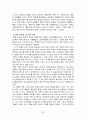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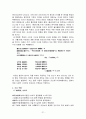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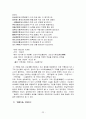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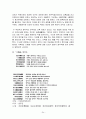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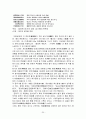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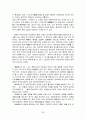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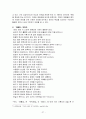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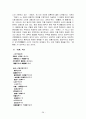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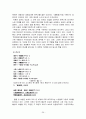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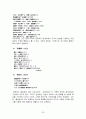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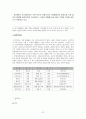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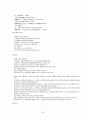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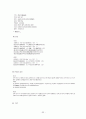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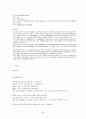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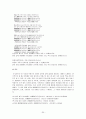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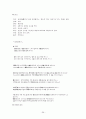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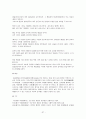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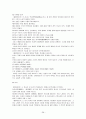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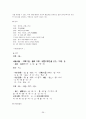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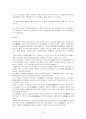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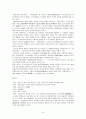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