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훈민정음
2. 표기법
3. 문헌자료
4. 중세국어의 형태적 특징
5. 중세국어의 통사적 특징
2. 표기법
3. 문헌자료
4. 중세국어의 형태적 특징
5. 중세국어의 통사적 특징
본문내용
중세국어
1. 문자와 문헌
훈민정음
창제시기
창제 : 1443년(세종25) 음력 12월에 예의본 완성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서문
(御製序文)」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자주정신)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만드니(애민정신) 사람마다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실용정신)
구성
예의
어지(御旨) : 창제의 취지
글자와 소리값 : 초성, 중성, 종성 글자와 소리값
글자의 운용 : 연서법(이어쓰기), 병서법(나란히쓰기), 부서법(붙여쓰기), 성음법(음절이루기), 사성법(점찍기)
해례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정인지 서
훈민정음 제작 경위
반포 : 1446년 9월(세종28) 음력 9월 상한에 해례본 완성
1459년(세조5) 언해본 간행(‘예의’만 언해되어 ‘예의본’이라고도 함)
구성
창제원리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상형의 원리 : 기본자(초성 5개, 중성 3개)를 만듦
초성자(조음위치)
중성자(우주의 기본요소)
아음 :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 ㅋ
설음 :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 ㄷ - ㅌ
순음 : ㅁ은 입의 모양 - ㅂ - ㅍ
치음 : ㅅ은 이의 모양 - ㅈ - ㅊ
후음 : ㆁ은 목구멍의 모양 - ㆆ - ㅎ
상형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하늘
ㆍ
ㅏ, ㅗ
땅
ㅡ
ㅓ, ㅜ
사람
ㅣ
ㅑ, ㅕ, ㅛ, ㅠ
가획의 원리 : 어떤 자의 음보다 ‘성출초려’(소리가 약간 셈)한 음을 표시하는 글자는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듦
합이성의 원리 : 기본자끼리 조합하여 초출자를 만들어 내고, 다시 초출자와 기본자 ‘ㅣ’를 조합하여 재출자를 만듦
성음법
초성, 중성, 종상의 글자를 합쳐서 적어야 소리가 이루어진다는 규정(모아쓰기) → 한자를 글자의 모범으로 생각 군, 땀, , , 침
초성자
초성자
(17자)
조음위치
기본자
가획 한 번
가획 두 번
이체자
아음
ㄱ
ㅋ
ㆁ
조음위치는 아음이나 소리가 후음과 유사하여 ‘ㅇ’에 가획함
설음
ㄴ
ㄷ
ㅌ
ㄹ
‘ㄴ→ㄷ→ㄹ’ 가획하였으나 가획의 의미(소리의 세기)는 없음
순음
ㅁ
ㅂ
ㅍ
치음
ㅅ
ㅈ
ㅊ
ㅿ
\'ㅅ→ㅿ‘ 가획하였으나 가획의 의미(소리의 세기)는 없음
후음
ㅇ
ㆆ
ㅎ
조음위치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예사소리)
ㄱ
ㄷ
ㅂ
ㅅ,ㅈ
ㆆ
차청(거센소리)
ㅋ
ㅌ
ㅍ
ㅊ
ㅎ
불청불탁(울림소리)
ㆁ
ㄴ
ㅁ
ㅇ
ㄹ
ㅿ
전탁(된소리)
ㄲ
ㄸ
ㅃ
ㅆ,ㅉ
ㆅ
연서자
ㆁ을 입술소리 밑에 연서하면 순경음이 된다. → 순경음 표기(ㅸ, ㆄ, ㅹ, ㅱ,)
병서자
각자병서
초성을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쓴다. → 된소리 표기(ㄲ, ㄸ, ㅃ. ㅉ. ㅆ, ㆅ)
합용병서
초성 두 자, 세 자를 합해서 나란히 쓴다.
된소리설
ㅅ계 합용병서
된소리 표기(ㅺ, ㅼ, ㅽ) → 16세기 초에 된소리로 바뀜
‘ㅅ’계 합용병서로 쓰인 말이 현대어에서는 대체로 된소리로 발음 리>꼬리, ㅎ>땅
‘ㅅ’을 예전에 ‘된시옷’으로 불렀던 사실
‘ㅅ’이 사이시옷으로 쓰여서 뒤에 실현되는 말이 된소리로 발음됨*‘ㅻ’제외 히>사나이
이중자음설
ㅂ계 합용병서
어두자음군 표기(ㅳ, ㅄ, ㅶ, ㅷ) → 18세기 초 된소리로 바뀜
/ㅂ/의 덧남 해>햅쌀, 조>좁쌀,
/ㅂ/받침소리 존재 말며 > 밟지, 쉬 아니니>쉽지
<훈민정음 해례>에서 합용병서 글자의 음가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각각의 글자대로 발음한 것으로 보아야 함.
ㅄ계 합용병서
어두자음군 표기(ㅴ, ㅵ) 이>입때, >함께 → 17세기 된소리 또는 ‘ㅂ’계 합용병서로 합류
중성자
기본자
상형
기본자
혀
소리
하늘
ㆍ
설축
소리가 깊음
땅
ㅡ
설소축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
사람
ㅣ
설불축
소리가 얕음
ㆍ, ㅡ, ㅣ
단모음
단일구성
합성자
초출자
‘ㆍ’가 하나만 쓰임 → ㅏ, ㅓ, ㅗ, ㅜ
재출자
‘ㆍ’가 두 개 쓰임 → ㅑ, ㅕ, ㅛ, ㅠ
* 단일구성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구성과 발음이 불일치)
이중모음
합용자
동출합용자
초출자, 재출자끼리 합함 → ㅘ, ㅝ, ㆇ, ㆊ
복합구성
‘l\'합용 일자 중성
중성자 하나(단일구성 11개 중 ‘ㅣ’모음 제외한 10개)가 ‘ㅣ’와 합함
→ ㆎ, ㅢ, ㅐ, ㅔ, ㅚ, ㅟ, ㅒ, ㅖ, ㆉ, ㆌ
‘l\'합용 이자 중성
종성자 두 개(동출합용자 4개)가 ‘ㅣ’와 합함 → ㅙ, ㅞ, ㆈ, ㆋ
종성자
鐘聲復用初聲 :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가져다 쓴다.
『훈민정음』 해례본 八鐘聲可足用也 : 받침에는 ㄱㆁㄷㄴㅂㅁㅅㄹ 8자면 가히 족히 쓸 수 있다.
사성법
성조
방점법
거성
가장 높은 소리
글자의 왼쪽에 점 하나
상성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글자의 왼쪽에 점 둘
평성
가장 낮은 소리
점 없음
입성
빨리 끝나는 소리 (경우에 따라 평성, 상성, 거성이 될 수 있으나, 한자음의 경우에는 거성과 유사한 소리)
평성, 상성, 거성의 경우와 같음
표기법
표음주의적 표기법
음소적 표기법
명사나 용언의 어간형을 고정시키지 않고 교체 현상을 표기에 반영 八鐘聲可足用也 : 고지(곶+이), 곳도(곶+도), 업서(없+어), 업고(없+고) = 표음주의적 표기법
단, 자음동화는 반영되지 않음 믿는[민는]
예외
명사나 용언의 어간형을 고정시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냄 鐘聲復用初聲 : 곶,
1. 문자와 문헌
훈민정음
창제시기
창제 : 1443년(세종25) 음력 12월에 예의본 완성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서문
(御製序文)」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자주정신)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만드니(애민정신) 사람마다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실용정신)
구성
예의
어지(御旨) : 창제의 취지
글자와 소리값 : 초성, 중성, 종성 글자와 소리값
글자의 운용 : 연서법(이어쓰기), 병서법(나란히쓰기), 부서법(붙여쓰기), 성음법(음절이루기), 사성법(점찍기)
해례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정인지 서
훈민정음 제작 경위
반포 : 1446년 9월(세종28) 음력 9월 상한에 해례본 완성
1459년(세조5) 언해본 간행(‘예의’만 언해되어 ‘예의본’이라고도 함)
구성
창제원리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상형의 원리 : 기본자(초성 5개, 중성 3개)를 만듦
초성자(조음위치)
중성자(우주의 기본요소)
아음 :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 ㅋ
설음 :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 ㄷ - ㅌ
순음 : ㅁ은 입의 모양 - ㅂ - ㅍ
치음 : ㅅ은 이의 모양 - ㅈ - ㅊ
후음 : ㆁ은 목구멍의 모양 - ㆆ - ㅎ
상형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하늘
ㆍ
ㅏ, ㅗ
땅
ㅡ
ㅓ, ㅜ
사람
ㅣ
ㅑ, ㅕ, ㅛ, ㅠ
가획의 원리 : 어떤 자의 음보다 ‘성출초려’(소리가 약간 셈)한 음을 표시하는 글자는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하여 만듦
합이성의 원리 : 기본자끼리 조합하여 초출자를 만들어 내고, 다시 초출자와 기본자 ‘ㅣ’를 조합하여 재출자를 만듦
성음법
초성, 중성, 종상의 글자를 합쳐서 적어야 소리가 이루어진다는 규정(모아쓰기) → 한자를 글자의 모범으로 생각 군, 땀, , , 침
초성자
초성자
(17자)
조음위치
기본자
가획 한 번
가획 두 번
이체자
아음
ㄱ
ㅋ
ㆁ
조음위치는 아음이나 소리가 후음과 유사하여 ‘ㅇ’에 가획함
설음
ㄴ
ㄷ
ㅌ
ㄹ
‘ㄴ→ㄷ→ㄹ’ 가획하였으나 가획의 의미(소리의 세기)는 없음
순음
ㅁ
ㅂ
ㅍ
치음
ㅅ
ㅈ
ㅊ
ㅿ
\'ㅅ→ㅿ‘ 가획하였으나 가획의 의미(소리의 세기)는 없음
후음
ㅇ
ㆆ
ㅎ
조음위치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예사소리)
ㄱ
ㄷ
ㅂ
ㅅ,ㅈ
ㆆ
차청(거센소리)
ㅋ
ㅌ
ㅍ
ㅊ
ㅎ
불청불탁(울림소리)
ㆁ
ㄴ
ㅁ
ㅇ
ㄹ
ㅿ
전탁(된소리)
ㄲ
ㄸ
ㅃ
ㅆ,ㅉ
ㆅ
연서자
ㆁ을 입술소리 밑에 연서하면 순경음이 된다. → 순경음 표기(ㅸ, ㆄ, ㅹ, ㅱ,)
병서자
각자병서
초성을 어울려 쓰려면 나란히 쓴다. → 된소리 표기(ㄲ, ㄸ, ㅃ. ㅉ. ㅆ, ㆅ)
합용병서
초성 두 자, 세 자를 합해서 나란히 쓴다.
된소리설
ㅅ계 합용병서
된소리 표기(ㅺ, ㅼ, ㅽ) → 16세기 초에 된소리로 바뀜
‘ㅅ’계 합용병서로 쓰인 말이 현대어에서는 대체로 된소리로 발음 리>꼬리, ㅎ>땅
‘ㅅ’을 예전에 ‘된시옷’으로 불렀던 사실
‘ㅅ’이 사이시옷으로 쓰여서 뒤에 실현되는 말이 된소리로 발음됨*‘ㅻ’제외 히>사나이
이중자음설
ㅂ계 합용병서
어두자음군 표기(ㅳ, ㅄ, ㅶ, ㅷ) → 18세기 초 된소리로 바뀜
/ㅂ/의 덧남 해>햅쌀, 조>좁쌀,
/ㅂ/받침소리 존재 말며 > 밟지, 쉬 아니니>쉽지
<훈민정음 해례>에서 합용병서 글자의 음가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각각의 글자대로 발음한 것으로 보아야 함.
ㅄ계 합용병서
어두자음군 표기(ㅴ, ㅵ) 이>입때, >함께 → 17세기 된소리 또는 ‘ㅂ’계 합용병서로 합류
중성자
기본자
상형
기본자
혀
소리
하늘
ㆍ
설축
소리가 깊음
땅
ㅡ
설소축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음
사람
ㅣ
설불축
소리가 얕음
ㆍ, ㅡ, ㅣ
단모음
단일구성
합성자
초출자
‘ㆍ’가 하나만 쓰임 → ㅏ, ㅓ, ㅗ, ㅜ
재출자
‘ㆍ’가 두 개 쓰임 → ㅑ, ㅕ, ㅛ, ㅠ
* 단일구성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구성과 발음이 불일치)
이중모음
합용자
동출합용자
초출자, 재출자끼리 합함 → ㅘ, ㅝ, ㆇ, ㆊ
복합구성
‘l\'합용 일자 중성
중성자 하나(단일구성 11개 중 ‘ㅣ’모음 제외한 10개)가 ‘ㅣ’와 합함
→ ㆎ, ㅢ, ㅐ, ㅔ, ㅚ, ㅟ, ㅒ, ㅖ, ㆉ, ㆌ
‘l\'합용 이자 중성
종성자 두 개(동출합용자 4개)가 ‘ㅣ’와 합함 → ㅙ, ㅞ, ㆈ, ㆋ
종성자
鐘聲復用初聲 :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가져다 쓴다.
『훈민정음』 해례본 八鐘聲可足用也 : 받침에는 ㄱㆁㄷㄴㅂㅁㅅㄹ 8자면 가히 족히 쓸 수 있다.
사성법
성조
방점법
거성
가장 높은 소리
글자의 왼쪽에 점 하나
상성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글자의 왼쪽에 점 둘
평성
가장 낮은 소리
점 없음
입성
빨리 끝나는 소리 (경우에 따라 평성, 상성, 거성이 될 수 있으나, 한자음의 경우에는 거성과 유사한 소리)
평성, 상성, 거성의 경우와 같음
표기법
표음주의적 표기법
음소적 표기법
명사나 용언의 어간형을 고정시키지 않고 교체 현상을 표기에 반영 八鐘聲可足用也 : 고지(곶+이), 곳도(곶+도), 업서(없+어), 업고(없+고) = 표음주의적 표기법
단, 자음동화는 반영되지 않음 믿는[민는]
예외
명사나 용언의 어간형을 고정시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냄 鐘聲復用初聲 : 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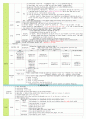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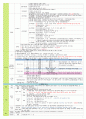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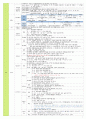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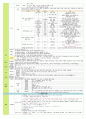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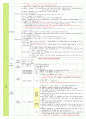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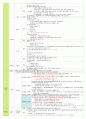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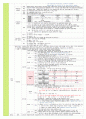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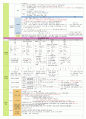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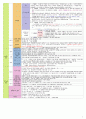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