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향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서동요 : 백제 무왕
2. 혜성가 : 융천사
3. 풍요 : 만성 남녀
4. 원왕생가 : 광덕
5. 모 죽지랑가 : 득오곡
6. 헌화가 : 실명 노인
7. 제 망매가 : 월명사
8. 도솔가 : 월명사
9. 찬 기파랑가 : 충담사
10. 천수대비가 : 희명
11. 안민가 : 충담사
12. 우적가 : 영재
13. 처용가 : 처용
14. 보현십원가 : 균여대사
1. 서동요 : 백제 무왕
2. 혜성가 : 융천사
3. 풍요 : 만성 남녀
4. 원왕생가 : 광덕
5. 모 죽지랑가 : 득오곡
6. 헌화가 : 실명 노인
7. 제 망매가 : 월명사
8. 도솔가 : 월명사
9. 찬 기파랑가 : 충담사
10. 천수대비가 : 희명
11. 안민가 : 충담사
12. 우적가 : 영재
13. 처용가 : 처용
14. 보현십원가 : 균여대사
본문내용
향가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신라의 노래로서 ‘우리의 노래’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로서 <삼국사기>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집니다.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향가는 전래민요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10구체로 갈수록 점차 정제되어 완성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10구체의 낙구에서는 ‘아야’라는 감탄사가 붙는데 이것은 뒤의 시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자층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주로 승려와 화랑이 대다수여서 불교적 색체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한자를 무작정 쓰지 않고 음과 소리를 빌려 쓴 것으로 보아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쓴 좋은 예입니다.
1. 서동요 : 백제 무왕
2. 혜성가 : 융천사
3. 풍요 : 만성 남녀
4. 원왕생가 : 광덕
5. 모 죽지랑가 : 득오곡
6. 헌화가 : 실명 노인
7. 제 망매가 : 월명사
8. 도솔가 : 월명사
9. 찬 기파랑가 : 충담사
10. 천수대비가 : 희명
11. 안민가 : 충담사
12. 우적가 : 영재
13. 처용가 : 처용
14. 보현십원가 : 균여대사
서동요
선화공주(善化公主)니믄善化公主主隱
그지 얼어 두고,他密只嫁良置古
맛둥바 薯童房乙
바 몰 안고 가다.夜矣卯乙抱遣去如
<삼국유사(三國遺事)>
백제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가 연못가에 살고있었는데, 그 못에 사는 용과 정을 통하여 그를 낳았다. 항상 마를 캐며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름은 서동(맛둥)이며 도량이 넓었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의 수도로 갔다.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니 아이들이 친해서 따르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얼어 두고 서동방(薯童房)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라는 내용의 동요를 지은 후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였다. 진평왕의 오해를 산 그녀는 결국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서동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
이 노래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 백제의 무왕이 지은 4구체 향가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이고, 전래민요가 정착된 작품이며 서동이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참요(예언하는 노래)이다. 10구체 향가와는 달리 4구체 민요 형식으로 정제되어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남의 것으로 돌려 진솔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서 천박해 보이지 않는다.
이 설화의 내용은, 서동이라는 한 영웅이 시련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의 귀천과 같은 제약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영웅 설화에 포함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서동이 용의 아들로 태어나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됨으로써 영웅 설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혜성가
녀리 실 믈갓
乾達婆애 노론 자살랑 바라고,
여릿 軍도 왯다
홰 태얀 어여 수프리야.
三花애 오롬 보시올 듣고
다라라도 가라그시 자자렬 바애,
길 쓸 벼리 바라고
彗星이여 살바녀 사라미 잇다.
아야 다라라 떠갯다야.
이예 버믈 므슴ㅅ彗ㅅ 다마닛고.
예로부터 동해변
건달파(국선, 화랑)들이 노는 성을 보고서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올리던 해변이로다.
세 화랑들의 관산행차(觀山行次)를 듣고,
달도 이미 훤청히 밝혀 주고 있는데
길안내 별을 보고
혜서이라고 사뢰는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이 갔다.
달도 없는데 무슨 혜기(慧氣)가 있다는 말인가.
신라 진평왕 때, 거열랑, 실처랑,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으로 유람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중심이 되는 큰 별:북극성)을 범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천체의 괴변은 종종 국토에 불길한 변란을 가져온다는 속설이 있었으므로, 혹 왜군의 침범이 염려되어 세 화랑은 금강산 유람을 포기했다. 그 때, 융천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변괴가 사라지고 때마침 국토를 침범한 왜병도 물러갔다. 이리하여 화가 물러가자 대왕이 기뻐하여 그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유람하게 하였다.
10구체 향가로서 주술적이며 혜성의 변괴를 없애고 왜병의 침략을 막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전하는 향가로는 초기의 것으로, 이 노래는 강한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 고대 가요일수록 노래의 주술성을 동반하는데 향가 <혜성가>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이 노래에서는 언어와 사실을 동일시하여 나타난 혜성이 없다고 함으로써 혜성을 사라지게 한 고대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풍요
來如來如來如 오다 오다 오다 오라 오라 오라
來如哀反多羅 오다 셔럽다라 오라 서럽더라
哀反多矣徒良 셔럽다 의내여 서럽다 우리들이여
功德修叱如良來如 功德 라 오다 공덕 닦으러 오라.
이 노래는 신라 선덕여왕 때 명승 양지가 영묘사의 불상인 장륙존상을 만들 때, 이 일을 도와주려고 모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 주어 진흙을 운반하면서 부른 것이라 고한다. 그 후 고려시대에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을 보면 노동요로 볼 수도 있지만 한 줌의 흙이라도 부처님께 공양하겠다는 마음이 담긴 순수한 불교적 민요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온다’는 말의 연속적인 반복은 강한 운율을 느끼게 하고 꿈에 공덕을 닦으러 온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으며, ‘서럽더라’는 자신의 신세가 서럽다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없는 현세에서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서동요>나 <헌화가>와 함께 현존 향가의 민요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형태로 여러 사람에게 불려진 노래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사용된 ‘풍요’라는 명칭은 노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민요라는 노래 성격으로 지칭한 것인데 즉, <풍요>는 민요란 뜻으로, 성중의 남녀들이 불렀던 민요이다.
원왕생가
하 이뎨 달님이시여, 이제
西方(서방)장 가샤리고 서방 정토까지 가시려는가.
無量壽佛前(무량수불전)에 (가시거든)무량수불 앞에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신라의 노래로서 ‘우리의 노래’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로서 <삼국사기>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해집니다.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향가는 전래민요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10구체로 갈수록 점차 정제되어 완성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10구체의 낙구에서는 ‘아야’라는 감탄사가 붙는데 이것은 뒤의 시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자층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주로 승려와 화랑이 대다수여서 불교적 색체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한자를 무작정 쓰지 않고 음과 소리를 빌려 쓴 것으로 보아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쓴 좋은 예입니다.
1. 서동요 : 백제 무왕
2. 혜성가 : 융천사
3. 풍요 : 만성 남녀
4. 원왕생가 : 광덕
5. 모 죽지랑가 : 득오곡
6. 헌화가 : 실명 노인
7. 제 망매가 : 월명사
8. 도솔가 : 월명사
9. 찬 기파랑가 : 충담사
10. 천수대비가 : 희명
11. 안민가 : 충담사
12. 우적가 : 영재
13. 처용가 : 처용
14. 보현십원가 : 균여대사
서동요
선화공주(善化公主)니믄善化公主主隱
그지 얼어 두고,他密只嫁良置古
맛둥바 薯童房乙
바 몰 안고 가다.夜矣卯乙抱遣去如
<삼국유사(三國遺事)>
백제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가 연못가에 살고있었는데, 그 못에 사는 용과 정을 통하여 그를 낳았다. 항상 마를 캐며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름은 서동(맛둥)이며 도량이 넓었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의 수도로 갔다.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니 아이들이 친해서 따르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얼어 두고 서동방(薯童房)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라는 내용의 동요를 지은 후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였다. 진평왕의 오해를 산 그녀는 결국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서동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
이 노래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때 백제의 무왕이 지은 4구체 향가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이고, 전래민요가 정착된 작품이며 서동이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참요(예언하는 노래)이다. 10구체 향가와는 달리 4구체 민요 형식으로 정제되어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남의 것으로 돌려 진솔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서 천박해 보이지 않는다.
이 설화의 내용은, 서동이라는 한 영웅이 시련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의 귀천과 같은 제약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영웅 설화에 포함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서동이 용의 아들로 태어나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됨으로써 영웅 설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혜성가
녀리 실 믈갓
乾達婆애 노론 자살랑 바라고,
여릿 軍도 왯다
홰 태얀 어여 수프리야.
三花애 오롬 보시올 듣고
다라라도 가라그시 자자렬 바애,
길 쓸 벼리 바라고
彗星이여 살바녀 사라미 잇다.
아야 다라라 떠갯다야.
이예 버믈 므슴ㅅ彗ㅅ 다마닛고.
예로부터 동해변
건달파(국선, 화랑)들이 노는 성을 보고서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올리던 해변이로다.
세 화랑들의 관산행차(觀山行次)를 듣고,
달도 이미 훤청히 밝혀 주고 있는데
길안내 별을 보고
혜서이라고 사뢰는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이 갔다.
달도 없는데 무슨 혜기(慧氣)가 있다는 말인가.
신라 진평왕 때, 거열랑, 실처랑,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으로 유람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중심이 되는 큰 별:북극성)을 범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천체의 괴변은 종종 국토에 불길한 변란을 가져온다는 속설이 있었으므로, 혹 왜군의 침범이 염려되어 세 화랑은 금강산 유람을 포기했다. 그 때, 융천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변괴가 사라지고 때마침 국토를 침범한 왜병도 물러갔다. 이리하여 화가 물러가자 대왕이 기뻐하여 그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유람하게 하였다.
10구체 향가로서 주술적이며 혜성의 변괴를 없애고 왜병의 침략을 막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전하는 향가로는 초기의 것으로, 이 노래는 강한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 고대 가요일수록 노래의 주술성을 동반하는데 향가 <혜성가>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이 노래에서는 언어와 사실을 동일시하여 나타난 혜성이 없다고 함으로써 혜성을 사라지게 한 고대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풍요
來如來如來如 오다 오다 오다 오라 오라 오라
來如哀反多羅 오다 셔럽다라 오라 서럽더라
哀反多矣徒良 셔럽다 의내여 서럽다 우리들이여
功德修叱如良來如 功德 라 오다 공덕 닦으러 오라.
이 노래는 신라 선덕여왕 때 명승 양지가 영묘사의 불상인 장륙존상을 만들 때, 이 일을 도와주려고 모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 주어 진흙을 운반하면서 부른 것이라 고한다. 그 후 고려시대에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을 보면 노동요로 볼 수도 있지만 한 줌의 흙이라도 부처님께 공양하겠다는 마음이 담긴 순수한 불교적 민요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온다’는 말의 연속적인 반복은 강한 운율을 느끼게 하고 꿈에 공덕을 닦으러 온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으며, ‘서럽더라’는 자신의 신세가 서럽다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없는 현세에서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서동요>나 <헌화가>와 함께 현존 향가의 민요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형태로 여러 사람에게 불려진 노래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사용된 ‘풍요’라는 명칭은 노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민요라는 노래 성격으로 지칭한 것인데 즉, <풍요>는 민요란 뜻으로, 성중의 남녀들이 불렀던 민요이다.
원왕생가
하 이뎨 달님이시여, 이제
西方(서방)장 가샤리고 서방 정토까지 가시려는가.
無量壽佛前(무량수불전)에 (가시거든)무량수불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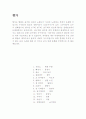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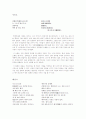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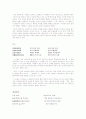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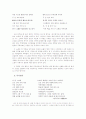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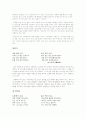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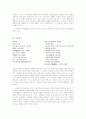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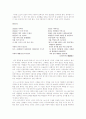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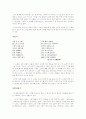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