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⑴ 창작동기
⑵ 형식
⑶ 원문 및 현대어 풀이
1. 예경제불가
2. 칭찬여래가
3. 광수공양가
4. 참회업장가
5. 수희공덕가
6. 청전법륜가
7. 청불주세가
8. 상수불학가
9. 항순중생가
10. 보개회향가
11. 총결무진가
Ⅲ. 결론
- 보현십원가의 국문학적 의의
Ⅱ. 본 론
⑴ 창작동기
⑵ 형식
⑶ 원문 및 현대어 풀이
1. 예경제불가
2. 칭찬여래가
3. 광수공양가
4. 참회업장가
5. 수희공덕가
6. 청전법륜가
7. 청불주세가
8. 상수불학가
9. 항순중생가
10. 보개회향가
11. 총결무진가
Ⅲ. 결론
- 보현십원가의 국문학적 의의
본문내용
보현십종원왕가(普賢十種願往歌: 약칭 普賢十願歌)》라는 11수(首)의 향가(鄕歌)를 지어 노래로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부르게 함으로써, 대중이 부처에 친근해지도록 하였다. 불교계의 종파 통합에도 힘을 기울여 관혜(觀惠)의 남악파(南岳派)와 희랑(希朗)의 북악파(北岳派)의 통합을 위해 인유(仁裕)와 함께 대찰(大刹)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였고 민간을 방문하여 설교하여 종파 간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958년(광종 9)에는 시관(試官)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했다. 법계(法階)는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에 이르렀다. 한때 오관산(五冠山) 마하갑사(摩訶岬寺)에 있었으며, 963년(광종 14) 왕이 그를 위해 창건한 귀법사(歸法寺)에서 주지로 있다가 죽었다.
그의 저서로는 《수현방궤기(搜玄方軌記)》 《공목장기(孔目章記)》 《오십요문답기(五十要問答記)》 《탐현기석(探玄記釋)》 《교분기석(敎分記釋)》 《지귀장기(旨歸章記)》 《삼보장기(三寶章記)》 《법계도기(法界圖記)》 《십구장기(十句章記)》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抄記)》 등이 있다.
★ 균여전
원명은 《대화엄귀법사주원통수좌균여전(大華嚴歸法寺主圓通首座均如傳)》이다. 균여의 제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찬술되었다. 전체 10문 중 제7 〈가행화세분(歌行化世分)〉에는, 균여가 보현십원(普賢十願)에 따라 지은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 이하 l1수의 향가가 실려 있고, 제7의 전문(前文)에는 그 작가의 유래를 밝혔다.
또 제8 〈역가공덕분(譯歌功德分)〉에는 균여와 같은 때의 사람인 최행귀(崔行歸)가 이를 한시(漢詩)로 번역한 것이 함께 실려 있다. 희귀한 향가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와 함께 고대 국어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해인사(海印寺) 소장의 대장경보판(大藏經補板) 중 《석화엄교분기원통초(釋華嚴敎分記圓通)》 권10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Ⅱ. 본 론
⑴ 창작동기
이 노래는『균여전』<가행화세분>에 있는데 이는 ‘법가를 유행케 하여 속세를 교화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나와있는 창작의도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대저 사뇌란 것은 세상사람들의 유희와 오락의 도구요, 부처님께 소원하는 것은 도를 닦는 요체이다. 얕은데를 지나서 깊은데로 들어가고, 가까운 것을 좇아서 먼 것에 이르는 것이니 세상일을 자료로 하여 불교와 연분이 적은 사람을 끌어 들여야 한다. 이제 알기 쉽고 가까운 일로 미루어서 생각해 내기 어려운 먼 근원을 알게끔 열한수의 거칠은 노랫말은 만드니 뭇사람의 눈앞에 내놓기는 극히 부끄러우나 여러 부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를 바란다. 비록 뜻이 덜 되고 말이 어그러져 성현의 오묘한 취지에 맞지 못하더라도 일반 세속사람들의 선행을 닦는 뿌리가 생기기를 바란다. 웃으며 외우고자 하는 이는 그 외우는 염원의 인연을 맺을 것이고 헐뜯으며 생각하는 이는 염원하는 이익을 얻을 것이니 후세의 점잖은 분네께 엎드려서 청하거니와 헐뜯거나 예찬하거나 이것은 관계치 않는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 널레 퍼져서 이따금씩 여러 담벼락에 써붙여지기도 하였다. 사평군에 급한(벼슬이름)으로 있는 나필이 삼년동안 중병을 앓았는데 균여대사가 보고 가엾이 여겨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늘 읽으라고 권하였다. 그후 어느날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네가 큰 성인의 노래 덕으로 아픈 것이 꼭 나으리라고 하더니 제절로 병이 나았다.
이를 보아 균여가 향가를 지은 목적은 불법으로 대중을 교화하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⑵ 형식
각 수 모두가 11분절로 띄어져 있다. 10구체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그 띄어쓰기를 존중하여 11구체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형식상 정연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1 구는 매우 짧으며, 제9 구 앞에는 감탄사를 수반하는 것이 특성이다. 각 작품 모두가 의미단위로는 세 단락이다. 이들 세 단락을 이루는 구수는 4구 또는 2구이며, 작품은 4·4·2의 구수로 되어있다. 체제는 <화엄경〉보현행원품에 기초하여, 그 10행원의 순서를 그대로 하고, 제목은 \'****품\'을 ‘****가\'로 고치고 그밖의 다른 글자는 거의 그대로 쓰면서 10수의 향가를 창작한 다음에〈총결무진가>를 더하여, 전체 11수로 짜고 있다
⑶ 원문 및 현대어 풀이
1. 禮敬諸佛歌(예경제불가)
心末筆留심말필유
慕呂白乎隱佛體前衣 모려백호은불체전의
拜內乎隱身萬隱 배내호은신만은
法界毛叱所只至去良 법계모질소지지거양
塵塵馬洛佛體叱刹亦 진진마락불체질찰역
刹刹每如邀里白乎隱 찰찰매여요리백호은
法界滿賜隱佛體 법계만사은불체
九世盡良禮爲白薺 구세진양예위백제
歎曰 身語意業無疲厭 탄왈 신어의업무피염
此良夫作沙毛叱等耶차양부작사모질등야
▶양주동 해독▶현대역
부드루 마음의 붓으로
그리 부텨전(前)에 그린 부처님 앞에
저누온 모절하옵는 이 내 몸아
법계(法界)록 니르가라법계의 끝까지 이르러라
진진(塵塵)마락 부텨ㅅ찰(刹)이티끌마다 부처님의 절이요,
찰찰(刹刹)마다 뫼시리 절마다 모시옵는
법계(法界) 샨 부텨법계에 가득찬 부처님
구세(九世) 다아 예(禮)져 구세 다하도록 절하고 싶어라
아으 신어의업무피염(身語意業无疲厭)아, 몸과 말과 뜻에 싫은 생각 없이
이에 브즐 다라이에 부지런히 사무치리
⇒ 여러 부처들에게 두루 절하자는 노래
2. 稱讚如來歌(칭찬여래가)
今日部伊冬衣 금일부이동의
南無佛也白孫舌良衣 남무불야백손설양의
無盡辯才叱海等 무진변재질해등
一念惡中涌出去良 일념악중용출거양
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 진진허물질요여백호은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공덕질신을대위백악지
際干萬隱德海 제간만은덕해힐
間王冬留讚伊白制 간왕동유찬이백제
隔句 必只一毛叱德置 격구 필지일모질덕치
毛等盡良白手隱乃兮모등진양백수은내혜
▶양주동 해독▶현대역
오 주비 오늘 모든 무리가
남(南)무불(佛)이여 손 혀아「나무불」이라 부르는 혀에
무진변재(無塵辯才)ㅅ 바끝없는 변재의 바다가
일념(一念)악 솟나가라 한 생각 안에 솟아나누나
진진허물(塵塵虛物)ㅅ 뫼시리속세의 허망함이 모시는
공덕신(功德身)ㅅ을 대디공덕의 몸을 다하겠기에
업는 덕(德)바 끝없는 덕의 바다를
서왕(西王)루 기리져부처로써 기리고지고
아으 비록 일모(一毛)ㅅ덕(德)두아, 비록 한 터럭만큼도
그의 저서로는 《수현방궤기(搜玄方軌記)》 《공목장기(孔目章記)》 《오십요문답기(五十要問答記)》 《탐현기석(探玄記釋)》 《교분기석(敎分記釋)》 《지귀장기(旨歸章記)》 《삼보장기(三寶章記)》 《법계도기(法界圖記)》 《십구장기(十句章記)》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抄記)》 등이 있다.
★ 균여전
원명은 《대화엄귀법사주원통수좌균여전(大華嚴歸法寺主圓通首座均如傳)》이다. 균여의 제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찬술되었다. 전체 10문 중 제7 〈가행화세분(歌行化世分)〉에는, 균여가 보현십원(普賢十願)에 따라 지은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 이하 l1수의 향가가 실려 있고, 제7의 전문(前文)에는 그 작가의 유래를 밝혔다.
또 제8 〈역가공덕분(譯歌功德分)〉에는 균여와 같은 때의 사람인 최행귀(崔行歸)가 이를 한시(漢詩)로 번역한 것이 함께 실려 있다. 희귀한 향가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와 함께 고대 국어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해인사(海印寺) 소장의 대장경보판(大藏經補板) 중 《석화엄교분기원통초(釋華嚴敎分記圓通)》 권10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Ⅱ. 본 론
⑴ 창작동기
이 노래는『균여전』<가행화세분>에 있는데 이는 ‘법가를 유행케 하여 속세를 교화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나와있는 창작의도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대저 사뇌란 것은 세상사람들의 유희와 오락의 도구요, 부처님께 소원하는 것은 도를 닦는 요체이다. 얕은데를 지나서 깊은데로 들어가고, 가까운 것을 좇아서 먼 것에 이르는 것이니 세상일을 자료로 하여 불교와 연분이 적은 사람을 끌어 들여야 한다. 이제 알기 쉽고 가까운 일로 미루어서 생각해 내기 어려운 먼 근원을 알게끔 열한수의 거칠은 노랫말은 만드니 뭇사람의 눈앞에 내놓기는 극히 부끄러우나 여러 부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를 바란다. 비록 뜻이 덜 되고 말이 어그러져 성현의 오묘한 취지에 맞지 못하더라도 일반 세속사람들의 선행을 닦는 뿌리가 생기기를 바란다. 웃으며 외우고자 하는 이는 그 외우는 염원의 인연을 맺을 것이고 헐뜯으며 생각하는 이는 염원하는 이익을 얻을 것이니 후세의 점잖은 분네께 엎드려서 청하거니와 헐뜯거나 예찬하거나 이것은 관계치 않는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 널레 퍼져서 이따금씩 여러 담벼락에 써붙여지기도 하였다. 사평군에 급한(벼슬이름)으로 있는 나필이 삼년동안 중병을 앓았는데 균여대사가 보고 가엾이 여겨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늘 읽으라고 권하였다. 그후 어느날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네가 큰 성인의 노래 덕으로 아픈 것이 꼭 나으리라고 하더니 제절로 병이 나았다.
이를 보아 균여가 향가를 지은 목적은 불법으로 대중을 교화하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⑵ 형식
각 수 모두가 11분절로 띄어져 있다. 10구체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그 띄어쓰기를 존중하여 11구체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형식상 정연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1 구는 매우 짧으며, 제9 구 앞에는 감탄사를 수반하는 것이 특성이다. 각 작품 모두가 의미단위로는 세 단락이다. 이들 세 단락을 이루는 구수는 4구 또는 2구이며, 작품은 4·4·2의 구수로 되어있다. 체제는 <화엄경〉보현행원품에 기초하여, 그 10행원의 순서를 그대로 하고, 제목은 \'****품\'을 ‘****가\'로 고치고 그밖의 다른 글자는 거의 그대로 쓰면서 10수의 향가를 창작한 다음에〈총결무진가>를 더하여, 전체 11수로 짜고 있다
⑶ 원문 및 현대어 풀이
1. 禮敬諸佛歌(예경제불가)
心末筆留심말필유
慕呂白乎隱佛體前衣 모려백호은불체전의
拜內乎隱身萬隱 배내호은신만은
法界毛叱所只至去良 법계모질소지지거양
塵塵馬洛佛體叱刹亦 진진마락불체질찰역
刹刹每如邀里白乎隱 찰찰매여요리백호은
法界滿賜隱佛體 법계만사은불체
九世盡良禮爲白薺 구세진양예위백제
歎曰 身語意業無疲厭 탄왈 신어의업무피염
此良夫作沙毛叱等耶차양부작사모질등야
▶양주동 해독▶현대역
부드루 마음의 붓으로
그리 부텨전(前)에 그린 부처님 앞에
저누온 모절하옵는 이 내 몸아
법계(法界)록 니르가라법계의 끝까지 이르러라
진진(塵塵)마락 부텨ㅅ찰(刹)이티끌마다 부처님의 절이요,
찰찰(刹刹)마다 뫼시리 절마다 모시옵는
법계(法界) 샨 부텨법계에 가득찬 부처님
구세(九世) 다아 예(禮)져 구세 다하도록 절하고 싶어라
아으 신어의업무피염(身語意業无疲厭)아, 몸과 말과 뜻에 싫은 생각 없이
이에 브즐 다라이에 부지런히 사무치리
⇒ 여러 부처들에게 두루 절하자는 노래
2. 稱讚如來歌(칭찬여래가)
今日部伊冬衣 금일부이동의
南無佛也白孫舌良衣 남무불야백손설양의
無盡辯才叱海等 무진변재질해등
一念惡中涌出去良 일념악중용출거양
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 진진허물질요여백호은
功德叱身乙對爲白惡只 공덕질신을대위백악지
際干萬隱德海 제간만은덕해힐
間王冬留讚伊白制 간왕동유찬이백제
隔句 必只一毛叱德置 격구 필지일모질덕치
毛等盡良白手隱乃兮모등진양백수은내혜
▶양주동 해독▶현대역
오 주비 오늘 모든 무리가
남(南)무불(佛)이여 손 혀아「나무불」이라 부르는 혀에
무진변재(無塵辯才)ㅅ 바끝없는 변재의 바다가
일념(一念)악 솟나가라 한 생각 안에 솟아나누나
진진허물(塵塵虛物)ㅅ 뫼시리속세의 허망함이 모시는
공덕신(功德身)ㅅ을 대디공덕의 몸을 다하겠기에
업는 덕(德)바 끝없는 덕의 바다를
서왕(西王)루 기리져부처로써 기리고지고
아으 비록 일모(一毛)ㅅ덕(德)두아, 비록 한 터럭만큼도
추천자료
 공민왕, 최영, 이성계
공민왕, 최영, 이성계 불상의 이해...
불상의 이해... 경복궁 문화유적 답사- 광화문, 해태, 근정전, 사정전, 근령전, 교태전, 아미산, 경회루, 수...
경복궁 문화유적 답사- 광화문, 해태, 근정전, 사정전, 근령전, 교태전, 아미산, 경회루, 수... 법주사기행문
법주사기행문 한국의 무용수 최승희에 대하여
한국의 무용수 최승희에 대하여 오즈의 마법사 연구
오즈의 마법사 연구 [신라향가][고려향가][향가]신라 향가와 고려 향가를 통해 본 향가의 발생, 성격, 내용, 형식...
[신라향가][고려향가][향가]신라 향가와 고려 향가를 통해 본 향가의 발생, 성격, 내용, 형식... [향가][향가 형식][향가 표기][향찰][향가 배경][향가 자연물 상징][향가 특징]향가 분석 고...
[향가][향가 형식][향가 표기][향찰][향가 배경][향가 자연물 상징][향가 특징]향가 분석 고... 한국문학통사 제 4판 1권 정리
한국문학통사 제 4판 1권 정리 광덕사 답사 보고서
광덕사 답사 보고서 [태권도, 태권도역사]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 및 특징 - 태권도의 유래와 기원, 본질, 태권도 ...
[태권도, 태권도역사]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 및 특징 - 태권도의 유래와 기원, 본질, 태권도 ... 대한민국세계문화유산
대한민국세계문화유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과 찬반의견, 선진외국사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과 찬반의견, 선진외국사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고시론- 향가 배경설화
고시론- 향가 배경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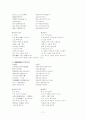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