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목차
* 문장의 성분
1. 문장과 문법 단위
2. 문장 성분의 종류
(1) 서술어와 주어
(2) 목적어와 보어
(3)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 문장의 짜임
1.문장의 짜임새
2.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
3. 이어진 문장
* 문법 요소
1 문장종결표현
2 높임표현
3.시간 표현
4. 피동 표현
5. 사동 표현
6 부정 표현
1. 문장과 문법 단위
2. 문장 성분의 종류
(1) 서술어와 주어
(2) 목적어와 보어
(3)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 문장의 짜임
1.문장의 짜임새
2.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
3. 이어진 문장
* 문법 요소
1 문장종결표현
2 높임표현
3.시간 표현
4. 피동 표현
5. 사동 표현
6 부정 표현
본문내용
, 보아지다, 들어지다’는 ‘-어지다’가 붙은 형태이다. 또한 ‘잡혀지다, 보여지다, 들려지다’는 접미사에 다시 ‘-어지다’가 붙은 형태인데, 이러한 이중 피동(중복 피동)도 삼가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 문장들의 의미 차이를 모둠별로 설명하여 보자.
①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②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혔다.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는 경우, 의미가 바뀌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부분 ①에서처럼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②와 같은 수량사 문장에서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①에서도 능동문에서는 주어(어마)가 목적어(아기)에 대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피동문에서는 행동에 주어(아기)의 의지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②에서는 능동문이 두 가지 의미(포수 열 명이 모두 함께 토끼 한 마리만 잡다, 포수 열 명이 각각 토끼 한 마리씩 잡다.)를 가질 수 있음에 비하여, 피동문은 첫 번째 의미만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86p
1. 다음 문장들을 괄호 속의 말을 주어로 하는 사동문으로 바꾸어 보자.
얼음이 녹는다.
→(난롯물이)
담이 높다.
→(아저씨가)
철수가 짐을 졌다.
→(아버지가)
2. 다음 예들을 관찰하여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는지 모둠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보자.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1. 사동문 만들기
① 얼음이 녹는다.
→(난롯불이) 얼음을 녹인다.(주어→목적어)
→(난롯불이) 얼음을 녹게 한다.(주어→목적어)
②담이 높다.
→(아저씨가) 담을 높인다.(주어→목적어)
→(아저씨가) 담을 높게 한다.(주어→목적어)
③철수가 짐을 졌다.
→(아버지가)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주어→부사어)
→(아버지가) 철수에게 짐을 지게 한다.(주어→부사어)
☞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얼음을, 담을)나 부사어(철수에게)로,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짐을)로 된다. 이 때 새로운 주어(난롯불이, 아저씨가, 아버지가)가 생겨난다. 주동문의 경우 서술어가 자동사이건 타동사이건 상관없으나, 사동문에서 서술어는 항상 타동사(사동사)로 바뀐다. 예문에서 ‘녹이, 높이다, 지우다’는 사동 접미사가 붙은 형태이고, ‘녹게 하다, 높게 하다, 지게 하다’는 ‘-게 하다’가 붙은 형태이다.
2.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구분하기
① 어머니 딸에게 옷을 입혔다.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②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 대개 파생적 사동문은 주어가 객체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내고, 통사적 사
동문은 간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낸다. ①의 예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입혔다’ 문장은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혀 주었다는 의미이고, ‘입게 하였다’ 문장 딸로 하여금 입게 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②와 같은 경우에는 파생적 사동문이든 통사적 사동문이든 모두 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는 서술어와 다른 성분들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8p
1. 다음에 짝지어진 두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여 보자.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밤잠도 못 잤다.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밤잠도 안 잤다.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못했다.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않았다.
2. 다음 예문을 관찰하여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의 차이를 설명하여 보자.
(가) 저도 그 사실을 안 모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나)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면 쓰지 못해요.
<탐구활동 풀이>
1.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 의미 차이 알기
①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밤잠도 못 잤다.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밤잠도 안 잤다.
②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못했다.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않았다.
☞ ‘못’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안’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①의 첫 문장은, 예컨대 몸이 아프든지 또는 몸이 너무 안 좋든지 하여 밥을 먹을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둘째 문장은 본인 의지로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의 의미 차이는 ②에 쓰인 ‘못하다’와 ’않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짧은 부정문이 ’안, 못‘ 형태에 비하여 긴 부정문인 ’않다, 못하다’ 형태에서도 의미가 간접적을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다.
2. 부정 표현의 특이성 탐구하기
(가) 저도 그 사실을 안 모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나)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면 쓰지 못해요.
☞ ‘모르다’나 ‘없다’ 같은 용언은 특수 부정어에 속한다. 이것들은 ‘안 모르다, 안 없다: 모르지 않다. 없지 않다’에서 알 수 있듯이 짧은 부정 표현은 불가능하고, 긴 부정 표현만 가능하다. 보조 용언 ‘말다’도 ‘안 읽어라, 안 읽자: 읽지 말아라, 읽지 말자’에서 보듯이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긴 부정 표현만 가능하므로, 특수 부정어라 할 만하다. (가)에서처럼 긴 부정문이 가능한 이유는 부정하는 의미가 ‘모르다’가 아닌 ‘저도 그 사실을 모르다’라는 문장 전체이기 때문이다.
부정 표현 중에는 짧은 부정문의 형태가 관용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도 많다. (나)에 사용된 ‘못 쓰다’라는 말도 역시 ‘바르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쓰지 못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문장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특히 (나)의 ‘못쓰다’는 합성어이므로 정서법상 붙여 써야 하는데 교과서에는 이해 편의상 띄어 썼으므로, 반드시 정서법상 붙이는 합성어임을 알려 주어야 함
가꾸기(189p)
1. 다음은 인터넷에 올려진 그리
2. 다음 문장들의 의미 차이를 모둠별로 설명하여 보자.
①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②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혔다.
☞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는 경우, 의미가 바뀌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부분 ①에서처럼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②와 같은 수량사 문장에서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①에서도 능동문에서는 주어(어마)가 목적어(아기)에 대해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피동문에서는 행동에 주어(아기)의 의지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②에서는 능동문이 두 가지 의미(포수 열 명이 모두 함께 토끼 한 마리만 잡다, 포수 열 명이 각각 토끼 한 마리씩 잡다.)를 가질 수 있음에 비하여, 피동문은 첫 번째 의미만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86p
1. 다음 문장들을 괄호 속의 말을 주어로 하는 사동문으로 바꾸어 보자.
얼음이 녹는다.
→(난롯물이)
담이 높다.
→(아저씨가)
철수가 짐을 졌다.
→(아버지가)
2. 다음 예들을 관찰하여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는지 모둠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보자.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셨다.
1. 사동문 만들기
① 얼음이 녹는다.
→(난롯불이) 얼음을 녹인다.(주어→목적어)
→(난롯불이) 얼음을 녹게 한다.(주어→목적어)
②담이 높다.
→(아저씨가) 담을 높인다.(주어→목적어)
→(아저씨가) 담을 높게 한다.(주어→목적어)
③철수가 짐을 졌다.
→(아버지가)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주어→부사어)
→(아버지가) 철수에게 짐을 지게 한다.(주어→부사어)
☞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목적어(얼음을, 담을)나 부사어(철수에게)로,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짐을)로 된다. 이 때 새로운 주어(난롯불이, 아저씨가, 아버지가)가 생겨난다. 주동문의 경우 서술어가 자동사이건 타동사이건 상관없으나, 사동문에서 서술어는 항상 타동사(사동사)로 바뀐다. 예문에서 ‘녹이, 높이다, 지우다’는 사동 접미사가 붙은 형태이고, ‘녹게 하다, 높게 하다, 지게 하다’는 ‘-게 하다’가 붙은 형태이다.
2.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구분하기
① 어머니 딸에게 옷을 입혔다.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②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였다.
☞ 대개 파생적 사동문은 주어가 객체에게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내고, 통사적 사
동문은 간접적인 행위를 한 것을 나타낸다. ①의 예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입혔다’ 문장은 어머니가 직접 옷을 입혀 주었다는 의미이고, ‘입게 하였다’ 문장 딸로 하여금 입게 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②와 같은 경우에는 파생적 사동문이든 통사적 사동문이든 모두 간접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는 서술어와 다른 성분들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8p
1. 다음에 짝지어진 두 부정문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여 보자.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밤잠도 못 잤다.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밤잠도 안 잤다.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못했다.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않았다.
2. 다음 예문을 관찰하여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의 차이를 설명하여 보자.
(가) 저도 그 사실을 안 모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나)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면 쓰지 못해요.
<탐구활동 풀이>
1.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 의미 차이 알기
①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밤잠도 못 잤다.
그는 꼬박 일 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밤잠도 안 잤다.
②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못했다.
예나는 침대에 누워 통 일어나지 않았다.
☞ ‘못’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안’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①의 첫 문장은, 예컨대 몸이 아프든지 또는 몸이 너무 안 좋든지 하여 밥을 먹을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둘째 문장은 본인 의지로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의 의미 차이는 ②에 쓰인 ‘못하다’와 ’않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짧은 부정문이 ’안, 못‘ 형태에 비하여 긴 부정문인 ’않다, 못하다’ 형태에서도 의미가 간접적을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다.
2. 부정 표현의 특이성 탐구하기
(가) 저도 그 사실을 안 모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나) 그런 말을 하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면 쓰지 못해요.
☞ ‘모르다’나 ‘없다’ 같은 용언은 특수 부정어에 속한다. 이것들은 ‘안 모르다, 안 없다: 모르지 않다. 없지 않다’에서 알 수 있듯이 짧은 부정 표현은 불가능하고, 긴 부정 표현만 가능하다. 보조 용언 ‘말다’도 ‘안 읽어라, 안 읽자: 읽지 말아라, 읽지 말자’에서 보듯이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긴 부정 표현만 가능하므로, 특수 부정어라 할 만하다. (가)에서처럼 긴 부정문이 가능한 이유는 부정하는 의미가 ‘모르다’가 아닌 ‘저도 그 사실을 모르다’라는 문장 전체이기 때문이다.
부정 표현 중에는 짧은 부정문의 형태가 관용 표현으로 굳어진 경우도 많다. (나)에 사용된 ‘못 쓰다’라는 말도 역시 ‘바르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쓰지 못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문장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특히 (나)의 ‘못쓰다’는 합성어이므로 정서법상 붙여 써야 하는데 교과서에는 이해 편의상 띄어 썼으므로, 반드시 정서법상 붙이는 합성어임을 알려 주어야 함
가꾸기(189p)
1. 다음은 인터넷에 올려진 그리
추천자료
 국어지식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국어지식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국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특징 및 다른 언어(영어)와의 비교연구
국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특징 및 다른 언어(영어)와의 비교연구 구결(口訣)에 대한 정리
구결(口訣)에 대한 정리 국어 지도안 (고등 국어 (하) 3. 함께하는 언어생활)
국어 지도안 (고등 국어 (하) 3. 함께하는 언어생활) 단어-형태론정리
단어-형태론정리 외래어 사용실태와 대책
외래어 사용실태와 대책 [명사구][품사]국어 품사 명사구의 유형, 국어 품사 명사구의 구조, 국어 품사 수량명사구, ...
[명사구][품사]국어 품사 명사구의 유형, 국어 품사 명사구의 구조, 국어 품사 수량명사구, ... [사범/아동] 아동발달 레포트
[사범/아동] 아동발달 레포트  성분 호응에 관한 국어교육적 소고
성분 호응에 관한 국어교육적 소고 c프로그래밍 실습 - 성적입력 프로그램
c프로그래밍 실습 - 성적입력 프로그램 2017년 2학기 맞춤법과표준어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맞춤법과표준어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맞춤법과표준어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2학기 맞춤법과표준어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방통대 2017학년 1학기 논문 영어학 A형] (논문주제 : 영어도치구문에 관한 연구-주어-동사 ...
방통대 2017학년 1학기 논문 영어학 A형] (논문주제 : 영어도치구문에 관한 연구-주어-동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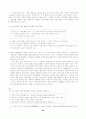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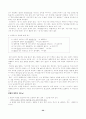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