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
< 본 론 >
1. 잡가의 범주 및 개념
2. 잡가의 명칭
3. 잡가의 발생과 전개, 소멸
4. 담당층과 향유층
5.잡가의 특성과 내용
6. 문학사적 의의
< 결 론 >
< 참 고 문 헌>
< 본 론 >
1. 잡가의 범주 및 개념
2. 잡가의 명칭
3. 잡가의 발생과 전개, 소멸
4. 담당층과 향유층
5.잡가의 특성과 내용
6. 문학사적 의의
< 결 론 >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대로 각 연의 뒤에 붙는 것이다. 여기에는 <황계사>, <백구사> 등이 있다. 셋째, 여음이 분절된 각 연의 앞뒤에 붙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유가>, <창부타령> 등이 있다. 넷째, 여음이 각 연의 뒤에 붙되,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붙는 것이다. 여기에는 <산염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여음이 각 연의 뒤에 붙는 것은 경기체가, 고려속요 등에 이미 보인 것이며 민요에 흔히 활용된 것을 잡가에서 원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작품의 내용
이노형은 잡가의 내용적 특징을 네 범주의 주제 유형으로 정리한바 있다. 그에 의하면 잡가는 남녀의 애정 문제, 대중이 추구하는 유흥의 문제, 대중의 현실 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삶에 대응하는 자세로서의 웃음의 문제 등을 중심적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노형,「한국 근대 대중가요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울산대출판부, 1994) pp.42-46.
위와 더불어 잡가의 내용은 전원예찬이라든지 세태풍자의 정신 등과 같은 민중의 보편적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잡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보았다. 노미원,「1910년대 유행한 잡가의 한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첫째,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잡가에 나타난 사랑노래의 특성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별한 일에 대한 그리움이라 축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먼저 임의 모습을 노래한 <놀량>, <판염불> 등이 있어, 눈에 암암 귀에 쟁쟁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임과의 약속이 허망하게 깨어졌음을 육자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저 건너 연당 앞에
백년 언약초를 심었더니
백년 언약초는 아니나고
금년 이별초가 피어 만발하였네
또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이별한 임은 소식마저 없다.
일조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어허야 좋을시고 -<황계사>
이렇게 임과 소식이 막힌 것은 인위적인 장벽이라 노래한 수심가도 있다.
또한 잡가에는 이러한 임에 대한 그리움 외에 탈선된 사랑도 보인다.
난사로구나 난사로구나
난사중에도 겹난사로구나
남의 임 정들여 놓고서
살자고 하기도 졉난사로구나 -<수성가>
그 외 조혼으로 인한 어린 남편에 대한 회의 등을 노래하여 정상적인 남녀 관계 외의 사랑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
둘째, 무상과 취락에 대한 것이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감을 늙을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것을 하소연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허무를 놀이와 술로 달래자고 노래한 것도 있다.
세월아 가지마라 청춘흥안이 속절없이 늙는구나
인생이 일장춘몽이로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늙어 백수를 날리면 못놀리라
人生一死는 萬乘天子 王侯將相 文章名筆 佳人才子
젊어 청춘에 마음대로 노자구나
무정한 세월이 덧없이 가더니
무심한 백발이 날 침노하는구나 -<수심가>
이러한 내용은 <날개타령> <단가> <난봉가> 등 여러 잡가에서 흔히 노래되고 있다.
셋째, 자연을 노래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시문을 인용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것과 소박한 우리 주변의 풍경을 노래한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유산가> 같은 것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날개타령>, <오동추야>, <방아타령> 등이 있다. 이제 <날개타령>을 예로 들어보자.
수양버들 심었더니 꾀꼬리 집을 지었네
뒷동산 고목남개 뻐꾸기 집을 지었네
이같이 소박한 자연이 노래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환경이 묘사된 것이다.
넷째, 판소리의 영향을 입은 잡가가 많다. <춘향가>에서는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잡가의 내용에도 <춘향가>의 소재들이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적벽가>에서는 <공명가>, <화용도> 등의 잡가가 만들어지고, <흥타령>, <자진산타령>, <자진육자배기> 등에도 <적벽가>의 내용이 삽입되고 있다.
그 밖에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등의 내용들이 잡가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잡가와 판소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정, 삶의 무상함, 취락,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류, 세상살이의 애환, 익살 등 내용은 다채로우나 전체적으로 보아 세속적, 쾌락주의적 지향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잡가는 철저히 현세적인 관점에서 삶의 여러 욕망과 그 성취, 지연, 좌절에 따른 감흥과 비애를 노래하며 이 세상 안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확실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6. 문학사적 의의
잡가의 사적 고찰은 우선 그 문학 양식을 배태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들을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 잡가가 성행했던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변화를 겪던 시기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문학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야기되던 시기였다.
잡가는 유흥문화가 발달하고, 상하층 문화의 간격이 좁아지며 갈래간의 개방이 진행되던 19세기 시가사의 정점에 선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다기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시가사에 등장한 잡가는 당시 전통적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실생활의 모습을 제한없이 표출하고자 했던 당대 민중들의 시대적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문학으로 볼 수 있다.
하층 소리꾼의 음악에서 출발한 잡가의 부상은 문학예술이 이념적계층적 굴레에서 벗어나 수용층을 넓혀가는 전문화평준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애경,「19세기 시가사의 전개와 잡가」,『조선후기 문학의 양상』(이회문화사, 2001) pp. 306-313.
조선 후기 하층민의 예술로 등장한 잡가가 근대화 이후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뛰어넘어 전 계층적 향유자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술적 가치 평가를 떠나서도 분명 어느 정도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양식은 민중적 양식들이 대중예술로 상승해 가는 문화적 민주화의 코스를 약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미숙,「20세기 초반 잡가 연구」,『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사의 구도』(소명, 1998) pp. 275-286.
잡가는 조선 후기 이후 근대로의 전환기에도, 민중의 다채로운 삶을 비추고 있다. 동학란 통에 병정이 된
이렇게 여음이 각 연의 뒤에 붙는 것은 경기체가, 고려속요 등에 이미 보인 것이며 민요에 흔히 활용된 것을 잡가에서 원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작품의 내용
이노형은 잡가의 내용적 특징을 네 범주의 주제 유형으로 정리한바 있다. 그에 의하면 잡가는 남녀의 애정 문제, 대중이 추구하는 유흥의 문제, 대중의 현실 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삶에 대응하는 자세로서의 웃음의 문제 등을 중심적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노형,「한국 근대 대중가요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울산대출판부, 1994) pp.42-46.
위와 더불어 잡가의 내용은 전원예찬이라든지 세태풍자의 정신 등과 같은 민중의 보편적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잡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보았다. 노미원,「1910년대 유행한 잡가의 한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첫째,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잡가에 나타난 사랑노래의 특성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별한 일에 대한 그리움이라 축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먼저 임의 모습을 노래한 <놀량>, <판염불> 등이 있어, 눈에 암암 귀에 쟁쟁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임과의 약속이 허망하게 깨어졌음을 육자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저 건너 연당 앞에
백년 언약초를 심었더니
백년 언약초는 아니나고
금년 이별초가 피어 만발하였네
또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이별한 임은 소식마저 없다.
일조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어허야 좋을시고 -<황계사>
이렇게 임과 소식이 막힌 것은 인위적인 장벽이라 노래한 수심가도 있다.
또한 잡가에는 이러한 임에 대한 그리움 외에 탈선된 사랑도 보인다.
난사로구나 난사로구나
난사중에도 겹난사로구나
남의 임 정들여 놓고서
살자고 하기도 졉난사로구나 -<수성가>
그 외 조혼으로 인한 어린 남편에 대한 회의 등을 노래하여 정상적인 남녀 관계 외의 사랑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
둘째, 무상과 취락에 대한 것이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감을 늙을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것을 하소연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허무를 놀이와 술로 달래자고 노래한 것도 있다.
세월아 가지마라 청춘흥안이 속절없이 늙는구나
인생이 일장춘몽이로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늙어 백수를 날리면 못놀리라
人生一死는 萬乘天子 王侯將相 文章名筆 佳人才子
젊어 청춘에 마음대로 노자구나
무정한 세월이 덧없이 가더니
무심한 백발이 날 침노하는구나 -<수심가>
이러한 내용은 <날개타령> <단가> <난봉가> 등 여러 잡가에서 흔히 노래되고 있다.
셋째, 자연을 노래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시문을 인용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것과 소박한 우리 주변의 풍경을 노래한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유산가> 같은 것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날개타령>, <오동추야>, <방아타령> 등이 있다. 이제 <날개타령>을 예로 들어보자.
수양버들 심었더니 꾀꼬리 집을 지었네
뒷동산 고목남개 뻐꾸기 집을 지었네
이같이 소박한 자연이 노래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환경이 묘사된 것이다.
넷째, 판소리의 영향을 입은 잡가가 많다. <춘향가>에서는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잡가의 내용에도 <춘향가>의 소재들이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적벽가>에서는 <공명가>, <화용도> 등의 잡가가 만들어지고, <흥타령>, <자진산타령>, <자진육자배기> 등에도 <적벽가>의 내용이 삽입되고 있다.
그 밖에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등의 내용들이 잡가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잡가와 판소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정, 삶의 무상함, 취락,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류, 세상살이의 애환, 익살 등 내용은 다채로우나 전체적으로 보아 세속적, 쾌락주의적 지향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잡가는 철저히 현세적인 관점에서 삶의 여러 욕망과 그 성취, 지연, 좌절에 따른 감흥과 비애를 노래하며 이 세상 안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확실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6. 문학사적 의의
잡가의 사적 고찰은 우선 그 문학 양식을 배태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의 관계들을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 잡가가 성행했던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변화를 겪던 시기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문학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야기되던 시기였다.
잡가는 유흥문화가 발달하고, 상하층 문화의 간격이 좁아지며 갈래간의 개방이 진행되던 19세기 시가사의 정점에 선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다기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시가사에 등장한 잡가는 당시 전통적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실생활의 모습을 제한없이 표출하고자 했던 당대 민중들의 시대적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문학으로 볼 수 있다.
하층 소리꾼의 음악에서 출발한 잡가의 부상은 문학예술이 이념적계층적 굴레에서 벗어나 수용층을 넓혀가는 전문화평준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애경,「19세기 시가사의 전개와 잡가」,『조선후기 문학의 양상』(이회문화사, 2001) pp. 306-313.
조선 후기 하층민의 예술로 등장한 잡가가 근대화 이후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뛰어넘어 전 계층적 향유자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술적 가치 평가를 떠나서도 분명 어느 정도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양식은 민중적 양식들이 대중예술로 상승해 가는 문화적 민주화의 코스를 약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미숙,「20세기 초반 잡가 연구」,『18세기에서 20세기 초 한국 시가사의 구도』(소명, 1998) pp. 275-286.
잡가는 조선 후기 이후 근대로의 전환기에도, 민중의 다채로운 삶을 비추고 있다. 동학란 통에 병정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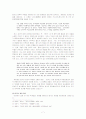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