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차자표기
(1) 구결(口訣)
(2) 이두(吏讀)
(3) 향찰(鄕札)
2. 신지글자[녹도문자]
3. 가림토문자(加臨土文字),가림다문자
< 훈민정음 재창제의 증거 >
(1) 구결(口訣)
(2) 이두(吏讀)
(3) 향찰(鄕札)
2. 신지글자[녹도문자]
3. 가림토문자(加臨土文字),가림다문자
< 훈민정음 재창제의 증거 >
본문내용
<정보화와 훈민정음 과제>
영남대학교 생물학과 4학년 20510991 원경애
훈민정음 이전에는 우리말을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한문은 한문 자체로만 쓰이지 않았다. 한문의 어법을 충실하게 지킨 본격한문의 문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문에다 우리말의 어순이나 형태를 보탠 <속한문체>라 할 것도 일찍부터 있었다.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서 좋은 본보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체를 \'서기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가 본격한문체로 일관했다면, [삼국유사]에는 속한문체가 섞여 있다. 한문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문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속한문체일 수밖에 없는데, 후대의 야담(野談)이나 소설(小說)에 그런 것들이 흔히 보인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른바 <차자 표기>도 일찍부터 있었다. 우리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차자 표기가 우리말을 적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관습으로 고착된 차자 표기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차자표기는 구결(口訣), 이두(吏讀), 향찰(鄕札)로 나눌 수 있다.
1.차자표기
차자 표기(借字表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문자화한 표기법으로 처음에는 인명, 지명 등 간단한 고유 명사에서부터 시작하여 탑비(塔碑)에 새긴 문장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차자 표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구결(口訣)
한문을 읽기 위해 한문 사이에 다는, 한자의 한 부분을 떼어 약호로 쓴 토로 한문 원전(漢文原典)을 읽을 때 그 뜻 및 독송(讀誦)의 편의를 위하여 각 구절 아래 달아 쓰는 문법적 요소의 총칭이다. 현토(懸吐) · 토(吐) · 석의(釋義)라고도 한다.
구결(口訣)이란 ‘입
영남대학교 생물학과 4학년 20510991 원경애
훈민정음 이전에는 우리말을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한문은 한문 자체로만 쓰이지 않았다. 한문의 어법을 충실하게 지킨 본격한문의 문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문에다 우리말의 어순이나 형태를 보탠 <속한문체>라 할 것도 일찍부터 있었다.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서 좋은 본보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체를 \'서기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가 본격한문체로 일관했다면, [삼국유사]에는 속한문체가 섞여 있다. 한문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문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속한문체일 수밖에 없는데, 후대의 야담(野談)이나 소설(小說)에 그런 것들이 흔히 보인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른바 <차자 표기>도 일찍부터 있었다. 우리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차자 표기가 우리말을 적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관습으로 고착된 차자 표기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차자표기는 구결(口訣), 이두(吏讀), 향찰(鄕札)로 나눌 수 있다.
1.차자표기
차자 표기(借字表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문자화한 표기법으로 처음에는 인명, 지명 등 간단한 고유 명사에서부터 시작하여 탑비(塔碑)에 새긴 문장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차자 표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구결(口訣)
한문을 읽기 위해 한문 사이에 다는, 한자의 한 부분을 떼어 약호로 쓴 토로 한문 원전(漢文原典)을 읽을 때 그 뜻 및 독송(讀誦)의 편의를 위하여 각 구절 아래 달아 쓰는 문법적 요소의 총칭이다. 현토(懸吐) · 토(吐) · 석의(釋義)라고도 한다.
구결(口訣)이란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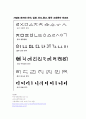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