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1文段 : 作品의 時間的․空間的 背景 및 天[月] + 地[水] + 人[酒․舟]이 渾然된 道敎的 仙境의 提示
第2文段 : [導入] ― 事(言)의 端과 그 先提的 象徵性.
第3文段 : 客의 佛敎的 諸行無常의 人生觀과 道敎的 要素.
第4文段 : 蘇子의 性理學的 儒敎的 人生觀과 道敎的 要素.
第5文段 : 和解와 融和의 境地.
第2文段 : [導入] ― 事(言)의 端과 그 先提的 象徵性.
第3文段 : 客의 佛敎的 諸行無常의 人生觀과 道敎的 要素.
第4文段 : 蘇子의 性理學的 儒敎的 人生觀과 道敎的 要素.
第5文段 : 和解와 融和의 境地.
본문내용
(넓은 기운)은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나아가듯 하여, 그 그칠 바를(곳을) 모르고[→어디에서 그쳐야 할지 모르고],
배가 떠가는 그 표표함(홀연한 기운 : 나부낌)은 속세의 모든 일을 잊고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홀로 서서, 날개가 돋쳐 신선이 되어 오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第1文段의 構造的巨視的 解釋方法에 依한 敍述]*
1. 時間的空間的 背景의 提示
2. 地 → 水
3. 人 → 舟酒詩歌
4. 天 → 月
5. 天地人이 融和渾然된 仙境의 [敍景].
6. 天地人이 融和渾然된 仙境의 [敍情].
※2.4.는 第4文段의 水月과 對比하여 前提的 伏線의 役割을 한다.
3.은 第5文段의 人 → 舟酌枕藉와 首尾相應의 役割을 한다.
第2文段 : [導入] ― 事(言)의 端과 그 先提的 象徵性.
1. 於是飮酒樂甚, 舷而歌之.
어시음주락심, 구현이가지.
이 때에 이르러 술을 마시니 즐거움이 더하여,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였다.
歌曰 : “桂棹兮蘭漿, 擊空明 水 + 月의 境地를 含蓄하는 句節이다.
兮流光 이 역시 水[地] + 月[天]의 境地를 含蓄하는 句節이다.
. 渺渺兮予懷, 望美人兮天一方.”
가왈 : “계도혜란장, 격공명 혜소류광. 묘묘혜여회, 망미인혜천일방.”
노래에 이르기를
\"계수나무 노(삿대)와 목란(木蘭) 상앗대(돛대)로, 속이 훤히 들이비치는 밝은 물을 쳐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오르도다. 아득하도다, 나의 회포여. 하늘 한 가에서 미인(美人)을 바라보는도다.\" 라 하였다.
2. 客有吹洞簫者, 倚歌而和之,
객유취통소자, 의가이화지,
손 중에 퉁소를 부는 이 있어, (나의) 노래에 따라(맞추어) 그에 화답(和答)하니,
其聲嗚嗚然, 如怨如慕, 如泣如訴, 여기까지 소리의 [內的 內容]을 比喩的 技法으로 敍述한 句節이다.
| 餘音, 不絶如縷, ) 여기까지 소리의 [外的 形象]을 視覺的 이미지의 技法으로 描寫한 句節이다.
舞幽壑之潛蛟, 泣孤舟之婦.
기성오오연, 여원여모, 여읍여소, 여음요뇨, 부절여루, 무유학지잠교, 읍고주지리부.
그 소리는 탄식하는 듯하여,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음(餘音)은 간들거리는바, 그 끊어지지 않음이 가늘게 실과 같이 이어져,
그윽한 골짜기의 물에 잠긴(숨어있는) 교룡(蛟龍)을 춤추이고,
외로운 배의 홀어미(과부)를 울린다(울릴만 하였다).
* [第2文段의 構造的巨視的 解釋方法에 依한 敍述]*
1. 第4文段 記載의 蘇子 스스로의 人生觀을 先提的으로 象徵敍述하여 글월을 導入하고 있다.
2. 第3文段 記載의 客의 人生觀을 先提的으로 象徵描寫하여 글월을 導入하고 있다.
* [起承轉結의 4段構成法의 見地에서 본 本 글월의 構成]*
本 글월은 本稿와 같은 5段構成이 아니라 起承轉結의 4段構成으로 區分되기도 하는바, 이 경우에는 本稿의 第2文段까지가 ‘起’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그 中
第1文段該當部分은 ‘起’의 部分으로서 視覺的 Image를 强調하고 있고
第2文段該當部分은 ‘起’의 部分으로서 聽覺的 Image를 强調하고 있다고 把握解釋할 수 있다.
第3文段 : 客의 佛敎的 諸行無常의 人生觀과 道敎的 要素.
1. 蘇子楸然, 正襟危坐, 而問客曰 : “何爲其然也?”
소자추연, 정금위좌, 이문객왈 : “하위기연야?”
나는 처량하고 슬퍼서 옷깃을 바로잡고 곧추(단정히) 앉아 손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런 곡을 부는가?”라고 하였다.
2. 客曰 객왈 : 손은 말하기를,
“月明星稀 이는 조조(曹孟德)의 ‘乘勝長驅’의 側面에 對한 象徵的 詩句이다.
, 烏鵲南飛, 此非曹孟德之詩 曹孟德之詩 : 魏 武帝 曹操(字: 孟德)의 詩 <短歌行>에 明月星稀 烏鵲南飛 라는 句가 나옴.“ 달이 밝으면 별이 드물다”는 것은 조조 자신의 威力에 群雄이 그림자를 감추는 것과 같다는 뜻.
乎?
“월명성희, 오작남비, 차비조맹덕지시 호?
“<달이 밝아 별이 성긴데(적은데) 까막까치가 남쪽으로 날>고 있는데,
이는 조맹덕(曹孟德 : 조조)의 詩가 아닌가?(詩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西望夏口, 東望武昌, 山川相繆, 鬱乎蒼蒼 이는 조조(曹孟德)의 ‘四面楚歌 내지 敗走’의 側面(←孟德之困於周郞者)에 對한 象徵的 語句이다. 즉, 이 자체가 조조(曹孟德)가 周郞에게 곤혹을 당하는 点을 事物에 빗대어 視覺的으로 描寫한 部分이다.
, 此非孟德之困於周郞者乎?
서망하구, 동망무창, 산천상무, 울호창창, 차비맹덕지곤어주랑자호?
서쪽으로 하구(夏口)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武昌)을 바라보니, 산천(山川)이 서로 얽히고
배가 떠가는 그 표표함(홀연한 기운 : 나부낌)은 속세의 모든 일을 잊고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홀로 서서, 날개가 돋쳐 신선이 되어 오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第1文段의 構造的巨視的 解釋方法에 依한 敍述]*
1. 時間的空間的 背景의 提示
2. 地 → 水
3. 人 → 舟酒詩歌
4. 天 → 月
5. 天地人이 融和渾然된 仙境의 [敍景].
6. 天地人이 融和渾然된 仙境의 [敍情].
※2.4.는 第4文段의 水月과 對比하여 前提的 伏線의 役割을 한다.
3.은 第5文段의 人 → 舟酌枕藉와 首尾相應의 役割을 한다.
第2文段 : [導入] ― 事(言)의 端과 그 先提的 象徵性.
1. 於是飮酒樂甚, 舷而歌之.
어시음주락심, 구현이가지.
이 때에 이르러 술을 마시니 즐거움이 더하여,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였다.
歌曰 : “桂棹兮蘭漿, 擊空明 水 + 月의 境地를 含蓄하는 句節이다.
兮流光 이 역시 水[地] + 月[天]의 境地를 含蓄하는 句節이다.
. 渺渺兮予懷, 望美人兮天一方.”
가왈 : “계도혜란장, 격공명 혜소류광. 묘묘혜여회, 망미인혜천일방.”
노래에 이르기를
\"계수나무 노(삿대)와 목란(木蘭) 상앗대(돛대)로, 속이 훤히 들이비치는 밝은 물을 쳐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오르도다. 아득하도다, 나의 회포여. 하늘 한 가에서 미인(美人)을 바라보는도다.\" 라 하였다.
2. 客有吹洞簫者, 倚歌而和之,
객유취통소자, 의가이화지,
손 중에 퉁소를 부는 이 있어, (나의) 노래에 따라(맞추어) 그에 화답(和答)하니,
其聲嗚嗚然, 如怨如慕, 如泣如訴, 여기까지 소리의 [內的 內容]을 比喩的 技法으로 敍述한 句節이다.
| 餘音, 不絶如縷, ) 여기까지 소리의 [外的 形象]을 視覺的 이미지의 技法으로 描寫한 句節이다.
舞幽壑之潛蛟, 泣孤舟之婦.
기성오오연, 여원여모, 여읍여소, 여음요뇨, 부절여루, 무유학지잠교, 읍고주지리부.
그 소리는 탄식하는 듯하여,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음(餘音)은 간들거리는바, 그 끊어지지 않음이 가늘게 실과 같이 이어져,
그윽한 골짜기의 물에 잠긴(숨어있는) 교룡(蛟龍)을 춤추이고,
외로운 배의 홀어미(과부)를 울린다(울릴만 하였다).
* [第2文段의 構造的巨視的 解釋方法에 依한 敍述]*
1. 第4文段 記載의 蘇子 스스로의 人生觀을 先提的으로 象徵敍述하여 글월을 導入하고 있다.
2. 第3文段 記載의 客의 人生觀을 先提的으로 象徵描寫하여 글월을 導入하고 있다.
* [起承轉結의 4段構成法의 見地에서 본 本 글월의 構成]*
本 글월은 本稿와 같은 5段構成이 아니라 起承轉結의 4段構成으로 區分되기도 하는바, 이 경우에는 本稿의 第2文段까지가 ‘起’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그 中
第1文段該當部分은 ‘起’의 部分으로서 視覺的 Image를 强調하고 있고
第2文段該當部分은 ‘起’의 部分으로서 聽覺的 Image를 强調하고 있다고 把握解釋할 수 있다.
第3文段 : 客의 佛敎的 諸行無常의 人生觀과 道敎的 要素.
1. 蘇子楸然, 正襟危坐, 而問客曰 : “何爲其然也?”
소자추연, 정금위좌, 이문객왈 : “하위기연야?”
나는 처량하고 슬퍼서 옷깃을 바로잡고 곧추(단정히) 앉아 손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런 곡을 부는가?”라고 하였다.
2. 客曰 객왈 : 손은 말하기를,
“月明星稀 이는 조조(曹孟德)의 ‘乘勝長驅’의 側面에 對한 象徵的 詩句이다.
, 烏鵲南飛, 此非曹孟德之詩 曹孟德之詩 : 魏 武帝 曹操(字: 孟德)의 詩 <短歌行>에 明月星稀 烏鵲南飛 라는 句가 나옴.“ 달이 밝으면 별이 드물다”는 것은 조조 자신의 威力에 群雄이 그림자를 감추는 것과 같다는 뜻.
乎?
“월명성희, 오작남비, 차비조맹덕지시 호?
“<달이 밝아 별이 성긴데(적은데) 까막까치가 남쪽으로 날>고 있는데,
이는 조맹덕(曹孟德 : 조조)의 詩가 아닌가?(詩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西望夏口, 東望武昌, 山川相繆, 鬱乎蒼蒼 이는 조조(曹孟德)의 ‘四面楚歌 내지 敗走’의 側面(←孟德之困於周郞者)에 對한 象徵的 語句이다. 즉, 이 자체가 조조(曹孟德)가 周郞에게 곤혹을 당하는 点을 事物에 빗대어 視覺的으로 描寫한 部分이다.
, 此非孟德之困於周郞者乎?
서망하구, 동망무창, 산천상무, 울호창창, 차비맹덕지곤어주랑자호?
서쪽으로 하구(夏口)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武昌)을 바라보니, 산천(山川)이 서로 얽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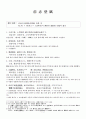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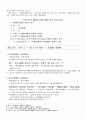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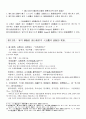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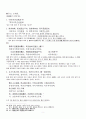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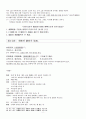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