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기
특징
길이
심장
갈비뼈 아래 폐 사이에 위치
1.6cm
폐
5개의 엽이 겹친 모양
3.7cm
소장
흐물흐물 한 관들의 연속
86cm 지름 약 5mm
대장~직장
소장과 비슷함
18cm
간
6개의 lobe로 이루어짐
6.2cm
신장
좌우가 동일한 강낭콩 모양
1.9cm
맹장
크기가 상당히 컸고 초록색을 띰
5.5cm
정낭
좌우 한 쌍으로 핑크색에 핏줄이 비침
1.4cm
고환
2.1cm
위
크기는 간보다 작았고 아래에 십이지장으로 가는 관이 연결되어 있음
4.5cm
고 찰 :
마취유도를 빠르게 하는 인자로서는 호흡회로 내의 마취제 농도의 증가 이외에도 새 가스의 공급량의 증가, 폐환기량의 증가, 심박출량의 감소, 이차 가스 효과, 비재호흡회로, 낮은 혈액, 가스용해상수가 있다. 마취제의 흡입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폐포 내의 마취제 농도 증가 속조가 빨라지고, 흡입용적도 더욱 증가하여 폐포 내 가스농도가 흡입농도에 빨리 접근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은 그림8에서 볼 수 있는 농축작용과 환기증가 작용으로 구성된다. 환기 증가 작용이란 많은 양의 마취제가 흡수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회로와 기관내의 공기가 폐포 내로 이동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환기량이 증가해 마취유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4)
그림8 농축작용
마취제 투여량에 따른 Rat의 마취유도 및 회복단계를 관찰하는 실험1에서 에테르를 전용량(12ml/kg) 투여 했을 때와 1/2용량(6ml/kg) 투여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론상 전용량을 투여했을 때 유도시간이 빠르고 회복시간은 느려야 하지만 저용량을 투여한 7대의 rat은 9분만에 정좌 반사가 소실되었고, 전용량을 투여한 우리 조 rat은 10분이 지나서야 정좌반사가 소실되었다. 이는 마취 유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좌반사가 소실된 시점을 정하는데 있어서 조별 판단기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같은 rat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론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조의 rat이 7대의 rat보다 흥분상태에 있었으며 움직임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Ether 의 투여용량 차이에 의한 마취유도시간 비교 실험은 같은 조건(실험동물의 종류, 성별, 정신상태)에서 같은 실험자가 실시했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실험이었다.
회복시간의 경우 저용량을 사용한 7대가 2분 20초로 고용량을 사용한 우리 조가 4분이 걸렸다. 고용량의 마취제가 저 용량의 마취제보다 회복시간이 더 길어짐을 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마취유도시간과 회복시간이 이론상으로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만 실제 결과 유도시간이 회복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다.
Preanesthetic medication (morphine)의 마취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2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론상 마취보조제를 쓴 경우가 유도시간이 감소해야 하는데 결과 역시 실험 1보다 유도시간이 감소했다. 이는 마취 전 투약이 마취의 유도를 돕는 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morphine의 경우 양이 과다하면 근육의 강직현상이 나타나고 호흡이 억제되며 분비물 감소 동공의 수축이 일어나며 morphine의 양이 치사량을 넘게 되면 죽기도 한다. 우리 조의 경우 고용량의 morphine을 투여하여 마취이전에 이미 쥐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ether를 투여하고 나서도 거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었다. 마취회복의 경우 이론상 마취제를 투여했을 때 보다 마취보조제를 함께 투여했을 때 더 늦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마취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 1과 비교했을 때 마취유도시간도 빠르고 회복시간도 빨랐다. 우리조의 경우 고용량의 Morphine을 사용하여서 계속 마취가 된 듯 하게 보였으므로 마취 유도시간을 정확히 측정을 못했고 그에 따라 마취 회복시간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rat의 해부 실험에서는 해부를 하자마자 보이는 것이 방광으로 방광이 굉장히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서 터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서 해부를 시작했다. rat의 몸통은 그 길이가 15cm 남짓했으나 소장의 길이가 무려 86cm 나 되었고 사람과는 달리 맹장이 매우 큰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사람과 비슷하게 여러 엽으로 이루어진 폐와 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소화기관을 모두 제거하자 등 쪽으로 두개의 강낭콩모양의 신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배를 가를 때 조금 윗부분부터 해서 인지 정소가 보이지 않아 핀셋으로 꺼내서 정관부분에 연노란색의 꼬불거리는 점을 볼 수 있었다.
rat의 뇌는 교수님 말씀과 같이 정말 lobe 없어서 뇌 같이 안 보였다. 뇌 해부에서 대뇌피질을 펼치자 양옆으로 펼 칠 수 있었고, 주변조직보다 약간 희고 빗살무늬를 가늘게 가진 선조제(Striatum)를 볼 수 있었다. 선조체 옆으로 희미하게 해마(hippocampus)가 보였다. 선조체와 해마를 찾기 위해 시간을 지체했더니 뇌가 흐물하게 되어서 소뇌와 중뇌, 시상하부는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처음에 조교님이 단두 치사 시범을 보일 때 징그러워서 고개를 돌렸는데 계속하다보니깐 적응이 돼서 단두치사를 하는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게 되었다. 단두를 한 뒤에 몸통을 보니 잘린 쪽으로 뭔가가 계속 튀어 나오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심장 이었다. 죽은 뒤에도 몸이 움직이는 것과 몸통 해부를 거의 끝냈을 때도 심장이 약하게 뛰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험을 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험을 무사히 끝나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역시 실험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 지는 것을 보니 실험이 끝날때쯤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쥐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Reference
1. www.Kweather.co.kr
2. 김화정교수님 약물학2 Anesthetic 강의록
3.김동수 마취과학 핵심분석 99~123p(1993)
4. 선배 족보 02학번 문성주
5.유기의약품화학 편찬위원회 유기의약품화학 (각론) 4p(2008)
6.김경환 엮음, 이우주의 약리학 강의 4판 p277~293(2001)
특징
길이
심장
갈비뼈 아래 폐 사이에 위치
1.6cm
폐
5개의 엽이 겹친 모양
3.7cm
소장
흐물흐물 한 관들의 연속
86cm 지름 약 5mm
대장~직장
소장과 비슷함
18cm
간
6개의 lobe로 이루어짐
6.2cm
신장
좌우가 동일한 강낭콩 모양
1.9cm
맹장
크기가 상당히 컸고 초록색을 띰
5.5cm
정낭
좌우 한 쌍으로 핑크색에 핏줄이 비침
1.4cm
고환
2.1cm
위
크기는 간보다 작았고 아래에 십이지장으로 가는 관이 연결되어 있음
4.5cm
고 찰 :
마취유도를 빠르게 하는 인자로서는 호흡회로 내의 마취제 농도의 증가 이외에도 새 가스의 공급량의 증가, 폐환기량의 증가, 심박출량의 감소, 이차 가스 효과, 비재호흡회로, 낮은 혈액, 가스용해상수가 있다. 마취제의 흡입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폐포 내의 마취제 농도 증가 속조가 빨라지고, 흡입용적도 더욱 증가하여 폐포 내 가스농도가 흡입농도에 빨리 접근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것은 그림8에서 볼 수 있는 농축작용과 환기증가 작용으로 구성된다. 환기 증가 작용이란 많은 양의 마취제가 흡수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회로와 기관내의 공기가 폐포 내로 이동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환기량이 증가해 마취유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4)
그림8 농축작용
마취제 투여량에 따른 Rat의 마취유도 및 회복단계를 관찰하는 실험1에서 에테르를 전용량(12ml/kg) 투여 했을 때와 1/2용량(6ml/kg) 투여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론상 전용량을 투여했을 때 유도시간이 빠르고 회복시간은 느려야 하지만 저용량을 투여한 7대의 rat은 9분만에 정좌 반사가 소실되었고, 전용량을 투여한 우리 조 rat은 10분이 지나서야 정좌반사가 소실되었다. 이는 마취 유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좌반사가 소실된 시점을 정하는데 있어서 조별 판단기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같은 rat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론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조의 rat이 7대의 rat보다 흥분상태에 있었으며 움직임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Ether 의 투여용량 차이에 의한 마취유도시간 비교 실험은 같은 조건(실험동물의 종류, 성별, 정신상태)에서 같은 실험자가 실시했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 실험이었다.
회복시간의 경우 저용량을 사용한 7대가 2분 20초로 고용량을 사용한 우리 조가 4분이 걸렸다. 고용량의 마취제가 저 용량의 마취제보다 회복시간이 더 길어짐을 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마취유도시간과 회복시간이 이론상으로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만 실제 결과 유도시간이 회복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다.
Preanesthetic medication (morphine)의 마취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2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론상 마취보조제를 쓴 경우가 유도시간이 감소해야 하는데 결과 역시 실험 1보다 유도시간이 감소했다. 이는 마취 전 투약이 마취의 유도를 돕는 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morphine의 경우 양이 과다하면 근육의 강직현상이 나타나고 호흡이 억제되며 분비물 감소 동공의 수축이 일어나며 morphine의 양이 치사량을 넘게 되면 죽기도 한다. 우리 조의 경우 고용량의 morphine을 투여하여 마취이전에 이미 쥐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ether를 투여하고 나서도 거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었다. 마취회복의 경우 이론상 마취제를 투여했을 때 보다 마취보조제를 함께 투여했을 때 더 늦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마취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 1과 비교했을 때 마취유도시간도 빠르고 회복시간도 빨랐다. 우리조의 경우 고용량의 Morphine을 사용하여서 계속 마취가 된 듯 하게 보였으므로 마취 유도시간을 정확히 측정을 못했고 그에 따라 마취 회복시간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rat의 해부 실험에서는 해부를 하자마자 보이는 것이 방광으로 방광이 굉장히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서 터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서 해부를 시작했다. rat의 몸통은 그 길이가 15cm 남짓했으나 소장의 길이가 무려 86cm 나 되었고 사람과는 달리 맹장이 매우 큰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사람과 비슷하게 여러 엽으로 이루어진 폐와 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소화기관을 모두 제거하자 등 쪽으로 두개의 강낭콩모양의 신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배를 가를 때 조금 윗부분부터 해서 인지 정소가 보이지 않아 핀셋으로 꺼내서 정관부분에 연노란색의 꼬불거리는 점을 볼 수 있었다.
rat의 뇌는 교수님 말씀과 같이 정말 lobe 없어서 뇌 같이 안 보였다. 뇌 해부에서 대뇌피질을 펼치자 양옆으로 펼 칠 수 있었고, 주변조직보다 약간 희고 빗살무늬를 가늘게 가진 선조제(Striatum)를 볼 수 있었다. 선조체 옆으로 희미하게 해마(hippocampus)가 보였다. 선조체와 해마를 찾기 위해 시간을 지체했더니 뇌가 흐물하게 되어서 소뇌와 중뇌, 시상하부는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처음에 조교님이 단두 치사 시범을 보일 때 징그러워서 고개를 돌렸는데 계속하다보니깐 적응이 돼서 단두치사를 하는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게 되었다. 단두를 한 뒤에 몸통을 보니 잘린 쪽으로 뭔가가 계속 튀어 나오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심장 이었다. 죽은 뒤에도 몸이 움직이는 것과 몸통 해부를 거의 끝냈을 때도 심장이 약하게 뛰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험을 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험을 무사히 끝나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역시 실험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 지는 것을 보니 실험이 끝날때쯤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쥐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Reference
1. www.Kweather.co.kr
2. 김화정교수님 약물학2 Anesthetic 강의록
3.김동수 마취과학 핵심분석 99~123p(1993)
4. 선배 족보 02학번 문성주
5.유기의약품화학 편찬위원회 유기의약품화학 (각론) 4p(2008)
6.김경환 엮음, 이우주의 약리학 강의 4판 p277~293(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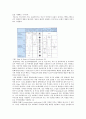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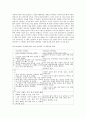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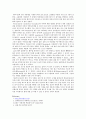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