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에서는 왕비를 중심으로 무속행위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80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3. 성무과정
성무과정은 무속신의 점지나 선택에 의해서 무업(無業)울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성무과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할 사항은 입무의 유형이다.무당이 되는 과정이나 필연적 사유는 각양각색이나 유형화해서 두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신의 소명을 받고 인간적인 생활을 벗어나 신을 모시는 유형.신의 소명은 흔히 무병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유형을 강신무라 하고 혈연적인 유대를 통해서 세습되는 유형. 이를 세습무라 한다.
4. 무당의 유형
무당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그 성격에 따라 무당형, 단골형, 심방형, 명두형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무당형
중부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과 박수가 해당된다. 강신체험에 의해 영력을 획득하고 강신한 몸주신을 비롯한 체험 신을 모신 신단이 있으며 가무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인 동시에 영력에 의해 점을 치기도 하는 무당이다. 무당이 한 신만 무시는 것은 아니지만 몸주신은 그가 섬기는 주신을 일컫는다.
나)단골형
단골형은 호남과 영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무당을 호남에서는 단골, 영남에서는 무당이라고 한다. 이들 단골형은 혈통에 따라 사제권이 세습되고 단골판이라는 일정한 관할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만 굿을 할 수 있다. 단골판도 형통에 따라 세습되며 비록 신을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굿 학습을 거친 무당이어서 정통굿을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강신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통력이 없고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지 않아 신을 모시는 신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심방형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을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단골형과 마찬가지로 무의 사제권이 혈통에 의해 계승되는 세습무로서 무속상의 제도화된 일면을 보인다. 그러나 무당형처럼 영력을 중시하며 신의 인식이 확고하여 구체화된 신관이 확립되어 있으나 자기 집에 신단은 없는 것이 보편적이다. 직접적인 강신영매가 없이 매개물인 명도. 천문. 상잔과 같은 무점구를 통해 신의 뜻을 물어 점을 칠 수 있고 신을 향해 일방적인 가무로 정통굿을 하는 사제다. 따라서 심방형은 단골형과 무당형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는데 제의 때 무가 신격화하지 못하는 점에서 단골형에 가깝다.
라)명두형
숨진 아이가 영이 된 사아령의 강신체험을 통해서 된 무당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아이의 영이 강신된다. 여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당을 명두, 남자 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동자 또는 태주라고 한다.
강신무- 무당형. 명두형. 무당형+명두형
세습무-단골형과 심방형
강신무의 학습과정
신의 소명을 실현하고 무병을 치유하는 일차적 기능이 내림굿에 있다. 신의 소명이 구체화 되는 절차가 허주굿이다. 허주굿은 내림굿을 하기 전에 무(巫)로서의 위력을 나타내는 절차이다. 대개가 손뼉을 치고, 신의 권세에 의한 예언과 점지를 한다. 이 과정에서 몸에 씌인 허주를 벗겨내야 정신이 맑아지면서 참다운 자신의 신격을 모실 수 있다. 이 때에는 예언과 점지
3. 성무과정
성무과정은 무속신의 점지나 선택에 의해서 무업(無業)울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성무과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어야 할 사항은 입무의 유형이다.무당이 되는 과정이나 필연적 사유는 각양각색이나 유형화해서 두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신의 소명을 받고 인간적인 생활을 벗어나 신을 모시는 유형.신의 소명은 흔히 무병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유형을 강신무라 하고 혈연적인 유대를 통해서 세습되는 유형. 이를 세습무라 한다.
4. 무당의 유형
무당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그 성격에 따라 무당형, 단골형, 심방형, 명두형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무당형
중부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과 박수가 해당된다. 강신체험에 의해 영력을 획득하고 강신한 몸주신을 비롯한 체험 신을 모신 신단이 있으며 가무로 정통굿을 주관하는 사제인 동시에 영력에 의해 점을 치기도 하는 무당이다. 무당이 한 신만 무시는 것은 아니지만 몸주신은 그가 섬기는 주신을 일컫는다.
나)단골형
단골형은 호남과 영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무당을 호남에서는 단골, 영남에서는 무당이라고 한다. 이들 단골형은 혈통에 따라 사제권이 세습되고 단골판이라는 일정한 관할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만 굿을 할 수 있다. 단골판도 형통에 따라 세습되며 비록 신을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굿 학습을 거친 무당이어서 정통굿을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강신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통력이 없고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지 않아 신을 모시는 신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심방형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을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단골형과 마찬가지로 무의 사제권이 혈통에 의해 계승되는 세습무로서 무속상의 제도화된 일면을 보인다. 그러나 무당형처럼 영력을 중시하며 신의 인식이 확고하여 구체화된 신관이 확립되어 있으나 자기 집에 신단은 없는 것이 보편적이다. 직접적인 강신영매가 없이 매개물인 명도. 천문. 상잔과 같은 무점구를 통해 신의 뜻을 물어 점을 칠 수 있고 신을 향해 일방적인 가무로 정통굿을 하는 사제다. 따라서 심방형은 단골형과 무당형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는데 제의 때 무가 신격화하지 못하는 점에서 단골형에 가깝다.
라)명두형
숨진 아이가 영이 된 사아령의 강신체험을 통해서 된 무당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아이의 영이 강신된다. 여자아이의 영이 내린 무당을 명두, 남자 아이의 영이 내린 무를 동자 또는 태주라고 한다.
강신무- 무당형. 명두형. 무당형+명두형
세습무-단골형과 심방형
강신무의 학습과정
신의 소명을 실현하고 무병을 치유하는 일차적 기능이 내림굿에 있다. 신의 소명이 구체화 되는 절차가 허주굿이다. 허주굿은 내림굿을 하기 전에 무(巫)로서의 위력을 나타내는 절차이다. 대개가 손뼉을 치고, 신의 권세에 의한 예언과 점지를 한다. 이 과정에서 몸에 씌인 허주를 벗겨내야 정신이 맑아지면서 참다운 자신의 신격을 모실 수 있다. 이 때에는 예언과 점지
키워드
추천자료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하여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하여 월명사와 도솔가, 처용랑과 망해사의 내용풀이와 배경설화, 작품 해석의 문학적 관점, 민속학...
월명사와 도솔가, 처용랑과 망해사의 내용풀이와 배경설화, 작품 해석의 문학적 관점, 민속학...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기독교 가정의 역할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기독교 가정의 역할 [인문과학] 한국의 무속신앙
[인문과학] 한국의 무속신앙 지모신 숭배신앙
지모신 숭배신앙 [한국문화사]한국 무속신앙의 이해
[한국문화사]한국 무속신앙의 이해 [단군신화][민족주의][홍익인간][학교교육][학교교육]단군신화 분석 및 민족주의, 홍익인간과...
[단군신화][민족주의][홍익인간][학교교육][학교교육]단군신화 분석 및 민족주의, 홍익인간과... [무속][무속의 성격][무속의 역사][무속의 유형][무속의 분포][개인 신당][굿당][무][무가][...
[무속][무속의 성격][무속의 역사][무속의 유형][무속의 분포][개인 신당][굿당][무][무가][... 평가인증 통과한 우리나라 세계여러나라 6~7세 통합 보육일지 :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옷
평가인증 통과한 우리나라 세계여러나라 6~7세 통합 보육일지 :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옷 [책요약] 한국의 토속신앙
[책요약] 한국의 토속신앙 우리나라의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문화
우리나라의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문화 한국 전통놀이(민속놀이) 정의, 가치, 한국 전통놀이(민속놀이)와 놀이, 단계별전통놀이, 한...
한국 전통놀이(민속놀이) 정의, 가치, 한국 전통놀이(민속놀이)와 놀이, 단계별전통놀이, 한... [민속행사와 이벤트] 민속행사와 지역이벤트, 민속행사이벤트의 문제점 (민속행사의 개념, 민...
[민속행사와 이벤트] 민속행사와 지역이벤트, 민속행사이벤트의 문제점 (민속행사의 개념, 민... [보육保育학개론] 한국 전통 사상에 따른 아동관과 아동 교육 및 우리나라 전통 보육에 대한 ...
[보육保育학개론] 한국 전통 사상에 따른 아동관과 아동 교육 및 우리나라 전통 보육에 대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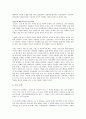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