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림별곡> 을 중심으로 본 경기체가의 작자층 연구
서론
본론
1. 신흥사대부
2. <한림별곡>과 신흥사대부
3. <한림별곡> 속 현실인식에 대한 두 견해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서론
본론
1. 신흥사대부
2. <한림별곡>과 신흥사대부
3. <한림별곡> 속 현실인식에 대한 두 견해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인해, 신라 이래의 오랜 인습을 지켜오며 권력을 독점했던 문벌 귀족이 몰락했다. 이와 함께 특권의식모화사상형식주의를 특징으로 삼는 문벌귀족의 문학이 청산되었다. 무신란 이후, 사회진출이 억제되었던 지방 향리 또는 중소 지주층에 기반을 둔 문인들이 중앙 정계로까지 등장해서 새로운 문학을 이룩하는 주체가 되었다. 무신란 이후 최충헌의 집권기에는 가문의 전통이나 문벌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우성ㄴ적으로 참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문학에 대한 재능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문재(文才)와 이재(吏才)가 가치척도의 기준이 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무신란 이후 새로이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 초토화된 정치현실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재등용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을 기용(起用)할 필요성을 느꼈고, 둘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지원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휘하에 두었던 3천여명의 문객들 가운데 신분의 구애됨이 없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함이며, 셋째로는 무신란 전후에 걸쳐 격렬하게 일어났던 농민반란과 무인들의 급격한 사회적 위치가 상승됨으로써 민중의식이 팽배하여 인물의 평가를 문벌위주에서 개인의 능력본위로 하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 번째의 원인에 유의하여 보자.
이들의 출신과 처세관은 다양했지만, 단 하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관직에 나가 포부를 실현하고자하는 욕구였다.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관직에 나가지 못했을 때 비탄에 빠져 지은 시문이나, 사치나 향락 속에 아첨과 찬양이 넘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잔치에 참여해서는 그를 들어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고려사 악지>에 따르면, 한림별곡의 작가를 \'한림제유\'라고 한다. \'한림\'이란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선비를 일컫고, \'제유\'란 이 한림원 고려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본떠서 원봉성(元奉省)을 두고, 뒤에 학사원이라 하다가 8대 현종 때에 다시 한림원이라 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한림원으로 되었고, 1362년(공민왕 11)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바뀌었다.
에 종사하는 선비를 뜻한다. 그러므로 \'한림제유\'는 일정한 수준의 학문과 덕망을 갖춘 한림원의 문인 벼슬아치로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층을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문인은 고려 전반에 걸친 문신이 아닌, 고려 고종시대(1213~1259)사이의 인물을 말한다.
<한림별곡>은 총 8장으로 되어 있어, 당시 최충헌 정권에서 벼슬을 하던 문인들이 함께 놀면서 한 대목씩 지어 부르는 돌림노래를 짓지 않았던가 한다. 한림별곡을 읽으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과 원용되고 있는 소재를 살펴보면 작가의 현실적 위치와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림별곡의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 곡의 작가로 보고, 그들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1장
元淳文(원
이들의 출신과 처세관은 다양했지만, 단 하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관직에 나가 포부를 실현하고자하는 욕구였다.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관직에 나가지 못했을 때 비탄에 빠져 지은 시문이나, 사치나 향락 속에 아첨과 찬양이 넘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잔치에 참여해서는 그를 들어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고려사 악지>에 따르면, 한림별곡의 작가를 \'한림제유\'라고 한다. \'한림\'이란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선비를 일컫고, \'제유\'란 이 한림원 고려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에 태봉(泰封)의 제도를 본떠서 원봉성(元奉省)을 두고, 뒤에 학사원이라 하다가 8대 현종 때에 다시 한림원이라 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한림원으로 되었고, 1362년(공민왕 11)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바뀌었다.
에 종사하는 선비를 뜻한다. 그러므로 \'한림제유\'는 일정한 수준의 학문과 덕망을 갖춘 한림원의 문인 벼슬아치로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층을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문인은 고려 전반에 걸친 문신이 아닌, 고려 고종시대(1213~1259)사이의 인물을 말한다.
<한림별곡>은 총 8장으로 되어 있어, 당시 최충헌 정권에서 벼슬을 하던 문인들이 함께 놀면서 한 대목씩 지어 부르는 돌림노래를 짓지 않았던가 한다. 한림별곡을 읽으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과 원용되고 있는 소재를 살펴보면 작가의 현실적 위치와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림별곡의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 곡의 작가로 보고, 그들의 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1장
元淳文(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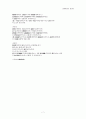









소개글